
이 ‘꽃가라’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여성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진부한 의미의 패턴이라는 뜻이 담겼다. 이러한 편견은 ‘긴 생머리’와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가 종종 남성의 판타지를 구성하는 여성의 ‘룩’이 된다는 ‘팩트’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폴 스미스 같은 디자이너가 플로랄 프린트의 남성 재킷이나 셔츠, 바지 같은 아이템을 내놓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플로랄 프린트를 입은 남성은 모두 게이인가? 물론 아니다. 남성들의 플로랄 프린트는 여성들의 꽃가라와 살짝 다르다. 색과 무늬가 강렬해서 남성적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진보적인 남성으로 보이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올해 톱 디자이너들이 내놓은 플라워 프린트도 예년과 많이 다르다. 옷을 캔버스 삼아 ‘예술을 했다’고나 할까.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는 르누아르부터 쇠라에 이르는 인상파 화풍의 그림을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에 그려넣었고, 프라다는 아르누보적인 일러스트를 판탈롱에 디자인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줄리앙 슈나벨의 회화처럼 보이는 돌체&가바나의 거대한 드레스다.
모델들은 아이라인을 시커멓게 그린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청순하고 부드러운 봄처녀의 ‘꽃가라’를 상상하는 남성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녀들은 차라리 192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나 70년대의 히피, 80년대의 과장된 여성성을 표현한다. 아니, 디자이너들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봄이면 봄마다 입던 꽃무늬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니!
예술가들과 손잡은 올해의 플로랄 프린트가 노리는 것은 대중적 ‘꽃가라’와의 확실한 결별이다. 오랜 역사와 장인적 전통을 통해 명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차별화의 새 빛을 예술에서 찾아낸 듯하다. 이제 상품 자체에 예술가들을 끌어들여 ‘아르모드’라는 말도 내세웠다. 돌체&가바나의 드레스는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상과 럭셔리의 상징으로서 소비자에게 어필한다. 럭셔리 패션과 예술의 동거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언제나 발빠른 루이비통이 일본의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을 통해 큰 재미를 봤으며 올봄에는 현대미술가 리처드 프린스를 영입해 화제가 됐다.
패션은 개인의 부와 ‘문화자산’을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미술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또한 패션이 낯선 시각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관념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것을 보는 건 흥미롭다. 올봄 그로테스크하며 중성적이고 파워풀한 꽃무늬들을 컬렉션에서 보지 못했다면 꽃무늬는 언제까지나 소녀 취향의 ‘꽃가라’로만 남았을 것이다. 올봄의 ‘머스트해브아이템’으로 이 예술적인 ‘꽃가라’ 셔츠를 강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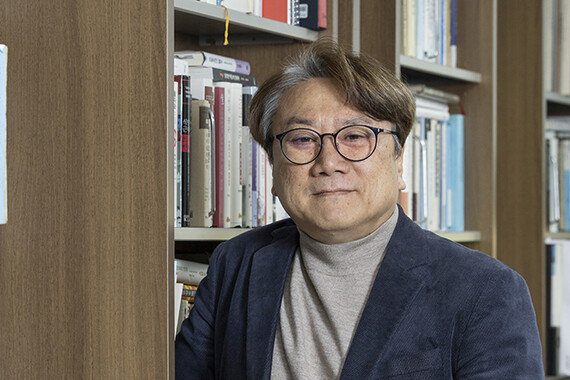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