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전으로 평가받는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가 최근 타계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으로 지적된 ‘정의(正義)’를 되살리고 전체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동시에 비판한 존 롤스의 이론은, 절차와 합의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
- 21세기 사회철학의 역사를 다시 쓰며 말년에는 하버드의 ‘성인’이라 불린 위대한 철학자의
- 삶과 사상을 살펴본다.

롤스가 대표 저작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의 기본 구상을 담은 최초의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1958)’를 발표했던 1950년대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규범학(normative science, 規範學)의 종언을 노래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도덕은 한갓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소견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emotivism)가 기세를 올렸고 지지자를 가진 정치철학은 기껏해야 사회복지의 극대화론인 공리주의가 전부였다. 사회·정치철학 불모의 시대에 ‘정의론’의 출간은 규범철학의 복권을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학계 바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공정책 관리를 정치적 문제 해결에 이용 가능한 간명하고 엄정한 방법이라 여겼다. 모든 정책 대안가운데 각각이 가져올 이득을 더하고 비용을 계산하여(cost-benefit analysis) 순수 이득을 최대로 만드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복지정책에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지배 이념이 되기에는 그것이 갖는 전체주의적 함축으로 인해 권리론자들(right-theorists)의 비판이 점증하게 되었다.
영향력 막강한 ‘정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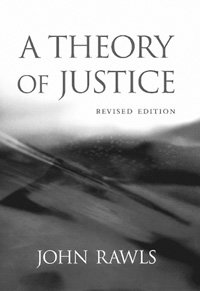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정치철학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 많은 권리론자들이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통적 목록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취업과 교육, 의료 및 여타 재화들에 대한 평등한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둘째, 학계 분위기는 공리주의자보다 권리론자에게 유리해졌으며 대표적 정치 이론 학자들이 권리론자들로 바뀌어 갔다. 따라서 이제껏 학계를 주도해 온 공리주의는 수세에 놓였다.
셋째, 규범학의 불모지로 간주되었던 사회·정치철학계에서 다시 규범철학의 복권이 주창되면서 거대이론(grand theory)의 전통이 소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 가지 변화는 모두 롤스의 ‘정의론’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정의론’이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긴 하나 롤스는 그 후에도 주목할 만한 두 권의 저서를 남겼다. 두 번째 저서인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1993)’는 정의론을 부분적으로 변호하고 보완하기 위해 쓰여졌으나 동시에 갖가지 새로운 담론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자유주의에 폭넓은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만 한정시킨 자유주의의 최소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롤스의 마지막 저술인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은 그의 ‘정의론’을 지구촌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그의 정의론은 적용 범위가 개별 국가에 한정되었으나,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삼아 만민법에서는 자신의 정의론을 국제 사회에 확대 적용하려 시도했다.

롤스는 20세기 사회철학계의 거목이다. 그가 영향을 받은 17세기 사회 계약론자 존 로크, 18세기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 19세기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왼쪽부터).
롤스가 기본적인 자유의 목록에서 이같은 자유를 배제한 것은 비일관성이라기보다 오히려 그의 논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로크(John Locke)의 사회계약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달리 롤스의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상대적 재산과 소속된 사회 계층을 모르는 가운데 분배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자본가인지 노동자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재산 소유자의 이득을 보호하기보다 자신과 후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삶(decent life)을 보장하는 데 더 큰 배려를 한다.
롤스 정의론의 두 번째 원칙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최소 수혜(least advantaged)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다. 제 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고 사회주의가 제기한 비판의 도덕적 의미를 충분히 참작한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는 보상적 교육의 실시와 경제적 불평등의 한계를 요구함으로써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유사한 동기와 자질을 가진 이에게 교양과 성취에서 평등한 전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의의 제 1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시키는 일을 거부하는 롤스 이론의 자유주의적 단면을 보여준다.
더욱 자유롭고 보다 평등하게
두 번째 원칙은 자유주의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게 하는, 롤스 정의론에 있어 사회주의적 경향을 대변한다. 물론 롤스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을 제시한 최초의 철학자는 아니다. 롤스는 밀, 그린, 홉하우스, 듀이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철학의 오랜 전통의 연장선 위에서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어떤 이론과도 견주기 어려운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같은 통합은 두 진영으로부터 많은 동조자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두 진영으로부터의 공격 또한 면하기 어렵다.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노직(R. Nozick)은 자신의 노동 산물을 점유할 자유가 롤스의 자유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는 인간의 개체성을 중요하게 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롤스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및 집단 소유(collective ownership) 간의 선택 문제를 도덕적 논리에 의해 결정하기보다 정치 사회학의 문제로 보고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롤스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가 제시한 정의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롤스는 당시 지배적인 도덕 이론이었던 공리주의를 내용뿐 아니라 그 방법론적 함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결국 롤스는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권리론’과 자연권 이론의 바탕이 된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일반적인 논변 형식으로 발전시켜, 이를 최근 경제학의 성과 중 하나인 합리적 의사 결정론(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롤스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pure procedural justice)을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공정성을 보증해줄 전제들의 집합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개념은 사회계약설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실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닌 정의원칙을 선택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가 될 계약 조건을 통합 구성한, 순수한 가설적 세계이다. 즉,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생 계획 등 특수한 사정을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이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으나, 타인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하며 시기심(envy)과 동정 같은 관심도 없다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롤스에게 있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다.
그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초적 입장이 갖는 특이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maximin)라는, 지극히 보수적 전략에 의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들은 가능한 대안들 중 각 대안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minimorum) 중 최선의 여건(maximum)을 보장하는 대안을 택함으로써, 그 선택의 결과 각자의 인생 계획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자유나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잃는 그런 모험을 피하려 한다. 이는 결국 우리가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롤스는 이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신념, 혹은 숙고한 도덕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정의 원칙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누적된 정치적 지혜로서 우리의 도덕 판단에 합치한다는 정합논증(coherence argument)뿐만 아니라, 공정한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의 준 연역적인 계약논증(contract argument)에 의해서도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이중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의 방법은 한마디로 정의의 원칙들과 우리의 도덕 판단들, 그리고 계약 논증과 관련된 인간관, 사회관, 도덕관 등의 배경적 이론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스는 정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원칙 도출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갖가지 비판에 봉착한다. 계약론에 동조하는 자들 가운데도 계약의 조건에 대해 비판하고 이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마이클 샌들(M. Sandel), 맥킨타이어(A. MacIntyre) 등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의 방법론에 암암리에 함축된 개인주의적 인간관 및 사회관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공동선을 위시한 인간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추상적 보편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롤스는 계약론적 방법을 통해 권리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법적 기초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정치철학에 있어 규범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단 롤스의 방법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기에 이들을 롤스 이후의 세대(post-Rawlsian)라 부를 정도이다.
롤스는 그의 두 번째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철학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매우 독특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pluralism)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실천적인 정치이론(practical political theory)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견해(롤스는 이를 포괄적 교설[敎說]이라 부름)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정치 이론’이라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그에 의거한 판단력을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성의 부담(burdens of reason)으로 인해 의견이 달라 질 수 있다.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인 포괄적 견해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과 인간 이성이 갖는 한계로 인해 합당한 안정성에 이르는 길은 오직 자유주의 자체가 합의되기 어려운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적용 범위를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일, 즉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같이 삶을 포괄하는 철학, 즉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칸트나 밀의 포괄적 자유주의)로부터 오직 정치적 삶에만 한정짓는 철학인, 협의의 자유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최대의 수용 가능성을 위한 최소화 전략에 의거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공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될 경우, 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분분한 교설이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견해들 간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유주의는 특정한 교설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을 성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포괄적 교설에 의해서도 동일한 지지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포괄적인 도덕 교설(comprehensive moral doctrine)’과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간의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이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가치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정을 비롯한 사회적 인간 관계의 이상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곧 다양한 철학, 가치관, 형이상학 등을 말한다.
주요 종교 역시 포괄적 교설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며, 칸트나 밀의 자유주의를 포함한 철학적 도덕 이론 역시 또 다른 예이다. 포괄적 교설은 공적이고 정치적 문화라기보다 시민사회의 배경적 문화로서 공적이지 않은(non-public) 사회적 문화에 속한다.
롤스는 이같이 포괄적 견해와 정치적 정의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대비한다. 우선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적, 경제적 주요 제도들, 즉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도덕이지 삶의 전반과 관련되는 포괄적 가치관이 아니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하나 이상의 포괄적 가치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교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정치적 정의관은 그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속에 존속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에 의해 지지될 수 있고 그들과 양립 가능한 핵심적 구성 요소이며 동시에 특정 교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서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민주 사회의 공공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이념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롤스는, 가치관의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문화와 제도적 측면들이 존재하며 그같은 공통 이념과 가치관이 체계화되어 하나의 정의론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적 교설 간의 중첩적 합의의 초점을 이루는 정치적 정의관은 여러 상이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논변을 통해서 이를 수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우월한 통로나 모두가 취해야 할 단일한 통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로 확장된 ‘지구촌 정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대세 속에, 세계 시민적 통합과 개별 국가적 다원성 간의 조정 문제는 심각하면서도 다급한 담론으로 부각되었다. 이 점에 있어 다원주의에 대한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헌팅턴은 학술적 조망을 통해 문명간의 충돌(clash)을 예견했지만, 현실 갈등의 조정을 담당하는 UN은 문명간의 대화(dialogue)를 강조하고 UNESCO는 이의 연장선에서 보편 윤리(universal ethics)와 공동 가치(common values)에 관한 포럼을 주선하기도 했다.
롤스의 마지막 저서 ‘만민법’은 일국에 한정되었던 정치적 자유주의를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한 세계화된 형태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관용(tolerance)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스는 자유주의적 민주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깊은 갈등 속에서 안정적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문제라고 분석한다. 롤스에 따르면 자유주의 원칙을 정치적 영역에 국한하는 이유는 자유주의의 협상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 관용이 도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롤스는 관용에 대한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을 국제관계에까지 확장하려 한다. ‘만민법’의 서언은 이러한 확장 프로젝트를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다른 개인의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을 존중해야 하듯(그것이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부합되게 추구되는 한), 자유주의 사회는 ‘포괄적 교설’에 의해 조직된 다른 사회가 그들의 제도가 그 사회로 하여금 합당한 만민법을 준수하게 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사회를 존중해야 한다”.
롤스는 그의 전지구적 관용이 국내에서처럼 자유주의적 도덕이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단지 특수한 다원성을 조정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칙의 흥정이나 협상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은 진정한 중첩적 합의의 추구가 아닌 이해 타산에 근거한 세력 균형(modus vivendi)의 추구에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합당한 만민법이 우선 추구되고, 그 다음에 비자유주의적 사회 체제까지도 강제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 법에 동조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확장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표자들은 지구촌 정의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고민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적인 입장에서와 같이 이때도 각국의 대변인으로서 당사자들은 일정한 우연적 사실이나 도덕적으로 무관한 사실들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가정되는데, 그들은 영토나 인구의 규모, 그들이 대변하는 주민들의 기본적 이해 관계가 갖는 상대적 강도를 모르며 그들의 자연 자원이나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 세계적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비자유주의(illiberal) 국가들의 대표자들 역시 기본 인권 및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관련된 만민법의 원칙들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호전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무법적 체제는 이같은 보편 원칙을 수용하지 않을지 모르나 기본 인권이 존중되는 질서있고 품위 있는 계층적 사회(decent hierarchical societies)로 이루어진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가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세계적 원칙을 준수하는 한, 비자유주의적 계층 사회도 상당한 지위를 갖춘 국가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 편에서 이러한 사회를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그들의 제도 개혁을 위해 경제적 혹은 여타의 제재를 가할 정당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롤스가 남긴 위대한 유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롤스의 정치론이 남긴 유산은 그 실질적 내용이나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 국내적 정의는 물론 국제적 정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 통일 한국의 정치적 이념을 구상함에 있어 계약론적 접근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은 실질적인 참조의 틀이 될 것임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싶다.
정의로운 세기의 전사(戰士)여! 세상의 온갖 부정의를 잠시 잊으시고 부디 영면하소서….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