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맥은 그다지 넓지 못하다. ‘인재풀’의 빈약함은 그의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당선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여론정치’를 표방했다. 노무현 정권 최고의 파워맨은 어쩌면 ‘국민’이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 여기에 재야시절부터 노당선자와 함께해 온 국민통합추진회의 출신 정치인과 재야 입당파, 당내 쇄신그룹, 386 보좌진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노당선자 인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인재풀’보다 자율적이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12월8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정대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노당선자의 대선 승리는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3김 정치’의 주류를 일거에 퇴장시키는 동시에 노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가 정치의 중심무대로 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노당선자를 비롯한 비주류 집권세력은 젊고 개혁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정 전반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인적 네트워크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당선자는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보다는 전문성 있는 테크노크라트를 대거 기용하거나 외연 확대를 염두에 둔 초당적(超黨的) 인사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세력’은 과거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처럼 일정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계보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노당선자 스스로가 19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 특정 계보에 속해 본 일이 없고, 스스로도 수직적 형태의 인적 관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계보를 따지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운동권 출신 보좌진 몇 명 정도가 늘 그와 함께해 온 직계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세력’은 노당선자가 2000년 4월 16대 총선 낙선 이후 대권 도전의 꿈을 키워가던 때 합류했던 인사들과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대위를 중심으로 모여든 인사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들은 크게 재야 입당파, 쇄신파,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統推) 출신, 비동교동계 인사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쇄신파가 주도하는 형국이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탈(脫)DJ 전략과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와의 후보단일화 문제 등 선거전략상의 핵심문제를 둘러싼 노선 투쟁과정에서 쇄신파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재야 입당파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또한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비롯한 동교동계 신파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노당선자와 제휴관계였으나, 대선 과정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등 ‘노무현 지원세력’의 구성은 이합(離合)을 계속해 왔다. 대선기획단 체제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동교동계 신파인 문희상(文喜相) 최고위원과 한때 DJ 직계부대였던 정동채(鄭東采)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선으로 밀려나는 등 부분적인 세력교체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노당선자는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 집권 5년간 국정운영 공조에 합의했고, 양자간 정례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한 만큼 과연 정대표가 노무현 정권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 김원기와 정대철, 김근태

김원기, 정대철, 김근태(왼쪽부터)
두 사람이 공동운명체로서 의기투합한 것은 1995년 DJ가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위해 정계복귀와 함께 민주당을 깨고 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야권분열은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DJ를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면서부터. 이때 김고문은 노당선자와 김정길(金正吉) 전 행정자치부장관, 유인태(柳寅泰) 전 의원 등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했고, 이후 야당의 주류에서도 밀려나면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함께 겪었다. 더욱이 김고문은 전북 정읍에서 4선을 했지만 1996년 4·11 총선에서 낙선의 쓴 잔을 마시기도 했다.
물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회의에 입당해 DJ를 지지했지만, 김고문의 경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자리를 되찾은 것 외에 어떠한 정치적 영광도 누리지 못했다.
이처럼 김고문의 사심 없는 태도와 고난의 통추 시절을 함께했던 인연은 노당선자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로 발전했다. 김고문에 대한 노당선자의 의존도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더욱 커졌다. 노당선자가 당내 분란으로 흔들릴 때 김고문은 홀로 반노(反盧), 비노(非盧) 인사들을 설득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 성사 과정에서도 노당선자는 김고문의 판단을 거의 따랐다. 단일후보로 결정된 노당선자가 정대표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요구를 거부했을 때 간곡하게 설득한 것도 김고문이었다. 선거 막바지에 노당선자는 선대위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김고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지요”라면서 결론을 내릴 정도로 김고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대철, 낙마 위기에서 구조
정대철(鄭大哲) 선대위원장은 당내에서 김고문과 함께 노당선자를 적극 뒷받침해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97년 국민회의 대선 후보경선 때 DJ에 맞서 독자출마를 감행했던 정위원장은 이때 노당선자와 처음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정위원장은 5년 뒤 민주당에서 실현된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동시에 DJP공조를 극력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정위원장은 외부 지원을 업기 위해 통추를 이끌고 있던 김원기 고문, 노무현 당선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 정위원장과 김원기 김상현 김근태 노무현 등은 국민경선추진위원회를 함께 만들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위원장은 노당선자를 정치후배쯤으로 여겼으나, 이때 노당선자에 대해 적지 않은 신뢰감을 느꼈다고 한다.
정위원장과 노당선자의 인간적 관계는 1998년 정위원장이 경성사건 뇌물비리로 구속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노당선자는 구속중이던 정위원장을 면회하고 “형님이나 저나 DJ가 별로 예뻐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위로했고, 정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였다고 전해진다.
정위원장은 8·8 재보선 패배 직후 노당선자가 당내 반노 세력의 후보직 사퇴 요구로 중도낙마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 ‘8인 친노(親盧) 중진모임’을 결성해 노당선자 ‘구조’에 적극 나섰다. 정위원장의 주도로 김원기 김상현 조순형 김근태 박인상 정동영 추미애 의원 등이 하나로 모였고, 이를 토대로 해 재야출신 입당파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친노 세력이 형성됐다. 정위원장의 정치적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노당선자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을 맡은 뒤에도 사비를 털어가며 노당선자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각계 각층에 인맥이 두텁고, 2002년 4월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당 안팎을 놀라게 했다.
김고문, 정위원장과 비주류 연대를 해왔던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노당선자와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됐지만, 노당선자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 노당선자는 후보단일화를 수용할 때에 “김근태 의원까지 후보단일화를 하라고 하시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애정을 보이고 있다.
노당선자가 후보가 된 뒤 선대위원장직 제의를 뿌리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노당선자가 차기정부와 민주당에서 개혁노선을 밀어붙일 경우 김의원의 역할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야 입당파

이해찬,임채정,이상수,이호응(왼쪽부터)
이해찬(李海瓚) 기획본부장, 임채정(林采正) 정책본부장, 이상수(李相洙) 총무본부장, 이호웅(李浩雄) 조직본부장, 이재정(李在禎) 유세본부장, 신계륜(申溪輪) 후보 비서실장, 이미경(李美卿) 대변인 등이 그들이다. 김경재(金景梓) 홍보본부장은 재야 출신은 아니지만, 이들과 교분이 깊고 정치적 행보도 함께해 왔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대위에 앞서 구성된 대선기획단이 한화갑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동교동계 신파 인사 중심이었다면 새로 출범한 선대위는 이들 재야출신이 가세함으로써 노당선자 지지그룹은 색깔이 달라진다.
또한 재야출신들은 ‘탈(脫)DJ 전략’을 강력히 주장한 쇄신파 의원들과 달리 선거전략의 기본 컨셉트로 ‘구정치 대 신정치’ 대결구도를 주장했고, 이 전략은 DJ 계승세력 대 반(反)DJ 세력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려 했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도리어 구시대 정치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들은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반노(反盧) 진영의 후보단일화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패색이 짙었던 선거구도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후보단일화를 극력 반대했던 쇄신파 중심의 정치개혁추진위는 2선으로 밀려났고, 재야출신 입당파는 노당선자의 핵심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당선자와 머리를 맞대왔고, 만일의 경우 민주당이 분당(分黨)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노당선자와 정치적 ‘명운(命運)’을 같이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기획통 이해찬 입각 여부 미지수
노당선자의 지지도가 10%대에 머물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때에도 이들은 1000만∼3000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동지애를 보였다. 이들 중 이해찬 임채정 김경재 이호웅 의원 4명은 틈만 나면 내기바둑을 두며 우의를 다져온 ‘바둑친구’사이이다. 각자 개성이 강한 이들이 불협화음 없이 팀워크를 이룬 데에는 ‘바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해찬 기획본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전문가로 꼽힌다. 1997년 대선은 물론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기획 업무를 도맡았던 이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아 전체 선거전략을 짜는 ‘두뇌’ 역할을 했다. 후보단일화 수용이나 세대교체론 등 핵심 선거전략은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노당선자와는 정치적 인연도 깊다. 1992년 총선을 앞둔 통합민주당 시절 이의원이 ‘신동아’에 DJ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공천조차 받지 못할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노당선자가 이의원의 공천을 강력히 주장, 관철시켰다. 노당선자가 1998년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당선돼 두 번째 금배지를 달고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할 때에도 노당선자는 교육부장관이던 이의원의 교육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노당선자가 깐깐한 성격의 이의원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DJ정권에서 초대 교육부장관을 지내는 등 이미 입각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임채정 정책본부장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을 만들어내는 등 노당선자의 개혁노선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결사반대했으나, 노당선자는 그의 순수하고 강직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7년 대선 때에는 정세분석실장을 맡아 DJ와 매일 독대하는 등 신임을 얻었으나, 정부 요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민통련 상임위원장 등 재야에서 활동하다 1987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재정,신계륜,이미경,김경재(왼쪽부터)
그런 인연 탓인지 이의원의 노당선자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 후보단일화 수용 과정에서 이의원은 반대 입장에 서 있었으나,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나자 선대위 회의 말미에 “기왕에 단일화를 하기로 결론이 났으니 박수라도 칩시다”라며 흔쾌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자금을 조달하는 총무본부장을 맡았으나, 한화갑 대표의 반대로 당 재정권을 인수받지 못하는 바람에 초기에는 큰 곤욕을 치렀다.
1997년 대선 때 국민회의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재 홍보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홍보전의 사령탑을 맡았고, 방송광고전에서 한나라당에 압승을 거두는 공을 세웠다. ‘노무현의 눈물’ 광고에 이어 ‘노무현과 링컨’ 광고, 박재동 화백이 만든 수채화 애니메이션 기법의 ‘겨울’ 광고 등은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한 한나라당의 광고와 완전히 차별화 된 것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후보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노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기를 누설해 한때 ‘역적’으로 몰리기도 했으나, 결국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노당선자와는 이전에 아무 인연이 없었으나 4월 국민경선 당시 사회를 맡아 전국을 도는 과정에서 노당선자에게 매료됐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에 나섰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1980년대 김형욱 (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을 집필하기도 했다. 논리와 언변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현 정부 들어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공하는 등 DJ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불편한 관계였다.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성공회신학대 총장을 지낸 재야출신으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다. 민주당 창당 때 재야출신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를 이끌고 참여했고 당내 후보 경선 때에는 김근태 의원을 지원했다. 김의원이 중도에 경선을 포기하자 노당선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섰고 대선 막판에는 외부 인사 영입작업을 도맡았다.
이본부장은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11월24일 선대위 회의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 그 날 밤 단일후보로 노당선자가 확정되자 “이재정의 ‘기도발’이 먹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대학총장 출신으로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노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을 입안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신계륜, 386세대 ‘맏형’격
이호웅 조직본부장은 서울대 재학시절 유신반대로 옥고를 치른 데 이어 1980년대 중반 대표적인 재야단체였던 민통련 의장을 지내며 1986년 ‘5·3 인천사태’로 두 번 옥살이를 한 재야출신이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노당선자에 비판적이었던 당내 의원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반노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본부장을 맡은 뒤에도 당내에 친노 지지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리를 내놓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했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1차 협상단에 참여해 막역한 사이인 국민통합21의 이철(李哲) 전 의원과 의기투합해 일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된 조직본부장을 맡았으나 선대위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조직 가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난하게 제 몫을 해냈다는 평이다.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신계륜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재야출신 입당파. 1992년 총선 때 서울 강북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당내 386세대 정치인의 ‘맏형’격이며, 4월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으나 71표 차로 9위에 그치는 바람에 아깝게 당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중립적 입장에 서서 노당선자를 돕지는 않았으나 정동채 의원의 후임으로 후보 비서실장에 기용됐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2차 협상단장을 맡아 끈질긴 협상력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노당선자와는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때 교분이 있었고 1991년 야권통합운동 때에도 같은 노선에 서는 등 노당선자의 개인적인 신뢰가 두텁다.
◇ 전문가 그룹

유재건,김한길,정세균,허운나,정동채,이강래(왼쪽부터)
유재건 특보단장은 경기고, 연세대 정외과를 나와 미국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미국통이다. 외교분야에 취약한 노당선자에게 균형감각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부드러운 인상에 조용하면서도 달변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유단장은 외부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서는 등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했다.
김한길 본부장은 1997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미디어분야를 맡았다. 꼬마 민주당 시절 서울 동작을 지구당 원외위원장으로서 노당선자와 짧은 인연이 있었다. 당시 꼬마 민주당이 DJ의 신민주연합당과 통합하면서 지구당을 내놓게 되자, 조직책 선정작업에 참여했던 노당선자는 김본부장에게 “지구당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적이 있었다. 방송토론의 기본컨셉트와 TV토론 준비를 도맡았고 후보단일화 2차 협상단에 참여해 두둑한 배짱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정세균 본부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뒤 곧바로 대선기획단에 참여해 노당선자의 경제 과외교사를 자임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실물경제에 밝은 재경통이다.
인터넷 선거를 지휘한 허운나 본부장에 대한 노당선자의 신임은 각별하다. 노당선자가 사석에서 허의원을 두고 “내가 본 여성정치인 중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다”고 극찬했을 정도다. 초선인 허의원이 선대위의 본부장급으로 기용된 것도 노당선자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 대선을 인터넷 선거로 치르겠다는 노당선자의 확고한 소신과 허의원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방유세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노당선자는 허의원과 인터넷을 소재로 한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한양대 교수로 있다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정동채·이강래 2선 후퇴

쇄신파 의원들은 선거기간 내내 노 당선자의 손과 발이 됐다. 부산발-서울행 기차안.
선대위에서 미디어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의원은 노당선자와 오랜 인연은 없다. 당 기조위원장을 맡았을 때 동남특위 위원장이던 노당선자와 함께 동진(東進)정책 문제를 상의한 정도다. 노당선자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천정배(千正培) 의원의 추천으로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첫 인연을 맺은 셈이다.
아태재단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DJ가 국민회의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DJ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치밀하지만 너무 직선적이라는 평도 있다. 정대철 선대위원장이 “대선기획단에서 DJ를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하자 이강래 의원과 함께 자진해서 2선으로 후퇴했다.
이강래 의원은 1991년 꼬마 민주당 시절부터 노당선자와 인연을 맺어 온 돈독한 사이다. 당시 공채 민주당에 꼬마 전문위원으로 들어왔던 이의원은 신민주연합당과 꼬마 민주당 간 통합 협상과정에서 실무준비팀을 맡았다. 김정길 노무현 장기욱 3인이 협상 대표였고, 이때 이의원은 협상실무팀으로 노당선자와 호흡을 맞췄다. 나중에 DJ가 통합민주당을 깨고 나갔을 때 이의원은 국민회의로, 노후보는 통합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정치행보가 엇갈렸으나 노당선자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에 합류하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특히 이의원이 1998년 대통령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노당선자를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노당선자가 도리어 “나는 부산시장으로 나가겠다”고 해 노당선자를 재평가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수시로 노당선자에게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 대선 때에는 DJ의 기획특보로 활약했고 대통령정무수석과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냈다. 2000년 총선 때에는 동교동계의 견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 재입당한 케이스다.
◇ 쇄신파 그룹

정동영,신기남,추미애,천정배,조순형(왼쪽부터)
당내 후보경선 때에는 개혁파의 대표자로 노무현 김근태 정동영 3인이 각기 출마하는 바람에 어느 한 쪽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지만, 노당선자가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당내의 그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으로 노당선자를 뒷받침했다.
쇄신파의 리더격인 정고문은 노당선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당내 분란으로 노당선자가 흔들릴 때 ‘국민경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당선자를 떠받쳤고, 공조직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노당선자가 그 대안으로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만들었을 때에도 흔쾌히 본부장을 맡아 ‘희망돼지 저금통사업’을 벌여 제2의 노풍을 불러일으켰다.
신기남·추미애는 여의도 탈레반?
대선 기간 중에는 ‘돼지꿈 유세단’을 이끌고 취약지역인 영남권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뛰었다. 그런 탓인지 노당선자는 11월 강원 춘천을 방문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다음 번에는 정고문을 밀어주겠다”고 공언하는 등 차기 리더로 정고문을 꼽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기남 추미애 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각종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노당선자를 옹호하며 ‘노무현 전도사’역할을 했다. 당-정 분리라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노당선자를 흔드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격렬한 어조로 막아냈다. 탈DJ전략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탈레반’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나아가 후보단일화를 극력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때 노당선자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당선자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천명한 만큼 향후 새로운 리더 그룹으로서 이들의 당내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쇄신파의 일원은 아니지만 그들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 조순형(趙舜衡)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은 당내에서 차기정부의 감사원장 1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꼿꼿한 처신으로 유명하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뒤에도 노당선자가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격렬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 때문에 노당선자의 조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은 매우 크다. 조위원장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도 선대위 발족식 행사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자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감장에 참석할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 여긴다.
그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5선 의원이지만 변변한 당직 한번 맡은 적이 없을 정도로 DJ와 동교동계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현직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 3년 연속 ‘최고의 신사’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당선자가 당내 후보경선에 나섰을 때 유일하게 노당선자를 지지하며 경선 캠프에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노당선자와 함께 해마루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오래 전부터 가까운 사이다.
◇ 경선 캠프 출신

염동연,이강철,김병준,문재인,이기명(왼쪽부터)

남영진,윤석규,배기찬,서갑원,김만수(왼쪽부터)

천호선,황이수,유시민,문성근,명계남(왼쪽부터)
경선 캠프에 참여한 인사 중 연청 사무총장 출신인 염동연(廉東淵) 정무특보는 386세대는 아니다. 민주당 내의 이른바 주류인 동교동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노당선자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로 노당선자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측근 중의 한 명이다. 1993년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당선자와 동교동계 간의 연락업무를 맡으면서 노당선자와 인연을 맺었다. 염특보는 1997년 대선이 끝난 뒤 “DJ 이후는 노무현이다”라며 노당선자에게 대권 도전을 꾸준히 권유했다. 2000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노당선자의 요청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했던 노당선자로서는 당심(黨心)을 아는 참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 경선 때에 염특보는 ‘조직’을 맡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경선 캠프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때자신이 지닌 신용카드 8장이 모두 사용한도에 차 쓰지 못한 일이 있을 정도로 노당선자를 물심 양면으로 보좌했다.
이강철(李康哲) 정무특보는 1990년 3당 합당 때 민자당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한 이후 노당선자와 정치행보를 같이해 온 동지적 관계이다. 민청학련 출신인 이특보는 ‘인생의 절반을 노무현에게 걸었다’고 할 정도로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노당선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 대구시 지부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고 당내 국민경선 때에는 영남지역을 맡아 밑바닥을 누볐다.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교수는 노당선자가 원외 시절인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차렸을 때 자문역을 맡은 데 이어 경선 캠프의 모체가 된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을 맡는 등 40대 진보성향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교수 그룹을 이끌어왔다.
1988년 노당선자의 KBS 노동조합 초청 강연에 감동해 15년째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명(李基明) 문화예술고문은 비서실의 ‘큰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삿갓 북한 방랑기’로 유명한 방송작가 출신으로 방송계에 발이 넓다. 노당선자가 형님처럼 모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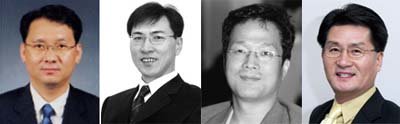
이광재,안희정,윤태영,유종필(왼쪽부터)
굳이 노당선자에게 가신(家臣)이 있다면 이광재(李光宰) 기획팀장과 안희정(安熙正) 정무팀장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노당선자의 비서로 시작해 1989년 이후 고락을 함께한 측근이다. 오랫동안 노당선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탓에 노당선자의 심중을 정확하게 헤아릴 줄 아는 몇 안 되는 측근으로 꼽힌다.
이기택(李基澤) 전 통합민주당 총재의 보좌관 출신인 윤태영(尹太瀛) 연설문팀장은 1990년 초반부터 노당선자의 자서전 발간 등을 맡아왔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을 때 후보수락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노당선자의 공식·비공식 연설문을 전담해 왔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유종필(柳鍾珌) 언론특보는 2001년 경선 캠프에 합류, 경선과정에서 노당선자의 ‘입’ 역할을 하면서 이인제(李仁濟) 후보측의 공세를 막아내는 ‘수문장’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기자협회장 출신인 남영진(南永振) 언론특보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국장 출신인 윤석규(尹錫奎) 정치개혁추진본부 사무처장도 경선 캠프에서부터 노당선자를 도왔다.
세종리더십개발연구원 소장 출신인 배기찬(裵期燦) 정책보좌역은 노당선자가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정책자문관으로 일했고, ‘노무현과 만난 링컨’ ‘노무현의 리더십이야기’ 등 노당선자의 저서를 기획했다. 1992년부터 노당선자의 비서관으로 일해온 서갑원(徐甲源) 의전팀장,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만수(金晩洙) 공보팀장, 천호선(千浩仙) 인터넷본부 기획실장, 황이수(黃二秀) PI기획국 팀장 등도 노당선자의 오랜 지킴이들이다.
개혁국민정당 창당을 주도한 시사평론가 유시민(柳時敏)씨는 개혁적 네티즌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화배우 문성근(文盛瑾) 명계남(明桂南)씨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이끌어오면서 노당선자의 열성적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