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적 동질성은 민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고구려어는 고구려가 한(韓)민족 국가인지, 중국의 변방국가인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결론적으로 고구려어는 한민족 언어인 백제어, 신라어와 놀랄 만큼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간 학계에서 구체적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은 고구려어를 집중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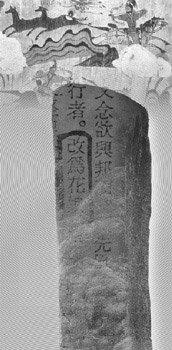
역사적 논란이 제기될 때 언어학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흔히 역사에서 언어가 간과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인류사는 언어와 무관할 수 없다. 인간과 사회의 모든 영역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로 기록되어 전래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어느 한 순간도 언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구려사 논란은 근본적으로 민족 문제로 귀착된다. 모든 민족은 언어를 소유하고 있다. 민족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다. 때문에 고구려의 국어인 고구려어는 고구려를 세운 민족의 언어와 일치한다. 그런데 고구려는 여러 민족이 연합해 세운 국가가 아니었다. 고구려는 단일 민족인 부여족이 세운 나라이며 부여족의 언어를 단일어로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단일 언어인 고구려어의 특성은 어떠한가. 중국어와 동질적이었던가, 아니면 백제어 및 신라어와 동질적이었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고구려사를 구명하는 횃불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과제이다.
역사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게 하고 반대로 언어가 역사적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고구려인들이 저술한 책이 현대에 전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고구려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광개토대왕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일부 남아 있는 고구려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고대어에서 성명과 관직명은 언어의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대국가에서 국왕과 지배계급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들의 성명, 관직명은 해당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된다. 또한 이웃 나라와의 상관성을 가리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고구려 왕의 성명과 관직명이 신라 및 백제의 그것과 닮은꼴이고 중국의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것은 분명 억지가 된다. 백제사와 신라사가 틀림없는 한국사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 언어적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고구려사 역시 한국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시조는 그가 세운 나라이름 ‘고구려’에서 ‘고’를 취하여 성을 ‘고(高)’씨로 삼았다. 그러나 이 ‘고’씨는 시조 ‘고주몽’ 1세대에서 끝났다. 왜 그랬을까. ‘삼국유사(고구려조)’는 주몽의 본성이 ‘해(解)’씨(本姓解氏也)라고 세주(細註)를 달았다. 이후 고구려 역대 왕들의 성씨는 ‘해’씨였다. 이런 점에 미뤄 고구려 왕족의 정통적 성씨는 ‘해’씨임에 틀림없다. ‘해’씨는 중국인에겐 없는 성이었다. 반면 부여 왕의 성명에선 ‘해부루(解夫婁)’ ‘해모수(解慕漱)’ 등 ‘해’씨가 등장한다. 이는 고구려가 부여(扶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해’는 한국어 ‘해(日)’와 동일하다. 일본어의 ‘히(日)’도 이 말에서 유래된 듯하다. 그러면 ‘해’씨의 어원을 밝혀보자. ‘광개토대왕비문(414)’은 고구려 시조 주몽을 북부여 왕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명기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는 건국 후 오래지 않아 동부여를 통합하였다.
주몽이 부여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그의 본성을 ‘해’씨라 한 것이다. 이후 고구려 왕들은 ‘대해주류(대무신왕)’ ‘해색주(민중왕)’ ‘해애루(모본왕)’ ‘소해주류(소수림왕)’(제3, 4, 5, 17대) 왕 등 모두 ‘해’씨다. 나머지 왕들의 성씨는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고구려는 단일 혈족으로 왕위가 계승됐고 비(非) 왕족이 정권을 찬탈한 적이 없었으므로 다른 고구려의 왕들 역시 ‘해’씨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의 성씨는 비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아들이 ‘해명’(解明) ‘해우’(解憂)였던 것으로 보아 ‘해’씨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근본은 부여에 있음이 확실하다. 고구려가 후에 동부여를 통합하였으니 부여의 역사를 승계한 나라다. 백제 역시 부여의 다른 지파로 나타난다. 백제의 경우도 왕의 성씨는 ‘해’씨 또는 ‘부여’씨였다. 백제의 귀족 중에는 ‘해루, 해충, 해수, 해구(解婁, 解忠, 解須, 解仇)’처럼 ‘해’씨가 많다. 한때 백제의 성왕은 공주에서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백제의 뿌리를 찾아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고치기도 했다. ‘南扶餘’는 “남쪽에 있는 부여”란 뜻으로 백제의 근원이 ‘부여(扶餘)’임을 밝히는 것이다.
즉, 고구려와 백제는 언어적으로도 ‘부여’라는 한 뿌리에서 갈라진 나라다.
‘햇빛(日光)’의 의미가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왕명에 고루 들어 있음도 깊이 새겨볼 일이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赫居世)는 신라어로 ‘누리(밝은누리)’로 불렸다. ‘삼국유사’는 ‘누리’를 ‘블구내(弗矩內)’로 음차표기하고 그 뜻을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言光明理世也)”로 한역했다.
여기서 ‘광명(光明)’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의 잉태 설화에도 ‘햇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한 대목을 보자.
“금와는 그녀를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왔다. 몸을 피해가니 햇빛이 또 따라가 비치었다. 그로 인하여 태기가 있어 닷 되들이 크기의 알을 낳았다(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遂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이처럼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관직명, 거의 일치
‘삼국유사’는 “본성은 ‘해’씨였으나 지금 자기가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는 까닭으로 스스로 ‘고’로써 씨를 삼았다(本姓解氏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고 세주(細註)를 달기도 했다. 고구려 시조 이름은 동명(東明)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유리명(琉璃明)이다. ‘동명’은 고구려어로 ‘새’이며, ‘유리명’은 ‘누리’이다.
고구려와 신라 시조의 이름에는 모두 ‘혁, 명(赫, 明)’의 뜻이 들어 있다. 초기 왕명의 동질성, 즉 ‘햇빛=(赫, 明, 昭, 昌)’은 후대로 이어져 고구려 유리명왕의 태자 해명(解明)을 비롯하여 고구려 문자명(文咨明)왕과 명리호(明理好)왕, 신라의 명지(明之=신문왕)왕과 비지(>비치)왕(昭知∼毗處), 백제의 성명(聖明∼明횕)왕과 창(昌)왕처럼 삼국의 후대의 왕명 속에 고루 나타났다. 신라 시조 ‘누리’와 고구려 제2대 왕 ‘누리’를 비교하면 형태소는 동일한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름을 지을 때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기능과 행동을 소재로 삼은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비류(비류국, 비류강에서 유래)’ ‘온조(온세상)’ ‘주몽·활보(명사수)’ ‘뱀보(뱀처럼 기어다님)’ ‘거칠부(荒宗)’ ‘이사부(苔宗)’ 등이 그것이다.
고구려 고국원왕(제16대)의 이름은 쇠(斯由∼劉)이다. 이것은 신라 진지왕의 이름 쇠돌이(舍輪∼金輪)의 ‘쇠’와 같다. 궁예가 창건한 후고구려의 수도는 ‘쇠벌(鐵原)’로 불렸다. 신라의 인명에도 ‘쇠나(素那=金川)’라는 어휘가 나온다. ‘쇠(金·銀·銅·鐵)’는 고구려와 신라에서 보편적인 성명, 지명으로 쓰였다.
부여 왕 이름에 ‘해부루(解夫婁)’라는 것이 있다. 고구려에는 ‘해애루, 삽시루, 모두루, 미구루, 해루(解愛婁, 歃矢婁, 牟頭婁, 味仇婁, 解婁)’ 등의 이름이 나타난다. 백제에서도 ‘다루, 긔루, 개루, 근개루(多婁, 己婁, 蓋婁, 近蓋婁)’ 등의 성명이 있었다. 부여, 고구려, 백제 모두 인명에서 돌림자 ‘루(婁)’를 즐겨 사용했다.
고구려 왕명에선 대무신(大武神)왕, 대해주류(大解朱留)왕, 대조대(大祖大)왕, 차대(次大)왕, 신대(新大)왕처럼 ‘대(大)’를 관형어로 썼다. 또한 관직명에도 대가(大加), 고추대가(古鄒大加), 대대로(大對盧)와 같이 ‘대’를 썼다.
백제의 경우는 건길지(鞬吉支), 근귀수(近貴首), 근개루(近蓋婁)처럼 ‘건’ 또는 ‘근’을 사용했는데 이는 ‘大’를 음차 표기한 것이다. 신라의 관직명에서도 대사(大舍) 〔=한사(韓舍)〕, 대나마(大奈麻) 〔=한나마(韓奈麻)〕의 표기가 발견된다. 고유어인 ‘한’은 ‘大’를 뜻한다.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밝힌 발해국의 시조 대조영(大祚榮)의 왕명도 고구려의 역대 왕들처럼 ‘大’를 사용했다. 대조영은 자신의 성씨를 ‘한’씨로 삼았다. ‘한’은 현재의 한국어에서도 ‘大’의 의미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백제어 ‘근’은 현대어 ‘큰(크다)’이 됐다. 이렇듯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명은 단일 토착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발음과 의미도 세 나라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중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세 나라만의 공통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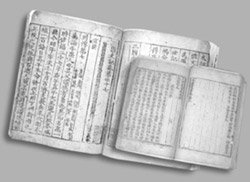
‘삼국유사’(왼쪽)와 ‘삼국사기’. 이들 역사서는 한(韓)민족사의 한 부분으로 고구려사를 기술하는 한편, 일부 고구려어를 소개하고 있다.
‘개’는 고구려의 ‘상가, 고추가, 소노가(相加, 古鄒加, 消奴加)’와 같이 관직명 아래에 붙여 쓰이기도 했다. ‘가’는 신라어의 ‘거서간, 마립간, 각간(居西干, 麻立干, 角干)’의 ‘간’(干)과 일치한다. 받침 ‘ㄴ’의 유무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벼슬인 ‘막리지(莫離支)’와 백제의 벼슬 ‘건길지(鞬吉支)’에서 ‘지(支)’가 일치한다. 또한 어소인 고구려의 ‘막리(莫離)’와 신라의 ‘마립(麻立)’도 ‘ㄱ’과 ‘ㅂ’받침을 무시하면 ‘마리’로 일치한다.
현대까지 내려온 고구려어
삼국시대 전기에 고구려·신라·백제의 최고 관직명엔 ‘대보, 좌보, 우보(大輔, 左輔, 右輔)’ 등과 같이 ‘보’가 사용됐다. 이 ‘보’가 후에 고구려에선 ‘상부(相夫=봉상왕), 구부(丘夫=소수림왕), 중외대부(中畏大夫), 명림답부(明臨답夫)’ 등과 같이 ‘부(夫)’로 변했다. 신라에서도 ‘심맥부(深麥宗=진흥왕), 이사부(苔宗), 거칠부(荒宗)’ 등과 같이 ‘부’로 바뀌었다. ‘부’는 ‘(宗)’의 뜻에 해당되는 고유의 한국어였다. ‘부’는 이후 흥부, 놀부, 뚱보, 곰보, 울보, 느림보 같은 말에서 보듯 인칭접미사로 현대어에까지 이어져 쓰이고 있다.
‘지(智, 支)’는 고대 한국어의 대표적 존칭접미사다. ‘지’는 고조선어 ‘긔 (箕子), 긔준(箕準)’의 ‘/주(ㄴ)’에서 유래한다. 신지(臣智), 근지(近支), 견지(遣支), 진지(秦支), 한지(旱支), 건길지와 같이 마한어에서도 쓰였다. 고구려어에선 막리지, 어지지로 쓰였고, 백제어엔 건길지, 개지(皆次) 등이 있다. 신라어에선 박알지(朴閼智), 김알지, 누리지(世里智), 거칠부지로 사용됐다. 가라어의 좌지(坐知), 탈지(脫知), 도설지(道設智) 등도 같은 맥락이다.
그 쓰인 빈도로 보면 신라와 가라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주로 왕명이나 최고 관직명에 ‘지’가 들어간다. ‘마(ㄱ)리지’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며 ‘어지지’는 고구려 고국원왕의 이름이다. 그리고 ‘건길지’와 ‘개지(치)’는 인칭접미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얼마치, 십 원어치, 내일치, 골치’ 등과 같이 비인칭에까지 쓰임새가 확대됐다.
고구려·백제·신라어는 고조선어에서 유래된 존칭접미사까지 동일하게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적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단일언어를 사용한 종족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언어의 역사를 연구할 때 지명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지명의 가장 큰 특징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명이 많다. 일종의 무형문화재인 셈이다. 가령 영토가 변하고 민족의 이동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토착인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결국에는 해당지역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치환(置換)된다 할지라도 그곳의 토착 지명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지명은 역사에 대한 증거력이 매우 강하다고 역설할 수 있다.
바벨탑의 고장이었던 ‘바빌론’(기원전 2400년에 만들어진 ‘이스타르 여신’의 문장식이 발굴됨)을 비롯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기원전 2650년경 실존)와 ‘우르크’(기원전 3600년경 만들어진 3.6m 높이 석조전이 잔존), 아수르 왕국의 ‘아수르’ 등이 현재도 이라크의 지명으로 남아 ‘구약성서’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다. 또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엘라’ 골짜기도 3100년이 지난 오늘날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요르단, 이스라엘 등의 지명 역시 수천 년 전 지명 그대로다.
하와이 열도의 ‘하와이(Hawaii)’ ‘와이키키(Waikiki)’ ‘호놀룰루(Honolulu)’ 등도 본래 이곳이 미국 영토가 아니었음을 증언한다. 미국의 주명(州名) 중 절반 정도는 인디언 지명 그대로다. 한국의 경우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童巾(퉁권=鐘)산, 豆漫(투먼=萬)강, 雙介(쌍개=孔·穴)원, 斡合(워허=石), 羅端(라단=七)산, 回叱家(횟갸), 斡東(오동), 투魯(투루)강 등의 지명은 이곳이 과거 여진족이 활거하던 지역이었음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고구려 지명은 중국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까, 한국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까.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삼국사기(지리4)’엔 압록강 이북 고구려 지명이 기록돼 있다. 바로 당나라 고종 2년(669)에 영국공(英國公) 이적(李勣)이 칙명을 받들어 작성한 32개의 성명(城名)이다. 이 지명은 당나라 이적이 고구려의 막리지 천남생과 상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상당수 지명은 ‘내물홀(乃勿忽>鉛城)’ ‘적리홀(赤里忽>積利城)’ ‘갑홀(甲忽>穴城)’ 등과 같이 ‘홀’로 끝난다. 당시 고구려인들은 ‘성(城)’을 ‘홀(忽)’로 불렀던 것이다. 중국 역사서엔 고구려가 ‘구루·구려(溝루(水+婁)·駒麗)’로 적혀 있다. 이 ‘구루’가 ‘홀’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홀’은 현대 한국어에 와선 ‘골(골짜기)’이 된다.
고구려어 ‘홀’은 백제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백제의 지명인 ‘위례홀, 미추홀’ 등이 그것이다. 현재의 수원을 백제인들은 ‘매홀(買忽)’이라고 불렀고, 음성(陰城)은 ‘잉홀(仍忽)’로 불렀다. ‘홀’은 한반도 서남단까지 남하했는데 현재의 전남 보성은 백제시대엔 ‘복홀(伏忽)’이었다.
압록강 이북 고구려 영토 내 32개 지역명 중 7개에서 ‘홀’이 나타난다. 이는 상당히 조밀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고대 한국어 ‘홀’은 고구려, 백제의 지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현대 한국어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산(山)·높다(高)’라는 뜻의 ‘달(達)’은 고조선의 지명인 ‘아사달(阿斯達>九月山)’에서부터 등장한다. ‘달’은 고구려에 와서도 ‘비달홀(非達忽)’ ‘가시달(加尸達)’ 등으로 이어진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도 ‘식달(息達)’ ‘석달(昔達)’ ‘달홀(達忽)’ 등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대구시도 옛 지명은 ‘달구불(達丘火)’로, ‘달’이 들어 있다.
岳(악)의 뜻인 ‘압(押)’도 고구려 지명 중 ‘거시압(居尸押)’ ‘골시압(骨尸押)’ ‘개시압홀(皆尸押忽)’ 등에서 널리 발견되는데 이 역시 ‘부소압(扶蘇押>松嶽)’ 등과 같이 한반도 중부지역에까지 조밀하게 퍼져 있었다. 銀(은)의 뜻인 고구려어 ‘소리’는 ‘소리홀(召尸忽>木銀城)’등의 지명에서 나타난다. ‘소리’는 후대의 ‘쇠’로 이어지는데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다. 신라어 ‘쇠잣(金城)’과 중세국어(용비어천가)의 ‘쇠잣(金城)’ ‘쇠재(鐵峴)’ 등이 그 확증이다.
땅과 내(壤·川)의 뜻인 ‘나(那)’도 고구려 영토와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했다. ‘나’가 양(壤)·천(川)의 뜻으로 쓰인 동음이의어였던 사실은 고구려 왕호 및 5부족 명에서 확인된다. 고구려 첫 수도인 졸본 주변을 흐르던 강은 ‘비류나(沸流那)’로 불렸다. 이 강은 또한 송양(松壤)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나’는 신라 초기 ‘사라·서라(斯羅·徐羅)’와 같이 ‘라’로 나타났으며 川의 뜻인 ‘나’도 신라 인명 ‘소나(素那=金川)’ ‘침나(沈那=煌川)’에 들어 있었다.
특히 고구려의 서울 ‘평양(平壤)’의 별칭은 ‘평나(平那)’였는데 이는 고구려어로는 ‘벌나’였다. 신라의 서울은 서라벌로 불렸다. 서라벌의 ‘라’는 ‘나’에서 변한 것이고 ‘나’ ‘라’는 모두 ‘땅(壤·地)’을 뜻한다. 결국 신라의 서울 ‘서라벌’의 ‘라벌’과 고구려의 서울 ‘벌나’를 비교하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뜻과 음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와 신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나’ ‘라’가 합쳐져 현대의 순 한국어인 ‘나라(國)’가 파생됐다.
‘코리아’라는 국호
한자어 ‘재(在)’는 고대 한국어에서 ‘견’으로 발음됐다. 신라 월성(月城)의 별칭인 ‘재성(在城)’을 추독하면 ‘견성’이 된다. ‘(왕이) 계신 성’이라는 뜻이다. 고구려 평양성을 한자로 ‘견성(킛城)’으로도 기록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단어가 일치한다. ‘압록(鴨綠)강’을 한역한 것이 ‘청하(靑河)’이다. ‘청하’는 고구려어로 ‘살하수(薩賀水)’라 불렸다. 청천(靑川)강은 고구려어로 ‘살수(薩水)’라 했다. ‘靑’의 뜻을 갖는 고구려어는 ‘살’이었다. 충북 괴산 청천(靑川)면의 옛 이름은 ‘살매(薩買)’였다. 그리고 고구려 건국 수도 졸본의 강은 비류나, 보술수, 송양(沸流那,普述水,松壤)으로 불렸다. 여기서 ‘보술’이 ‘소나무(松)’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보술’은 이후 ‘부사’ ‘부소’로 변화하였는데 백제의 첫 번째 수도 위례홀의 배산은 ‘부사악(負兒岳)’으로 불렸다. 개성시의 옛이름은 ‘부소압(扶蘇押)’이었다. 이후 소나무의 한자어가 이름에 들어가 ‘송악(松嶽)’이 됐다. 부여엔 현재도 ‘부소산(扶蘇山)’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지명 중 가장 역사적 정통성이 강한 것은 바로 국명이다. 백제는 한때 국명을 ‘남부여(南扶餘)’로 고쳤다. 백제 수도였던 ‘소부리(所夫里)’를 신라 경덕왕(757)이 ‘부여(扶餘)’로 고친 것도 백제의 뿌리가 부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한 뿌리에서 발원한 나라다.
후삼국 중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백제와 고구려를 이은 나라란 뜻이다. 후고구려를 줄여 국명으로 삼은 나라가 고려다. 고려는 분명 고구려의 후계국이다. 고려의 국호가 세계에 퍼져 현재 한국의 영문 국호인 ‘코리아(Korea)’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도 고구려사가 한국사임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이 코리아로 불리게 된 것은 ‘한국사’가 고구려에 뿌리를 두고 변천해온 역사라는 사실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중국측의 주장대로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하지 않는다면 ‘코리아’라는 국호 자체가 근거를 잃는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현재의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도 크게 퇴색된다. 백제의 성격도 모호해진다.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은 한국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고대사의 문제가 현재의 영토를 근거로 좌우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학적 측면에서 중국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는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같은 특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중국어에선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단일 언어권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만을 따로 떼어내 전혀 다른 언어권인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언어공동체는 단일 민족의 필요충분 조건이므로 삼국은 언어공동체인 한(韓)민족이 세운 별개의 나라들로 보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타당하다 하겠다.
‘안동도호부’의 의미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해(669) 당나라 이적(李勣) 등은 “고구려 제성에 도독부 및 주군(州郡)을 설치하는 건은 마땅히 남생(男生)과 상의 작성하여 주문(奏聞)하라는 칙명(勅命)을 받들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칙서는 “주청(奏請)에 의해서 그 주군(州郡)은 모름지기 (당나라에) 예속케 하여야 하겠다”고 돼 있다.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엔 안동도호부, 백제엔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다. 도호부와 도독부는 점령국에 대한 ‘식민통치부’에 해당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멸망 이전에 고구려는 당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중화권에 속하지 아니한 별개의 국가였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6/2f/27/69462f270fed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