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온 바다에서 한 해의 첫 해를 바라본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처음 이곳 바다에 들어섰을 때 생각이 난다. 여수 바다로 향하는 863번 지방도로를 타고 흐르다가 문득 들어선 바닷가 마을에서 해넘이 장관을 보게 됐다. 마을 앞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고 섬들이 갯물 끝에서 하루의 맨 마지막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갯벌은 해가 자신의 영과 육을 던져 만든 찬란한 노을로 물들었는데 하늘이 아닌 곳에 노을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색종이를 찢어 도화지에 붙이는 놀이를 하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 저녁노을을 바라보던 나는 마을 이름이 궁금해졌고 낡은 선창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와온(臥溫)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이 내게 경이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뜻하게 누워 있는 바다.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몸과 마음이 한없이 정직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만날 수 있는 정결한 평온이 허름한 포구의 이름 속에 깃들어 있었다. 언젠가 이곳 바다에 생의 한 시간을 누이리라는 꿈이 그때 찾아왔다.
갯벌에서 한 무리의 아낙이 꼬막을 채취하고 있다. 아낙들은 널이라고 하는 이동수단을 지니고 있는데 한쪽 무릎을 널 위에 올리고 다른 한쪽 발로 밀어서 움직이는 이 원시적인 이동수단이 없다면 아낙들의 노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겨울 햇살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아낙들의 등을 비추는 모습이 인상파의 그림 같다. 사실 아낙들의 이 노동은 십년 이십년의 세월이 뼈에 스미지 않은 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다. 널 위에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꼬막이나 바지락을 싣고 이동하다가 개흙이 딱딱하게 다져진 곳을 지나갈 적이면 허리는 휘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한 아낙은 어느 날 내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왜 이곳에 나를 낳았을까 한스러웠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내게 이 아낙들의 노동은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진다.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모습만큼 건강하고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을까.
어느 해 봄 이곳 바다에 들른 박완서 선생은 와온 바다의 갯벌에서 일하는 아낙들을 바라보며 ‘봄날의 꽃보다도 와온 바다의 갯벌이 더 아름답다’는 얘길 했거니와 이는 훌륭한 육체노동을 하는 갯마을 아낙들의 삶에 대한 헌사나 다름없었다. 내가 쓴 시 한 수가 농부가 수확한 감자 한 망태나 토마토 한 광주리 같은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오랜 관심사였으니 평생 글을 써온 선생에게는 그 소회가 오죽했을까. 밀물이 되어 노동을 마친 아낙들이 햇살과 바람에 그을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을 바라보며 선생은 내게 ‘나도 이곳에서 좀 살다갈까봐’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그 말이 선생 또한 이곳 갯벌에 납작 엎드려 널을 밀며 노동하는 삶의 시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선생이 오래 살아 와온 바다에서 널을 밀었다면 선생은 평생을 하얀 손가락으로 글을 쓰며 산 콤플렉스를 씻었을 것이다.
사실 와온 바다에는 널리 펼쳐진 갯벌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바다가 텅 빈 마음으로 밀려오고 텅 빈 마음으로 다시 밀려 나가는 것이다. 텅 비어 있으니 온몸으로 저녁 햇살을 껴안을 수 있고 텅 비어 있으니 밀려오는 바닷물도 따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와온의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이건 1급 비밀이다, 해넘이의 시각이 아니라 만월의 시각이다. 봄날 한없이 둥글고 큰 달이 와온 바다 위에서 달빛을 뿌릴 때면 세상은 온통 눈부신 꽃밭이 된다. 만파식적의 고요함 속에 달빛의 향기가 온 바다를 그윽이 흔드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내가 쓴 시들의 허름한 굴레에서 벗어나 눈앞에 펼쳐지는 생의 한 순결한 꿈에 숨을 죽인다. 가깝고 먼 갯마을의 불빛들, 먼 여행길에서 방금 돌아온 것 같은 섬의 그림자들, 알 수 없는 음절의 노래 한 자락을 떨구며 날아가는 잠들지 못하는 새들…. 핍진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삶 속에 펼쳐진 이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딕’과 ‘앤’생각이 난다. 둘은 부부사이고 네덜란드 사람이다. 둘은 시를 쓰는 한국인 친구와 와온 바다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국을 여행하게 된 내력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부부에게는 나이가 스물다섯인 딸이 있었는데 한국인 입양아였다. 딸이 스무 살이 되면서부터 부부는 한국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딸에게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에서 둘의 생활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다. 시골 마을의 조그만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하는 것이 부부의 소득원이었고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연립주택에 산다고 했다. 딸의 한국행을 위한 비행기표 값을 모으기 위해서도 여러 해의 내핍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는 동행한 한국인 친구로부터 들었다. 난 이들과 함께 순천만과 여수 바다 이곳저곳을 함께 둘러보았다. 이 여행은 한국의 기성세대로서 왜 한국의 아이가 네덜란드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야만 했는지 하는 부끄러움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동행하는 동안 앤은 내게 딸아이를 생각하며 쓴 시를 환한 웃음과 함께 읽어주었고 딕은 와온 바다에서의 우리의 만남을 추억하는 즉흥곡을 음식점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연주해주었다.
딕과 앤에게는 한국인 딸 말고도 아프리카에서 입양한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자신들의 삶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두 아이의 입양은 내게 놀라움이었다. 짧은 여행 중에 나는 그들에게 기어코 묻고 싶은 것을 물었다. ‘너희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인 친구로부터 들었다. 그런데도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은 우리가 매일 시를 읽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시를 읽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큰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좋은 일을 돈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돈이 부족하다고 시를 쓰지 않고 같은 이유로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면 인생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딕과 앤이 떠나던 날 나는 환하게 핀 와온 마을의 오동나무 꽃가지를 듬뿍 안겨 주었다.
와온 바다에 머무는 동안 부끄러워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한 적도 있고 부끄러움 속에서도 몇 줄의 시를 쓴 적도 있다. 분명한 것은 와온 바다가 지닌 촉촉하고 따스한 이데올로기 곁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臥溫, 따뜻하게 누워 있는 바다. 누가 처음 이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또한 이곳 바다에 펼쳐진 저녁노을의 향연과 달빛의 축제를 보았음이 틀림없다. 깊게 엎드려 널을 밀고 가며 조개를 캐던 아낙들의 굽은 등을 따스하게 지켜보았음이 틀림없다.
|
누군들 생의 와온을 꿈꾸지 않으랴. 새해에 나는 일하는 이들이 좀 더 대접받는 세상으로 인간의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싶다. 일하지 않고, 가능한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얻으려는 생각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수치(羞恥)임을 모두가 깨우쳤으면 싶다. 1%의 사람들을 위해 99%의 사람들이 절망하기보다는 99%의 사람들을 위해 능력 있는 1%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꿈꾸고 싶다.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졌어도 그것을 진실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임을 지구별 위의 모든 인간이 따뜻하게 가슴에 새겼으면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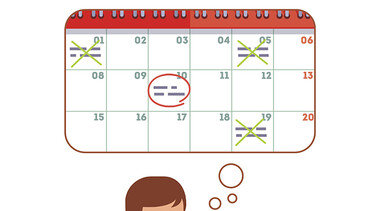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