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기대에 부푼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 나와 아이에게 역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너를 내 뱃속에 열 달 동안 넣고 다닌 값-무료 /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울면서 간호한 값-무료 / 너를 키우면서 마음 아팠던 값-무료 / 가난한 살림에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준 값-무료 / 너를 하늘만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값-무료.”
아이는 엄마의 글을 읽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갚아요?” 엄마는 아이를 꼬옥 안아 주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한다. “다 지불되었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다. 아이 어머니의 현명함이 돋보이는 이야기지만 내용인즉 어머니(부모)의 자식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일 게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란 것은 일단 생물학적인 근원을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떠나 신화처럼 절대화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모든 신화는 은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국신화는 건국과정의 온갖 갈등과 배신과 살육과 패륜을 은폐하고 있으며 종교신화 역시 그 성립과정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원을 은폐하고 있다. 이른바 모성의 신화, 여성성의 신화는 여성에 대한 수천년에 걸친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부모의 ‘내리사랑’이라는 신화도 그 신화화의 강도로 보아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은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부모해방운동본부’라는 낯선 이름의 단체가 인터넷상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ojum0’이라는 역시 낯선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거기엔 이런 내용의 ‘부모해방선언서’가 게시돼 있었다.
“일찍이 동방예의지국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 코리아의 지어미 지아비가 21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부모해방을 선언하노라. 자식을 미끼로 부모의 삶을 유린한 위정자에게 고하노니 그 동안 부모와 자식을 한데 가두어 온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식을 국가에 입양시켜 양육하고 정부에 귀속시켜 교육하라. 부모는 만자식의 어버이가 될 것이며 자식은 만부모의 자녀가 될 것이로다. 우리는 모든 물질적 소유를 떠날 것이며 정신적 삶으로 영혼의 양심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의무와 희생으로 짓밟힌 반생명체의 수동적 삶을 자율과 창의의 온전한 생명체의 능동적 삶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 세상의 끝에서 갈 길 잃은 인류가 부모해방을 통해 새 길을 찾을 때 이것이 바로 인류의 진화요 역사의 진보요 생명의 도약이라 할 것이다.”
글이 거칠고 수사학적 설득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엔 깜짝 놀랄 만한 도전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말인즉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해체하고 자식들을 국가가 입양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면 모두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양심을 되찾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인류의 진화, 역사의 진보, 생명의 도약이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가정이라는 공간과 부모-자식간 사랑의 절대성이라는 신화 뒤에는 새로운 세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수고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려는 국가, 혹은 자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식, 내 가족’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족주의적 집착을 부추겨 사회 전체, 세계 전체를 이기적 소유욕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교육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천박할 정도의 과도한 집착과 그것이 낳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와 문화적 폐해를 생각하면 이 거친 ‘선언’에서와 같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양육·교육관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맹목적 사랑과 집착이 그 근원은 종족보존이라는 생물학적 맥락에 있되, 이른바 문명사회가 그것을 승화하지는 못할지언정 갈수록 더 그악스럽게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불순한 의도와 관련된 사회적·역사적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가족 얘기를 좀 해보자. 언제나 어린아이 같기만 하던 두 아이가 벌써 열아홉, 열여섯 살이 되었고 큰 아이는 내년이면 대학엘 다니게 된다. 아이들 큰다고 좋아하다가 자기 늙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그 처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잘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보면 대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명색이 부모로서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해 준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믿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해 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부부의 교육관은 완전한 방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조형’하고 싶어하는 다른 부모들의 집착과는 멀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하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밖에서 무얼 하는지 늘 노심초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내 경우는 아이들 일이 내 삶의 리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편이고, 아내와의 관계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편이다.
나와 아내는 ‘내리사랑’의 신화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고자 하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은 ‘부모해방’을 주장하거나 실천하는 쪽도 아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사회가 다음 세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게 되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탁양육’한다고나 할까? 집착이 아닌 사랑, 방관이 아닌 거리 두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족과 사회의 경계를 사유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몫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게으르고 늘 자기 중심적인 우리 부부가 아이들에게 마지못해(?) 해주는 소극적이기 짝이 없는 부모노릇이라면 부모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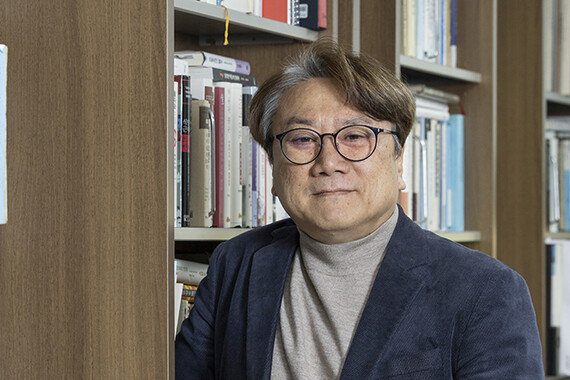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