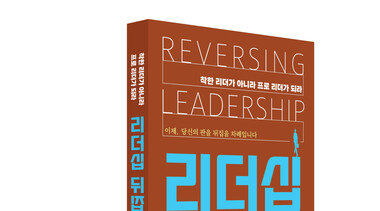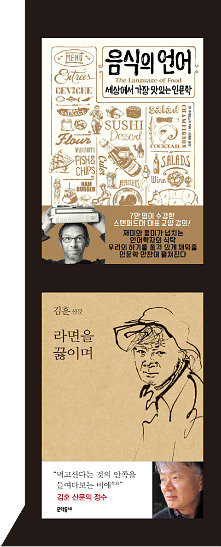
우리는 리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책을 고르기 전, 영화를 보기 전, 물건을 사기 전,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타인의 경험을 참고한다. 상대적으로 장문이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터넷의 문서들, 촌철살인과 시각성에 의존하는 SNS의 글을 통해 점점 진화하는 리뷰들. 그러한 리뷰의 맥락에서, 리뷰 중의 리뷰인 음식에 대한 리뷰를 다루려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리뷰는 궁극의 포르노그래피이며 극단의 스포일러다. 힐링계 ‘구루메’ 소설들에 나타나는 솔푸드의 위로나 최상에 이른 맛의 경지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소믈리에들의 냉철한 맛 분석이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1인 매체의 대신 먹어주기는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안으로 타인을 유혹하는 포르노그래피적 상상력과 닮았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리뷰는 어떠한 스포일러도 용납될 수 있는, 스포일러를 잘 하는 것이 관건인 리뷰다. 먹지 않아도 침이 고이거나 배가 불러야 제대로 된 ‘식후감’을 본 것 아닌가.
음식 리뷰 속 인간 본성
사실 나는 아이디(ID)의 수만큼 존재하는 리뷰가 과시와 눈치의 감각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했다. 쓰는 자는 상식적인 감수성 안에서 자신의 세련됨을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서 만족감을 갖는다. 보는 자는 군중 속에서 혼자만 길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리저리 따지고 재보다가 결국 리뷰의 대세에 맞춰 적당히 절충하고 안심한다.그러나 ‘음식의 언어(The Lang-uage of Food)’(2015)의 저자 댄 주래프스키는 음식에 관한 리뷰에서 인간의 긍정적 본성을 발견한다. 그것이 악평이든 호평이든 말이다.
때로 음식점이나 제조사 전체를 경영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는 악평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악의적인 블랙 컨슈머들에 대한 경계의 감각이 생겨날 만큼 부정적인 음식 리뷰는 이제 그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의 필자는 부정적인 음식 리뷰가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다양한 표현을 가졌다는 데 주목한다.
음식점에 대한 악평에는 많은 경우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은 스토리 구조가 있거나, 식자(食者)가 느낀 맛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만족이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공들여 표현된다. 인간은 부정적인 상황을 아주 잘 구별해내야 이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음의 위기에서 유비무환의 매뉴얼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음식 리뷰의 언어에 나타난 이러한 부정적 차별화 경향은 위험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진화론적 유용성에서 비롯했다.
사실 빈도 수를 따져본다면 음식에 대한 리뷰 대부분은 호평이다. 음식 리뷰에는 ‘나쁜(bad)’이나 ‘끔찍한(terrible)’ 같은 형용사보다는 ‘맛있는(delicious)’ ‘최고의(best)’ ‘훌륭한(great)’ 같은 긍정적 형용사가 3~10배나 더 자주 쓰인다. 한국식으로 하자면 ‘비추’ ‘불호’ ‘별로’ 보다는 ‘강추’ ‘존맛’ ‘대박’ 등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긍정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폴리애나 효과(pollyanna effect)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앨리너 포터의 동화에서 고아 폴리애나가 언제나 세상의 밝은 측면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의 언어’에는 음식과 관련된 인간의 여러 언어 상황이 제시돼 있다. 본디 중국의 생선 젓갈을 의미하던 ‘케첩’이 미국 패스트푸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세계화, 얇고 가벼우며 바삭바삭 씹히는 과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크래커’와 비슷한 소리의 이름을 가졌을 것이라는 증거들, 이제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프랑스식 ‘마카롱’이 어떻게 사치스러운 식문화를 대중화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음식의 언어’에는 재미있게도 한국의 식품 광고 이야기가 등장한다. 미국의 디저트 광고가 크림이나 부드러운 질감의 달콤함을 자극하는 반면, 한국의 식품 광고에는 ‘칼칼하다’ ‘톡 쏜다’ ‘얼얼하다’처럼 촉감을 자극하는 말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간식 광고라기보다는 라면 광고였을 것이며, 한국말로 재번역된 저 형용사들은 원래 ‘매콤하다’ 혹은 ‘얼큰하다’의 파생어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증명되는 듯하다.
유일무이한 라면 레시피
최첨단의 시대에도 여전히 원고지를 고집하는 아날로그적인 김훈 작가도 최근 라면을 리뷰했다(‘라면을 끓이며’, 2015). 라면을 한국인의 영혼에 “인 박여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말이다. 지속적으로 밥벌이의 지겨움과 밥덩이가 낚싯바늘에 꿰인 미끼인 줄 알면서도 물 수밖에 없는 가장의 비애를 말하지만, 그의 음식 리뷰 안에서도 전형적인 공식이 발견된다. 객관적 보여주기의 문체를 지향하는 작가이지만 ‘라면을 끓이며’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형용사 ‘좋다’의 등장이 빈번하며 ‘질색이다’나 ‘맛이 없다’ 등도 간간이 보이기 때문이다.작가가 리뷰하는 맛은 라면이 겪어온 통시적 현재의 정서에 대한 것이다. 1960년대 기아에서 허덕이던 국민을 구하기 위해 개발된 고칼로리의 저가 공업품 라면은, 현재에도 1년에 36억 봉지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부박한 삶의 영양소이자 산업화 시대의 맛이다. 여기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숙성되는 된장이나 간장과 같은 깊이나 심층을 느낄 수는 없다. 대량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중심과 주변, 인공과 천연, 전체와 개별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삶의 맛이자 정서다. 외롭게 혼자 끼니를 때우지만 누구나 다 같은 맛의 라면을 먹을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안도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라면에 대한 김훈의 리뷰는 결국엔 긍정적이다.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맛의 정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지만, 나만의 개별성을 부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 대동소이의 방법이 바로 작가가 ‘이제부터 본론’이라고 얘기하는 후반부의 라면 레시피다.
무더위에 수박 한 조각
이 레시피는 김훈답다. 최근의 화려한 라면 레시피들은 결국엔 라면이 아니게 돼버리는 주객전도의 결과를 낳고야 마는데, 작가가 보여주는 레시피는 라면의 본래적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청렴하고 정갈하다. “파의 서늘한 청량감이 달걀의 부드러움과 섞”이고,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김훈만의 라면 만들어 먹기는, 이 부박한 현실에서의 먹고살기를 “덜 쓸쓸하고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면을 끓이며’에 수록된 ‘수박’이라는 글에서 작가는 “글을 쓰면서 읽은 책을 들이대는 것은 게으르고 졸렬한 수작”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 어떤 포르노그래피보다도 자극적이며 그 어떤 스포일러보다도 생생한 여름 디저트 리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과 마음의 무더위에 휴식을 줄 것이기에, 마지막으로 김훈의 수박 한 조각을 건넨다.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수박이 두 쪽으로 열린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카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고, 나타나서 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면을 끓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