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치콕의 1954년 영화 ‘이창(Rear Window)’에서 주인공이 ‘훌륭하고 대단한 와인(great big glassful)’이라고 표현한 몽하쉐(Montra- chet)는 사실 문학세계에 더 일찍 등장했다. 알렉산더 뒤마는 와인세계에서 ‘삼총사’만큼 유명한 몽하쉐를 이렇게 극찬했다. “몽하쉐를 마실 때는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어라.”
현실세계에서도 몽하쉐는 위세를 떨친다. 몽하쉐는 프랑스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다. 강건하고 육중한 질감은 웬만한 레드 와인 못지않다. 진하고 풍부한 청포도 향기에 새 오크통에서 비롯된 강한 바닐라향이 잘 혼합돼 마시기 전부터 얼굴이 온통 향기로 뒤덮인다. 한 입 머금으면 상큼한 아로마가 곧장 입천장에 닿아 그 속도에 놀라며, 더 놀라운 것은 묵직한 질감이다. 입 안을 무겁게 장악하고 오랫동안 그 향내를 유지하며,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도톰함이란 잊기 어렵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꾸리고 떠나는 부르고뉴 기행은, 스테이크 먹을 때 맛을 돋우는 디종 소스의 고향 디종에서 시작하면 좋다. 디종행 테제베에서 내려 렌터카로 갈아탄다. 74번 국도를 타고 곧장 남하하면 부르고뉴의 황금빛 벌판이 펼쳐진다. 오른편으론 명산지가 줄지어 있다. 18세기 말 나폴레옹은 병사들이 프랑스의 위대한 유산을 목격하고 사기를 고취하게끔 이 길을 자주 지났다고 한다. “우로 봐” 하는 인솔 장교의 구령에 맞춰 군인들은 한껏 사기가 올랐을 것이다. 바라보는 거기엔 누구나 소망하는 샹베르탱, 클로 드 부조, 로마네 콩티, 몽하쉐 같은 최고급 포도밭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자존심과도 같은 부르고뉴의 우수한 포도밭들은 돌담을 쌓아 지층을 보호한다. 몽하쉐도 그렇고 로마네 콩티도 마찬가지다. 이런 포도밭을 ‘그랑 크뤼(Grand Cru)’라고 한다. 최고의 포도밭을 뜻한다.
1728년 수도원장 클로드 아르노(1695~1770)는 ‘부르고뉴의 상황(Dissertation on the situation of Burgundy)’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몽하쉐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나고 맛있는 화이트 와인이다. 그 맛은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운 특질을 지닌다. 나는 예닐곱 번 마신 적이 있어 그 섬세함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그는 몽하쉐의 희소성과 가격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다. “몽하쉐는 항상 수확 전에 다 팔리고 아주 비싸고 귀해서, 얻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잰시스 로빈슨의 ‘옥스퍼드 컴패니언 투 와인(Oxford companion to wine)’은 몽하쉐의 가격에 대해 디종 대학 라발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라발은 1855년 저서 ‘코트 도르의 역사와 통계학(The history and statistics of the Cote d′Or)’에서 몽하쉐를 최고의 화이트 포도밭으로 지정했다. 그의 등급 분류는 실상 보르도 메독의 분류에 자극받아 나온 결실이지만, 오늘날 부르고뉴 와인 등급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포도밭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그랑 크뤼’ ‘프리미어 크뤼’ 명세가 오늘날 부르고뉴 원산지 분류의 기초를 이룬다. 부르고뉴 전체의 화이트 포도밭 중에서 뫼르소 페리에르가 유일하게 몽하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몽하쉐는 샤르도네 100%로 만든다. 미국이나 호주 같으면 라벨에 샤르도네라고 표기하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몽하쉐라고 한다. 포도 이름보다 포도밭 이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그 만디노는 저서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성문화된 법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예방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푼의 돈을 벌 수도, 단 한마디의 칭찬을 들을 수도 없다”고 설파했는데, 그의 주장을 몽하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몽하쉐라고 해서 다 같은 몽하쉐가 아니다. 누가 생산하느냐가 실로 중요하다.
수천 병 남짓으로 전세계 컬렉터 자극
포도밭 몽하쉐는 8ha가 채 안 되는 면적이다. 몽하쉐는 풀리니 마을과 샤산 마을에 걸쳐 있다. 오래전부터 유명세를 떨친 몽하쉐 포도밭은 마을의 황금알이었기에 1879년 풀리니 마을은 마을 이름에 몽하쉐를 병기하기로 의결, 오늘날 풀리니 몽하쉐가 됐다. 샤산 몽하쉐도 마찬가지다. 두 마을은 사이좋게 반반씩 몽하쉐를 소유하고 있다. 몽하쉐는 18명이 분할 소유하고 있지만, 소작 생산자까지 합하면 몽하쉐의 라벨은 24가지나 된다. 같은 몽하쉐지만 각기 다른 24개의 브랜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 골라야 한다.

부르고뉴 지방에 펼쳐진 광활한 포도밭.
샤르도네는 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트리티스, 즉 귀부 와인을 만드는 곰팡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몽하쉐의 샤르도네도 마찬가지다. 몽하쉐의 토양은 얇은 표토층 아래로 석회암 지대가 형성돼 있다. 해발고도 250~270m, 경사 10도의 완만한 구릉에 놓인 몽하쉐 토양은 배수가 잘되고 퇴적물질로 인한 광물성 자양분이 많다. 햇빛을 잘 흡수해 샤르도네에 훌륭한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석회석 지대는 청포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니 양조장 주인들은 늦가을까지 수확을 기다리면서도 보트리티스 걱정을 덜 수 있다. 네덜란드인 거트 크룸의 저서 ‘도멘느 로마네 콩티(Le Domaine de la Romanee Conti)’에는 DRC의 공동경영자 오베르 드 빌렝의 수확에 관한 체험이 기록돼 있다. “1990년 이후로 되도록이면 늦게 수확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풍족함과 풍성함을 얻는다.”
와인을 조각하는 미켈란젤로
생산자에 따라서는 몽하쉐가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 잎사귀가 둥글게 말리는 병충해 피해 때문에 포도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그렇고, 바닐라향이 너무 강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 몽하쉐의 풍부한 질감과 향기는 새 오크통에서 강화된다. 어떤 이는 바닐라향에서 오는 미끈한 질감과 풍만한 감촉이 샤르도네의 인공적 혹은 가식적인 아름다움이라 느낀다.
샤르도네의 최고 장점은 적응성이다. 거트 크룸은 샤르도네를 이렇게 평가했다. “샤르도네는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 성격으로 인해 전세계를 손아귀에 넣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며 샤르도네 자체가 거대한 브랜드가 됐다. 포도밭에서 수확을 많이 함으로써 개성을 잃었으며, 그걸 만회하려고 양조장에서 여러 기교를 부린 통에 성격이 인공적으로 변했다. 오늘날 품질을 최고로 여기는 양조장에서만 샤르도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독일 와인가이드’를 펴내고 있는 조엘 페인은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한 와인 세미나에서 샤르도네와 리슬링의 차이를 일러 마치 석고와 대리석의 차이와 같다고 비유했다. 마음껏 주물러 원하는 모양대로 빚을 수 있는 석고는 오크통에 기대는 샤르도네와 같고, 고통스럽게 깎고 또 다듬어야 겨우 모양을 갖추는 대리석은 오로지 포도 성분에만 의지하는 리슬링과 같다면서, 미켈란젤로 같은 독일 현대 양조가들이 리슬링을 걸작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조엘 페인이 손꼽는 최고의 양조가 중에 ‘켈러(Keller)’가 있다.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잰시스 로빈슨 역시 “독일 드라이 화이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를 꼽으라면 난 켈러를 추천한다. 그 와인은 매년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의 명산지는 라인강변에 몰려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의 소설 ‘펠릭스 크룰의 고백, 1922’에는 라인계곡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풍토로 보나 기후로 보나 험준한 맛 하나 없이 온화하며 도시와 촌락이 허다하게 들어앉아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생각하건대 인간이 자리 잡은 가장 쾌적한 곳 중 하나인 저 복 받은 지대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었다. 이곳에는 라인밸리 산맥이 거친 바람을 가로막아주며, 이곳저곳에 흩어져 그 이름만 들어도 주객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유명한 도시들이 한나절 햇빛을 받으며 번영하고 있으니, 바로 이곳에 라우언타일, 요하니스베르그, 뤼데스하임이 자리 잡은 곳이요, 도이치 제국의 영광스러운 건국 1871년 후 몇 년 되지 않아 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신성한 소도시가 있다.”
소설의 묘사처럼 라인강 일대 풍광이 기가 막히다. 남향이라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강변 카페에 앉아 흐르는 강물에 쏟아지는 빛에 와인과 음식을 말아먹노라면 이보다 더 큰 호사가 없는 듯하다. 와인의 영화로 보면 독일이 결코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 리슬링의 영광은 찬란했다. 스티븐 브룩이 쓴 ‘와인백년(A century of wine)’에서 독일 와인의 영광이 명백하게 증명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가게 BBR의 1896년 가격표가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보르도의 맹주 샤토 라피트 로쉴드 1878 빈티지가 140실링인데, 독일 루데샤이머 힌터하우스 1862 빈티지는 200실링이다. 이 외에도 라피트보다 비싼 와인이 몇 개 더 보인다. 빌헬름 1세와 빌헬름 2세로 대변되는 ‘독일의 아름다운 시절(1871~1918)’에는 독일 와인이 최고가를 이뤘다. 그때는 산업화 시기, 번영의 시기여서 독일 최고급 리슬링에 대한 수요가 대단했다. 베르사유에서 대관식을 통해 독일제국의 기상을 알린 이후로 리슬링은 최고 와인의 명성을 이어갔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가장 비싼 와인으로 통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시절은 길지 않았다. 세계대전에 연이어 패한 후 독일이 잠복기에 들자, 독일 와인의 기세도 꺾였다.
중세 포도밭의 비밀을 찾아라!
독일 와인산지 중에 켈러 양조장이 있는 라인헤센만큼 윤이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의 무대가 되었을까? 라인헤센은 오랫동안 조명 받지 못한 음습한 지역이었다. 1960~70년대 엄청나게 쏟아낸 저급한 와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로 실바너나 뮬러 트루가우로 저그 와인(Jug Wine·1.5L나 그보다 큰 용기에 파는 저가 와인)을 만들었다. 이 지역은 모젤이나 라인가우처럼 급경사가 아니라 프랑스 부르고뉴처럼 완만한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리슬링 경작지는 당시 5% 남짓밖에 안 됐다. 라인강 기슭에 가까운 니어슈타인이나 오펜하임 같은 마을이 비교적 우수한 리슬링을 양조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라인헤센의 중심으로 평가돼왔다.

켈러의 후바커 포도밭.
클라우스-피터가 데뷔하기 전에는 주로 스위트 스타일로 양조했다. 그가 와인을 드라이 스타일로 바꾼 계기는 독일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찾아왔다. 잔당이 함유된 화이트에 염증을 느낀 애호가들은 드라이 화이트를 갈망했으며, 더욱이 그 수준이 최고이기를 원하던 때에 클라우스 피터가 등장한 것이다.
라인헤센의 달샤임이나 베스토펜은 오랫동안 와인을 양조해왔으나 여전히 무명에 가깝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아니 독일에서 가장 세련된 맛을 내는 양조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존 길만(John Gilman)은 그의 뉴스레터 ‘셀러에서 본 견해(View from the Cellar)’ 2007년 11월호에서 켈러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다. 켈러의 혜성 같은 등장은 포도밭 구입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세로 가보자. 중심도시 보름스의 교회는 종교적인 필요로 이름난 포도밭에서 나온 와인을 열렬히 원했다. 오늘날 켈러가 소유한 포도밭들이 당시 최고 인기였다. 교회가 좋아했던 포도밭 중에 압트세르데가 있었다. 그 밭을 돌본 수도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12세기에 4ha였던 이 포도밭은 지역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전량 보름스 주교를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유럽이 암흑기에 돌입하면서 포도밭의 비밀이 자취를 감추고, 후임자들은 포도밭에 대한 기억을 전수받지 못한다.
그러나 켈러에 의해 중세의 찬란했던 이 마을 와인 수준이 되살아났다. 켈러는 그 옛날 그 좋은 와인이 생산된 곳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켈러는 그 밭들을 언제 구입했을까? 라인헤센을 통째로 흔들어 깨운 발견은 놀랍게도 최근에 일어났다. 그러니 켈러의 포도밭 구입은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1999년에 키르흐슈피엘을 샀고, 이어 2001년에 몰슈타인, 곧이어 압트세르데 포도밭을 매입했다. 클라우스-피터는 라인헤센의 유망한 구역에 대해 말을 아낀다. 틀림없이 어딘가에 중세 암흑기에 놓친 기가 막힌 포도밭이 더 있으리라.
왕년에 유명했던 포도밭을 찾았다고 해서 일이 다된 건 아니다. 켈러가 오늘날 독일 최고의 드라이 화이트 생산자가 된 것은 세심한 포도나무 관리를 통해 옛 품질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2007년 켈러를 찾았을 당시 그는 14년 묵은 빈티지 1993년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았다. 그때 이미 주행기록이 40만km를 막 넘겼는데, 아마 지금도 그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는 매일 오전 7시 영락없이 포도밭에 있다. 빼어난 테르와(terroir·포도밭 토양)를 지닌 중세 명산지를 획득한 이후 매일 거듭된 작업 속에서 그는 포도나무 재배가 와인 품질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지에서 나오는 송이 수를 제한하고, 송이가 완숙되기 전에 반을 제거함으로써 송이 크기도 제한하고, 잎사귀의 수도 제한해 광합성을 늦춰 포도가 오랫동안 서서히 익게 한다. 다뉴브 강가에서 생산된 오스트리아산 화이트 명주 도수가 14도를 웃돌지만, 켈러의 리슬링은 높아야 13.2도다.
한잔을 마시고 한잔 더 원해야
세계적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 ‘아웃라이어’에서 주장한 ‘1만 시간 이론’이 켈러에 적용된다. 1973년생인 켈러는 이미 1만 시간 이상을 쏟아 부으며 포도 재배의 달인이 되어간다. 켈러의 최우수 포도밭은 후바커(Hubacker)다. 달샤임 마을에 속하며 남동향의 4ha 규모이고, 15도 정도의 경사지며 토양은 황토, 양토, 이회토, 석회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리슬링을 심고 거둔다. 리슬링의 매력은 그 맛이 무척 투명하고 순수해 땅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와인: 마개를 딴 인생(Wine: a life uncorked)’에서 휴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리슬링은 피노 누아처럼 토양을 들여다보는 렌즈다. 리슬링은 토양과 기후 그리고 빈티지 날씨를 집어 들어 틀림없이 그것들을 드러낸다.” 리슬링이나 피노 누아의 이러한 특질은 곧잘 샤르도네 혹은 카베르네 패밀리와 비교된다. 휴 존슨의 비교다. “보르도에서 하는 것처럼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카베르네 프랑은 혼합돼 서로를 가린다. 피노 누아는 리슬링처럼 투명하다.”
2009년 2월에 시음단체 ‘그랑 주리 유러피언(Grand Jury European)’은 2005년 빈티지의 리슬링 비교 시음대회를 열었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산 리슬링이 한데 모였다. 영예의 최고 점수는 단연 켈러의 ‘후바커 2005’였다. “내가 원하는 리슬링은 몬스터 리슬링이 아니다. 리슬링의 고품질은 정밀함, 피네스, 광물성이다. 한잔을 다 마시고도 한잔 더 원해야만 그 와인이 좋다고 믿는다.” 이 같은 신념을 가진 켈러의 리슬링은 몽하쉐처럼 오래 숙성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몽하쉐를 사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선각자들의 조언이 조만간 켈러의 후바커나 키르흐슈피엘에 적용될 것이다.
독일의 몽하쉐? 독일의 후바커!
경매회사 소더비의 와인 수장 세레나 서클리프(Serena Sutcliffe)는 저서 ‘버건디 와인(Wines of Burgundy)’에서 몽하쉐를 10년 이내에 마시는 것은 ‘와인계의 범죄’라고 표현했다. 병입 후 2~4년까지도 여전히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병 속에서 와인이 더 깊은 맛으로 변해간다고 믿는다. 한 10년은 돼야 마실 만하다. 세레나 서클리프는 13℃의 이상적인 셀러에서 보관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질감이 풍부해지며, 숙성되는 동안 연둣빛을 띤 노란색이 빛나는 금색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한다.
양조장을 방문하면 보통 품질별, 가격대별, 개성별로 순차적으로 와인을 시음하는데, 몽하쉐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시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켈러 양조장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량이 적으니 시음할 기회도 적은 것이다. 라발 교수는 몽하쉐의 가격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빈티지가 좋은 해의 몽하쉐 가격은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닐 것이다.”
화이트 와인의 최고봉 몽하쉐에 필적할 와인이 있을까? 그 역사와 지명도, 맛, 그리고 숙성력에 버금가는 걸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 후보가 있으니 바로 켈러다. 잰시스 로빈슨은 켈러의 리슬링을 ‘독일의 몽하쉐’라고 격찬했다. 켈러의 리슬링은 투명함, 정밀함, 우아함, 세련됨, 균형미, 미네랄을 잔뜩 갖고 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석탄을 불고 닦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킨 켈러는 아직 30대다. 그가 앞으로 리슬링 연구에 수만 시간을 투자해 ‘아웃라이어’로 성장해나가는 동안 독일의 몽하쉐가 아닌 후바커로 우뚝 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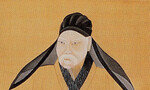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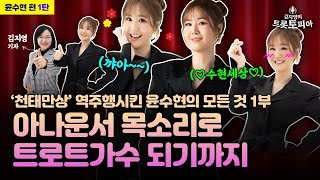






![[시마당] 열쇠](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6/0a/42/56/660a42560713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