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본인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효종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SNS 통한 모욕 심각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NS 이용자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SNS를 통해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악플’은 고 최진실씨를 자살로 이끈 요인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공간의 전파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여론에 의해 무산됐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모욕’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 공연성(公然性)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만 듣는 상태에서 모욕해서는 모욕죄가 될 수 없다.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범죄가 된다.
모욕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말하거나 나타내야 한다. 반면 모욕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만 주면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나쁜 놈’‘배신자’라고만 말하면 명예훼손은 될 수 없고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으로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쓴 경우 이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만일 피의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라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탤런트 문근영씨가 6년간 8억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왜 갑자기 빨치산 가문을 기부천사로 등장시켰을까?”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임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는 만원이라도 내고 문근영씨를 음해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지씨는 삐라로 기부했다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임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 상당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10년 7월 의정부법원의 법정 밖 복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쟁이 일었다. 원고 이씨는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공장.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인간쓰레기들”이라면서 피고와 변호사를 향해 폭언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중 감정이 격해 우발적으로 폭언한 경우라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피해자들에게 150만~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 망할 년’‘빨갱이 계집년’‘애꾸눈 병신’‘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과 같은 표현도 판례상 모욕죄가 인정됐다.
2009년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너는 아비 어미도 없냐”
교사인 김모씨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교사에게 큰 소리로 “학생 이모군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모욕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다”며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병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OO치과 가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리해보자면 기분 상하는 말을 했다고 항상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칠 만한 표현을 해야 모욕죄가 된다고 하겠다. 욕설은 명예감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모욕적인 표현의 원문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인터넷의 폐해가 더 심각한 이유는 ‘퍼 나르기’나 ‘링크 걸기’를 통한 강력한 전파력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로 글을 게시한 사람만 처벌하고 전파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년 9월 이미 공표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러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바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문 기사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원문 기사 등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인터넷 카페의 자료를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퍼 나르기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대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 링크 걸기를 해둔 사건에서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일정한 조건하에 ‘링크 걸기’를 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이트에 링크 걸기를 한 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용석 의원이 여자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고 한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더라도 집단에 소속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아나운서들이 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발언은 맥락상 아나운서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쉽게 상처 받는 세상
현대사포럼이라는 단체의 대표는 2008년 1월 강연회에서 4·3항쟁 피해자 1만3564명에 대해 이들은 폭동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4·3항쟁 피해자들은 집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희생자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만3564명을 폭동 가담자로 표현한 것은 희생자들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면서 4·3항쟁 피해자인 원고들에게는 각 30만원씩,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는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례를 종합하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 전체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모욕죄는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이 쉽게 상처 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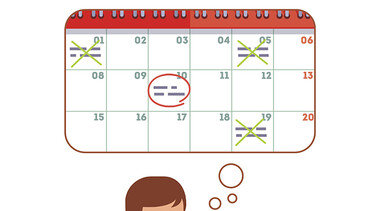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