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진 항.
길가에 줄지어 선 대형 관광버스들을 보고 그 꽁무니쯤에 차를 세웠는데, 차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다가오는 냄새는 전혀 뜻밖의 것이다. 비릿한 바다 냄새, 생선 냄새가 아닌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포(脯) 냄새였기 때문이다. 황태포, 가자미포, 쥐치포… 큰길 이편저편에 끝없이 늘어선 건어물 가게들을 보고서야 냄새의 근원을 짐작할 수 있었다. 큰 차들이 왜 이렇게 줄 지어 서 있는지도 요량하게 된다.
대강 훑어보아도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이 죄 말려진 채 이곳으로 옮겨온 듯싶다. 오징어, 멸치, 양미리, 새우, 다시마, 미역, 김… 없는 것이 없다. 버스에서 내린 듯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들을 휘젓고 다니며 물건을 살피고 흥정하는가 하면 어느새 포장된 물품을 옮기는 이도 적지 않다. 진동하는 냄새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 소리로 거리는 흥성하기만 하다.
어시장을 찾기 전에 포구 구경부터 하기로 한다. 조그만 광장 하나를 지나자 금세 냄새가 달라졌는데 바다보다 먼저 긴 방파제가 눈에 들어온다. 늦은 가을날, 바닷가에 쏟아지는 햇살은 맑고 투명하며 예리하다. 머잖은 거리에서 바라보는 주문진 어항은 오로지 두 개의 색깔만 덮어쓴 듯하다. 짙은 남색과 눈부신 흰색. 바다는 푸른 하늘보다 더 푸른빛이며 정박한 배들과 배경의 건물들은 희디흰 빛의 폭격 속에 들어 있다. 강렬한 빛의 대비에 의해 풍경은 더없이 견고하며 또 고요하다. 소리가 빛에 압도됨을 이 바닷가에서 여실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반반한 여인네 같은 등대

주문진 등대.
주문진항은 동해의 연안 항·포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오징어를 잡아들이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 오징어철만 되면 오징어 채낚기 배들이 밝히는 불빛으로 바다가 불야성을 이룬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3월부터 6월까지 한 철은 꽁치잡이로 북적인다고 한다. 명태잡이로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예전 이야기가 됐다.
어항을 지나 좀 더 걷다보면 방파제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초입에 수십 개의 횟집을 한군데 모아놓은 회 센터 건물이 있다. 손님들이 직접 횟감을 고른 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 언덕바지를 넘어 바닷길을 따라가면 곧 기다렸다는 듯 살갑게 모습을 드러내는 등대를 만난다. 주문진의 명물로 소문난 그 등대다.
가파른 길을 잠깐 올라서 마주한 등대, 생각보다 규모가 작지만 날렵한 모양새와 전신을 덮은 뽀얀 색채가 인상적이다. 누군들 등대의 기능을 모르랴마는 그 쓰임새와 무관하게 문득 낙산사의 해수관음상이며 사진첩에서나 본 저 먼 나라의 비너스 조각상을 떠올린 것은 분명 지나친 감상일 수 있다. 그러나 탑돌이 하듯이 내가 두세 차례나 등대를 돌면서 어떤 미색의 자태를 살피듯 아래위를 훑어본 까닭이 단출하면서도 어여쁜 그 형상 때문임은 분명하다.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등대로 올라가는 바깥 층계의 모양새도 나름 재미있다.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연상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아무튼 그런 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반한 여인네 같은 등대를 등 뒤에 세우고 바다를 마주하니 더할 수 없이 상쾌하다. 하도 크게 탁 트이고 하도 망망하니 되레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크고 넓음뿐이랴, 내려다보이는 바닷가 암석에는 쉼 없이 파도가 밀려와 포말로 부서진다. 빨강과 초록으로 지붕을 단장한 집들과 휑한 해변도로가 무심히 바다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득한 곳의 파도는 떼를 지어 달려가 해수욕장 모래밭을 못살게 군다. 군더더기 없는 풍경을 마주한 눈이 즐겁고 가슴이 벅차다. 등대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까닭을 알 법하다.
바다 향한 작별의 몸부림

주문진 어시장.
기록을 보면, 주문진 등대는 1918년 3월에 세워졌다.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이라고 생각하니 등대의 나이를 실감한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로 우리나라 등대 건축의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등대로 알려져 있다. 밤이 되면 등대 불빛이 15초에 한 번씩 반짝이며 37km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문진항에 여객선이며 화물선이 처음 입항한 것이 1917년 부산-원산을 내왕하는 기선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부터라고 하니 이 등대는 그 이듬해부터 밤바다의 뱃길을 열어주는 착한 일을 한 셈이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좀 더 세찰 무렵 어시장으로 돌아왔다. 회 접시를 놓고 소주잔을 채우고 싶은 그런 때였다.
마른 물고기들이 죄 저편 건어물시장에 있다면 살아서 펄떡이는 바닷고기들은 모두 이편 어시장에 있다. “네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산 오징어다. 홍게와 복어도 흔하디흔하다. 미로처럼 생긴 시장 통로마다 생선을 구하고 보려는 이들로 북적이고, 잠시라도 그들을 붙잡으려는 상인들이 소리 소리를 지르는 이곳은 말 그대로 장판이다. 저마다 장화를 신고 고무 앞치마까지 걸친 상인들이 뜰채를 든 채 줄지어 통로에 버티고 서 있다.
손님이 가리키기만 하면 그들은 뜰채로 수족관의 물고기를 냅다 건져 올린다. 물고기들의 퍼덕임, 퍼덕임… 살아 숨 쉬는 자들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이곳에 있으며 죽음은 저편 실내 장막 뒤에 있다. 여느 어시장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횟감을 골라 즉석에서 회를 먹을 수 있다. 회를 쳐줄 뿐만 아니라 주류며 채소와 양념값만 받고 자리를 내주는 식당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들 식당엔 전문적으로 회만 치는 이들이 있어서 온종일 장막 뒤에서 생선을 처리한다.
변두리 떠도는 성긴 눈발들
등 뒤에 발걸음 서성거리게 하고
붉은 국물 엷게 밴
싱싱한 사발낙지 한 마리
살짝 데쳐
좌판 소주 한 잔에
바늘 침으로 집어 올릴 때
누린내 졸아드는 국물 위로
첫사랑 여자의
망설이던 눈동자 떠오른다
어깨에 쌓인 눈 툭툭 털어내고
살찐 사발낙지 마지막
한 점 씹어 넘길 때
머나먼 바다를 떠돌던
방랑의 귀향자들아!
바다를 향해 작별의 깃발을 흔들어라!
자욱한 어둠이 먹물처럼 목구멍에 차오르면
얼얼한 얼굴에 부딪쳐 오는 찬바람
좌우로 가르며 선창가 걷는다
다가설 수 없는 그리움 껌벅이는
오징어 배 불빛
눈가에 가물거리고
빈 터
떠돌던 진눈깨비
불빛 환한 선술집 유리창에 몸 부딪쳐
참았던 눈물
터뜨리며 얼었던 몸 부르르 떤다
-최동호 ‘주문진 겨울 어시장’ 전문
소돌바위공원

주문진 소돌바위공원 기암괴석.
재미는 없지만, 이제 산문적 해석이 가능하다. ‘나’는 아직도 떠나간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하여 먼바다 같은 길을 방랑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픔과 방황과도 작별을 해야 한다. 나를 다그친다. 결의를 다진 뒤에도 그리움은 남고 마침내 눈물이 터진다…. 이런 각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시가 단순히 실연자의 고통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읽기에 따라서는 고기잡이 어부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 바다, 배, 물고기의 얘기로도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한 편이 주는 감흥은 사실 몇 줄의 산문적 해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튿날은 해변의 소돌바위공원을 찾았다. 여전히 날은 맑고 밝았다. 안내 글에 따르면 소돌바위는 원래 바닷 속에 있었는데 1억5000만 년 전 주라기 시대에 지각변동으로 지상에 솟은 것이라고 한다. 바위의 형상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도 한다.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기괴한 형상의 큰 바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바위들이 바닷가를 장식하고 있는데, 물기를 머금고 또 그렇지 않음에 따라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소원, 특히 아들 낳기를 원하면 그 바람을 들어준다는 ‘소원바위’ ‘아들바위’도 있다. 그 주변에는 근래에 조성한 듯한 기도자상, 아기 형상의 조형물들도 있다. 또 1960년대 가요계를 풍미하다가 요절한 가수 배호가 노래한 ‘파도’의 가사를 새겨 넣은 노래비도 서 있다. 어떤 이들은 이들 조형물이 좋은 볼거리가 된다고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자연에 사람의 것이 얹히고 덮이면 더 이상 온전한 자연이 되지 못하며, 어떤 공교로움이 더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자연이 가졌던 격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매향(埋香)의 전설
근처에 볼만한 호수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실한 불심(佛心)을 잘 나타내는 풍습으로 침향(沈香) 또는 매향(埋香)의 풍습이 있다.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이뤄지는데, 온 주민이 합심해서 향나무 도막들을 바닷가에 옮겨와서 썰물 밀물이 교차하는 갯벌 깊이 묻는 것이다. 민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곳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향을 묻어놓고 기다리길 최소 300년이며 길게는 500년, 1000년도 간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 향을 꺼내 부처님 전에 피우면 모든 소원이 이뤄진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때 꺼낸 향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고 거기서 피어나는 향내는 천 리 밖까지 퍼진다는 말도 있다. 이곳 주문진에도 매향의 전설을 가진 호수가 있으니 그것이 곧 향호리에 있는 향호(香湖)다. 그 옛날에 1000년 묵은 향나무를 묻었는데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호수 바닥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는 말도 있다.
호수 위쪽에는 예전 봉수대가 있던 바리봉이 우뚝 서 있으며 산기슭에는 성터도 있다. 조선 선조 때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과도 친분이 있었던 이곳 선비 최운우가 향호정이란 정자를 짓고 한가로움을 즐겼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
아직도 사람의 손때를 많이 타지 않은 듯 호수물은 맑고 주위 풍경은 고즈넉하기만 하다. 근래 조성했다는 산책로도 크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채 찾아오는 이에게 최소한의 편의만 준다는 뜻은 분명히 담고 있다.
천천히, 호수를 돌아 맞은편 나무다리를 지나니 탁 트인 바다가 나타난다. 탁월한 경관과 함께 깊고 그윽한 옛사람의 신심과 풍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데가 향호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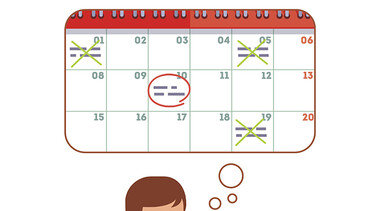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