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턴 케인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태도시’다. 어딜 가나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가 있다.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했기 때문이다.
- 개발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 만든 밀턴 케인스는 신도시의 교과서로 불린다. 그만큼 보고 배울 게 많다.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 밀턴 케인스의 개발 노하우와 그곳 사람들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퍼스턴 호수 주변에 위치한 고급주택들. 밀턴 케인스에는 이처럼 그림 같은 풍경이 즐비하다.
차에서 내려 동네를 한바퀴 둘러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을과 도로 사이가 울창한 숲이어서 도로변에서는 집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세계적인 ‘생태도시’ 밀턴 케인스(Milton Keynes)는 바로 그런 곳이다.
밀턴 케인스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80여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 약 20만명의 계획도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천안쯤에 해당하는 곳으로,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과 런던을 잇는 M1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이곳에 개발의 삽질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67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대도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1946년 신도시법을 제정했다. 그후 영국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구를 고시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밀턴 케인스는 그렇게 개발된 32개 신도시 중의 하나인데 영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신도시로 꼽힌다.
밀턴 케인스의 총면적은 약 9000ha. 서울 여의도의 30배, 축구장 2만2000개 정도의 넓이다. 이 넓은 땅을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만들기까지 30여 년이 걸렸다. 우리네 신도시가 개발 고시에서 건축까지 불과 4, 5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기에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Clean Green Safe’
밀턴 케인스에서 며칠만 지내보면 모든 것이 시민 위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쾌적하기 이를 데 없는 주거환경에서부터 도로, 쇼핑시설, 행정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이다.
원래 밀턴 케인스는 낮은 구릉지대였다. 울창한 숲, 맑은 호수가 곳곳에 자리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던 것. 밀턴 케인스개발공사(MKDC)는 이 같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풍광 좋은 야산을 까뭉개 평평하게 대지를 조성한 뒤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 우리네 신도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MKDC는 수백 년 된 나무와 숲, 늪지 등을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키로 했다. 숲을 피해 주택과 건물을 짓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투리 땅이 많이 생기는 등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부터 밀턴 케인스 개발에 참여했던 몬포트대학의 머빈 도비아 교수는 밀턴 케인스 개발의 3대 목표는 ‘Clean Green Safe’였다고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신도시 개발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밀턴 케인스는 도시의 22%가 공원 또는 잔디밭이다. 여기에 주택가 근처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을 더하면 녹지 면적은 배 이상 치솟는다. 가히 생태도시다운 주거환경이다. 이들 녹지는 파크 트러스트(Park Trust)라는 기구에서 관리하며 비용은 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 녹지 관리에 시민의 세금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니 밀턴 케인스 시민들은 공짜로 푸르름을 향유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공장을 도시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집중화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은 것도 돋보이는 점이다. 또 공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유치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했다. 현재 밀턴 케인스에는 500여 개의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클린 인더스트리’다. 회사 건물도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지어졌다. 대부분이 2, 3층이고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와 정원이 있어 회사 건물인지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밀턴 케인스의 명물 레드웨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주민들. 시 전체가 레드웨이로 연결돼 있다.
이 같은 지원에 밀턴 케인스는 조기상환으로 화답했다. 원래는 60년에 걸쳐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개발 작업이 순조로워 지난 1999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모두 갚았다고 밀턴 케인스 홍보센터의 미카엘 시노트씨는 말한다.
MKDC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도 성공요인의 하나다. 개발 초기 지주들과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MKDC가 중앙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정부가 환수할 수 있었다. 우리네 신도시가 부동산투기의 주무대가 되는 것과는 비교되는 사례다.
아무리 재정지원이 튼튼하고 개발 주체의 권한이 막강하다 해도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탁상공론식 난개발이 되기 십상인 것. 그러나 MKDC는 애당초부터 확실한 개발 모델을 수립했고 그것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시 개발에 깊숙이 참여했던 몬포트대학의 돈 헤드 교수는 개발 주체들이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개발에 참여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필수적이다. 밀턴 케인스의 경우 비정부기구(NGO)들의 견해를 대폭 수렴했다고 한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관 주도 개발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 도비아 교수는 이를 ‘파트너십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즉, 도시개발에서는 행정기관과 주민, 시민단체 등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외국의 신도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온 그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도비아 교수는 또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도시경영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로 건물만 짓는 것이 신도시 개발이 아니며, 도시가 형성된 후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영 마인드를 갖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경영의 요체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적 평등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을 꼽는다.
주민협의체 적극 가동

밀턴 케인스에서 20년째 살고 있다는 힐(72)씨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그는 직장 때문에 해외 9개 나라에서 생활해보았고, 영국내에서만도 10여 차례나 이사했는데 밀턴 케인스에 반해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다며 흐뭇해했다.

밀턴 케인스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2,3층짜리 건물에 입주해 있다. 조경이 워낙 잘 갖추어져 있어 언뜻 보기엔 공장 같지 않다.
존 몽크 밀턴 케인스 시장은 시청 직원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경영 마인드는 기업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생태도시 밀턴 케인스가 주민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다. 그 일환으로 몽크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지역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시의 각종 현안에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 당국은 주민 3000여 명 당 한 곳씩 마을회관을 지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밀턴 케인스의 면적은 약 9000㏊. 대부분 낮은 구릉지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 버스회사들이 민영화되고 난 후 수익성 있는 노선에만 차량을 배치, 외진 곳에는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짜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을까. 밀턴 케인스 도시계획 및 교통 책임자 데이비드 해포츠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단기, 중기로 나누어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심가 주차료를 인상해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심가를 본격 개발해 교통수요를 유발함으로써 버스회사들이 스스로 증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모두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겁니다. 교통 문제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베드타운화 가능성이다. 세계 각국이 거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곤 한다. 그러나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는 이내 베드타운화함으로써 오히려 거대도시를 더욱 팽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의 경우 분당 일산 중동 등이 그 예다.
주민 절반이 32세 이하
영국 정부가 전국에 32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이 점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도시는 애당초 의지와는 달리 베드타운화하고 말았다. 예외는 몇 개 되지 않는데 밀턴 케인스시가 그 중 하나다.
밀턴 케인스시는 생태도시로 계획되었으면서도 세계 각국의 기업을 적극 유치, 자족 기능을 갖추었다. 물론 이들 기업은 앞서 말한 대로 거의 대부분 무공해 산업이다. 최근에는 IT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며 기업 연구소도 적지 않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자족 기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면밀히 고려해 도시를 설계해야 제대로 된 자립형 도시가 된다고 도비아 교수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밀턴 케인스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남녀 성비, 주민 연령층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와 무직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용의주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① 잘 정돈된 시가지 모습<br>② 대형 인공 스키장이 들어 있는 레저센터<br>③ 밀턴 케인스에는 높은 건물은 없으나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중심가에도 나무가 많아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모자라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고급 인력은 영입하기 쉬우나 하급 직종에 종사할 인력은 비싼 집값 때문에 감히 이사 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인력의 불균형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며 가장 손쉬운 게 아파트 건설이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진 도시 곳곳에 삐죽삐죽 아파트가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영 탐탁지 않은 것이다. 하긴 밀턴 케인스 개발 초기에는 동네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보다 높은 집은 짓지 못하도록 했다니 이들이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고민하는 사정을 짐작할 만도 하다.
밀턴 케인스를 자동차로 둘러보면 잘 정비된 도로망에 감탄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길을 1km 간격의 바둑판형으로 배치해 찾기 쉽고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미국 LA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밀턴 케인스에는 웬만한 대도시에 다 있는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없다. 그럼에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간해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러시아워’란 단어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밀턴 케인스 주민들이다.
라운드어바웃, 레드웨이

밀턴 케인스는 숲, 공원, 호수가 잘 어우러진 도시다. 주택가에는 푸르른 잔디밭이 많아 아이들이 뛰놀기에 안성맞춤이다.
런던 등 영국의 다른 도시에도 라운드어바웃은 있다. 그러나 밀턴 케인스처럼 모든 교차로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밀턴 케인스에는 120여 개의 대형 라운드어바웃과 300여 개의 소형 라운드어바웃이 있으며, 이들에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다.
라운드어바웃의 장점은 신호등 교체, 경찰 배치 등 보수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지대 하나만 마련해놓으면 끝이다. 또한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정차할 일이 없으므로 연료가 절약되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훼손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간적인 도시’ 밀턴 케인스시는 길을 내는 데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레드웨이(red way)’라 불리는 길이 그것이다.
벽돌색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 레드 웨이라 불리는 이 보행자 전용도로는 넓디넓은 시 전체를 관통한다. 자전거나 도보로 시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것. 레드웨이는 대부분 숲길이어서 산책로로도 유용하다. 한갓진 레드 웨이를 걷다 보면 아름드리 나무를 오르내리는 날다람쥐의 재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레드웨이는 밀턴 케인스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외국에서 밀턴 케인스를 견학 오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레드웨이라고 한다. 길이지만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레드웨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이었다.
사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시 전체를 연결하는 레드웨이 같은 소롯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턴 케인스 개발 주체들은 인간 우선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았다. 숲 사이로, 호수 주변으로 길을 냄으로써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시민들에게 선사한 것이다.

오래된 집들은 그대로 놔둔 채 개발했다. 옛것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밀턴 케인스는 런던과 버밍엄에서 가까운 데다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IT, 운송,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입주했다. 회사가 늘어나다 보면 인구도 늘게 마련.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들을 위한 주택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건축업자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주택 건축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시에서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를 짓자니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손놓고 있자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밀턴 케인스처럼 철저히 계획된 도시가 갖는 근본적 한계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애당초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나 세월이 갈수록 있는 자들이 모든 부문을 과점,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커뮤니티마다 각종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긴 하나(초등학교는 주택으로부터 500m, 중등학교는 1km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수준이 런던 등 대도시만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조금이라도 수준 높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통학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식 치맛바람’이 불고 있는 셈인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시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밀턴 케인스는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인간과 자연을 기막히게 조화시킨 노하우는 전세계 도시공학자들의 참고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와 공무원들이 밀턴 케인스를 견학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 밀턴 케인스처럼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가 있는가. 물론 자연환경, 개발 배경 등이 다르다 보니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네 신도시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그것은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다 해도 생각을 바꾸면 환경친화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밀턴 케인스에 오래 살았다는 한 교포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 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견학 차 이곳을 찾아왔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안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 도시의 장점을 살린 도시가 없는 것 같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관광차 왔으니 뭘 배워가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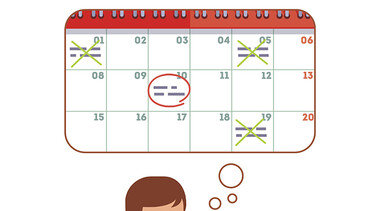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