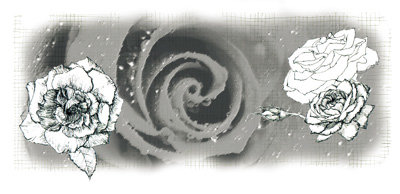
어른이고 아이고 요즘처럼 입이 더럽혀진 시대가 또 있을까. ‘매우’ ‘아이 참’과 비슷한 뜻의 부사가 ‘졸라’로 요약되고, ‘사랑한다’는 소리가 ‘먹는다’로 바뀌고 있다. 급전직하, 본능어만 남는 세상이 된다면 주고받는 인사조차 바뀌어 ‘너 잡아먹을까, 살려줄까?’로 하루가 시작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온통 상욕으로 도배되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는 대사에 질린 탓인지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관에도 발길을 끊었다. ‘트랜스젠더’니 ‘설거지 거드는 남자’니 하는 일견 새롭고 그럴싸해 보이는 바깥세상의 유행어 따위가 어떻게 마음에 스며들 여지가 있겠는가.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진 말 중 하나다. 이건 분명 야잡한 그런 말의 상대쪽 언어고 문청(文靑) 때는 애지중지하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혐오스러워진 것일까. 모르긴 하되 이건 주변 환경이 만든 심리적 요인 탓인 것도 같다. 사회 일각에 이른바 ‘중산층’이란 말이 생겨나면서 그 계층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즐겨 쓴다는 심증이 가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허세를 메우려고 그런 단어를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듯한 심증만은 또 어쩔 수 없다.
중산층이 되려면 무엇보다 소양과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신도 영혼도 깃들이지 않는다. 졸부가 비싼 그림 사다 걸어놓고 문화에 일가견이 있는 척하는 행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여 그렇다는 소리다.
어째 봐도 쉬이 잠들 수가 없어 강아지를 데리고 새벽 거리를 거닐 때 느닷없이 ‘장미가 대체 뭐길래?’ 하는 요령부득의 말이 떠올랐다. 무슨 노래를 속으로 흥얼대고 있었거나 아둔한 망상 같은 것에 젖어있었던 모양인데,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상념이요 문장이다. 반생을 두고 장미라는 꽃을 마음에 깊이 담은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될까.
꽃이라면 무조건 환성을 올리는 여자들은 본성이 원래 그렇다고 쳐도, 남자들의 의식구조란 그렇게 되어먹질 않았다. 작업실에 간혹 꽃을 들고 들어서면서 실내뿐 아니라 주인의 마음까지 일거에 밝혀주는 이들도 있지만, 보통은 내놓고 칭찬도 별로 못 듣고 잊히기 쉬운 미덕일 것이다. 그러니 이런 기괴한 의혹도 꽃 자체가 아니라 이를테면 ‘네가 뭐길래?’ ‘사는 게 대체 뭐길래?’라거나 하다못해 ‘여자가 뭐길래?’ 하는 상념과 맥락을 같이할지 모른다.
삶에 지치고 허기져 작은 다락 같은 곳으로 숨어들어 어디선가 묻어올 듯한 흐린 선율에 종일 귀를 기울이던 추억이 내게도 있다. 옛 프랑스문화원 바로 옆댕이에 있던 ‘예방’이라는 이층 카페.
이 카페의 첫 주인은 신촌서 같이 어울리던 연극패거리 중의 하나였는데 처음엔 사무실로 이곳을 얻었다가 비용조차 빠지지 않자 쓰던 소파와 의자 몇 개를 들이고는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누구에게 부탁한 휘호인지 ‘예방(禮訪)’이라는 제법 의젓한 한자 현판도 안에다 걸고 벽에는 역시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배우 M이 벽화 삼아 그려넣은 만화가 있었다. 내가 거길 자주 들른 것은 첫 주인이 카페를 넘기고 이탈리아로 오페라 공부를 하러 떠난 이후부터다.
몸집이 작은 소녀 타입의 두 번째 주인은 어쩌다 이쪽에서 ‘장미’를 한번 청해 들은 뒤부터 카페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노래를 틀어주었다. 나나 무스쿠리의 직직 긁히는 LP 음반이었는데, 남의 피곤과 외로움을 파고드는 그 멜로디가 유독 심상치 않아 아마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종일 귀를 기울였다’는 소리도 이런 친절함의 과장 내지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코빼기를 맞대다시피 해야 하는 실내 너비며 분위기나 당돌할 정도로 조숙해 노상 카페에서 살다시피 하던 여섯 살짜리 그 집 딸아이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이면 피로가 말끔히 가시곤 했다.
‘장미’는 제니스 조플린이 처음 부른 모양이지만 들은 적이 없다(혹은 그를 두고 만들어진 노랜지도 모르겠다). 마약과 광기로 무대에서 쓰러진 조플린의 짧은 일대기를 그린 영화 ‘로즈’에서 그의 역을 맡았던 베트 미들러의 노래가 오리지널인 걸로 알고 있지만, 가객마다 맛이 다르다. ‘나 홀로’의식을 물고늘어지는 나나 무스쿠리의 것은 물론이고 북구 언어로 부르는 시슬의 것이나 예술파답게 멜로디를 넓히는 주디 콜린스, 발음이 코에 걸려 되레 철학적인 느낌의 스즈키 시게코, 반주 없이 부르는 킹 싱어즈, 국내의 록 메탈그룹으로 알려진 모비딕의 것까지 예외 없이 끈끈한 느낌의 말을 이쪽에 걸어온다.
장미를 잘 그리는 화가로 황염수(黃廉秀)가 있다. 이 원로 화백은 아마 일생 동안 그것만 그려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그의 장미는 간결하고 온건하고 정확하다. 세련된 데생으로 표현된 그의 장미들은 화려한 외모, 화사한 봉오리의 짜임새, 꽃에 가는 마음까지 뽐낸다. 꺾어서 병 같은 데 꽂아둔 장미를 그의 화면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데,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아서가 결코 아니다. 이런 데서도 자연에 보내는 화가의 애틋한 마음이 읽힌다. 아무리 어둡고 습한 구석지라도 그의 장미 그림이 벽에 걸리면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리라.
이 꽃이 때로 발작적으로 내뿜는 인상이 있다. 쾌락과 격정이 거기서는 보이지 않아 속이 허전하다면 르누아르의 제자였고 일본에서 그림값이 가장 비싸다는 우메하라(梅原龍三郞)의 장미를 보라. 휘두르는 붓으로 폭발하듯이 구름을 표현하던 이 화가가 만년에 그린 장미는, 향이 너무 짙어 이 생각 저 생각을 가릴 필요가 없는 성숙한 여성의 체취 그 자체다. 거기에 비해 조금 뒷세대인 하야시(林武)의 장미는 그 향내를 몰래 맡으려 고개를 돌리고 이성으로 뻗대며 붓을 휘두른 격이랄까. 황염수도 세칭 그 ‘일본 유학파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그의 장미 역시 그쪽 색채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미는 죽어서도 그 모습이 별로 손상을 입지 않는 꽃이다. 시든 것은 때로 비루하고 처량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말라 비틀어져서도 다시 한번 자태를 되살려내는 이런 꽃은 어딘가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다. 사흘쯤 물을 갈아주면서 보고 그 다음은 줄기들을 끈으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말린다. 그러면 오므린 자태 그대로 원래의 빛깔이 서서히 돌아온다. 암자주색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빛깔은, 향과 액을 다 소진하고 스산한 바람에나 바스라질 듯 휘 불리며 그제서야 정작 떠들고 싶었던 침묵의 내용을 서걱대는 늦가을의 포도덩굴과 잎새들 마냥 제풀에 또 상기시킨다. 더 갈 데가 없는 곳에 다다른 빛깔과 품위….
‘장미여, 그 순수한 모순이여’라고 노래했을 때 릴케는 인간의 어떤 남모르는 쾌락과 슬픔과 소멸의 법칙을 거기서 보았더란 말인가.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