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9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들이 잡은 멸치를 털어내고 있다. [박경모 동아일보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e/a2/70/03/5ea270030924d2738de6.jpg)
2018년 4월 19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들이 잡은 멸치를 털어내고 있다. [박경모 동아일보 기자]
천 번 달걀프라이
일명 ‘천 번 달걀프라이’로 불리는 수플레가 그중 하나다. 달걀 4~5개를 준비해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다. 노른자는 살살 풀어둔다. 달걀흰자는 커다란 그릇에 모아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거품기로 15~20분 동안 휘젓는다. 중간에 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령이 있다면 흰자를 담아 둔 큰 그릇을 기울여 잡고, 거품기로 내려치듯 섞는다. 큰 원을 그리며 젓는 것보다 한결 수월하다. 이러나저러나 팔이 떨어져 나갈 때쯤 되면, 이름처럼 1000번을 휘저으면 엉긴 물 같던 달걀흰자가 마술처럼 순백의 크림 덩어리로 변한다. 흰자 크림의 3분의 1을 노른자와 골고루 섞는다. 애써 쌓아 올린 달걀 크림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살살 섞어 가벼운 덩어리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나 기름을 두르고 노른자 크림 반죽을 도톰하고 넓게 펼쳐 올린다. 불은 약하게 해야 타지 않는다. 반죽 바닥이 익었다고 생각되면 흰자 크림을 그 위에 소복하게 얹는다. 반죽을 반으로 살살 접는다. 이때 흰자 크림이 불룩불룩 삐져나오지만 그냥 둔다. 뚜껑을 덮고 흰자 크림이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익힌다. 흰자 크림이 익어 가면 쫀쫀하게 힘이 생기는 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다. 가능하다면 앞뒤로 뒤집어 익힌다. 조심스럽게 꺼내 그릇에 담고 설탕, 슈거파우더, 메이플 시럽, 꿀, 휘핑크림, 초콜릿 시럽 등 달콤한 재료를 입맛대로 곁들여 먹는다.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까지 썰어 얹으면 한껏 먹음직스러운 모양이 되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때 좀 더 뿌듯하겠지.
포크로 살짝 눌러 한입 크기로 잘라 먹자.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생경한 식감에 한 번 놀라고, 공들인 만큼 꿀맛은 아니라는 것에 두 번 놀란다. 이 수플레는 이어달리기처럼 가족이 합심해 만들기도 하고, 친구끼리 영상통화를 하며 누가 먼저 단단하게 크림을 완성하느냐는 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달고나 커피’도 있다. 블랙커피 알갱이, 설탕, 물을 같은 양으로 섞은 다음 팔뚝 근육이 욱신거릴 때까지 저어 황갈색 달고나 크림을 만든다. 차가운 우유 위에 크림을 얹어 달달하게 즐긴다. 천 번 수플레와 달고나 커피 모두 결과보다 진땀나는 과정이 시간의 여백을 즐겁게 메워준다.
트러플, 올리브, 앤초비를 밥상에 놓아볼까
![뛰어난 풍미를 자랑하는 트러플 버섯.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e/a2/70/1e/5ea2701e05ddd2738de6.jpg)
뛰어난 풍미를 자랑하는 트러플 버섯. [동아DB]
이럴 때는 자연의 힘을 빌리자. 어차피 식재료 값으로 수만 원을 지불할 용기를 지갑에 넣어 두었으니까. 기분을 사뿐하게 만들어 줄 미식 아이템을 집으로 초대하자. 호황을 누리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오가며 고르고 고른 것은 바로 송로버섯 즉, 트러플과 올리브, 마지막으로 앤초비다. 세 가지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콧구멍이 씰룩거린다. 모두 개성 있는 맛과 향을 가진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트러플은 넓고 축축하며 어둑한 숲속에서 오로지 피어나는 향을 따라가며 채취하는 버섯이다.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 열매로 과일치고는 굉장히 기름지기에 남다른 풍미를 지닌다. 앤초비는 ‘멸치’를 뜻하지만 보통 서양식 멸치 절임을 부르는 말로 통한다. 트러플을 선두로 풍미의 기차가 출발하니 갑자기 온갖 치즈와 햄, 발효음식과 술 따위가 마구잡이로 떠오른다.
장바구니에 트러플 오일, 트러플 케첩을 담았다. 신선한 트러플이나 신선한 트러플을 통째로 절인 것은 내가 무심코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 트러플 향을 은근히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알이 굵고 씨가 있는 그린올리브 절임, 씨를 뺀 블랙올리브 절임이다. 앤초비 절임 중 양이 작은 것을 고른다. 마지막으로 고민 끝에 구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남해의 생멸치다.
풍성한 생멸치의 맛
살이 통통히 올라 맛이 좋고, 풍성하게 잡히는 이때, 내 발이 묶였다고 생멸치 맛까지 놓칠 수는 없다. 지금 남해 부근 멸치 식당에 가면 무침회, 튀김, 구이, 매운탕, 전, 멸치밥까지 다채로운 방법으로 봄 멸치를 맛 볼 수 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몸통 윤기처럼 고소한 맛이 기름지다. 살코기는 아삭거릴 정도로 탄력 있고 생생하다. 이런 맛을 보는 시기는 1년 중 딱 지금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에 앉아서도 싱싱한 봄 멸치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어부들이 온라인 숍을 통해 제철 생멸치를 한철 판매한다. 게다가 통멸치부터, 머리와 내장만 제거한 것, 뼈까지 깔끔하게 제거한 것 등 여러 유형으로 손질도 돼 있어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고 싶다면 머리와 내장만 제거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 통째로 옷을 입혀 튀기거나, 자작한 국물에 조림을 하고, 얼큰하게 매운탕으로 끓여 먹기 좋다. 나는 조리해 맛을 낼 자신은 없기에 멸치 오일 절임만 조금 만들 요량으로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것을 골랐다.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집에서 트러플 가공품이며 올리브를 사서 밥상에 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멸치 절임도 마찬가지이다. 수년 만에 미세먼지와 황사 없는 봄 하늘 아래 서 있다. 빛이 밝게 들어오면 그림자도 그만큼 진하게 드리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림자 속에 서서 파란 하늘을 본다. 삶에 생기는 일은 온전히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봄 소풍은 못 가지만 봄바람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남편과 오순도순 미식 놀이할 생각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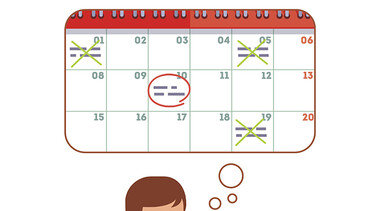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