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목갤러리 대표 황선주. 미술계에서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것으로 소문난 그는 한때 파친코 업계에서 날리던 사람이다. 그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전력을 밝혔다. ‘가방끈이 짧아’ 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던 그가 부동산을 팔아 고가의 그림들을 구입할 만큼 애호가로 변신한 특별한 사연.

“맘에 드는 그림 한 점을 방금 샀다”는 그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그림값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급매로 구입한 그림이라 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을 지급했다. 오지호 화백의 6호짜리 그림(1965년 작품)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진기자의 입이 쩍 벌어졌다. 황씨의 얼굴에 뜻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소가 감돌았다.
“지금의 내 마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제가 운이 좋은 거지요. 싸게 산 건 둘째 치고 이렇게 좋은 그림을 얻었으니.”
“돈 생각하면 미술관 못 지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줄도 모르고 소년처럼 즐거워하던 그는 “그림도 부동산처럼 돈이 급하면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되기도 한다”며 “인사동에 급매로 나오는 좋은 그림이 종종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동에서 얼굴 없는 큰손으로 소문이 났더라”는 필자의 말에 손사래를 쳤다.
“큰손은 무슨. 갤러리 현대의 박명자씨도 있고, 가나(아트센터)의 이호재씨도 있는데. 그런 이들에 견주면 나는 ‘쨉’도 안 돼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안 만났어요. 만나서 딱히 할 이야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서요.”
황씨가 구입한 오지호 화백의 그림은 10월20일 개관한 휘목미술관(전북 부안군 진서면 소재)에 전시됐다. 변산반도 바닷가 인근 운호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세워진 휘목미술관은 개인이 지은 미술관으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그가 시골에, 그것도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남짓 달려야 닿는 ‘촌구석’에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자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한다. 돈 안 되는 사업에 큰돈 들이지 말라고들 했다.
▼ 미술관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저는 이 세상에 남겨놓을 게 없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체를 남길 거고, 학자는 이름을 남길 텐데. 딱히 남길 게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남기고 죽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몇 번 거절했잖소. 내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좀 뭣하고. 거창한 미술관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서민이 마음껏 그림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었을 뿐인데.”
휘목미술관은 3만3000여m2(1만여 평)의 부지에 2곳(588m2, 628m2)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미술관 야외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다. 야외음악당과 전시실 2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 미술관을 짓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요.
“돈 생각하면 미술관 절대 못 지어요. 사실, 미술관 짓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한 40억~50억(원)이면 짓겠지 싶었는데, 해보니 그걸론 턱도 없습디다. 미술관 짓는다고 하니 시골인데도 땅값을 만만찮게 부르고. 그림값이 폭등하기 전이었다면 좀 덜 들어갔을 텐데. 몇 대째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미술관을 짓지 않나 궁금했는데 지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 같은 ‘막무가내’나 짓는 게 미술관입디다.”

전북 부안에 있는 휘목미술관 내부(위). 휘목미술관 앞 잔디광장에 있는 조각품.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쓰지 마쇼. 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거액이 듭디다.”
“앞으로 100억원 남짓 더 쏟아 부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그가 하얀 융보자기에 싸인 조각품 2점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손바닥만한 탈 모양의 작품과 엄지손가락 두 개를 포개놓은 듯한 작품이다. 조각가 권진규씨의 작품이라면서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소?” 하고 물었다. 미술품 가격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워 쉬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두 작품을 구입하는 데 2억원 조금 더 줬어요. 유명 화가와 조각가의 작품은 거의 다 수집했어요. 수집품 1000여 점 중엔 비싸지 않은 작품도 있긴 하지만. 작품 구입가가 모두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미술관 부지 사고 건물 짓는 데 든 돈은 그림값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미술관의 생명은 작품이니까 돈 아끼지 않고 사들였어요.”
“파친코로 먹여살린 게 창피해서…”
그는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남겨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부자라고 돈 쥐고 저세상 가는 거 봤소?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이 없어요. 미술관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간 흔적인 거고. 많은 사람이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눈과 가슴에 담고 간다면 그걸로 됐어요.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전시실을 더 짓고 미술관을 완공한 뒤 여유가 있다면 능력이 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한 가난한 화가들을 돕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8세에 아버지를 여읜 그는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형제를 책임진 채 힘겹게 살았다는 황씨는 “가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황씨가 미술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하게 된 데는 과거에 그가 벌인 사업이 밑천이 됐다. 25년 전 이른바 ‘파친코’라고 불리는 슬롯머신 사업에 손을 댄 그는 당시 적지 않은 재산을 일궜다. 황씨는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가족과 친지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과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 전력 때문에 남 앞에 나서기가 싫었어요. 그게 몸에 배었고요. 내가 누구라는 것,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처자식도 남편이,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몰랐어요. 파친코 해서 먹여살렸다는 게 창피했거든. 가족에게 그걸 감추기 위해 제조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입었어요. 여태껏 미술시장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도 그런 과거가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대개 건달이나 깡패들이 한 사업이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나마 지난날의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때 번 돈이 그림을 사랑하고 미술관을 짓는 초석이 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쪽 세상에 있다가 미술시장에 들어오니까 여긴 또 완전히 딴판입디다.”
재력, 권력, 주먹의 3박자
▼ 어떤 점에서요?
“그 세계(슬롯머신 업계)는 아무리 큰돈이 오가도 종이(계약서) 한 장 주고받지 않아요. 말이 곧 계약서지요. 파친코는 지분투자를 한 만큼 정확히 이익금을 나눠먹는 구조예요. 당시 잘되는 업장의 가격이 30억~40억원 했는데, 참여하고 싶은 지분만큼 돈을 건네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에요. 몇억, 몇십억을 투자해도 계약서 한 장 안 쓰거든. 지분에 투자한 다음달부터 배당금이 착착 나와요. 그 동네는 말이 곧 법인 동네지요. 약속을 어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그곳은 아군이 없어. 죄다 적군이지. 힘이 약하면 뺏기고 먹혀들어가니까. 먹혀들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이(미술) 시장은 흐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림값이 딱히 얼마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두 업종 간의 명백한 차이점은, 그림은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지만 파친코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3합’이 잘 맞아야 해요.”

황선주씨는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다고 한다.
“재력과 권력, 그리고 주먹.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조화를 이뤄야 업장이 살아나죠. 5, 6공까지는 잘됐는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허가를 전부 취소한 탓에 모든 업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칼처럼 정확한 세계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 아주 딴 세상이더군요.”
▼ 뭐가 그리 다르던가요.
“무엇보다 그림값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정상가라는 게 없는 동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림도 도박과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림은 부르는 게 값일 때가 많아요. 가짜 그림을 살 수도 있고. 멋모르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파친코로 적지 않은 재산을 일군 그는 “큰돈을 갖고 있어도 뭔지 모르게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들보다 ‘많이’ 소유한 후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돈, 그거 많으면 행복할 거 같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쪽(파친코 업계) 사람들이 절 보고 미쳤다고 해요. ‘그림에서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면서. 나더러 ‘형님, 그 돈으로 (강남) 테헤란로에 건물이나 사지 그러냐’고 한다니까. 그림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더 웃긴 건 혹시 가난한 화가들 그림이라도 한 점 사달라고 부탁할까봐 나를 피하더라는 거야, 허허.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쪽하고 멀어졌지요.”
그림값에도 지역차별?
황씨는 “가방끈이 짧다”고 했다. 비록 공부는 남만큼 못했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그림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췄다고 했다.
▼ 그림시장에 뛰어든 계기라면.
“운보 김기창 화백 때문이지요. 하루는 TV를 켰더니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운보 김기창 화백을 소개합디다. 말 못하는 화가가 자기 그림을 팔아 농아들을 위해 ‘청음회관’을 짓는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운보 그림을 좀 사면 ‘청음회관’ 짓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 방송 본 이튿날 아침 일찍 운보 집에 찾아갔어요.”
성격이 급하다는 그는 운보 김기창 화백 집으로 달려가 “나도 당신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1995년의 일이다.
“대전 법원 정문 앞에 운보 공방을 차렸죠.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당시 운보 그림을 많이 샀는데, 그게 잘 안 팔립디다. 운보 아들이 부도를 내서 한 2년 동안 하다가 공방 문을 닫았어요. 운보 그림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없어 서울에 가서 처분해야겠다 생각하고 서초동 대법원 앞에 화랑을 차렸지요. 김대중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니 10년 전쯤 일입니다. 화랑 문을 열었는데 썰렁했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그런데 ‘나카마’(딜러를 일컫는 화랑가 은어)가 한두 명씩 찾아오더니 운보 그림을 사 갔죠. 나카마들이 갖고 온 그림 중에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내가 사기도 하고.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림이 자꾸 좋아집디다. 나도 모르게 그림에 빠져든 거지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경이 되자 그는 “호랑이(좋은 그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1997년 인사동에 둥지를 틀었다.
▼ 인사동 텃세가 심하지 않던가요.
“심하지, 심해요. 하지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가의 그림을 사기 시작하자 소문이 좀 났지. 가만 보니까 (화랑들이) 나와 거래를 트고 싶은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나라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디다. 내 과거를 안 것 같기도 하고.”
▼ 인사동에서 돈은 좀 벌었습니까.
“벌긴요. 돈 벌려고 했다면 진작 이 바닥 떠났지요. 미술관 지으면서 사들인 그림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운보 그림을 비롯해 주로 동양화를 구매했는데 큰 손해를 봤어요. 비싸게 샀는데 싸게 내놔도 도무지 팔리질 않으니. 그림시장에서 동양화가 인기가 없더라고. 서양화에 비해 값도 무지 싸고요. 우리 화단은 서양화는 경상도가, 동양화는 전라도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값은 전라도 출신 작가의 것이 훨씬 싸요. 그동안 그림값에도 정치적인 영향이 암암리에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경상도 작가에 비해 전라도 작가의 실력이 뒤떨어진 것도 아닌데.”
“박수근 그림 어디 갔냐”
휘목미술관을 전북 부안에 지은 이유는 고향(전남 화순)이 가깝기도 하거니와 호남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후원하고 싶어서다. 황씨는 올해 그림값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혀를 찼다. 천경자 화백의 작품 30여 점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미술관 짓는 데 필요해 27점을 처분했다는 그는 “그림값이 이렇게 뛸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천경자씨 작품을 지난해 5000만~6000만원(4~6호 소품) 받고 팔았어요. 그게 1년 만에 10배가 뛰어 올해엔 5억~6억원에 팔리더라고요. 어휴,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팔았지. 몰랐으니 팔았지. 그걸 올해 내다 팔았으면 미술관에 더 좋은 그림을 많이 걸 수 있었을 텐데. 박수근 그림도 한 점 갖고 있다가 작년에 팔았어요. 미술관에 다른 그림은 있는데 박수근 그림이 없어요. 다시 사야 하는데, 그림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니까요.”
그의 집엔 갤러리처럼 많은 그림이 걸려 있다. 그림값이 집값보다 훨씬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귀한 작품도 적잖이 있다.
“아내가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귀한 그림들을 도둑맞으면 어쩌나 싶어 걱정되죠. 아내는 그림이 그렇게나 비싸다는 걸 모르거든요. 얼마 전 아내가 박수근씨의 그림이 경매에서 45억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뉴스를 접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거실에 있는 박수근 그림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수십억원 한다니 찾더라고. ‘작년에 팔았다. 내가 가진 것은 싼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아내에게 (그림을) 얼마에 샀다고 절대 말 안 해요. 돌았다고 할 게 뻔하니 안 가르쳐주죠. 친지들도 돈 안 되는 일에 돈 쏟아 붓고 산다고 눈치를 주거든요.”
휘목갤러리 안팎에는 CCTV와 도난방지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그림 도난에 대비해서다. ‘갤러리’에 있는 그림값이 전부 얼마나 되냐고 묻자 “6.6m2 남짓한 내 방(사무실)에 걸린 그림만도 수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 그림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도둑질한 그림은 10년 이내에는 못 팔아요. 도난당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 순식간에 전국 화랑가에 소문이 쫙 나기 때문에 내다 팔 수 없거든요. 고가의 그림을 개인에게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훔친다 해도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다른 판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황씨는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 이하로 파는 사람으로 컬렉터(미술품 수집가)들 사이에 소문나 있다. 이 질문에 그가 쑥스러워 대답하지 못하자 휘목갤러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 실장이 말을 거들었다.
결혼식 이후 두 번째로 입은 양복
“사장님은 파친코 업계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나 대기업, 정관계 인사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제값을 다 받아요. 이익은 거기서 남기고 평범한 컬렉터에겐 싸게 팔죠. 고객 중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75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맘에 드는 그림이 있는데 125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사장님이 두말없이 그 값에 그림을 건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저 연세에 생활비 대기도 빠듯할 텐데 그림을 사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냐’면서 밑지고 파셨어요.”
박 실장의 말을 들은 황씨가 “큰일났다”면서 “이 얘기가 기사로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와 다들 싸게 달라고 아우성칠 텐데…”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좋아하는 게 큰 기쁨이죠.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다른 집에 가서 더 사랑받겠다 싶으면 거저 주는 심리와 비슷해요.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 좋아하는 것은 마약 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디에 좋은 그림이 나왔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천릿길을 마다않고 달려가봐야 해요. 맘에 드는 작품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고 말죠. 처음엔 100만~200만원짜리 그림을 사던 사람이 얼마 안 가 억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요즘에는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진정한 컬렉터의 자세가 아니지요. 화랑에서 그림을 사다가 경매시장에 비싸게 내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400만원에 그림을 사 간 사람이 한 달 후 경매에서 2300만원에 팔더군요.”
그는 휘목미술관을 무료로 개관한다.
“옛날에 너무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그림을 사고 미술관을 지었으니, 이제 (사회에) 보답해야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변에 친한 이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요. 그들을 보면서 사는 게 참 덧없다 싶어 미술관 짓는 것을 서둘렀어요. 미술관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 버렸는데, 앞으로 전시실 두 곳 더 짓고 그림을 더 사려면 남은 부동산까지 팔아야 해요. 부동산 팔아 미술관 지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죽어서 돈 갖고 가는 사람 봤수?”
휘목미술관 개관식 때 결혼식날 이후 처음으로 양복을 차려입었다는 황선주씨. “미술관 개관이 결혼 못지않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겨 양복을 입었다”는 그는 “일반인이 그림과 예술을 평상복 입듯 편하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바다에 드리워진 석양빛이 아름다운 변산반도에 황선주가 살다간 흔적을 남겨 놓을 테니 누구든 맘 놓고 와서 쉬었다 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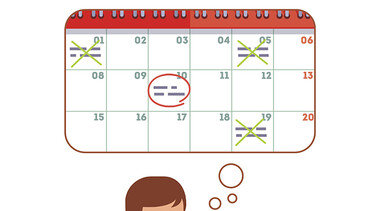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