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에게 흔한 질환. 대개 늙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정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심하면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질적 질환의 치료에 도입돼 최근 각광받는 시술법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이 곧 ‘건강한 황혼’을 보장할까.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각종 노인성 질환도 필연적으로 늘게 마련. 대표적 질환이 골관절염으로도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이다. 관절염의 종류는 150여 가지나 되지만, 그중 80% 이상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물렁뼈)이 손상을 받거나 노화로 인해 마모되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는 이 질환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면 통증과 관절의 기형이 발생하는데, 특히 무릎 부위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인 신체장애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이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관절운동 범위가 크게 줄고 다리가 ‘O’자형으로 휘게 된다. 심한 경우 전신쇠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을 동반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8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소비되는 인공관절의 수만 약 50만개. 미국에서만 1년에 20만개가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기준으로 5만여 개가 소비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002년부터 매년 4월25일을 ‘관절염의 날’로 정해 대(對)국민 캠페인을 벌여왔다.
말기에 이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대표적인 치료법은 인공관절(artificial joint) 수술. 인공관절은 외상이나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운동 부전이 된 관절의 인공 대용물을 뜻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뚜렷한 증세는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관절을 잘 펴지 못해도 통증이 없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없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엉덩이 관절, 척추, 손가락 끝마디 등에 흔히 생긴다. 특히 체중을 견뎌내야 하는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잘 걸을 수도 없다.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흔히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과 물리치료를 처방한다. 이를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해 통증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관절의 손상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정도일 뿐 완치는 불가능하다. 혹 시기를 놓쳤다면 더욱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최후의 해결책은 인공관절 수술뿐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통상 무릎·엉덩이·어깨 관절에 대해 시행한다. 최근엔 다른 조직에서 떼어낸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도 시도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1961년 영국 정형외과 의사 존 찬리 경(卿)이 고관절에 처음 시행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통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 수술에는 단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술 후에 뒤따르는 염증 등 합병증이 문제다. 합병증은 수술 직후뿐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생길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뼛속까지 세균이 들어갔다면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한다.
뼈에 고정시킨 인공관절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통증이 생기는데, 심하면 인공관절을 교환해야 한다. 닳아버린 인공관절 조각들이 주변의 뼈를 녹이면서 인공관절이 헐거워지기도 한다. 이때도 인공관절을 교체해야 한다.
환자 만족도 낮은 기존 수술법
이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관절 수술이 의사가 수작업으로 예측하고 진행하는 일이다보니 정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뼈 상태에 꼭 들어맞는 인공관절을 삽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의사들은 인공관절 수술 전에 환자의 관절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짐작하고 머릿속으로 가상수술을 해본다. 하지만 수술을 위해 막상 절개한 수술부위를 들여다보면 당초 생각과는 2∼3mm 오차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의사마다 숙련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공관절을 끼워 넣기 위해 관절이나 연골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전문의라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다. 결국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94년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이 도입된 까닭도 바로 그러한 기존 인공관절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로봇은 컴퓨터와 멀티 CT(컴퓨터 단층촬영)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인 관절 절제 범위와 깊이,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낸다.
기존 수술법에서는 2차원의 평면적인 X-ray 촬영사진으로 수술 대상 관절의 정·측면 상태만 파악할 수 있지만, 3차원의 멀티 CT는 정면과 측면은 물론 뒷면과 단면, 밀도까지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세밀히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주로 무릎과 고관절 부위에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척추전문병원인 서울 강동가톨릭병원, 경기도 수원의 이춘택병원, 전남 화순의 전남대병원 3곳.
이 가운데 강동가톨릭병원 관절센터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병원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202명(남자 43명, 여자 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미한 염증이 발생한 1명을 제외하곤 전원 부작용이 없어 수술 성공률이 99.5%에 달했다는 결과를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환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지만, 40대와 50대는 물론 젊은이도 적지 않다.
강동가톨릭병원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 1호 환자는 문모(52)씨. 술을 즐기다 5년 전부터 고관절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2003년 10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종(과다한 음주, 고관절 부위의 외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골두에 혈액 공급이 중단돼 진행성으로 뼈가 썩는 상태) 진단을 받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절던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올해 21세인 임모씨도 네 살 때 결핵성 고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인공관절 수명(20∼25년)이 다해 다리를 절뚝거리다 지난 4월14일 교정을 위한 재수술을 받은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2005년 3월 현재 강동가톨릭병원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 누적 건수는 303건. 이 병원이 연간 소비하는 인공관절은 1000여 개에 이르는데, 이중 3분의 2가 로봇 수술에 쓰인다. 로봇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로 기존 수술 보다 조금 더 걸리는 편.
수술 전 시뮬레이션 실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해 컴퓨터가 계산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는 것.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최종으로 나온 데이터가 로봇에 입력된다. 그러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로봇 수술기기(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로보닥(ROBODOC)’이라고 부른다)는 입력된 데이터대로 정확히 수술을 한다.
로봇은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0.5mm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인공관절이 뼈에 정확히 들어맞게 되어 합병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수술 후 회복기의 통증 또한 덜하다.
하지만 이렇게 정밀한 수술인데도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또 다른 한계가 로봇 수술에 있다. 로봇 수술을 하려면 기존 인공관절 수술보다 수술과정을 한 단계 더 거쳐야 한다는 점. 수술을 두 차례 받아야 하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로봇 수술을 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시행되는 수술에선 ‘핀(pin·금속 나사못)’을 수술할 뼈 군데군데에 박는데, 이는 로봇 수술 과정에만 있는 3D 입체영상 촬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강동가톨릭병원은 2003년 10월 로봇 인공관절 수술 도입 당시부터 이런 한계를 극복한 수술 방식(pinless type)을 적용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핀을 박기 위한 수술과정을 생략해 단 한 번의 로봇 수술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법이다.
이 수술법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골격이 다르듯, 뼈의 구조나 위치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해 이렇게 각기 다른 뼈 상태나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수술설계를 하는 이른바 맞춤형 수술이다.
최소 침습 방식 첫 도입
강동가톨릭병원 장종호(張宗鎬·61·정형외과 전문의) 원장이 밝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은 대략 6가지. 우선 의사가 직접 손으로 시술하는 기존 수술법에 비해 한층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앞서 언급했듯, 로봇 수술의 경우 수술할 관절 부위의 정·측면은 물론 단면까지 1mm 간격으로 200여 장의 CT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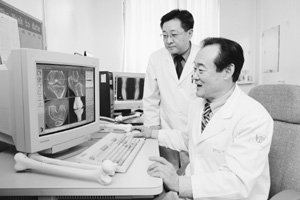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 상태를 컴퓨터를 통해 진단하는 장종호 원장(오른쪽).
또한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입원기간을 3분의 1 가량 단축할 수 있고, 수술 후의 느슨함, 불안정성, 탈구, 골절, 감염 같은 합병증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기존 인공관절 수술의 실패로 인한 재수술도 쉽고, 수술 실패율이 극히 낮아 2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강동가톨릭병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최소 침습(MIS)’ 방식을 도입한 점. 이 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최소 침습 방식은 인공관절 수술과정에서 기존 수술법에 비해 수술 부위를 훨씬 좁게 절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10cm 이상 피부를 절개해야 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데, 현재 절개 부위를 5cm까지 줄이는 정도로 발전했다.
최소 침습 방식은 지금껏 그 특성상 인공 무릎관절 수술에선 시도하기 어려웠으나, 강동가톨릭병원은 특수 고안된 최신 기기를 이용해 피부 절개 길이를 7∼10cm 이하로 줄여 수술 상처를 최소화했다.
국외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은 최소 침습 방식의 효과로 수술 후 단기 및 장기간 예후가 모두 뛰어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사용이 적고 회복 및 재활기간이 단축되며 기존 수술법보다 출혈량이 적다는 점을 든다.
장종호 원장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조건 기존 관절을 다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기 관절염 환자는 손상된 연골 부위를 다듬어낸 뒤 상한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해도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최소 침습 방식의 한 가지 흠이라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변형됐거나 살이 찐 환자에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도 적용할 수 없다. 로봇 수술에서는 관절 절제를 위해 ‘로보닥’ 톱날이 움직일 공간이 확보돼야 하기에 절개 부위가 최소 12c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방은 과도한 운동, 비만 피하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도 선진적인 수술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장종호 원장은 “적절한 운동은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줄이며, 관절의 운동범위를 넓혀 치료에 도움을 준다”면서도 “축구나 마라톤, 에어로빅 등 과도한 운동을 반복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지므로 운동을 원하는 관절염 환자는 자신의 체중과 몸 상태를 감안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운동종목과 방법을 선택하되 운동시간은 30분 이내로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또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다리 근력 강화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므로 비만을 막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관절 근육 운동(무릎을 펴고 수평을 유지한 채 10초간 머무른다. 한번에 10∼20회 실시)과 대퇴 사두근 운동(허벅지 안쪽에 힘이 가도록 약간 무릎을 굽혀 10초간 유지한다. 한 번에 10∼20회 실시)을 권할 만하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