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세끼 밥상만큼 건강에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도 회복하고 때론 병도 고칠 수 있다. 채널A의 교양 프로그램 ‘新대동여지도’는 기적의 건강밥상 코너에서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신동아’는 그 주요 사례들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례들은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新대동여지도’ 바로가기
6년 사이에 갑상선암과 유방암 등 암 선고만 세 번 받은 김갑순(69) 씨. 목에서만 16개의 종양을 떼어냈다. 의사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했다. ‘5년만 더 살았으면…’ 했던 것이 어느덧 14년째. 남편의 극진한 간호가 없었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평생 바다에서만 살던 남편이 암에 걸린 아내를 살린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2001년 여름 어느 날, 잠에서 깬 김 씨의 등은 땀으로 흥건했다.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어딘가로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던 그녀 앞에 흰색 차가 멈춰 섰다. 회색 경찰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그녀를 에워쌌다.

다시마 덕분에 암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김갑순 씨(왼쪽)가 남편 주창길 씨와 다시마 음식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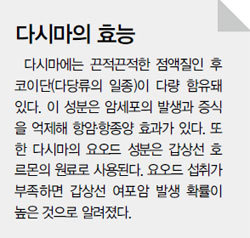
큰아들이 이렇게 외치며 김씨를 붙잡자 차와 남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도 모골이 송연했다. 몸에 특별히 이상한 증상은 없었다. 작은 통증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그냥 넘어가긴 꺼림칙했다.
다음 날 가족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의사에게서 검사 결과를 듣고 온 가족은 “별 이상 없다”면서도 표정이 어두웠다. 계속 추궁하니 ‘갑상선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답이 돌아왔다. 가족은 김씨가 충격을 받을까봐 검사 결과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수술대에 올랐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씨는 똑같은 꿈을 다시 꿨다. 병원 검사 결과, 이번엔 유방암이었다. 한쪽 가슴 일부를 도려내야 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2006년, 완치된 줄 알았던 갑상선암이 재발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세 번씩이나 암에 걸리나 싶어서….”
이생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다. 군복무 중이던 막내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휴가를 얻어 나왔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사진과 영정사진을 찍었다. 사진관은 눈물바다가 됐다.
두 차례 암 투병을 하면서 김씨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세 번째 수술은 목 전체에 퍼진 종양을 제거하는 대수술이었다. 떼어낼 종양이 16개나 됐다. 어렵게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 어지럼증이 엄습했다.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했다.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암 병동 같은 방에서 치료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나도 언젠가 떠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한 방에 8명이 지냈는데, 전화를 해보니 지금은 다 죽고 없어요.”

남편 주창길 씨는 아내의 건강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청정 해역 완도 앞바다에서 다시마를 채취한다.
“다시마는 생명의 은인”
세 번째 수술을 받은 지 올해로 9년째, 김씨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지도 오래다. 묵묵히 곁을 지키면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남편 주창길(72) 씨 덕분이다.
전남 완도에서 나고 자란 주씨는 평생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왔다. 해조류, 특히 다시마에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터. 그는 항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다시마를 채취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다. 아내가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올해로 12년째다.
“완도 바다는 청정 해역이거든요. 깨끗한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들을 아내에게 많이 먹였죠.”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않던 주씨가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둘렀다. 이제는 여느 주부 못지않게 칼질이 능숙하다. 아내를 위한 그의 지극정성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몸이 아프니 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산에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혼자서는 절대로 못 보내겠다고 하더군요.”(김갑순 씨)
그런 아내를 위해 주씨는 집 옆에 ‘황토방’을 직접 만들었다. 산 생활 대용이다. 요즘 주씨 부부는 집보다 황토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주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4시만 되면 다 그만두고 집에 온다. 황토방에 불을 넣어야 아내가 따뜻하게 잠들기 때문이다.
주씨는 그렇게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신선한 다시마를 채취해 오고, 매일 밤 황토방에 불을 땐다. 그리고 정성껏 다시마 요리를 만들어서 아내의 건강을 챙긴다. 덕분에 아내 김씨는 3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남편과 더불어 다시마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
김갑순 씨의 다시마 건강밥상&활용법
■ 다시마 묵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 끓는 물에 한천을 넣어 녹인 뒤, 말린 다시마를 곱게 갈아 넣고 잘 풀어지도록 저어준다. 중간 불에서 30분 동안 졸인 뒤 단단해지도록 식히면 바다의 내음이 가득한 탱글탱글한 다시마 묵이 완성된다.
■ 다시마 말이밥
흔히 먹는 김밥도 다시마를 활용하면 색다른 요리로 변신한다. 김 대신 다시마를 넓게 펴서 속 재료를 만다. 다시마는 잘 말아지지 않고 쉽게 풀리기 때문에 데친 미나리나 실파를 이용해 묶어준 뒤 사이사이를 자르는 것이 비법이다. 속 재료들은 김밥과 달리 볶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다시마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배가된다.
■ 다시마 전
수술 후 입맛이 없던 김씨를 위해 남편 주씨가 자주 해준 요리다. 부침 반죽에 파나 부추 대신 생다시마를 썰어 넣으면 바다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로 훌륭하다.
■ 다시마 팩
항암치료와 독한 약 성분으로 거칠어진 피부에는 다시마로 만든 팩이 최고다. 말린 다시마를 30분 정도 물에 담가 염분을 뺀 후 다시 미지근한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점액이 흘러나온다. 이 점액을 피부에 바르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미백 및 보습 효과가 있다.

◇ 20년 위궤양 치유한 삽주

‘新대동여지도’ 바로가기
20년 동안 위궤양에 시달려온 임미옥(57) 씨. 음식을 먹으면 신물(위산)이 올라오고, 음식물이 소화되기 전까지 찌르는 듯한 속쓰림의 고통과 더부룩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임씨의 위궤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다.
임씨가 위궤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음식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는 물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동반하기도 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위궤양은 그렇게 임씨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 우인국(53) 씨.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우씨는 심마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탄다.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들, 하지만 아내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20년간 앓던 위궤양을 삽주를 먹고 고쳤다는 임미옥 씨(왼쪽)가 남편 우인국 씨에게 자신이 만든 삽주 요리를 먹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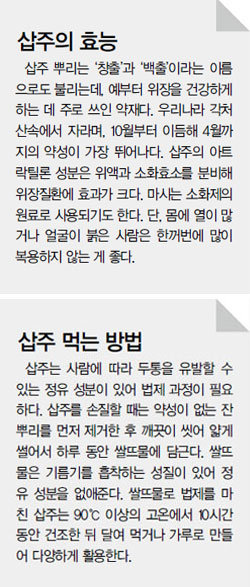
“이걸 먹고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캐러 다녔죠.”
임씨는 남편이 직접 캐온 삽주를 생으로 갈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쓴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또 생삽주는 금방 상해버렸다. 먹기 편하고 오래 보관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삽주를 말려 가루로 만드는 것. 삽주 분말은 복용하기도 편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임씨가 가장 즐겨 먹은 것은 삽주 식혜다. 하루에 무려 4L씩 마셨다.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일까. 삽주를 먹기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나자 위궤양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위산이 덜 올라오고 구토 증세와 속 더부룩함도 크게 줄었다.
“6개월쯤 복용하니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임씨는 4년 전 위궤양 완치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올해로 10년째 아내를 위해 산에서 삽주를 캔다. 남편만큼 삽주를 사랑한다는 임씨는 요즘도 매일 2L 정도의 삽주 식혜를 마신다.

남편 우인국 씨는 심마니다. 부인 임씨도 남편을 따라 산에 올라 직접 삽주를 캐기도 한다.
■ 삽주 분말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식전에 한 스푼씩 먹으면 위산 역류 현상을 억제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위궤양 증상이 심할 때는 취침 전 한 스푼 더 복용하면 좋다.
■ 삽주 식혜
엿기름을 짜낸 물과 밥을 섞은 후 솥에 넣고 6시간 동안 보온 상태로 둔다. 밥알이 뜨면 냄비에 옮겨 담고 끓이면서 삽주 분말을 적당량 넣어준다. 물 대신 수시로 마시려면 설탕은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다.
■ 단호박 삽주 갈비찜
소화력이 약해진 위장 질환자들에겐 육류 요리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삽주를 이용하면 갈비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찜기에 핏물을 빼고 깨끗이 씻은 갈비를 넣은 뒤 삽주 분말을 뿌리고 생삽주를 곁들여 푹 익힌다. 이어 속을 파낸 단호박에 갈비찜을 옮겨 담은 뒤 한 번 더 찜기에 쪄낸다. 단호박의 비타민A 성분이 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삽주 꿀차&마사지
꿀에 삽주 분말을 섞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차로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꿀과 삽주 분말을 섞어 얼굴에 마사지를 해도 좋다. 삽주 뿌리 중 백출에서 추출한 정제유는 비타민A 성분이 풍부해 피부 재생과 잔주름 예방 효과가 있다. 멜라닌 형성을 억제해 기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성분으로 백출(삽주 뿌리)오일이 사용되기도 한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