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민정음이 창제되자 ‘중화를 사모한’ 신하들은 ‘외교 마찰’을 내세워 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스승 없이도 깨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한글은 언어생활과 학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로써 조선의 지식수준은 중국의 벽을 넘어서게 됐다. 당시 세종의 ‘수제자’로 사대주의 학자들과 맞섰던 정인지의 생각을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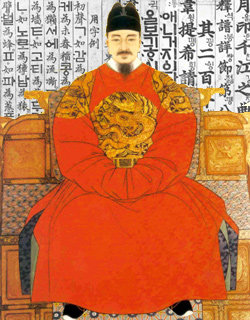
그렇다. 우리말을 한문으로 적을 때의 부자연스러움[?]은 시간이 지나거나 공부를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실린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시를 다 외운들 내 머릿속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어찌 다 적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배운 한문이 중국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조선식 한문이 중국에서 쓰는 한어(漢語)와 다를뿐더러 그 발음도 중국말, 즉 화어(華語)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1439년(세종21) 겨울 북경에 갔을 때 나는 저들이 ‘공자(孔子)’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함께 간 통사(通事, 통역관)에 따르면 저들은 ‘쿵쯔’라 발음한다고 했다. 고려시대에는 ‘한어도감(漢語都監)’을 설치해 그 안에서 오로지 중국말[華語]만 사용하게 하고, 중국인[漢人]이 와서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우수한 통사가 많았다(세종실록 23년 8월11일: 이하 세종실록은 23/8/11로 날짜만 표기함. #는 윤달 표시). 그런데 아조(我朝, 조선)에 들어 명나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통역이 낮은 직급의 일로 간주되면서 중국말 잘하는 재상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화를 사모하는 자’들의 공격
상(上)께서 명 조정의 반대에도 북경에 “생도(生徒)들을 보내 중국의 음훈(音訓)을 학습시키려” 한 것(21/12/4)이나, ‘강이관(講肄官)’과 ‘별재학관(別齋學官)’을 증설하고 생활비를 주면서 중국말 배우기를 권면하신 것은(23/8/11) 바로 이 때문이다. 심지어 당신께서는 중국의 명사(名士)가 요동(遼東)에 귀양 왔다는 말을 듣고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을 보내 한어를 배워오라고까지 하셨다(선조실록 6/1/11).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제아무리 중국말에 익숙하고 최고의 중국 학자들에게 배운다 해도 우리말을 한어로 적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야말로 “모두 각기 처지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28/9/28).
“글 배우는 사람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옥사(獄事) 다스리는 자도 그 곡절(曲折)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28/9/28) 1443년(세종25) 겨울,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창제하신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이었다. 상께서는 후자, 즉 억울한 옥사를 없애는 데 주목적을 두셨다. 하지만 내 생각은 약간 달랐다. 중국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그 많은 한자를 배우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까지 중국의 학문을 수입해야 하는지가 내겐 늘 의문이었다.
물론 예조판서라는 직책상 나는 한문의 통달은 물론이고 중원 학문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교정치의 ‘지식인 지배체제’에서 학문의 후진은 곧 국력의 약세를 뜻했고, 외교관계에서 갖은 멸시를 당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었다. 하지만 글 배우는 사람이 자기 뜻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창발적인 생각으로 이 나라를 문명의 국가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라 교육을 담당하는 예조의 더 큰 책무가 아닌가.
그러나 이런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럴 경우 최만리 등 ‘중화를 사모하는 자’들이 곧장 나를 ‘문명에 흠절을 내려는 자’로 공격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집현전 안의 정음반대파는 나와 성삼문 등의 트집거리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저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내 생각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문을 통하지 않고는 중원으로 모여드는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잘 안 맞는 도끼자루라 할지라도 새 도끼자루를 만들 때까지는 억지로 잡아맨 그 도끼자루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끼구멍에 들어맞는 둥근 도끼자루 역시 지금의 헌 도끼자루를 이용해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가 운서를 아느냐”
최만리의 말 중에서 우리글을 제작한 사실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는 말 역시 빈말이 아니었다. 이미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중국의 제후국임이 선포되었고, 또 태종임금 때부터 명나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지성으로 사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독자적인 언어 제작은 자칫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고려 말의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사건’(1390)이나 주상 초년의 ‘적휴(適休)사건’(1419)에서 이미 겪은 것처럼, 중국황제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찰 개혁에 지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니던가.
그 때문에 상께서도 사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언어학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다. “너희들이 ‘음을 사용하고[用音] 글자를 합한[合字]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설총의 이두(吏讀) 역시 음이 (중국말과) 다르지 않으냐”는 말씀이 그것이다. 나아가 당신은 이두를 만든 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점에서 정음 창제 취지나 다를 바 없는데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비판하셨다(26/2/20).
하지만 부제학 최만리에게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며 얼굴을 붉히신 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지나치셨다. 최만리가 ‘우려하는 바’를 당신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경연석상도 아닌 자리에서 음운학적인 문제로 신하를 무안 주는 것이 평소의 당신 모습은 아니었다. 아마도 중국과 문명 경쟁을 벌이는 시점에서 여전히 ‘수입 학문’에 의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외교적인 우려’를 내세워 편민(便民)의 새길 찾기를 저지하려는 지식인들의 근시안이 답답하셨을 것이리라.
그런데 아마도 주상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정창손의 발언이었던 듯싶다. 처음에 ‘언문제작’을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선 김문을 제외하면 정음반대파 중에서 유일하게 파직이라는 중벌을 받은 자가 정창손이었다. 사실 정창손은 내가 보기에도 주상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처음에 상께서는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라면서 정음 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이에 대해 정창손은 ‘삼강행실’을 이미 반포했지만 충신과 효자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자질의 문제이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상께서는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다”라고 하여 중벌을 내리셨다(26/2/20).
강직한 정창손, 세종을 찌르다
‘용속한 선비’라는 꾸중을 들은 정창손은 사실상 우직(愚直)한 학자였다. 1426년(세종8) 문과(文科) 급제자로 집현전에 들어온 그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주상께 언문창제의 효과 없음을 아뢴 것이나, 나중에 ‘단종 복위 사건’을 세조에게 고변한 것에서 보듯, 그는 말할 때 앞뒤를 저울질하지 않았다. 하지만 맹자가 자막(子莫)을 비판하면서 지적했듯이, 정치세계에서 고지식한 정직은 때로 일을 망쳐놓는다. 청렴과 정직[淸直]이란 소신은 그에게 ‘단정한 선비’(28/10/10)라는 이름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과연 집현전의 이국편민(利國便民)이라는 지향점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하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집안 내력이기도 했다. 그의 부친인 문경공(文景公) 정흠지는 김종서와 함께 육진을 개척한 공신이면서도 곧은 말 잘하는 인물로 유명했다. 일찍이 주상께서 철원에 강무(講武) 가셨을 때 짐승을 많이 잡은 자에게 벼슬로 상(賞)을 주겠다고 하자 정흠지 대감이 홀로 나섰다. “이제 짐승 많이 잡은 자를 벼슬 시키면 뒤에 전공(戰功)이 있는 자에게는 장차 무엇으로 상을 주시렵니까?” 주상은 뜨끔하셨고 결국 그의 반대를 받아들이셨다(21/6/16).
정창손의 맏형 정갑손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남들은 말할 수 있되 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나, 공은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었다[公則有言又有行]”라는 그의 제문(祭文, 정창손 지음)이 말하듯, 정갑손은 말과 일을 모두 ‘절직(切直)하게’ 하는 신료였다. 예를 들어 이조판서 최부(崔府)가 자기 아들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하자 정갑손은 어전회의에서 “전형(銓衡)을 맡은 자가 이 모양”이라면서 그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자 최부는 땀으로 등을 적셨으며 주상께서도 “내가 사람을 밝게 쓰지 못했으니, 매우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다(문종실록 1/6/26).
정갑손은 이처럼 매양 굽히지 않는 강직한 간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자세로 일하는 성실한 관료였다. 사헌부 감찰(監察)에 임명됐을 때, 그는 전국에서 올라온 쌀[稅糧] 중에서 조정에 바치고[監納] 남은 것을 사헌부 관원들의 주육비(酒肉費)로 쓰던 오랜 관행을 고쳤다. 그는 동료들의 갖은 회유에도 남은 쌀을 전부 국고에 집어넣었다. 그가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있을 때는 단 한 명의 직원도 사사로이 부리지 않았고, 청탁을 일절 거절했던 것도 유명하다. 그가 대사헌으로 있는 동안 “사헌부의 기강[臺綱]이 크게 진작되었고 조정이 숙청(肅淸)되었다”는 사관의 평가가 그의 자세를 말해준다(문종실록 1/6/26).
“충청감사 정인지는 일을 잘 돌보지 않아 전세수입이 형편없습니다.”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은 내가 세액을 책정할 때 그저 백성의 말만 듣고 너무 낮게 매겼다고 주상께 아뢰었다. 영의정 황희 역시 “정사(政事)에 경험이 없는 자가 관직을 맡으면 매양 재용이 부족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거의 3년을 주상께 요청하여 겨우 외관직에 부임했는데, 이제 영락없는 무능한 관찰사로 낙인찍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옛 사람의 말에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넉넉하지 않겠는가’ 했고, ‘제왕의 부는 백성이 저장한다’고 했으니, 어찌 백성에게 후한 정사를 했다고 벌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나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았다. 내 비록 홀로 계신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지방근무를 자청[乞郡]했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었다. 주상께서 노상 강조하시는 ‘백성 사랑하는 정치[愛民之政]’(9/11/11)를 실천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리는 정치[生民之政]’(18/7/21)를 구현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궁궐은 극히 선별된 정보만이 전달되는 공간이다. 민생의 고통을 실감하기엔 너무 폐쇄적이었다. 상께서는 낮 경연이 끝나면 지방에서 올라온 수령들을 붙잡고 백성의 형편을 물어보셨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령은 그저 좋은 얘기만 할 뿐이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 임금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는 듯했다. 그러다보니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보는 자주 차단되곤 했다.
즉위 초 주상께서 “신하 중에는 상서(祥瑞)를 말하기 좋아하는 자도 있고, 재변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도 있다. 하지만 오로지 상서만 말하고 재변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찌 가하겠는가. 상서를 만나면 상서를 말하고, 재변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옳다”(1/7/25)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주상의 의도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의 삶을 직접 돌아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다.
“백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라”
하지만 왕의 궁궐 밖 출입은 제한이 많았다. 따라서 상께서는 나에게 지방 백성이 공법(貢法)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 오라고 지시하곤 하셨다. 관찰사가 된 다음에도 나는 최대한 많은 백성을 만나보려 했고, 들판을 돌아보려고 노력했다.
백성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상당한 인내력과 체력을 필요로 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세액을 적게 책정받기 위해 얄팍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그런 불합리하고도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 보이는, 조정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과 기대를 보면서 ‘정치의 본령’이 과연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곤 했다.
무엇보다도 촌락의 실정은 조정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1436년(세종18)의 작황이, 내가 부임하기 1년 전의 흉년보다 덜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백성이 느끼는 고통은 그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지 못해 안달이었다. 하지만 굶주린 백성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능한 관리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세금을 독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방 관리는 모름지기 세금을 많이 걷어 올리기보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사’를 잘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평의 아름다운 뜻”을 잘 살리자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내가 이듬해 올린 ‘흉년구제 방책’에서 말했듯이, “백성을 살리는 정치는 식량과 재화 두 가지를 넉넉히 하는 데 달려있는 바, 농사가 풍년이면 값을 올려서 수매하고 흉년일 경우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내다팔아야 했다.”(18/7/21) 이런 내 생각을 주상께서도 인정하셨다. 신인손 등의 나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정인지는 근시(近侍)로 있으면서 문학에 전임하고 정사에는 경험이 없지만, 내가 듣건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이 그것이다(17/12/17).
15개월의 걸군(乞郡)생활. 그것은 내 개인으로서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존재,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외경(畏敬)의 대상이었다. 내 나이 19세 되던 1414년(태종14) 문과에 급제해 당신 곁을 떠나기까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셨다. 망설임과 신중함, 말하기 전의 시간과 말하고 난 후의 시간 고려, 재빠른 대답보다는 책임 있는 말의 침잠. 이 모든 것을 당신은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제 쉰셋의 나이에 나는, 네 아들의 아비로서 아버지의 길이 얼마나 무겁고 벅찬 것인지를,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아비 된 자격을 갖춰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새삼 깨닫는다.
세종에게 배운 효성
1427년(세종9)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곤혹스러웠다. 부여군 석성(石城) 현감을 지내신 아버지(鄭興仁)는 홀로 그곳(부여)에서 여생을 마치겠다고 고집하셨다. 우리 4남매 중에서 두 누이는 이미 시집을 갔고 경기도 광주(廣州)로 장가간 아우는 생활이 곤란한 형편이었다. 그나마 봉양할 수 있는 자식이라곤 나밖에 없는 처지라 주상께 걸군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고려사’ 편찬 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곤 하셨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상의 효성이었다. 상왕전하에 대한 주상의 효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내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대비에 대한 당신의 태도였다. 재위 2년 여름 대비께서 학질병에 걸리셨을 때 주상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학질은 여러 곳을 자주 옮겨 다녀야 환자에게서 떨어진다[出避之以圖離病]는 말에 따라 당신은 5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43일간 무려 12곳을 전전하셨다. 그 기간에 당신께서는 수라는 물론이려니와 “침소에도 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셨다.”(02/06/01).
주상께서는 “말 한 필에 내시 두 사람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피병(避病)을 위해 옮겨 다니셨다. 한밤중에 길을 잃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다. “임금은 주야로 잠시라도 대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왕은 불가불 환자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께서 “탕약과 음식을 친히 맛보지 않으면 드리지 않았고, 병환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없는”(02/06/20) 것을 보고 상왕도 감동을 받았다. 그간 소원했던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순전히 주상의 효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극 정성에도 7월10일 대비께서는 끝내 눈을 감으셨다. “임금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 발을 벗고 부르짖어 통곡”하셨는데, 그 곡성이 너무나 슬퍼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애간장이 녹아내렸다(02/07/10). 그때 그 슬픔이 너무나 강하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차가운’ 성격을 가진 나에게조차 주상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반드시 봉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1436년 9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곁에 모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버지는 내게 권력[權柄]에 대해 말씀하곤 했다. 상왕으로부터 “정인지는 크게 등용할 만하다”(성종실록 09/11/26)는 칭찬을 들었다는 소식에 당신은 오히려 걱정을 크게 하셨다. 국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 자칫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에 휘말릴까 염려하셨다.
당신이 보기에 공자는 권력을 혐오하지 않았다. 권력의 매력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기꺼이 군주를 위한 조언자로 나섰다. 주공이 그랬던 것처럼 공자는 어떻게 하면 권력이 악용되지 않고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쓰일 수 있는지를 깊게 연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내 이름 ‘인지(麟趾)’는 땅에 발을 딛되 극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라는 당신의 희망에 따라 작명된 것이었다(‘시경’ 국풍 주남).
한문은 지식 획득을 위한 도구
1448년(세종30) ‘동국정운(東國正韻)’이 배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정음’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했다. 4년 전 최만리 등은 정음을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라고 비판하면서 ‘언문의 시행’을 저지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였다. 언문이 공문서나 과거시험의 공식 언어로 사용될 경우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 주상은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정음을 문과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주상의 ‘전략’은 최만리 등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었다. 최만리 등이 문과시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상은 신숙주 등에게 ‘동국정운’을 편찬하게 하셨다. “전하께서 전해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해 각각 고증과 빙거(憑據)를 두어 바른 음에 맞게 하시니, 옛날의 그릇된 습관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진지라.”(‘동국정운’ 서문) 신숙주의 ‘서문’에 언급된 것처럼, 당신은 한문을 배우는 첫걸음부터 뜯어고치고[悉革] 계셨다. 신숙주의 말처럼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聲韻)부터 알아야 하며,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權輿]이다.”(29/9/29) 그런데 국가에서 표준음을 정하고 훈민정음에 따라 발음하도록 한 상황에서 어느 유생이 정음을 계속 외면할 수 있겠는가.
최만리는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면 누가 고심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배우려 하겠느냐”(26/2/20)고 하여 언문 배우기의 용이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동국정운’이 나오면서 정음은 용이성이 아닌 다른 면, 즉 언어생활의 기초라는 점에서도 파괴력을 가졌다. 상께서도 그 파괴력을 감지하셨는지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30/10/17)고 하셨다. 하지만 이미 ‘음(音)을 전하는 중심[樞紐]’이 된 정음을 수험준비생[擧子]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科擧)에서 ‘동국정운’을 쓰게 되었으나, 아직 인쇄 반포되지 않았으니, 옛날에 쓰던 ‘예부운(禮部韻)’에 의거해”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한 예다(단종실록 00/12/24).
혹자는 정음이 전면 시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훈민정음을 실패한 사업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음의 이 같은 파괴력과 지식인에게 미친 영향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선 한문에 대한 유학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한문 배우기 그 자체를 높이고, 한 글자라도 더 많이 알고자 했던 많은 유생이 한문이란 지식 획득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 사신과의 문장 대결
주상께서 늘 강조하시던 바, 아악이 중요한 만큼 향악도 필요하고, 중국의 역법이 있듯이 조선에 맞는 역법과 시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상께서는 ‘치평요람’을 편찬할 때 중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군부터 고려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배울 만한 행적이 있으면 응당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한문보다 훨씬 쉽고 수준 높으며 천지자연의 이치에도 부합하는 정음으로 우리의 말과 소리를 적겠다는 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정음 창제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나 자신이다. “지혜로운 자는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훈민정음’ 서문)는 말처럼, 훈민정음은 정말로 배우기 쉬운 문자였다. 주상의 설명을 듣고 불과 한나절 만에 나는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는 물론이고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현해 쓸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언어를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중국의 고전들을 더 잘 읽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학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28/9/29).
1450년(세종32) 명나라의 사신이 왔을 때가 그랬다. 상께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성삼문·신숙주 등에게 운서(韻書)를 묻게 하셨다. 태평관에 찾아가 상견례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른 음을 알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두 대인을 뵈었으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신은 “이 나라의 음이 복건주의 음과 똑같으니 그 음을 따라 하면 되겠소”라고 대답했다. 나와 신숙주는 마침 가지고 간 ‘홍무정운(洪武正韻)’을 가지고 음운의 같고 다름을 강론했다.
묻고 대답하기를 한참 한 후 명 사신 예겸(倪謙)은 어찌 그리 음운학을 잘 아는지 물었다. 나는 ‘동국정운’의 편찬 경험을 얘기하고, 아울러 ‘홍무정운’의 문제점도 몇 가지 일러주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문득 내게 물었다. “월재하분(月在何分)이오?” 하마터면 나는 밤하늘을 가리킬 뻔했다. 하지만 “달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 요구하는 답은 다른 데 있었다. 나는 즉시 “재동정(在東井)이오[동정에 있소]”라고 대답했다. ‘예기(禮記)’의 월령 오월(五月)편에 있는 동쪽 별자리[東方井宿]를 지칭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해박한 식견은 물론이고 지금 사신[月]이 와 있는 지리적 위치[東方],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문학 수준[天象列次分野之圖]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조선 문명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감탄
잠시 탄복하여 마지않던 예겸은 신숙주에게 “일접상과삼(日接常過三)”이라고 다시 운을 뗐다. 이번에는 운자를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말이렷다! 유려한 시의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삼(三)’ 자 운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매일 접대가 늘 삼경(三更·밤11시~새벽1시)이 지나서 끝나고 있소”라는 그의 말에 나는 “세간과비자 이진덕이삼(世間퉫毘子 利盡德二三)”이라고 했다. “세상에 굽신거리는 자들은 이로움이 없으면 덕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옆에 있던 신숙주 역시 내 말을 받아 “의도별전철 입취사무삼(意到瞥電立就思無三)”이라고 차운했다. “생각할 때 찰나의 순간이나, 뜻을 세움에 잠시라도 한결같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예겸은 비로소 “천지가 인재를 낼 때 하나의 기운에 의거했다더니 과연 중화와 변방이 구분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황화집I’ 국학자료원, 1993, 29~31). 우리나라 지성의 수준을 인정한 것이다.
이윽고 밤이 깊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뒤따라 나오던 예겸이 말했다. “여야심하(如夜深何)오?[밤이 깊었으니 어찌 하오]” 나는 이번에도 지체 없이 “가파이금오(可?李金吾), [아마, 이금오는 두려워해야겠지요]”라고 대응했다. 당나라의 두보가 밤늦게 헤어지면서 이금오를 놀리며 한 말로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금오(金吾), 즉 의금부(義禁府) 관리는 역시 두렵다는 약간의 과장도 들어 있었다.
그러자 다시 예겸은 “막봉왕옥여(莫逢王玉汝)하시오[허나 왕옥여는 만나지 말아야 할 걸]”라고 말했다. ‘송나라의 엄격하기로 유명한 관리인 한진(韓縝), 즉 옥여나 만나지 마시게’라는 말이었다(集注杜詩 권18). 마침내 우리는 “천하에 대구(對句) 없는 시란 없습니다그려”라고 크게 웃으며 헤어졌다(서거정, ‘필원잡기’ 권1).
이후 중국 사신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엔 거만한 태도로 우리를 깔보거나 따져 묻는 식으로 말을 하던 그들이 “조선에도 해 그림자를 측정하고 있는지”(32/1#07), 양촌 권근의 시 “일수요남 삼산진북(一水繞南 三山鎭北), [한 물줄기 남으로 둘러 있어 넘실 흐르고, 세 산이 북쪽을 눌러 우뚝 솟아 있네]”를 한강가의 희우정(喜雨亭)에 거는 게 어떨지(32/1#16)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 사신들이 으레 받아가던 선물에 대해서도 그들은 “만일 이것을 받는다면 조선 백성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 여기겠소”하면서 사양하기까지 했다(32/1#18).
이번 중국 사신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은 우리 자존감의 중요성이었다. “스스로 자기를 무시한 다음에 비로소 남에게 멸시받는다”는 말처럼, 내 것을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의 학문이 자폐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학문과 소통되고 비교되어야 하며,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 보아도 찬탄할 만한 수준의 지식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와 “더불어 조용하게 웃으며 말하고 시를 읊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던” 예겸은 어느 날 문득 “그대와 하룻밤 대화하는 것이 10년 동안 글 읽는 것보다 낫소[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라고 한 적이 있다(32/1#08). 나는 그 말이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찬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바로 성상께서 끌어올린 조선의 문명 수준에 대한 명나라 최고 지식인의 평가라 생각했다.
우리나라 지식 수준에 대한 중국인의 찬탄은 예겸이 처음은 아니었다. 일찍이 고려 인종 때(1123년) 개경을 방문한 송나라의 서긍(徐兢, 1091~1153)은 고려의 문풍을 이렇게 평했다: “임천각에는 장서가 수만권에 이르고 (…) 국자감을 세워 유생을 선발해 인원이 완벽히 구비되었다. (…) 위로는 조정 관리들의 위의(威儀)가 우아하고 문채가 넉넉하며, 아래로는 민간 마을에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두셋씩 늘어서 있다. (…) 백성들은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고, 장성해서는 벗을 택해 각각 절간에서 강습하고, 아래로는 군졸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향선생(鄕先生)에게 글을 배운다. 아아, 훌륭하구나!”(서긍, ‘고려도경’ 40권).
고려 말의 위기는 지성의 위기
이렇게 볼 때, 고려 말의 위기는 사실상 지성의 위기였다.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도 무서웠고, 무능한 국왕과 원의 간섭도 개탄스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스러운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음풍농월(吟風弄月)로 시절을 보내는 지식인들의 고루함이었다. “도덕의 으뜸(道德之首)”이요 “유가의 종장(宗匠)”이란 말을 들었던 이제현과 이색 역시 성리학을 수입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나라의 앞길을 헤치고 시대를 이끌어갈 탁연한 지성이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고려 말 위기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유학자는 중국 지식의 수입상 노릇에 만족하는가 하면, 한시 한 소절 더 외는 것으로 학문 수준을 평가하곤 했다. 연구에만 전념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풍토 역시 문제였다. 발언권(사헌부·사간원)과 인사권(이조·병조)이 있는 부처로 옮겨가려는 집현전 학사들을 비판하면서 주상께서 “그대들은 학술을 전업으로 하여, 종신토록 이에 종사할 것을 기약하라”(16/03/20)고 당부하신 것이나, “중국의 선비들은 각각 한 가지 학문만 오로지 하였기 때문에” 얻음[得]이 있었다(15/02/02)는 말씀은 모두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다. 당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사들에게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하게 했다.
|
그리고 젊은 문신들로 하여금 석학(碩學) 변계량에게 배우되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내도록”(08/12/11)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시행했다. 특히 학사들에 대한 평가방법과 조건을 엄정하게 했다(12/05/27). 충분한 연구기간을 제공하되, 엄격하고 철저한 평가방법을 도입해 문풍을 혁신한 것이다. 집현전 학사들의 연구열이나 문신들의 밤샘 공부는 이런 제도변화의 결과였다. 아! 이제 우리글로 개척하고 패기 있게 만들어갈 조선의 신문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집현전의 밤은 깊어만 간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