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골프장에선 여간해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힘들다. 라운드 조(組) 간격이 앞뒤 7~8분으로 촘촘한 데다 홀이 대개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평지에 가까운 레이크우드에선 골프백 2개를 얹은 수동 카트를 캐디 2명이 하나씩 끌었다. 그럼에도 라운드 시간은 전동 카트를 이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까지 카트를 끌고 가니 낭비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라운드 내내 자연과 온전하게 하나 된 기분이었다.
69세에 드라이브 거리 250m
이날 윤환병(69) 삼원수출포장 회장과 라운드에 나섰다. 삼원수출포장은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수출품의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다. 레이크우드 운영위원장인 윤 회장은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 소문난 ‘골프 박사’. 룰, 기술, 유머, 철학 등 골프에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갖춘 인물이다. 평소 그와 가깝게 지내는 만화가 이상무 씨, 골프 칼럼니스트 조주청 씨도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 씨는 히트작 ‘독고탁’과 ‘싱글로 가는 길’ 등 골프 만화로, 조 씨는 전 세계 골프 코스 탐방 칼럼으로 잘 알려진 골프계의 명사들이다. 덕담을 주고받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며, 유쾌한 몇 시간이 봄 햇살처럼 따사로이 흘렀다.
윤 회장은 69세에도 드라이버샷 거리가 250m에 달하는 괴력의 소유자였다. 아이언샷은 자로 잰 듯 정확했다. 체구는 크지 않지만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50g짜리 골프공을 치기 위해서는 50g의 힘만 있으면 된다. 황소를 때려잡을 만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말에 스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했다.
“아이언샷의 정확성을 기르려면 반복해서 연습하고 프로에게서 교정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 그립, 자신만의 스윙 템포, 마인드 컨트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은 골프 클럽을 자기 체형과 파워, 스윙스피드에 맞게 피팅(fitting)하는 것입니다. 롱 아이언의 경우 임팩트 전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해야 공을 정확하게 멀리 보낼 수 있어요.”

크고 깊은 벙커가 페어웨이 중간중간에 있는 남코스 8번 파4홀(위). 골프 칼럼니스트 조주청 씨와 담소를 나누는 윤환병 회장(아래 사진 왼쪽). 장타의 비결은 정확한 임팩트에 있다(오른쪽).

윤 회장은 이야기꾼이었다. 홀을 이동할 때마다 골프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GOLF를 두음문자로 보고 풀어쓰면 그린(G), 오존(O), 라이트(L), 프렌드(F)라고 했다. 푸른 잔디를 밟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포츠라는 것이다. 골프가 잘 되지 않을 땐 어떻게 감을 되찾느냐고 물으니 “라운드 후 미국 사람은 연습장에 가고 일본 사람은 서점에 가서 골프책을 사는데, 한국 사람은 골프숍에 가서 클럽을 바꾼다더라”며 웃었다.
“골프의 1차 목적은 동반자와의 친목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코어에 지나치게 연연해 동반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런 취지가 무너져요. 플레이는 신중하되 심각하진 말고, 자기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로 한다면 훌륭한 골퍼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10리를, 말의 향기는 100리를, 베풂의 향기는 1000리를 간답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윤 회장은 ‘골프 다이제스트’ 세계 100대 코스 선정 패널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골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혔다고 한다. 패널들은 코스를 평가할 때 샷 가치(Shot Value), 난이도, 디자인의 다양성, 기억성, 심미성, 코스 관리 상태, 기여도, 서비스 등을 고려한다.
“샷 가치란 각 홀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라운드의 즐거움을 더하는 코스의 경관적 가치인 심미성,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각 홀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억성, 코스 설계자의 숨은 의도 등을 파악하다보면 라운드의 재미가 훨씬 커집니다.”

윤 회장은 벙커샷에서 풀스윙을 하되 임팩트 이후 클럽헤드가 하늘을 향하도록 했다.
윤 회장은 1974년 친구의 권유로 골판지 사업을 시작해 40년 가까이 한길을 걸었다. “되돌아보면 역동적인 세월이었고,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후회도 없다”며 자선활동에도 열심이다. 세 딸이 크게 되라는 뜻에서 회사 이름을 삼원(三元)이라 지었는데 그의 바람대로 딸들은 의사 교수 국제공인회계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골프는 1981년 삼성물산 협력업체 협의회인 삼동회 회장을 맡으면서 시작했다. 당시 380여 개 협력업체가 ‘공존 공생 공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모여 삼성의 앞선 경영기법도 배우고 임원들과 정기 모임도 가졌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프 모임도 갖게 됐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라운드는 아무래도 ‘머리 올리러 간’ 첫 라운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스코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운동을 왜 재미있다고 하는지 정말 의아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흥미로운 역설입니까, 하하.”
골프를 통해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과 즐거움을 나눴다. 기업인뿐 아니라 한때 정당의 지역구위원장을 지내며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도 라운드를 자주 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라운드에 나서는 윤 회장은 “골프 친구가 많으니 늙어도 외롭지 않고, 아직도 도전할 게 있으니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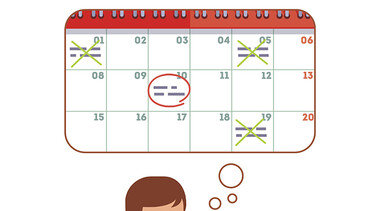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