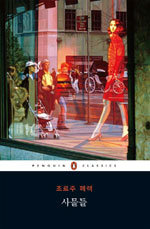
사물들<br>조르주 페렉, 김명숙 옮김, 웅진펭귄클래식코리아
“김형, 우리는 분명 스물다섯 살 짜리죠.” “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중에서
그들은 어긋나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미 돌아설 수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끌려다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대개는 조바심을 낼 뿐이었다. 자신들은 준비된 것 같았다. 자신들은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삶을 기다렸다.
-조르주 페렉, ‘사물들: 1960년대 이야기’ 중에서
투명한 감각과 자의식
기묘하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둘의 공명(共鳴)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 그곳이 어디든, 그 시대, 1960년대에는. 아니다. 두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도시적 감수성’이라는 수식어 앞에 굳이 ‘1960년대식’을 첨언할 필요는 없다. 그 시기 태어난 내가, 철들 무렵 그들을 처음 읽었던 20세기 후반이나, 세월이 흘러 21세기에 들어서도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다시 읽어도 이들 소설이 거느린 ‘도시적 감수성’은 전혀 늙어버렸거나 낡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청춘들에게는 이미 고전이 되어버렸을지언정, 나만은 이들 작품에 굳이 ‘살아 있는’ 또는 ‘현대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 서울의 스물다섯 살짜리들이나 파리의 제롬과 실비는 지금 이곳 88만 원 세대의 공기 속에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으니.
35㎡의 아파트는 조그만 현관과 절반은 세면실이 차지하는 턱없이 비좁은 부엌, 작은 침실, 그리고 서재이자 거실이며 작업실, 손님방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 뭐라 딱히 이름 붙이지 못할 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골방과 복도의 중간쯤 되는 이곳에 작은 냉장고, 전기온수기, 임시로 만든 옷걸이, 식탁, 의자로도 쓰이는 세탁물 함이 놓여 있었다. 어떤 날에는 비좁은 공간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 옆집을 터서 연결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번번이 이제는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원래의 35㎡로 되돌아오고야 말았다.
-조르주 페렉, ‘사물들’ 중에서
파리에서 35㎡는 두 공간(2 pieces)으로 나누어진 10평 크기의 작은 아파트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연구자나, 소설 주인공인 제롬과 실비처럼 젊은 동거 커플이 세 들어 사는 공간으로 통한다. 1990년대 말부터 파리에 잠깐씩 체류할 때마다 나는 팡테옹 아래 리네 거리 11번지의 아파트에 머물곤 했다. 놀랍게도, 바로 옆 13번지에 페렉이 한때 살았고, 그의 소설 속 공간은 대부분 이곳 또는 이곳과 유사한 크기의 아파트들이다.
위의 인용에서 언뜻 볼 수 있듯이 페렉은 20세기 프랑스 현대소설사에서 소설을 매개로 공간 탐구에 열정적이었던 인물. 그의 소설의 특장으로 평가되는 ‘도시적 감수성’은 사물에 투영된 공간에 대한 작가의 예민하고도 투명한 감각과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시공간 속의 인간의 삶이란 인생이자 관습인 동시에 법이다. 이때 관습이란 긍정적인 의미로 일상에서 걸러지고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고, 견고하면서도 유려한 일상의 체계(system)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렉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인 ‘사물들’(1965) 출간 이후 10년 여 뒤 발표된 ‘인생사용법’(1978)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사물들을 각각의 시공간 속에서 벼려내어 조각조각 페렉식으로 창조하고 재구성한 방대한 퍼즐 작품이다.
계단은, 각 층마다 얽혀 있는 하나의 추억을, 하나의 감동을, 이제는 낡고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러나 그의 기억의 희미한 빛 속 어디에선가 고동치고 있는 그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즉 어떤 몸짓, 어떤 향기, 어떤 소리, 어떤 번쩍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오페라 곡을 노래하던 어떤 젊은 여인, 서투른 솜씨로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 크레졸의 고약한 냄새, (…) 실크나 모피가 스치는 소리, 문 뒤에서 나던 고양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칸막이벽을 두드리는 소리, (…) 혹은 7층 오른쪽 아파트에서 가스파르 윙클레의 크랭크톱이 내던 지겨운 윙윙 소리, 그 소리에 답하는 듯한 세 층 아래 4층 왼쪽 아파트의 늘 한결같던 참을 수 없는 침묵을.
-조르주 페렉 ‘인생사용법’(김호영 옮김, 문학동네) 중에서
‘인생사용법’은 가스통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공간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중첩시키고 있다. 이는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울리포(OuLiPo)라는 당시 문학실험 전위그룹의 핵심이었던 페렉의 서사적 실험의 총화인 셈이다. 그리고 이 총화의 형상은 퍼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완성된 퍼즐은 시몽크뤼벨리에 거리 11번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한 9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페렉의 ‘사물들’과 ‘인생사용법’을 읽은 독자라면, 그들과 함께 파리에 오래 산 것처럼 거리와 골목, 계단과 문, 벽과 천장, 창문과 창문 밖 풍경까지 세밀하게 알고 있는 듯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정원에 면한 천장이 낮은, 작고 아담한 아파에 살고 있었다. 냄새에 찌든 데다 어두침침하며 좁고 후끈거리는 복도에 있던 코딱지만한 옛집을 떠올리면, 새소리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이 처음에는 황홀할 정도로 행복했다. 창을 열고 한참 동안 행복에 겨워 정원을 바라보고는 했다. (…)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풀들이 무성하고 화분들과 풀숲, 소박한 조각상까지 갖춘 모양이 제각각인 아담한 다섯 개의 정원과 아름드리나무들 사이로 난 다양한 모양의 큼직한 돌이 깔린 산책로는 마치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비라도 내리고 나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낙엽 냄새, 두엄, 진한 숲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파리의 몇 안 되는 곳이었다.
-조르주 페렉 ‘사물들’ 중에서
이렇듯 공간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인 페렉은 파리의 장소들을 기록하는 ‘서기(書記)로서의 소설가’를 자처하고, 소설뿐 아니라 영상으로 파리의 곳곳을 기록하는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기에 이른다. 45세에 요절하기까지, 그가 기획한 마지막 프로젝트(‘장소들 Lieux’)는 12년에 걸쳐 파리의 열두 곳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는 왜 파리의 서기를 자처하며 장소들의 뿌리를 뽑듯이 낱낱이 기록하려고 했던 것일까.
서기(書記)로서의 소설가
나에게는 유년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 불확실한 내 기억을 되살려내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빛바랜 사진, 몇몇 증언과 보잘것없는 서류 조각뿐이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선택은 아주 오래도록 내가 치유 불가능한 것이라 이름 지은 것들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과거의 것, 아마도 현재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만 하는 과거의 것들.
-조르주 페렉 ‘W 또는 유년의 기억’(이재룡 옮김, 웅진펭귄클래식코리아) 중에서
파리에 도착해 두 달 가까이 체류하는 동안 책상에서든 거리에서든 페렉의 소설들을 끼고 살다가, 마침내 20구 빌랭 거리를 찾아갔다. 파리시의 거리기록 자료에는 언뜻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200m의 포석이 깔린 거리’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정작 가보니 채 100m가 되지 않았고 포석은 거리와 이어진 벨빌 공원의 산책로에 깔려 있었다. 이 장소는 폴란드 이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네 살에 전쟁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여섯 살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어머니를 잃은 페렉이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W 또는 유년의 기억’이라는 그의 자전소설의 무대이기도 하다. 페렉은 이 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기록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소설과 영상으로 남겼다.
페렉의 소설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나는 1996년에야 출간된 초역판 ‘사물들’과 2000년 출간된 초역판 ‘인생사용법’을 소장하고 있다. 당시 그의 소설실험을 수용하기에 한국 소설독서계는 이념 아니면 오락 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된 페렉의 소설들은 균형잡힌 독자들의 서가에 오롯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00/200/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