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환경에 놓였을 때 인체의 반응을 연구하는 영국 옥스퍼드대 생리학과 프란세스 아쉬크로프트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사람의 몸은 오히려 더위에 잘 견디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인체 곳곳에 남아 있는 이런 진화의 흔적들을 살펴보자. 인간의 피부에는 땀샘이 200만개 정도 있는데, 땀은 몸을 식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포유류에서 이렇게 땀샘이 많은 동물은 드물다. 피부에 털이 없는 것도 이런 적응의 결과다. 털이 없는 매끄러운 피부는 땀이 좀더 쉽게 증발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몸에 비해 팔, 다리가 길고 체중 대비 피부 면적도 넓은 편이다. 그만큼 몸의 열을 잘 내보낼 수 있는 구조다. 피부에 있는 온도 센서도 그런 흔적 중 하나다. 이 센서는 13~35℃ 사이의 온도에 반응해 덥고 추운 정도를 알려주는데 28℃ 부근에서 가장 민감하다. 이는 인류가 평균 온도가 28℃ 근처인 곳에서 진화했음을 암시한다. 인류의 화석이 발굴되는 아프리카 중부지역의 연평균 온도와 비슷한 값이다.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약 16만년 전 아프리카에 나타나 그 뒤 전대륙으로 퍼져나갔다. 인종이 다양한 것은 열대 사바나 기후인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가 새로운 기후에서 수만년 동안 적응한 결과다.
동북아시아로 이주한 인류는 빙하기를 맞아 혹독한 추위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팔다리가 짧아지고 상체가 커졌다. 땀샘의 수도 줄고 땀을 배출하는 능력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편 아프리카 흑인들을 보면 현생 인류의 초기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기후가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인들의 탄력 있는 하반신도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의 더운 기후에 적응한 결과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먹을거리가 풍부할 때 체지방을 몸에 저장한다. 그런데 지방층은 체열의 발산을 막는다. 따라서 열이 많이 나는 내장이나 근육을 지방층이 덮게 되면 더위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체열의 발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엉덩이로 지방층이 몰린다. 남아프리카 하텐토츠족은 유난히 튀어나온 엉덩이와 길고 날씬한 다리로 유명하다.
현대인들은 팔다리가 길고 히프가 올라간 탄력적인 몸매를 이상적으로 여긴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수만년 뒤에는 한국인들도 늘씬한 체형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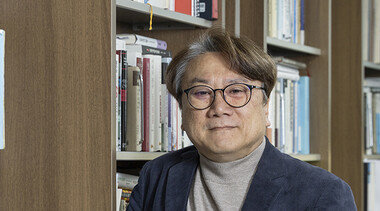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