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마다 입에 맞는 음식 제각각”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지 않을 구실을 줬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만일 부시 전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라면 어떨까.
쓴맛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사람의 유전자 유형은 PP, PA, AA 3가지로 나뉜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 아메드 엘 소헤미 교수팀은 이 유형에 따라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느끼는 맛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유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시금치와 커피 등 떫거나 쓴맛이 나는 식품 20여 가지를 먹게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맛의 강도를 1부터 9까지 숫자로 쓰라고 했다.
그 결과 AA형 그룹은 떫거나 쓴맛을 잘 느끼지 못했고, PP형 그룹은 두 가지 맛을 모두 잘 느꼈다. 즉 채소를 유달리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 쓴맛을 잘 인식하는 PP형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음식을 통해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면 개인의 염기서열 차이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발현되고, 어떤 유전자는 억제되기도 한다.
이런 차이에 따라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조금씩 달라져 체내 대사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한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유전자와 음식의 영양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분야를 ‘영양유전학(Nutrigenomics)’이라고 한다.
2004년 영국의 ‘사이오너(Sciona)’라는 생명공학 기업은 영양유전학을 이용해 ‘DNA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입 속에 면봉을 넣어 타액을 추출한 뒤 DNA를 분석한다. 이 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돌리면 유전자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기술한 결과가 나온다.
‘사이오너’의 수석 영양학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B6나 B12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 맛의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단 것은 찾아도 쓴 것은 피할 수밖에 없다. 쓴맛은 독(毒)일 수 있으므로 뱉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쌉쌀한 나물을 즐기는 것은 몇 번 먹어보면 쓴맛의 부정적인 느낌이 극복되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도 유전자 앞에서는 편식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부모의 입에 발린 말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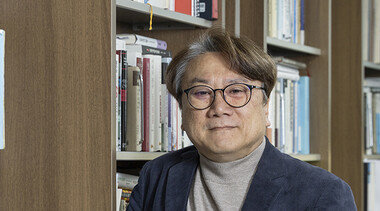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