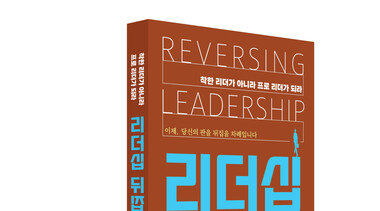쓰레기봉투 입은 간호사 사망, 복도에 쌓여가는 시신들…
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코드 블루’…죽음이 일상
1인실을 2인실로 개조…몰려드는 환자들
공원에서 6피트 거리 안 뒀다고 400달러 벌금
보호장구 직접 구입해 환자 돌보는 간호사들
한인 간호사 12명 중 2명 확진, 1명 과로로 입원
냉동 탑차에 실려 가는 시신들…“뉴욕이 증발했다”
![[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e/9e/86/48/5e9e86480809d2738de6.jpg)
[뉴시스]
2월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나는 1월 중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소식을 접한 터라 다른 뉴욕 시민들과 달리 감염이 염려됐다.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뉴욕시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으면 뉴욕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 뉴스가 속속 전해졌다.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발생한 만큼 동양인에 대한 ‘의심’도 함께 커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동양인이 “왜 마스크를 안 썼느냐”며 폭행당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만 해도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에 잠시 분노했지만, 평범한 미국인들은 코로나19를 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급변한 뉴욕
그러나 3월 1일 뉴욕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월 7일 확산 억제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음 날 ‘최대한 대중이 밀집되는 곳을 피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3월 9일이 되자 뉴욕주 확진자는 149명이 됐다.이즈음 지하철을 타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을 느낄 정도였다. 예전에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하던 사람들이 모른 척하거나 쌀쌀맞게 대하는 모습에 적잖은 상처를 받았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뉴욕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아시아계 인사들도 “비슷한 마음”이라며 서로 위로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미국인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아픈 사람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던 3월 12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일하던 중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 미국인 수간호사가 와서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니 마스크를 벗어라”고 했다며 의아해했다. 그나마 내가 다니는 병원은 집에서 가져온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다른 간호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3월 중순을 지나면서 환자가 몰려들었다. 병원도 정신없었다. 870병상의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려드니 대부분 1인실 병실은 침대를 하나 더 갖춰 2인실로 운영했다. 총 병상의 2배 정도의 환자를 수용하다 보니 의료진도 ‘녹다운’ 됐다. 보통 미국에서는 한 병동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4~5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1명의 간호사가 10~11명의 환자를 돌보니 지쳐 나가떨어지는 게 당연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다,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해 내 몸을 부리는 것도 힘들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6피트 거리 두기, 웅성거리는 韓人사회
![지인이 ‘6피트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신영미 제공]](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e/9e/86/70/5e9e867026fcd2738de6.jpg)
지인이 ‘6피트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신영미 제공]
당장 간호사 가운을 빨아 입어야 하는데 이 또한 걱정이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세탁실이 없어 보통 집 앞 빨래방을 이용했는데, 병원에서 입은 가운을 다중이 이용하는 빨래방에서 세탁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다. 설상가상 욕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와 다른 삶이었다. 코로나19는 그렇게 나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다.
3월 22일 오후 8시 쿠오모 주지사가 자택대기 행정명령(Stay Home Order)을 내리면서 병원 치료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자전거 타기나 조깅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람 간 ‘6피트(1.8m)’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평소의 2배가량 더 걸렸다. 24시간 내내 병원 앰뷸런스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 불신은 더욱 커졌다. 가게가 문을 닫으니 많은 사람이 실직했고, 가게 월세나 집 임차료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거렸다.
‘6피트’는 미국 보건 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거리다. 스쳐 가는 산책도, 대형 마트도 예외가 아니다. 한 지인이 공원에서 6피트보다 가깝게 사람들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400달러 벌금을 물었다고 ‘카톡’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인 사회도 웅성거렸다. 모든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됐는데, 어떤 한국인 유학생은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하지 못한 채 귀국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유학생도 의료비가 비싼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택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3월 25일 뉴욕의 한 병원에서 방호복이 없어 검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간호사들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나는 건강검진 때 지급받은 N95 마스크(의료인이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한 장밖에 없어 더욱 걱정됐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던 간호사가 사망하자 헤어망과 고글, 발 씌우개 등 직접 보호장구를 구입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많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며칠에 한 번 N95 마스크가 지급됐다.
‘쓰레기봉투’ 간호사의 사망
![보호장비가 부족해 쓰레기봉투를 착용한 미국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웨스트 병원 간호사들. 이 병원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뒤 숨졌다. [Criselle Cruz Bermas의 페이스북]](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e/9e/86/87/5e9e86870cc8d2738de6.jpg)
보호장비가 부족해 쓰레기봉투를 착용한 미국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웨스트 병원 간호사들. 이 병원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뒤 숨졌다. [Criselle Cruz Bermas의 페이스북]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 생각이 났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네가 지금 이 시기에 미국에 간 것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니 겁먹지 말고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해라”고 말씀하셨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호복을 입고 병실로 갔다.
한국에서 10여 년 간호사로 일했지만 N95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건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는 기본이고, 하루 50번 정도 방호복을 갈아입다보니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순간 팔이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12시간 넘는 근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니 콧등과 귓등이 찢어질 듯 아프다.
3월 30일 근무 중 ‘코드 블루’ 방송(Code Blue·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안내 방송)이 나오자 해당 병실로 뛰어갔다. 난 마침 모든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여서 다른 의료진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도왔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깊은 절망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여러 번 ‘코드 블루’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워낙 많은 환자가 사망하다 보니 한동안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 방송을 하지 않았다. 죽음이 일상화됐다.
“달리 치료 옵션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일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병실에 들어가니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해 장비를 벗고 병실 앞에 물잔을 놓은 뒤 다시 보호장비를 착용해 병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음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이처럼 보호장구를 벗고 입고를 종일 반복하기도 했다.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환자다. 대부분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환자들에게는 타이레놀이나 트라마돌 같은 약 처방이 내려졌다. 실제 코로나19는 애드빌(이부프루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보다는 타이레놀이 효과가 있다는 뉴스 탓인지, 타이레놀을 사는 게 마스크 구하는 것만큼 어려워졌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황산염이 타미플루와 함께 치료에 사용됐다.
이는 3월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는 오랫동안 사용돼온 약물이어서 새로 개발된 약물보다 잠재적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빠르게 알려졌다. 그러나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클로로퀸을 복용한 뒤 남성은 사망하고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CNN 보도가 나오는 등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런데 어쩌랴. 현재 달리 ‘치료 옵션’이 없으니.
복도에 쌓여있는 시신들
이후에도 나는 밤새 환자들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적합한 산소마스크로 바꿔 호흡 곤란 증상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여전히 환자들 침상 패드를 갈아주는 일은 힘들다. 환자 대부분의 몸집이 커 다리 한쪽 들기도 버겁다. 중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점심을 맛있게 먹던 환자가 저녁에 갑자기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병이 없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병실 자리가 나기 무섭게 다른 환자가 곧바로 입원한다. 죽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4월 어느 날 밤 근무를 하는데, 다른 간호사가 돌보던 환자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환자 이송을 돕는 이송원도 과로로 쓰러져 시신을 옮길 사람이 없었다. 결국 나를 포함한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시신을 장례식장 시신보관소로 이송해야 했다. 몸무게 150kg인 환자는 셋이 이송하기에 너무 무거워 옮기는 내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복도에는 시신이 쌓여 있었다. 병원은 한 편의 호러 영화 촬영소 같았다. 매일 5~7명의 환자가 사망했는데, 시신보관소 냉동고에 검은 비닐로 덮인 시신 49구가 한꺼번에 냉동 탑차에 실려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들렸다.
4월 15일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다. 확진자 발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밀려온다. 마스크도 부족해 이웃 병원의 아는 의사가 몇 장 구해준 마스크를 아껴 쓰고 있다. 두 시간에 한 번꼴로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여전히 뉴욕은 전쟁터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는 소소한 기쁨을 떠올리며 오늘도 방호복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