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마루야마 마사오 지음, 김석근 옮김, 문학동네, 808쪽, 3만원
사상가로서 후쿠자와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문명론의 개략’이다. 이 책에 깔린 정조는 지독한 위기위식, 즉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의 밥이 되기 직전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전하기를, 더 나아가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가학(家學)을 통해 획득한 동양고전에 대한 박학, 능통한 외국어 실력으로 획득한 서양학문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수차에 걸친 서유(西遊)를 통해 얻은 견문(見聞)을 조합해 놀라운 통찰을 빚어낸다.
한편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1914~96)는 종전 후 일본 사상사학계의 ‘천황’으로 칭송받은 학자다. 그의 주저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는 일본의 재빠른 근대화의 사상적 근거를 해명한 독보적 저서다. 요컨대 일본의 근대화는 에도시대 일본화된 유교사상의 전개과정에서 그 싹이 터 나왔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생적 근대화론은 일본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다(요즘은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일본 근대화의 시작과 끝
이 마루야마가 저 후쿠자와의 ‘문명론의 개략’을 읽었다. 그 만남이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다. 일본사상계 최고 고수들의 만남인 셈이다. 햇수로 치면 1875년에 출간된 책을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읽었으니 근 100년의 시차가 있다. 허나 그 사이에는 보통의 100년 세월로는 담지 못할 격동이 넘쳐난다. 일본 근대국가의 형성과 팽창, 그리고 몰락이 있었고, 미군의 점령과 산업화의 도정이 들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과 그 끝(?)을 함께 보여주는 두 겹의 렌즈다.
‘…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었을까. 대략 독서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해를 위한 읽기가 있고, 비판적 읽기가 있다. 그는 단연코 이해를 위한 독해에 몰입하겠노라고 선언한다. 서문 첫머리에서 ‘…읽는다’를 “에도시대 유학자들이 많이 남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전 주석서처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전의 본문을) 그저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 내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다. 급기야 그는 “후쿠자와 마니아(후쿠자와 호레)”임을 자처한다.
이렇게 되면 난처해진다. 왜냐하면 후쿠자와가 개개인의 견해를 자유로이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반면 마루야마의 독서법은 동양의 전통적인 경전 독법과 똑같기 때문이다(원전을 소리 내어 읽으라는 요구는 더욱 그렇다). 즉 후쿠자와의 ‘문명론의 개략’을 경전화하고, 마루야마 자신은 중국의 주희(朱喜)나 일본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와 같은 주석가를 자처하는 셈이다. 주석자(마루야마)와 원저자(후쿠자와) 간의 거리가 협소하다는 점이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원전은 전부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곧 중국과 전통 일본의 생활방식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서구문명에 대한 이해에 주력하는 것으로 짜여있다. 이것을 주석자는 20개의 항목으로 나눠, 각 장절을 읽으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서술해간다. 후쿠자와는 동양을 ‘덕성의 세계’로 서양을 ‘지식의 세계’로 범주화하고, 당시 일본에 시급한 것은 서양의 지식세계로 돌입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즉 ‘문명론의 개략’의 주어인 ‘문명’이란 자연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의심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식은 여럿의 지식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시끄러운 논의와 토론은 문명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이를 통해 문명은 끝없이 발전해간다.
서구사상에 대한 이해와 反유교
이에 반대되는 것이 동양이다. 동양이 서양에 뒤처진 까닭을 그는 지식이 아니라 덕성을 추구한 데서 찾는다. 덕성은 위선이 싹트는 장소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상체계가 유교다. 그의 반(反)유교는 철저하다. 예컨대 유교의 경전 숭배가 폐쇄된 사유공간을 만들고 그것은 또 군주를 숭배하는 지배-복종의 수직적 정치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민의 자유로운 사유는 철저히 봉쇄된다. 덕치(德治)란 곧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시혜에 불과한데 이건 허위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끼에 불과하다. 후쿠자와는 동양적 사유의 그 ‘야만’을 끊고 서양 근대의 ‘문명’을 시급히 건설하지 않으면, 제국주의의 침탈에 인도처럼 식민지가 되고 말리라고 염려한다. 그 시대의 위급함을 염두에 두면, 조국(일본)이 식민지냐 독립국가냐의 기로에서 염려하는 선각자의 고뇌가, 국적에 관계없이 뜨겁게 와 닿는다.
한편 주석자 마루야마의 지적 성실성도 눈에 띈다. 후쿠자와 글쓰기의 기원을 낱낱이 추적하고 또 이를 꼼꼼하게 지적함으로써 그 사상의 기원을 ‘폭로한다’는 점에서다. 이 점이 전통식 경전주석학 스타일이라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읽는다’가 보여주는 지적 성실성이다. 전체적으로 ‘문명론의 개략’이 딛고 있는 서양 원전은 프랑스 근대역사가 기조의 ‘유럽문명사’와 영국역사가 버클의 ‘영국문명사’다. 주석자는 원문을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이 기조에게서 나왔는지, 또 어느 부분의 출처가 버클인지를 세세하게 확인해낸다. 이로써 창조적 사상가로 경탄의 대상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필자는 처음 ‘문명론의 개략’을 접했을 때 그 사유의 창의성에 매우 놀랐다) 마루야마의 천착으로 말미암아 ‘번역적 사상가’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동시에 번역가로서의 후쿠자와 역시 서양 언어와 개념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실력이 대단하다는 점, 그리고 서구문명에 대한 조예가 만만치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서구사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세밀한 반면 동양사상, 특히 유교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혹은 무시한다)는 점이다. 원저자 후쿠야마야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의 반동적 정책, 예컨대 유교식 ‘교육칙어’의 반포와 같은 역(逆) 추세에 반대하기 위해 짐짓 철저한 반유교로 일관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주석자인 마루야마다. 그는 원전 속에서 민주주의(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리버럴리즘)를 구별해내고, 후쿠자와가 끝내 민주주의자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기도지 한다. 그만큼 서양적 개념들에 대해서는 세밀하다. 그뿐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원시불교와 중국불교, 그리고 일본불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일본불교의 어용성에 대해서 불교사상적 맥락에서 비판한다.
식민지 지식인의 지적 천박
그런데 유교에 대해서는 동양전제주의, 군주독재 등 제반 악의 근원으로 전제한다. 동양사상학자라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 유가와 법가(法家) 간의 차이, 한(漢)나라의 제국 건설과정에서 ‘겉은 유교이되 속은 법가(外儒內法)’로 습합(習合)되는 사상사적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은 한 번도 제대로 유교국가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기한다. 그러면서 유교를 ‘동양=전근대=억압=폐쇄=야만’이라는 항등식으로 난타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교를 ‘악의 꽃’으로 보는 인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입수됐다는 점이다. 이광수의 논설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유교적 논조는(‘논리’가 아니라) 그 기원이 일본사상가들의 유교 인식, 특히 후쿠자와라는 사상가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은, 한국 독자로서 이 책을 읽는 와중에 얻는 가외의 소득이다. 한 번도 유교국가인 적이 없던 일본 지식인의 유교 비판에 내재된 정치성을 몰각한 채, 그것을 유교국가였던 조선사회로 무비판적으로 입수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지적 천박성은 따로 분석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식민지 연구자들과 현대 한국사상 연구자들이 꼭 읽어야 할 텍스트다. 함께 ‘후쿠자와 자서전’(이산), ‘학문의 권장’(소화),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예문서원)를 참고하면 더욱 차분한 ‘비판적 글 읽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넉넉한 ‘번역자 주’와 더불어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은 8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을 쉽게 읽히도록 만드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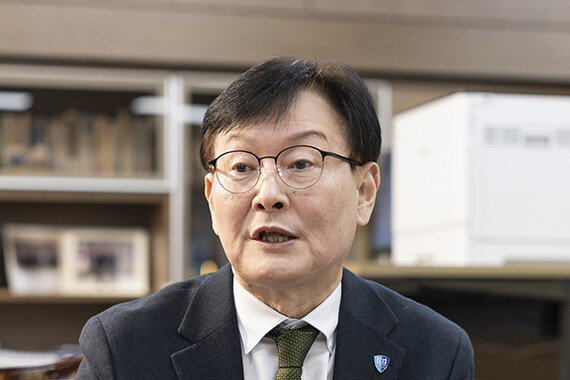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