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인 ‘진경시대’를 밝혀낸 최완수 간송미술관 실장은 최근 ‘겸재 정선’이라는 대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최 실장을 만나 진경시대의 중심인물인 겸재 정선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40년 연구를 통해 밝힌 성과를 들어보았다.

최 실장은 1971년 간송미술관 첫 전시로 ‘겸재전’을 연 후 겸재 관련 전시를 11차례 열었고 ‘겸재의 한양진경’ 등 겸재 관련 저작물도 여러 권 세상에 내놓았다. 이번에 나온 책은 그동안 겸재 연구에 바친 열정의 결정체다.
흔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달보다도 손가락을 더 보고 싶은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찬란한 문예부흥기였던 ‘진경(眞景)시대’의 중심인물이었던 겸재가 ‘달’이라면 이런 시대가 있었음을 밝혀낸 최 실장은 바로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 실장은 어떤 계기로 겸재를 만났으며 그 숱한 시간을 한눈팔지 않고 겸재에 쏟아 부은 것일까. 10월10일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최 실장을 만났다. 아주 연한 쪽빛의 한복을 차려입은 그는 겸재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자신의 삶에 관한 질문에는 자상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으면서 “겸재에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겸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진경화풍을 창안해서 확립한 분이고 우리 생활 풍습을 최초로 그린 분이지요. 우리식으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의 모습이나 조선의 승복을 입은 승려 모습이나 한복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을 최초로 화폭에 올리기 시작한 분입니다. 더구나 중국화풍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서 주역의 원리에 입각해 화면을 구성했지요.”
▼ 겸재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제 식민사관이 조선시대 문화를 왜곡했다는 점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화두처럼 늘 머릿속에 이 문제를 두고서 연구한 거죠. 당시에는 조선 사회나 문화가 발전이 없었다는 조선정체설이 통설이었는데 기록만으로는 극복하기 참 어려웠어요. 조선정체설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날조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당쟁이 심할 때 서로 주고받은 글들을 근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결코 정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을 찾던 중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겸재의 그림을 보고 ‘아, 이거구나!’ 탄성을 지르게 된 거죠.”
겸재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그는 일찍부터 불상을 연구하려고 서울대 사학과에 진학해 불교 유적을 찾아 전국을 휘젓고 다녔다. 대학 졸업 후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학예사로서 ‘옛것’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1966년 최순우(崔淳雨·1916~84) 전 국립박물관장의 소개로 고려대장경을 새롭게 편찬한 ‘신수대장경’이 간송미술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읽기 위해 발을 들여놓았다가 발목이 붙잡혔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교육자이자 문화재 수집가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1906~62) 선생이 수집해놓은 겸재 정선과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작품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 겸재의 그림을 간송미술관에서 처음 본 겁니까.
“당시에는 겸재 그림 도록도 없었어요. 1971년 첫 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겸재 그림을 처음으로 살펴봤는데 그림이 제 머리를 꽝 친 거죠. 오도(悟道)의 경지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 어떤 면이 최 실장을 사로잡았습니까.
“겸재 이전의 화가들이 따랐던 중국화법이라는 것은 남방화법과 북방화법이 달라요. 남방에서는 기후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안개나 구름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치를 묘사하기 위해서 번지는 화법, 즉 묵법이 유행했어요. 그리고 북방에서는 선으로 묘사하는 필법이 유행했습니다. 중국화가들은 한 화면에 묵법과 필법이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그림을 그렸지만 출신 지역의 화법에 치우쳤지 통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통합을 겸재가 이뤄냈단 말입니다. 한 화면에 주역의 원리, 즉 음양 조화의 원리를 구현한 겁니다. 즉 흙으로 된 토산(土山)은 수목이 우거져 있으니까 묵법으로 그리고, 골산(骨山) 즉 바위로 된 암산(岩山)은 필법으로 처리해서 음인 토산이 양인 골산을 감싸게 하거나 서로 대립하게끔 화면을 구성한 거죠. 이런 겸재의 그림을 보고 당시 중국화가들이 놀란 거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겸재를 만나게 해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조상 앞에 선 최완수 실장.
“그러니까 천재지요. 그러나 이미 그 시대 우리 문화의 역량이 그만큼 축적되어 있었던 거지요. 당시 사대부들이 그런 그림을 요구하니까 점점 그런 그림이 많아지고 겸재가 대접받은 거예요. 당시 사회가 뒷받침한 겁니다.”
▼ 숙종과 영조 시대에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습니까? 예술이란 우선은 배가 부른 후에야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겸재가 처한 시대가 참 독특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직교역을 하지 못했어요. 청나라 초기에 대만을 정벌하는 문제로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교통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조선이 중개무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평양감사와 경상감사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동래 왜관이 수백만냥의 은화를 우리나라에 빚질 정도였어요. 문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최 실장은 당시 겸재의 그림이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음을 알려줬다.
“청나라 화가들과 비교하면 겸재는 동북아 최고의 화가였어요. 겸재 그림이 중국에 가면 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사신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면 역관들이 그림을 구하려고 겸재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 아닙니까. 청나라에 가져가서 고가로 파는 거죠. 이와 관련된 일화가 상당히 많아요.”
▼ 어떤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까.
“하루는 겸재의 이웃집 처녀가 잔치를 벌이는 겸재 집에 와서 실수로 비단 치마에 고깃국물을 흘렸어요. 그 치마를 빨아서 겸재 집에 보관해뒀는데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겸재가 화흥(畵興)이 이니까 그 치마에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좍 그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치마에 여백이 있으니까 별도로 해금강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웃집 주인을 초대해서 ‘내가 화흥이 일어서 비단을 찾으니 마침 비단 치마가 있어서 그렸네’라고 말했어요. 이웃집 주인은 너무 좋아 한상 잘 차려드리고 그 그림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금강산전도’는 자기 집 가보로 두고 ‘해금강도’만 역관을 통해 중국에 팔았는데 그 대가로 비단 수십 필을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처녀가 또 비단 치마를 입고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겸재가 늘 그러는 것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린 ‘금강산전도’는 이야기만 전하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겸재, 금강산 그림으로 ‘스타 화가’ 되다
겸재는 금강산을 그리기 좋아했다. 겸재가 ‘스타 화가’로 데뷔하게 된 것도 바로 금강산 그림 덕분이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에는 겸재가 36세 때 그린 것으로 보이는 13폭의 금강산 그림이 남아 있다. 겸재의 금강산 그림을 시로 묘사해놓은 제화시(題畵詩) 21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원래 금강산 그림은 21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강산 그림을 ‘해악전신첩(海岳傳神帖)’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금강산 그림의 일부가 ‘신묘년풍악도첩’에 실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산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겸재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진경시의 대가였던 사천(?川) 이병연(李秉淵·1671∼1751)이 금화현감으로 있었어요. 당시에는 내금강을 거쳐 금강산으로 들어갔는데 가는 길목에 금화가 있었어요. 사천이 겸재를 초청해서 금강산으로 가 겸재는 산수화로, 사천은 제화시로 사생한 겁니다. 이들이 쓴 그림과 시를 보고 두 사람의 스승이었던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1653∼1722)은 제사(題詞)를 씁니다. 시가 아닌 산문을 쓴 거죠. 이처럼 셋이 진경화, 진경시, 진경문으로 시문화첩을 꾸며놓고 ‘해악전신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화첩을 사천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금화에 들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니 겸재가 요즘 말로 떴어요. 이 화첩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후(後)해악전신첩’은 언제 그린 겁니까.
“36년 뒤인 72세 때 겸재가 다시 금강산으로 가서 젊은 시절에 그린 화첩을 재현했는데 바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악전신첩’입니다. 36세 때 그린 것과 비교하면 만폭동, 장안사 등 거의 같은 곳을 그렸는데 72세에 그린 것은 굉장히 세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화시가 일일이 다 적혀있어요. 겸재가 72세 때 그린 ‘해악전신첩’은 같은 장면을 그린 것인지 다른 장면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생본이 있었는데 최근 나타났어요. 화첩 두 벌이 이번에 나온 책에 실려 있어요.”
▼ 새로 발견한 화첩과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첩 중 어느 것이 먼저 그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발견했다는 표현이 싫어서 출현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 그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출현한 것이 사생본인 것 같은데 먼저 그린 거지요. 금강산을 주유하면서 사생한 겁니다. 이번에 출현한 것은 겸재서문만 있는 것을 보니 겸재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출현이에요. 간송미술관 소장본은 처음 그릴 때의 화흥이 없기 때문에 기는 좀 빠져 보이지만 더 세련됐어요.”
▼ 겸재의 그림에 나이에 따른 변화는 있습니까.
“겸재는 만년에 이르면 산수를 접해도 절대 그대로 그리지 않아요. 내면세계, 즉 본질을 포착할 줄 안단 말입니다. 뺄 것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넣을 것은 과감하게 넣어요. 그래도 그린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인왕제색도’에 나오는 인왕산은 백색 바위를 먹빛으로 그렸는데도 ‘아 이게 인왕산이구나’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 그림만 봐도 진경산수화를 그리게 된 겸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출판기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사람을 사귈 새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낼 틈이 없는 거지요.”
1971년에 만난 겸재와 대화하고 사귀느라 그림 밖의 이성과는 사귈 틈도 없었던 것이지 특별히 독신주의를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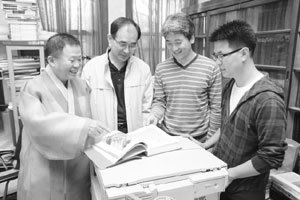
제자들과 함께 ‘겸재 정선’을 이야기하는 최완수 실장.
최 실장은 문화를 식물에 비유하면 이념은 뿌리이고 예술은 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주자성리학의 경우 우주론 등을 담고 있는 어려운 철학을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시문서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성리학자가 시문서화에 능했다고 한다. 그러면 진경시대의 이념적 뿌리는 무엇일까.
“이념적으로 조선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진경시대가 피어났어요. 이기이원론을 주장한 주자성리학을 조선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70) 시대인데 퇴계의 다음 세대인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84)가 이기일원론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 조선성리학입니다. 자기 고유의 이념이 생기면 자기애가 생깁니다. 자기애가 생기면 국토애와 민족애도 생기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국토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율곡에 의해 고유사상인 조선성리학 체계가 확립되자 이를 바탕으로 율곡학파에서는 문화 전반에 걸쳐 조선 고유색을 드러내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문학에서는 율곡의 평생지기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한글 가사문학으로 국문학 발전의 서막을 장식하고 조형예술 분야에서는 석봉(石峯) 한호(韓濩·1543~1605)가 나와 조선 고유의 서체인 석봉체를 이루어냈다. 그림에서도 조선 고유색을 드러내는 사대부 화가가 나타났다.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창강(滄江) 조속((趙涑·1595~1668)은 세속적인 명리를 초개같이 버리고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산천을 시화로 사생해내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 겸재는 율곡이 완성한 조선성리학을 자양분으로 진경산수화를 창안하고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율곡학파의 3대 수장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고 우암의 제자가 삼연 김창흡이고 삼연 선생의 제자가 겸재였으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삼연은 학예계의 종장(宗匠)이었어요. 당시에는 삼연이 최고다 하면 최고예요. 삼연은 성리학자에다 불교와 도교에 다 능했어요. 진경시문에도 능하고 특히 주역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겸재도 주역에 정통했어요. 겸재도 30대 때 이미 주역에 능통해 금강산을 음양조화의 원리로 화면을 구성한 겁니다. 삼연을 중심으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진경시문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대개 백악산과 인왕산 아래의 순화방에서 대대로 살던 서인 자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백악사단(白岳詞壇)이라고 일컫는데 겸재는 바로 이 백악사단 출신입니다.”
▼ 서양의 살롱문화처럼 일종의 유파가 형성된 셈이군요.
“이후에 겸재를 존숭하는 일군의 학파가 형성됩니다. 겸재가 1676년생인데 170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겸재 아들 세대쯤 되는 성리학자들이 겸재를 추종합니다. 겸재 그림 애호 세력들이지요. 겸재가 그림을 그리면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빌려 보기도 하고.….”
▼ 일종의 후원자 역할을 한 셈인가요.
“그 후원자들의 중심에 영조가 있었어요. 영조는 자신이 겸재의 그림 제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겸재가 현재 경복고 자리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영조가 출궁해서 나간 자리가 창의궁 자리예요. 당시에는 왕자가 장가가면 나가 살아야 했는데 숙종이 왕자궁을 마련해준 거지요. 13세 때부터 영조 명의로 해줬는데 영조가 거기를 가끔 드나들면서 겸재에게 그림을 배웠어요. 숙종이 영조가 16,17세 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잘 그린다’며 매번 칭찬하면서 제화시를 써주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요? 영조는 왕이 된 뒤에도 평생 겸재를 호로 불렀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스승으로 대우한 거죠.”
조선왕릉 조사를 통해 진경시대 확인
▼ 숙종부터 영조에 이르는 125년간을 ‘진경시대’로 명명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에는 일목요연하게 진경시대를 설정할 자신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이랬을 것이라는 가설만 세웠을 뿐이지 실증할 형편이 못되었지만 간송미술관에서 겸재 그림을 접하면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 간송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이 진경시대의 작품들을 수집한 겁니까.
“간송 선생은 일제 식민지 초입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전망이 요원해 보이니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수집한 거지요. 그런 영향을 미친 분은 3·1운동 당시 33인 중 한 분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1864~1953)이었습니다. 간송 선생의 부친과 위창은 동시대인이었고 간송은 막내아들로서 나이로는 위창의 손자뻘이었는데 고희동 선생이 위창과 간송 선생을 연결해주었어요. 간송 선생은 휘문고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미술선생이 고희동 선생이었어요.”
▼ 겸재가 그린 그림을 통해 간송 선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군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없지요. 겸재의 작품을 보면서 간송 선생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경시대란 이름을 붙이려면 한 시대 문화 전체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1977년부터 조선왕릉 조사를 시작했어요.”
▼ 왕릉 자체보다는 왕릉에 있는 석물(石物) 등을 통해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까.
“한 가지 주제를 통해 조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아, 왕릉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조선왕릉이 잘 보존돼 있으니까. 왕릉을 통해 시대 양식의 변천을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기록도 거의 다 남아있고요. 예술 양식이 드러나니까 서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죠.”
▼ 진경시대에 한정해서 보면 왕릉 석물의 양식 변화와 서화의 양식 변화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진경시대의 왕릉 조각도 사생조각이에요. 서울 사람들 모습 그대로예요. 이전의 조각들은 서역인 등 기괴한 모습이었는데 진경시대에 오면 아주 사생적인 조각을 해요.”
▼ 이미 ‘진경’은 그 시대의 정신이었군요.
“왕릉의 석물조각을 보면서 내 가설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경시대라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설정했어요.”
▼ 한두 명의 천재 작품을 보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군요.
“조선시대 전체를 다 조사해서 결론을 얻은 겁니다. 100년 전후로 달라지는 문화현상을 확인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왕릉을 답사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아, 이거구나’ 하면서 통쾌하게 웃은 거지요. 그 후 기록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진경시대는 최 실장을 중심으로 한 간송학파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제자가 참여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미대 교수들도 있었고 음대 교수도 있었다. “진경시대에는 악기도 우리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겸재 연구에서 미진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회가 되면 한 권을 더 낼 생각입니다. 겸재는 자신은 인물화를 못 그린다면서 누가 부탁해도 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보다 10년 후배인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 1686∼1761)이 더 잘 그린다면서 자꾸 떠넘긴 거지요. 관아재도 자신감 있게 겸재의 양보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인물화도 겸재가 더 잘 그렸어요. 진경산수화에 나타나는 작은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려내거든요. 그래도 인물화를 그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사대부로서 수치스럽기 때문이었어요. 왕의 얼굴인 어진을 그리게 되면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려야 되니까요. 영조도 겸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진을 그릴 때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겸재를 제외시켜줬어요. 그런데 겸재 말년이 되면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화가 중에 겸재보다 유교 경전에 더 밝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서삼경 칠서를 뒤돌아서서 보지 않고 암송했다고 하니까 유학 성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겸재보다 더 능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꾸 그려달라고 하니까 고사도를 그렸는데 거의 조선식으로 그렸어요.”
▼ 어떤 유의 그림이든 진경정신을 살리려고 애쓴 겁니까.
“사대부가 아니면 새로운 화풍을 창조는 못해요. 화원의 화가들은 그냥 답습하는 거죠. 진경풍속화를 겸재가 창안해내니까 단원과 혜원이 계승해서 완성시키잖아요. 진경산수화는 겸재가 창안해서 완성시킨 겁니다.”
신선과 고승 그린 도석화에도 진경정신 배어
10월18일부터 간송미술관은 도석화(道釋畵) 특별전을 열고 있다. 어떤 전시회일까.
“도석화는 신선과 고승을 그린 것인데 예배 대상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그려진 거지요. 중국에서 시작되어 오래된 것인데 종교가 대중화하면서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지요. 가정에서 감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염원도 담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것들인데 중국 것도 비교 대상으로 몇 점 있어요.”
▼ 감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조선 전기는 중국풍이 그대로 배어나요. 진경시대에 오면 겸재 것부터 풍속적인 도석화로 바뀌어요. 우리 모습을 그리기 시작해요. 승려나 노인을 우리 모습대로 사실적으로 그려요. 단원에 이르면 완전히 우리 이웃 사람 모습으로 그려요. 달마대사도 코가 높고 눈이 둥근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절에 있는 어떤 스님 모습으로 보여요. 신선 모습도 중국에선 문어처럼 그렸는데 평범한 우리 모습으로 그려요. 평범하면서도 기품 있는 사대부처럼 그려요. 혜원에 이르면 완전히 풍속도로 바뀌지요. ‘혜원전신첩’속에 도석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승려들이 등장하는데 거의 희화적으로 그려놓았어요. 그것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했어요. 겸재, 단원, 혜원 등의 작품이 다 나오는데 특히 단원 것이 많이 나와요. 단원이 신선도나 도석화를 가장 많이 그렸어요.”
▼ 도석화조차 진경시대로 오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지 보여주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추사 이후에 중국풍이 다시 들어오면서 오원 장승업에 이르면 중국풍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미 진경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풍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 청대의 고증학 영향 때문입니까.
“그렇죠. 진경시대를 부정하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니까 우리 고유색을 부정해버리고 새 색을 쓰려고 해요. 추사풍이라는 게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발전적 계승으로 봐야죠. 그대로 뒀으면 고증학으로 인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것인데 그즈음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겸재가 잡고 있던 발목은 풀어졌는지 묻자 최 실장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가 잡은 발목은 언제쯤 풀리는 것일까. 일흔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년’ 최 실장은 추사 김정희의 세계로 떠나는 긴 여행을 위해 옷고름을 다시 매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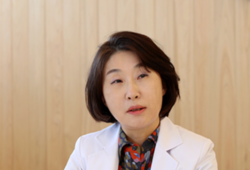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