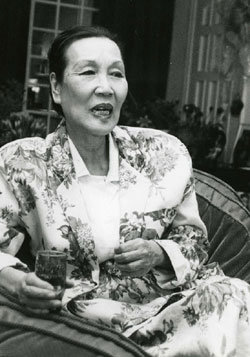
이 씨는 2003년 천 화백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부터 그의 작품 관리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대리인. 2007년 전시관 건립 당시 고흥군과 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양측은 “천경자전시관 설치와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을 만큼 우호적으로 작품을 주고받았다. 이 씨는 고흥종합문화회관 내 한 구역을 전시관으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55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왜 전시관 폐쇄를 사실상 확정짓고 작품 반환 조건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이 씨는 “모든 것은 고흥군이 전시관 설치 당시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비롯됐다”고 했다.
청소도구함에 작품 보관
애초 고흥군에 천 화백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건 이 씨였다. 2005년 고흥군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설치를 포기할 즈음, 2007년 이번엔 고흥군에서 연락이 왔다. 군립화랑에 천 화백의 이름을 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공공장소에 어머니의 이름만 쓰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드로잉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고향에 어머니를 기념하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판화를 포함해 작품 66점과 개인 소장품도 기증했지요. 하지만 고흥군은 전시관 운영 과정에서 번번이 기증 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어머니 작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증협약서에는 ‘을(천경자)은 갑(고흥군)이 본 협약서의 내용을 위약할 경우에는 기증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고흥군이 즉시 작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은 2010년 6월, 미국 뉴욕에 사는 이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전시관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그해 11월 이 씨가 고흥군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에는 “제가 직접 전시실을 방문했을 때 교체되었다는 조명등들이 작품에 해를 입히는 할로겐 전구인 것을 보았고 전시관 구석에 키가 큰 화분들이 그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관에 전시 못한 두 작품이 청소용품 등을 넣는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씨는 “원래 설치한 조명 장치는 전시장에 쓰도록 제작된 특수 전구였다. 그런 걸 설치한 뒤에도 혹시나 뒤에 문제가 생길까봐 협약서에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정한 설치 디자이너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고흥군이 이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구를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40~50년 된 어머니의 드로잉 작품들이 뜨거운 조명 때문에 다 상했어요. 이제 어디 전시도 못합니다. 어머니 작품을 신문지로 싸서 청소도구함에 넣어놓은 것도 용납할 수 없고요. 협약에는 ‘고흥군이 양도받은 작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걸 위반한 거죠.”
이때 이 씨는 처음으로 고흥군 측에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작품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고흥군의 답변은 “협약 불이행에 다른 작품 반환 요청을 하셨는데 작품 훼손의 사유가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주시면 그 근거로 기증 작품 반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기증 작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흥군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분노가 인 것도 이때부터다.
“소송 안 걸면 돌려주겠다”
고흥군 역시 당시 이 씨가 목격한 장면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이었다. 전시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신유옥 씨는 “조명 문제는 그렇다. 전시관을 계속 운영하다보니 군데군데 전등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럴 때 새 전구를 사서 갈아 끼운 것이다.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고 했다. 작품을 신문지에 싸서 청소도구함에 보관한 데 대해서는 “그림을 넣어둔 곳은 당초 전시관을 만들 때 수장고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 맞다. 여분의 작품이 하나 있어 거기 넣어둔 것이다. 신문지로 싼 건 그래야 빛 같은 게 좀 막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작품이 청소도구함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는 왜 나온 걸까. 신 씨는 “그 안에 청소도구가 몇 개 같이 있기는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시관에 학예사가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작품 관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한계는 알죠. 하지만 작품 훼손 여부는 육안으로 모르는 거고….”
신 씨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라고 말을 흐렸다.
양측의 갈등은 이처럼 천 화백의 명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시관 운영을 바란 이 씨와 ‘선의’로 관리하면 족할 것이라고 믿은 고흥군의 아마추어리즘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 실수로 어머니 작품을 욕보였다”고 생각한 이 씨가 점점 더 강력하게 작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시관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고흥군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 씨는 “기증 협약에 분명히 위약 사항이 있으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고흥군은 계속 ‘선량한 작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에 작품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다. 작품이 여기 있는데 어떡하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머니 작품을 다 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쪽 화랑 관계자와 함께 3월 말 고흥군을 방문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일체의 소송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이 이 씨에게 보낸 합의서 문안에는 소송 포기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을(천경자)이 갑(고흥군)으로부터 인도받은 작품들은 전부 을이 2007년 6월 8일자 협약(작품 기증 협약)에 따라 갑에게 인도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임을 인정한다’ ‘을은 위 작품들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갑이 현 명칭을 사용하여 을의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 측은 “합의문 문구가 현재 작품이 손상돼 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기증자와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반환하지만 이후 혹시 생길지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씨와 논의해 얼마든지 문구 수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좋은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했다가 마음을 많이 다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머니를 마음대로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쪽이 내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작품을 되찾았다’는 영수증뿐이다. 아무 조건 없이 작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 출신 예술가의 기념관 등을 설립 중이다.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제2, 제3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원 한국미술협회 사무국장은 “천경자 선생뿐 아니라 다른 원로 작가 중에도 기관에 작품을 기증한 뒤 부실한 사후 관리 문제에 서운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 협회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기증 미술품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