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간 도적질’ 표현 지금도 사과할 생각 없다
- 메르스 초동대처 미흡했으나 조기 종식은 좋은 평가 받을 것
-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국민에게 과도한 공포감
- 공적연금·건강보험 개혁해 ‘균형복지’로 가야
- 국회, 부처 이해관계 대립으로 ‘숲’ 못 본다

단골식당보다 더 자주 드나든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지 한 달 후, 그는 정진엽 신임 장관에게 바통을 넘기고 물러났다.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자연인’ 문 전 장관을 만났다. 반포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온 그에게 명함을 건네자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라며 허허 웃었다.
마침 이날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여당과 야당은 문 전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야당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미 국회 메르스 특위 때 들을 얘기를 다 들었다”고 반박했다. 문 전 장관은 “오라는 연락은 못 받았고, 신문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피하는 건 아니고,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리고 떠났다”라고 했다.
우리는 메르스를 몰랐다
▼ 퇴임사에서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제가 외국에 있었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귀국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역학(疫學) 활동을 충분히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굴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랐으니 직무유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과거에 유사한 일을 경험한 바가 없었습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공항 입구에서 막아버렸고, 신종플루는 호흡기 감염이라 역학을 할 수가 없었지요. 역학요원이 34명인데 그중 정규요원은 2명뿐이고, 32명은 공공보건의입니다. 미국에서는 2년간 교육받고 역학요원이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만 교육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스위스 WHO 총회에 참석 중이셨죠. 당시 주무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 초기 대응이 엉켜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글쎄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받았었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지…. ‘만약’에 해당하는 얘기라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월 말~6월 초 메르스 정국의 최대 이슈는 ‘정보 공개’였다.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6월 7일이 돼서야 명단을 공개했다. 그사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4번 환자’와 밀접 접촉한 ‘35번 환자’의 동선(動線)을 공개했다. 35번 환자가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재건축 조합원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르스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 당시 서울시 기자회견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재건축 조합원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확대된 매뉴얼을 적용하더라도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기자회견 전에 서울시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이 제게 ‘당신은 두 가지와 싸워야 한다.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공포’라고 했습니다. 공포와 싸우는 것…곧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공포는 심어줘선 안 돼요.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 국민에게 과도한 공포심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훗날 상당한 평가 받을 것”
▼ 서울시 기자회견 사흘 후에야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뒷북’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부러 늦춘 게 아닙니다. 발표 전에,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의 전화를 담당할 콜센터와 의심 증세 환자를 수용할 병원 등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순서잖아요. 이런 준비에 이틀가량 걸렸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긴밀하게 협조가 됐지만, 서울시와는 이때 협조가 잘 안 됐어요.”
▼ ‘국가가 방역을 삼성에 맡겼다’는 지적도 있었죠.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병원 측의 협조 없이 역학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요. 삼성서울병원이 ‘1번 환자’를 확진했고, 아무런 전파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14번 환자도 1번 환자의 경우처럼 합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정부의 역학 활동을 평택에 집중하다보니 삼성서울병원에는 덜한 측면이 있었고요. 역량이 충분치 않았던 건 사실이나 삼성에 역학을 일임한 건 아닙니다. 6월 3일 복지부 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급파돼 협조 체계를 만들었고요.”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9월 초 방한해 “한국 정부는 소통에서는 미진했지만 메르스 대응은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이 밤새워가며 밀접 접촉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도 했다. 문 전 장관은 “한 달가량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 정말 많았다”고 회상했다.
“세종시 청사에 마련한 대책본부에서 하루 세 끼 도시락만 먹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도 일 터지면 대응하고…. 중동에서 귀국한 사람에게 발열 증세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인덱스 환자(감염 확산의 원인과 과정을 보여주는 환자)가 발생하나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0이 되더니 일주일째 계속 0이더라고요. 꿈같으면서도 이러다 또 한 명이라도 새로 나올까봐 전전긍긍했고요. 아무튼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태가 마무리돼 다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신문에 ‘한국은 메르스를 3개월 만에 막았는데, 사우디는 3년이 지나도 아직 못 막았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하더군요.”
그는 “초기 대응은 미숙했지만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조기에 메르스 사태를 종식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환자들을 직접 보살펴준 간호사들의 희생정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급여만 올리자? 무책임하다!”
문형표 전 장관은 연금정책 전문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연금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줄곧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금 및 복지 정책을 연구해왔다. 그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깜짝 발탁됐을 때, 세간에선 그를 여야 사이 갈등이 많았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구원투수로 해석했다.
▼ 최근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마다 정책적 선택이 달라져야 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안전망보다 경제 발전에 재정을 집중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부(富)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방향의 재정 정책이에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늘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는 논쟁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제도는 불균형 구조예요. 취약계층의 혜택은 최소화한 대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잘돼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취약계층 복지를 늘려 ‘균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요.”
▼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엔 반대합니까.
“소득대체율 40%에서도 낸 만큼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4%가 돼야 해요. 그런데 현행 보험료율은 9%죠. 즉, 5% 정도는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오는 셈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선 보험료율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소득대체율 상향만 얘기하지요. 더욱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이미 소득대체율이 5~10%포인트 올라간 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부채를 다 합치면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에는 눈감은 채 급여를 올리자니,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연금 학자들은 이걸 ‘세대 간 불형평성’ 또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5월 그는 국회에서 야당을 향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발언했다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도적질’ 소동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편을 다시 논의할 때 문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야가 약속하고 일단락됐다고 한다.

문형표 전 장관이 인터뷰를 마친 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국회 앞에 잠시 섰다.
“감정이 격해져서…”
▼ ‘세대 간 불형평성’이라는 점잖은 표현도 있는데 왜 굳이 도적질이라 했습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도 밖에서 열심히 지원했고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낮춘 거죠. 그래놓고 갑자기 정책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제 아들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은 못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세대라고 우리 좀 편하게 살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떠넘깁니까.”
▼ 여전히 ‘도적질’ 발언에 대해선 사과할 뜻이 없나봅니다.
“표현이 과격했다면 유감이지만, 신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도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살 테니 걱정할 거 없다’고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하고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언급했듯, 독일처럼 우리 국회 안에도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 환경 등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할 때 현재의 유권자에게만 유리한 방안을 좇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뜻에서다.
▼ 지난 1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발표를 전면 백지화한 배경은 뭔가요.
“우선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 태스크포스(TF)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마련한 여러 대안을 발표하려던 것인데, 그게 정부안인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 안을 공개하진 않고 복지부가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복지부는 ‘완전 형평성’이나 ‘소득일원화’ 등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행정적으로 신중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에요. 신임 장관께서 잘 마무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장관들 중 유난히도 야당과 설전을 자주 벌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가 아직 복지의 ‘방향’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그는 “야당 의원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경제학자가 복지를 망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보편’ ‘선별’ 아닌 ‘맞춤형’
“복지와 경제는 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건데…. 재정이나 저출산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무작정 복지를 누리자고 하는 게 맞습니까?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옛날 얘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주는 맞춤형 복지가 21세기의 복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는 보편이 아니라 획일인데, 이 둘을 혼동하는 이가 많은 것 같아요. ‘행복e음’을 아세요?”
▼ 행복e음?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름이에요. 세계 유일의 모형이라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전 국민의 모든 정보를 집대성했는데, 복지부가 관할하고 모든 부처가 사용합니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진 셈이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국민의 건강 정보가 몇 십 년간 누적돼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맞춤형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요.”
연구실 밖으로 나와 ‘현장’을 겪은 소회에 대해 그는 “국회, 그리고 부처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첨예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때가 많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자고 했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목소리 큰 집단에 의해 주도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잦았다”고 덧붙였다.
▼ 파란 많았던 장관 생활을 정리한다면.
“유익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해 송구스럽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를 도입했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만, 아무래도 메르스 임팩트가 크겠지요. 중동과의 교류는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메르스는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도 있고요.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제대로 짜길 바랍니다.
학자로서는 평생 연구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 주제를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얻었습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과 ‘연구 경쟁’을 벌일 자신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은 없지만, 학자로서 국가에 도움 되는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관 때 치아 4개 빠져
올해 초 정부는 11년 만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담뱃값 인상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37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기로 하고 동아일보에 금연일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기자 주변의 흡연자들은 그가 여전히 담배를 끊은 상태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나라면 다시 피웠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 여전히 금연 중이신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처음 3년간은 ‘금연했다’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있다’고 말해야 한대요. 그 말이 맞죠. 어떤 분은 담배연기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까지는 금연에 성공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아직 담배연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진 않네요(웃음)….”
메르스 사태 때 남몰래 담배 피운 적은 없느냐고도 물어봤다. 그는 “자꾸 캐묻지 말라”며 손사래 쳤다. 1년 9개월간 장관 자리에 있으며 이가 4개나 빠졌다는 그다. ‘금연 수행’ 도중에 몇 개비 태웠다한들 누가 탓할 수 있으랴. 인터뷰가 끝난 후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그는 “국민이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고 격려도 해주신다”며 “메르스 덕분에 정말 유명해지긴 했나보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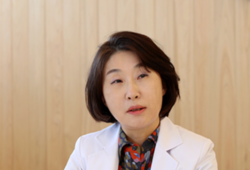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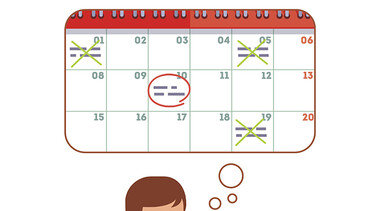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