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산업훈장을 받은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포넷(E4NET)이다. 이포넷은 ‘벤처’라는 말조차 낯설던 1995년 기업 간 전자 상거래(B2B) 시장에 진출해, 현재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10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서 만난 이포넷 창업자 이수정(48) 대표는 “내 꿈은 세계에서 1등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하면 바로 ‘이포넷’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포넷의 사업은 크게 두 분야다. 먼저 IT서비스. 이포넷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관리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기술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의 정보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IT 자원을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는 ‘IT거버넌스’ 시장을 선구한다. 롯데카드, BC카드 등 금융회사 인터넷 시스템 개발도 맡았다.
또한 이포넷은 소프트웨어를 다국어로 번역하는 사업도 한다. 해외 IT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상품 매뉴얼부터 세부 내용까지 모두 한글로 바꿔야 한다. 이포넷은 사업 초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는 사업을 맡았고 현재 구글, 오라클, HP, IBM 등 글로벌 IT기업의 주요 제품을 한글화하고 있다. 이밖에 LG전자, 아이리버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한국어 매뉴얼을 영어로, 영어를 다시 60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도 담당한다.
창업 15주년이던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이포넷은 ‘전화위복’의 결과물이다. ‘BC카드 여성 최초 대리’였던 이 대표는 신생아 때부터 아픈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그가 사표를 낸다는 소문이 나자 동료들은 “아르바이트나 하라”며 일거리를 챙겨줬다. 이 대표는 “혼자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은 다행히 아이가 건강하다”며 웃었다.
아픈 아들 돌보려 창업
그때 들어온 일 중 하나가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기업 삼성SDS와 협력해 조달청과 거래하는 일이었다. 그는 “작은 회사로선 상상도 못할 큰일이지만 국내에 IT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때 내가 이전 직장에서 데이터 및 문서 표준화(EDI), B2B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회상했다.
이포넷이 ‘IT거버넌스 1인자’가 된 계기를 살펴봐도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2003년 IT거버넌스의 개념이 없을 때 이포넷은 삼성증권의 IT를 통합·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IT거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해뒀다. 2005년 “3년 평균 정보화 예산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은 IT거버넌스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법이 제정되면서 갑자기 IT거버넌스 시장이 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기관의 절반 이상이 이포넷의 IT거버넌스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귀띔했다.
회사 규모를 차근차근 키워가던 2002년, 이포넷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포넷이 번역해 MS에 납품한 파일이 ‘님다 바이러스(nimda-virus)’에 감염된 채로 전 세계에 유통된 것. 님다 바이러스는 컴퓨터 내 주소목록을 뒤져 무차별로 바이러스 e메일을 전송하고, e메일 서버를 다운시키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다. 이 대표는 “당시 님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백신은커녕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납품했다. 이포넷의 실수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으로 MS는 9시 뉴스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MS 전 제품을 리콜했다. 그리고 이포넷과 더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으로 이포넷은 휘청했다. 매출 70%를 차지하던 MS 관련 사업을 못하게 됐고, MS 협력사와의 거래도 끊겼다. 직원 20%가 회사를 떠났고, 이 대표는 스트레스로 근육마비까지 겪었다. 그는 “꼭 영화 속 장면처럼, 사업 망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어린 자식 5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 같았다”며 “내 자식 같은 직원들을 위해 회사를 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파트너를 찾았다. 사건을 해명했고 신규 거래를 부탁했다. 그는 “MS와 거래하며 콧대 높던 이포넷은 잊었다. 단가도 낮추고 저자세로 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시기 신규 인터넷 업무 협력사를 찾던 BC카드가 이포넷에 사업을 맡기면서 수익은 금방 회복됐다. 그는 “MS는 우리와 업무를 끊은 지 2년 후 정책을 바꿔 지역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업체에 일괄적으로 일을 맡겼다”며 “오히려 우리 업체는 MS 계약 해지 2년 전에 저자세로 파트너를 만들면서 시장에 적응했다. 지나고 보니 님다 바이러스 사건은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됐다”며 웃었다.
정부도 소프트웨어 제값 주고 안 산다

10월5일 20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서 이포넷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유일하게 산업 훈장을 받았다.
“IT거버넌스가 법제화됐으면 각 기관이 우수 벤처에서 IT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행정안전부가 무료 IT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했어요.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벤처는 죽으라는 거죠.
당시 정부에 우리 제품을 팔러 가면 ‘공짜 있는데 왜 사느냐’고 하거나, ‘성능이 우수한 건 알지만 어차피 공짜도 있으니 20% 가격에 판매하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애써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값 못 받고 팔았죠. 그러다보면 회사도 직원 2명 쓸 걸 1명만 쓰게 되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에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벤처’라는 말도 익숙지 않을 때 회사를 창업한 그는 최근 ‘제2의 벤처붐’을 보며 벤처 후배에게 당부하고픈 점이 많다. 그는 “부채는 최소화하고, 현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투자나 융자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IT회사는 영업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IT업계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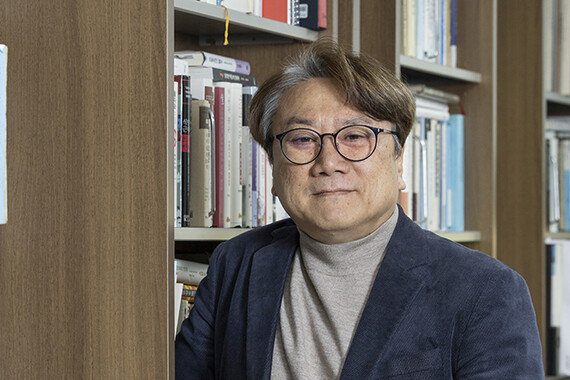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