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1990년대 초에 한 남자 선배가 “쇼핑 갈 때 같이 가자”며 슬쩍 따라와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자신의 낙타색 코트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 몇 년 뒤 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와 수다를 떨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흰색 셔츠의 칼라 크기와 모양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 집 칼라는 말야, 너무 거대해. 그런데 그걸 나보고 사라는 거야. 작은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참, 그 구두는 스티치 없는 것을 갖고 왔기에 환불해버렸지.”
오홋,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다. 그 시절에 그는 셔츠에서 칼라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갖는지 알고 있었다. 한순간에 그가 좋아졌다. 역시나, 그는 지금 한 패션지 에디터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메트로섹슈얼에 대한 기사가 전세계 언론을 휩쓰는 요즘, 남자 쇼퍼홀릭도 많아졌다. 이들은 구두 한 켤레 사면서 구두 브랜드의 역사와 자신의 미학적 관점, 가죽의 특성, 남자 셀레브리티들의 취향과 습관에 이르기까지 엑셀 표처럼 나열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지친다.
남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의 단골 구매자란 건 수치로 나온다. 남성패션지를 보면 남자 ‘지름신’이 이 달에 어디로 강림하는지 알 수 있다. 구치 리미티드 에디션(한정 판매) 토트백,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바지, 흰색 스니커, 그게 그거 같은 다양한 아이팟, 언감생심 스포츠카에 싱글몰트위스키라. 남자들의 인생도 참 버라이어티하군. 아, ‘저의 패션 바이블(잡지)을 내다 버리라는 부인 때문에 고민’이라는 독자의 편지도 있다.
최근 내게 깊은 인상을 준 남자 쇼퍼홀릭은 ‘꽃가라’라는 별명이 붙은 59세 중년 사업가다. 부인 몰래 틈틈이 쇼핑 다니는 맛에 산다는 그는 한국 남자들이 거부하는 것들만 사서 입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전신이 ‘튄다’. 그는 남자 배우들의 스타일링을 열심히 봐두었다 그대로 입었다. 한때 그는 조인성과 똑같은 차림이었는데, 믿을 수 없는 건 나름대로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그는 ‘멋지다’는 말 듣는 걸 좋아한다. 얼마 전 꽤 터프한 시계가 어떤지 물어봐서,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행복해했다. 세상엔 이런 남자들도 있다. 한자리 얻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겨진 양복과 인생으로 흉하게 발버둥치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골프를 하느니 폴 스미스의 ‘꽃가라’ 슈트 입고 와인이나 마시겠다는 멋쟁이들도 있다. 나는 물론 후자의 남성들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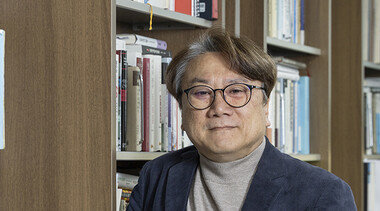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