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박진영
산보를 나왔던 아이는 목마를 태운 엄마가 무릎을 꺾을 때마다
가늘게 나부끼고 있었네
여름을 가로챈 봉우리가 화려한 모조 열매를 전시했다
손가락들이 정상을 지목했지만
눈의 두께를 재는 얼굴을 치켜들지 못해서
연인들은 키스를 미루고 몇 마디 안부로 입을 맞추었다
어두운 어깨를 감싸고 체온을 유지하던
손바닥들은 에이포 용지처럼 겹쳐져 달빛의 노래를 복사했네
밀봉된 공기를 터뜨리듯 사람들은 새들을 띄웠지만 탕, 탕,
메아리로 돌아오는 총성
두 눈만 믿어선 안 돼요
연인들은 서약을 미루고 몇 마디 당부로 입을 맞추었다
눈 먼 사냥꾼들이 공중의 산성에서 잠복 중인 계절
한 걸음 오를수록 대화는 희박해져 숨통을 얼리고
끝없는 설원 위에 우뚝 멈춘 누군가 허공의 틈새로 흘러내렸다
그는 사라졌고 우리도 그에게서 사라졌을 뿐
입이 무거운 그는 비명조차 없었네
우리도 각기 다른 크레바스를 타고 떠내려 온 전생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구름의 크레바스를 통과한 노인들은 숨소리를 아꼈고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곡예사들은 날개를 물려주지 않고 이민을 갔다
악몽을 토하듯 고개를 내둘렀지만
목 잘린 새들이 전염병처럼 산을 덮을 뿐
산 밖으로 신음은 새지 않았고
|
눈이 녹을 때까지 새를 날리는 행렬은 쉬지 않았고
죽은 나무들의 검붉은 뿌리털이 땅속의 내장을 휘감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기다란 버스가 산 하나를 통째로 싣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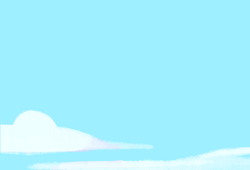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