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3/8d/79/fb/638d79fb07d0d2738276.jpg)
[Gettyimage]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이력서의 빈칸에 기재하던 정보를 모두 빼고 나니,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캄캄해졌다. 깨달았다. 평생 나로 살아왔으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라는 시험지를 앞에 두고도 아무 답을 적을 수 없는 마음이 조금 슬펐다.
그러던 어느 날, 팟캐스트를 듣다가 단순명료한 자기소개법을 발견했다. 문학가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누는 팟캐스트 ‘문장의 소리’에서는 첫 만남에 평범한 듯 특별한 자기소개를 권한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나요?”라고 묻고, 게스트들은 각자 답했다.
저는 잠을 좋아하고 기상을 싫어합니다.
저는 집을 좋아하고 먼 곳을 싫어합니다.
저는 입금을 좋아하고 마감을 싫어합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싫어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마스크를 싫어합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설거지를 싫어합니다.
저는 은근한 걸 좋아하고 애매한 걸 싫어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단순한 호오(好惡)를 묻고 답할 뿐인데 대답한 이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묵직한 소설을 쓰던 소설가도, 어려운 시를 쓰던 시인도, 멀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이 성큼 다가와 친근해졌다. 당신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저걸 싫어하는 사람이군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도 좋아하면 손뼉을 치며 호들갑 떨고 싶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가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걸 그가 좋아하면 바짝 다가앉아 얘길 들어보고 싶어졌다. 내가 싫어하는 걸 그도 싫어하면 슬쩍 눈을 마주치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싶어졌다. 한마디로 마음이 활짝 열렸다.
나를 설명하는 것 ‘호오(好惡)’
호감을 느낀 대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던 걸 생각하면 사람이란 참 단순하고 귀여운 존재. 좋고 싫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친해지다니. 크레파스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장난스럽게 그려보는 아이들 같다. 나도 그럴듯한 사회 옷들일랑 훌훌 벗고서 좀 즐겁고 홀가분하게 나를 소개하고 싶었다. 곰곰 생각해 두었다가 언제든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한다고 얘기해 봐야지.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내가 좋아하는 것들 : 책. 아침. 숲. 바다. 크루아상. 걷기. 캠핑. 포옹. 뒷모습. 종이. 나뭇잎. 돌멩이. 따뜻한 커피. 초콜릿. 샐러드. 나무로 만든 책상. 산책. 골목. 코트. 커다란 나무. 웃음소리. 티타임. 나란히 누워 자기. 여름밤. 피아노. 라디오. 조용한 공간. 책방. 새벽. 해 뜨는 아침. 해 질 녘 바다. 노을. 눈 내리는 아침. 비 내리는 낮. 비 갠 뒤 산책. 군더더기 없는 셔츠. 거의 모든 종류의 스웨터. 청바지. 내 발에 편한 운동화. 장난치기. 반짝 켜지는 가로등을 목격하는 순간. 부드러운 이불. 5년 일기장. 밀린 일기 쓰는 시간. 규칙적인 일상. 한 접시 식사. 따뜻한 음식.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가 싫어하는 것들 : 텔레비전. 막 어둠이 내린 쓸쓸한 저녁. 바닷물. 다툼. 미지근한 커피. 민트초콜릿. 고수. 똠얌꿍. 파인애플 피자. 차가운 책상. 여행. 8차선 도로. 술. 술 취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소음. 쇼핑몰, 호텔. 리코더. 다섯 이상 홀수 명의 모임. 낯선 사람과의 식사. 미세먼지. 불편한 옷. 앙고라 스웨터. 형광색. 구두. 네 칸 남은 신호등 초록불. 내기하기. 오토바이. 번지점프. 첫 페이지를 잘못 쓴 노트. 갑작스러운 방문. 전화 통화. 초인종. 혼자 먹는 케이크. 혼자 자는 밤.
深深한 마음
의외로 목록 작성은 어려웠다. 좋고 싫음을 말하려면 마음의 척도와 정도가 분명해야 했다. 그런데 단호하게 ‘이것 좋아, 저것 싫어’라고 표현하는 일이 나에겐 대단히 어려웠다. 알고 보니 나는 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한 사람. 호오의 마음 자체가 두루뭉술한 사람이었다. 특히나 좋아하는 것들에 그랬다. 좋아하는 마음의 척도와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나는 푹 빠져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취향이라고 할 만큼 반드시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다. 왜 그런 게 없을까. 내가 너무 맹숭맹숭한 사람 같아서 부끄러웠다. “너무너무 좋아해!” 말하는 사람들. 분명하고 견고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이들이 부러웠다. 열정이라 할 만큼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세계는 빈틈없이 빛나서, 내가 가진 마음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졌다.그런데 호오의 목록을 작성하며 심심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라는 사람은 실은, 스스로 어느 선만큼만, 적당히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의식적으로 마음에 ‘정도’ 혹은 ‘경계’를 두고 있었다는 걸. 무엇이든 지나치게 마음 쏟고 싶지 않았다. 일상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즐기고 싶었다.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나만의 쳇바퀴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빈틈을 지키고 싶었다. 타인에게는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 심심한 마음은, 나 자신에게는 깊고 깊은 심심(深深)한 마음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그랬다.
저는 산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싫어합니다.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고 민트초콜릿을 싫어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좋아하고 텔레비전을 싫어합니다.
저는 스웨터를 좋아하고 앙고라 스웨터를 싫어합니다.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혼자를 좋아하고 혼자를 싫어합니다.
성취와 평가를 걷어내야 보이는 나
한때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약간의 거리를 둔다. 하루의 어느 시간쯤은 나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오래 걷는다. 완벽한 혼자가 됐을 때 에너지를 채운다. 그러나 고요하고 간결하게 홀로 되고픈 마음 한편, 사람들과 깔깔 웃고 수다 떨며 시끌벅적하게 살고도 싶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싫어한다. 혼자를 좋아하고 혼자를 싫어한다. 단순명료하다 믿었던 자기소개도 이렇게 알쏭달쏭해지다니. 사람이란 참 이상하고 복잡한 존재.그래도 좋았다. 나이, 일, 성취, 인정, 평가 같은 것들 하나 없이도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구름 같은 내 마음을 헤집어보고서야 어렴풋이 진짜 마음이 보인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라는 시험지에 꽤 많은 답을 적어볼 수 있겠다. 마지막 문장은 이것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니 그럴싸한 자기소개가 마음에 들었다. “저는 두루뭉술한 걸 좋아하고 지나친 걸 싫어합니다. 좀 심심한 사람입니다.”
고수리
● 前 KBS, MBC 방송작가
● 2015 브런치북 프로젝트 금상
● 2019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 발표
● 동아일보 칼럼 ‘관계의 재발견’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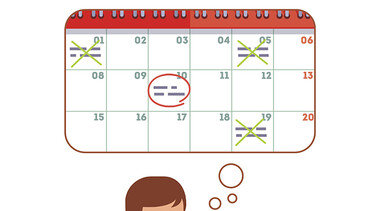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