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양쪽서 환영 못 받는 대통령
요즘 청년세대 정서에 부합하는 행보
‘내 편에 손해’ 사안도 외면 안 해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a/650/0/90/5/ugc/CDB/SHINDONGA/Article/63/d9/c9/c3/63d9c9c313fcd2738276.jpg)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미국 국무부는 가난한 나라의 전도유망한 지도자들에게 자유세계의 번영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마셜플랜의 성공으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유럽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들은 10여 년 전 ‘냉전의 대리전’을 겪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번영을 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든든한 아군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당시 세계는 냉전의 정점을 향하고 있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카자흐스탄의 한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 뒤를 이어 10월 1일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던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핵을 보유한 소련과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재앙이 닥칠 게 뻔했다. 거기에서 비롯한 두려움은 1950년대 매카시즘의 형태로 미국 사회를 뒤덮었다.
김영삼이 미국을 방문하기 2년 전인 1962년 10월,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서 벌어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의 절정에 놓인 사건이었다. 미국 U-2 정찰기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위기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역시 튀르키예 등지에 설치돼 있던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
미국인들은 턱밑까지 닥쳤던 공산주의의 위협을 실감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존 F 케네디 암살 이후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베트남전쟁을 무리하게 감행한 것도 이해 못 할 건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남베트남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통일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 여파가 주변국에도 미칠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1년간 엄청난 희생과 군비 지출을 감수하면서 베트남에 개입했다.김영삼은 1964년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전혀 다른 걸 보았다. 그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독자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중국을 승인, 수교를 맺은 것과 소련의 흐루쇼프가 동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접점을 넓히려 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세상은 이념보다 경제력이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했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김영삼은 깨어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4개월간의 여행을 통해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귀국 후 이 제목으로 책을 냈다. 나는 김영삼 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이 책을 현대에 맞게 윤문하고 해설을 붙여 ‘YS 세계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새로 내게 됐다.
사실 김영삼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보수층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진보층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꼽는다. 김영삼은 보수·진보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보수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결이 다른 까닭에 본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진보에서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배신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역대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김영삼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김영삼만큼 굵직한 성과를 남긴 대통령도 드물다. 김영삼 정부의 대표 치적으로 꼽히는 하나회 척결이나 금융실명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정보통신부를 설립하는 등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비록 말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김영삼만큼 업적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없다. 성과와 평가 사이의 이와 같은 괴리는 내가 김영삼이라는 인물에 호기심을 갖게 된 이유였다.
김영삼의 정치 행보는 요즘 청년세대의 정서와 부합하기도 한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화끈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자기 재산을 공개하며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밀어붙인 게 대표적이다. 당시 박양실 보건사회부 장관, 허재영 건설부 장관, 김상철 서울시장 등이 부정 축재 시비에 휘말려 줄줄이 옷을 벗었다. 그는 “토사구팽”이라는 아우성에도 끝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안착시켰다.
청년들은 전통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다. 진보와 보수가 박빙으로 맞붙은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까지만 해도 이들은 진보 진영의 든든한 우군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적잖은 청년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대남 현상이 워낙 주목받아 가려지긴 했지만, 보수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층 여성들로부터도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이 진보 진영에서 이탈한 이유로는 불공정과 내로남불, 젠더갈등 등이 꼽히지만 사실 검찰개혁처럼 이념 중심 이슈에 천착했던 방향성 자체가 문제였다. 민생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에 “광주 정신에 위배된다”고 맞받아친 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보수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년들은 보수정당이 과거 자유한국당처럼 극으로 치닫는 걸 경계한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와중에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옹호하는 민주당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북한이라면 입에 게거품 물고 열을 올리는 보수 세력에도 반감을 느낀다. 그저 상식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합리적 대응을 하길 원할 뿐이다.
김영삼 정부 때보다 퇴보한 정치
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도 진보쯤으로 규정한다.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정부가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해내길 원한다. 그런 내게 사람들은 ‘왜 김영삼을 좋아하느냐’ 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내 편에 손해인 사안이라고 비겁하게 외면하지 않았다. 기득권의 거센 반대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용기 있게 관철했다. 김영삼은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사회의 부조리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한 진정한 개혁가였다.최근 들어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진영의 이익을 지키느라 우리 사회에 산적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30주년이 됐지만, 정치는 외려 그 시절보다 퇴보한 듯 보인다. 이런 시대에는 다시, 김영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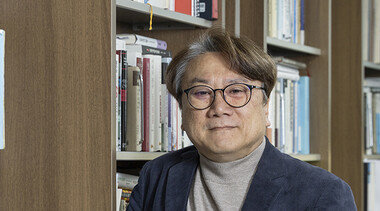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