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론<br>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자유’를 사실상 처음 철학적 원리로 체계화해 세계 지성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는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가 1859년 세상에 내놓은 ‘자유론’(원제 On Liberty)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전범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각별하게 강조하는 자유는 ‘사상의 자유’다. 모든 자유는 사상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밀은 자유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의식의 내면적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가 그것이다. 내면적 자유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절대적 자유가 포함된다. 단결의 자유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들어 있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는 통치 형태가 어떠하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밀은 웅변한다. 밀은 자유의 원칙은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
이 책은 또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로 나누고, 행동의 자유를 다시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자유로 세분한다. 어느 경우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라고 역설한다. “개인의 행동 중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 반대로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밀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진리를 찾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는 여기서 유명한 말 하나를 남긴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는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경종을 울린다.
밀은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이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론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견에 대한 판단 오류는 무오류의 독단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세상 앞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밀은 어떤 사상도 절대적일 수 없다며 자신의 저술이나 사상에 대한 신성시조차 거부한다.
그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옳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 첫째, 권력이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 이를 탄압하는 것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무오류라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도 탄압은 널리 인정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인식하는 수단을 앗아간다. 셋째, 일반적 사회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일 경우에 대한 탄압은 그것에 의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경합하는 의견들의 과정에 대한 간섭이다.
그는 다수의 횡포가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무섭다고 말한다. 밀은 소수 의견을 발표할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셋째, 여론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토론을 통한 검증이 없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치우쳐버릴 수도 있다. 넷째, 통설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토론이 없다면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의문부호
‘자유론’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개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그것이 신의 의지나 인민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공언된다고 해도, 모두 전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은 국민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도 천명했다. “전체적 국가 교육은 오직 국민을 틀에 집어넣어 서로 너무나 흡사하게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을 정형화하는 틀은 결국 국가권력을 장악한 우월한 세력(군주건, 승려계급이건, 귀족계급이건, 현재 대중의 다수파이건)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효과와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국민의 정신에 대한 압제가 확립되며, 그 압제는 자연의 추세로서 국민의 육체에 대한 압제를 유발한다.”
밀이 ‘자유론’에서 당시 중국을 분석한 걸 보면 매우 흥미롭다. “중국은 한때 놀라운 재능과 지혜를 과시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난 현자와 철학자들이 명예와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런 민족이라면 계속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야 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그들은 정체됐고, 그 정체는 몇 천 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중국이 제자리에 머무른 이유로 단 한 가지를 들었다.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규칙에 따라 통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소신도 펼친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알랭 드 보통이 남녀관계의 해결사로 ‘자유론’을 내세운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국민에게 다른 구두를 신으라거나, 어떤 책을 읽으라거나, 이를 치실로 닦으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듯이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알랭 드 보통은 익살을 섞어 얘기한다.
‘자유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옳다고 하긴 어렵다.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미숙자나 미개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한 대목에는 제국주의 의식에 따른 편견이 담겼다. 밀이 식민지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전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식민지의 전제적 지배를 합리화한 것이었다.
공동체주의 밑거름
밀의 자유주의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기업 규제 완화와 정부의 경제 개입, 복지제도의 감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후세의 일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자유론’에 대해 자본주의 특유의 건강성을 해쳐 오히려 체제를 약화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책의 문제점은 몇 가지 의문부호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행동을 순수하게 개인만 관련된 행동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처럼 확연하게 구분되는 행동이 있는가? 있다면, 그런 구분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유론’은 같은 해에 서구인의 의식 궤도를 바꾼 다른 책 한 권과 더불어 출간돼 시너지효과를 불러왔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그것이다. ‘종의 기원’이 기독교 중심의 서구세계를 과학 중심의 세계로 전환했다면,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길을 밝힌 횃불과 같았다.
‘자유론’은 세계 지성사는 물론 정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현대 자유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인류는 밀이 인도한 방향을 따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헌법에 신체, 직업 선택, 양심, 종교, 언론·출판·집회·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해 ‘자유론’의 정신을 구현했다.
이 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단골로 인용되는 고전이기도 하다. 우리가 왜 비효율과 무질서를 감내하고서라도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충분하게 논증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론’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세계, 자유국가의 성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유론’은 공리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켜 공동체주의의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같은 스타급 학자들도 밀의 상속자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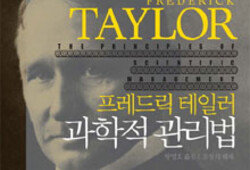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