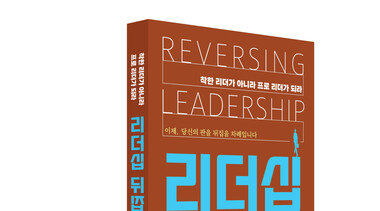2만 화교, 한국에서 나고 자라 용모도 다를 바 없지만…“너희는 외국인”
母國 대만에서는 ‘한국인’ 취급
취업 어렵고, 취업해도 업무상 차별 겪어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 확대하는 개헌에 기대
![인천 중구 북성동 및 선린동 일대의 차이나타운.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a/e1/39/6c/5ae1396c203ad2738de6.jpg)
인천 중구 북성동 및 선린동 일대의 차이나타운. [동아DB]
알베르트 카뮈의 대표작 ‘이방인’의 첫 문장이다. 소설은 주인공 뫼르소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이방인’은 카뮈 자신이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사회에서 ‘피에 누아르(Pied-Noir)’라 불렸다. ‘검은 발’이란 뜻이다. 혈연상 프랑스인이지만 당시 식민지이던 알제리 태생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늘 카뮈를 따라다닌 콤플렉스였다. 프랑스 주류 사회는 그에게 경원(敬遠)의 시선을 보냈다. 카뮈는 평생 프랑스 사회의 이방인이었다.
한국에도 오랜 세월 한국인과 부대끼며 살아왔음에도 ‘태생적 한계’로 평생 이방인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모, 언어, 습속(習俗)에서 보통 한국인과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다. ‘화교(華僑)’다.
화교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들과의 동화(同化)를 여전히 거부한다. 멸시는 줄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이 속에서 화교들은 숨죽이며 살아간다. 화교 연구의 권위자 왕언메이(王恩美) 국립대만사범대학 교수(동아시아학과)는 한국 현대사 속 화교사(史)를 ‘구속과 억압의 역사’라 정의한다.
중화를 뜻하는 ‘빛날 화(華)’와 ‘타향살이 교(僑)’가 합쳐진 화교는 재외 거주 중국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청(淸) 말 개혁사상가 정관응(鄭觀應)이 이홍장(李鴻章)에게 보낸 문서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교민(僑民)’과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1909년 청나라 정부와 1929년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는 헌법에 “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화교라고 부른다”고 규정했다.
산둥성에서 온 사람들
서울지하철 1호선의 서쪽 끝, 인천역에 내리면 한자로 ‘중화가(中華街)’라 쓴 편액이 걸린 중국식 대문이 보인다. 한국 유일의 ‘공식’ 차이나타운이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다. 약 130년 전, 이곳에 화인(華人)들이 터를 잡았고, 명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했다. 조선의 출병 요청을 받은 청 정부는 광둥(廣東) 수사제독 오장경(吳長慶)을 지휘관으로 병력 4만5000명을 파견했다. 군용품 조달을 위해 상인 40여 명도 함께했다. 한성에 진입한 청군은 용산, 동대문, 경모궁(景慕宮·현 서울대 의대 일대) 등에 주둔하며 난을 진압했다. 이들이 ‘근대’ 한국에 발 디딘 ‘중국인’의 시초다. 오장경은 한국 화교의 비조(鼻祖)로 추앙받는다.
그해 8월 조선과 청의 첫 근대조약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이하 ‘장정’)’이 체결됐다. 조선을 속방(屬邦·종속국)으로, 조선 국왕을 청 북양대신(北洋大臣)과 동급으로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장정’에 의거해 청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상국(上國) 신민’ 신분이었다. 이듬해 서울과 제물포(인천) 등 각 개항장에 개업한 청 상인은 약 210명이었는데, 1년 후 서울 353명, 인천 235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1883년 청의 주(駐)조선 총영사관 격인 총판조선상무위원공서(總辦朝鮮商務委員公署)가 한성에 설치됐다. 초대 상무위원으로 진수당(陳樹棠)이 부임했다. 그는 남별궁(현 원구단 터)에 주재하며 영사 업무를 처리했다. 이듬해 진수당은 낙동(현 명동 중국대사관 부지)에 있던 무위대장(武衛大將) 이경하의 집을 사들여 새 상무공서를 지었다.
1884년 4월, ‘인천화상조계장정(仁川華商租界章程)’이 체결됐다. 인천 선린동 일대 5000평 토지는 청 조계지(租界地)가 되었다. 그해 10월 상무위원분서(영사관·현 청국영사관)도 개관했다. 이후 청 건축양식을 본뜬 건축물이 하나둘 세워져 차이나타운 꼴을 갖추었다. 1883년 48명이던 인천 내 거류민은 1년 후 235명으로 늘었다. 1890년에는 1000여 명에 달했다.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직함으로 실질적인 조선총독 역할을 하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조선에 개항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1887년 부산, 1889년 원산에 청 조계지가 추가 설치됐다. 청 상인들의 경제적 침투는 가속화됐다. 초기 상인들은 주로 푸젠(福建)·저장(浙江)성 등 남방에서 왔다.
남방계가 다수이던 조선 내 화인 사회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은 1898년 베이징(北京)에서 발발한 의화단(義和團) 사건이다. 북청사변(北淸事變)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산둥(山東)성 일대는 전화(戰禍)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서해를 건너 인천으로 밀려들었다. 훗날 이들이 한국 화교 사회의 주류가 된다. 오늘날 한국 내 화교의 원적은 98% 이상이 산둥성이다.
‘외국인등록증’, 인터넷에선 무용지물
![2017년 6월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 갤러리에서 열린 ‘인천 화교 이야기 전시회’에 출품된 화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김보섭 제공]](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a/e1/39/72/5ae13972031dd2738de6.jpg)
2017년 6월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 갤러리에서 열린 ‘인천 화교 이야기 전시회’에 출품된 화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김보섭 제공]
화교 숫자와 경제력 증가는 한국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차별 정책으로 이어진다. 1949년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은 매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됐다. 더불어 외환을 교환할 때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규제가 실시되고, 화교 신규 이주 금지가 실시됐다. 이듬해 창고 봉쇄 조치(6·25전쟁 중 창고 물건 압류) 등 이승만 정부하에서 화교를 주 타깃으로 한 규제가 이어졌다. 1957년에는 ‘무역법’을 공포, 사실상 화교 상인들의 대외 무역을 금지했다.
박정희 집권 후에도 규제는 가중됐다. 1961년 제정·공포된 ‘외국인토지법’으로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한국 내 신규 토지 취득이 금지됐다. 1968년 규제가 완화됐지만 거주용은 200평, 상업용은 50평까지만 취득을 허가했다.
화교 경제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1953년, 1962년 두 차례 화폐개혁이다. 현금을 대량 보유하던 화교들은 복구 불능의 손실을 입었다. 이 밖에 1970년대 자장면 가격 동결, 중국음식점 내 쌀밥 판매 금지, 세무 당국이 임의로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인정과세(認定課稅) 실시 등 화교 경제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연거푸 이어졌다.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는 화교 인구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증가일로이던 화교 인구는 1972년 3만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 4월 현재 한성화교협회 비공식 추산 화교(대만 국적 보유자)는 2만1000명 선이다. 2011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화교는 1만3702명, 2년 단위로 거주비자(F2)를 갱신하며 지내는 영주권 비보유 장기 거주자는 5955명이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은 1970년대 명동 차이나타운을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된, 한국 화교들에게 아픈 기억이 서린 건물이다.
한국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은 철폐, 완화되는 중이다. 1999년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한 것이 대표적 예다. 화교를 ‘짱깨’, ‘되놈’이라 하던 한국인들의 멸시의 시선도 누그러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화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2002년 영주거주비자(F5) 제도가 신설됐다. F5는 거주비자(F2) 취득 5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화교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상 불편은 가중된다.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따른다. 화교들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분 증명을 위해 써야 하는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다”고 입을 모은다.
출입국 불편도 빠지지 않는다. 한국 내 화교의 90% 이상은 대만(중화민국) 국적 소지자다. 여권에도 ‘중화민국’ 국호가 박혀 있다. 문제는 이것이 ‘깡통여권’이라는 것이다. 2018년 4월 현재 대만 여권으로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는 123개국. 그러나 대만 내 호적이 없고, 통일번호(統一編號·대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화교들이 소지한 여권으로는 이 같은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방문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명목상’ 모국(母國)인 대만 방문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2012년 7월 한국과 대만은 상호 무비자 체류기간을 90일로 연장, 한국·대만 여권 소지자는 이 기간 동안 상대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화교들은 이 혜택에서도 소외됐다. 대만 정부는 자국 여권 소지자이지만 자국 내 호적은 없는 이들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분류, 대만 방문 시 유효기간 5~10년짜리 ‘방문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외국인과 동등한 비자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자국민 역차별인 셈이다.
‘부모만 셋을 둔 고아’
대만 정부가 이처럼 자국민을 역차별하게 된 기저에는 대만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자리한다. 2000년 5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했다.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부는 ‘중국’이 아닌 대만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는 화교 정책에도 반영됐다. 2000년 대만 행정원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화교업무위원회) 위원장 장푸메이(張富美)는 “노(老)화교, 신(新)화교”라며 대만 국적 재외국민을 양분했다.노화교는 1949년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천도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신화교는 대만 출신 재외국민을 뜻한다. ‘대만인’ 출신 해외 거주자에게는 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만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사였다. 이후 재외국민법, 출입경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구화교’로 분류된 이들은 대만 방문·거주 시 외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됐다.
한성화교협회(漢城華僑協會) 총무 곽원유(郭元有) 씨의 말이다. “대만을 방문할 때마다 입국신고서를 쓰고, 외국인 창구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요. 한번은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고 입국하려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반드시 써야 한다’며 화를 내더군요. ‘내가 내 나라 입국하는데 왜 이딴 걸 써야 하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2013년부터 한성화교협회는 대만 교무위원회, 외교부 등에 “대만 본토 여권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4년 7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 ‘차별적 불평등 여권제도 개선 촉구’ 궐기대회도 벌였다. 하지만 대만 정부로부터 답은 없다. 전담부처 교무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명무실화됐고, ‘신화교’로 분류된 대만 출신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외교부 영사사무국으로 넘어갔다.
화교들이 대만서 겪는 것은 제도상 차별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중국인(Chinese)’이 아닌 ‘대만인(Taiwanese)’ 정체성을 지니게 된 대만 사람들에게 받는 설움도 크다. 한국 화교 3세로 2000년대 초반 국립대만사범대학에서 공부한 담안유(譚安維) 씨는 유학 당시 겪은 일을 토로한다.
“대학서 같이 공부한 대만인 친구들은 나를 한국인이라 불렀습니다. ‘난 대만 국적자인데 왜 내가 한국인이냐?’고 항변하면, ‘한국에서 왔으니 한국인이지, 넌 대만 호적도 없잖아!’라고 했어요.”
추덕건(鄒德建)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그들의 심사가 뒤틀리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네 나라(한국)로 돌아가! 여긴 대만이야’라고요.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의 분함과 서운함이란···.”
이들은 “한국서는 대만 국적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 하고, 대만서는 대만 내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 취급받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중국’에 뿌리를 둔 한국 화교들이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사이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셈이다. 이충헌(李忠憲) 전 한성화교협회장은 한국 화교들을 “부모만 셋을 둔 고아”에 비유한다. 형식상 모국인 대만이 어머니, 원적이 있는 중국이 아버지라면, 나고 자란 터전인 한국은 양아버지란 뜻이다.
아버지는 서씨, 아들은 쉬씨?!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차별도 여전하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입사해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다. 취업에 성공해도 핵심 부서 배치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한국 화교들의 공통된 ‘체험담’이다. 이들은 감히 임원 승진을 꿈꾸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추덕건 씨의 말이다.“화교가 외국인임이 분명한 사실이니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무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차별이 불필요한 분야까지 차등 대우하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외국인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화교들은 한국 사회에서 화교가 성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연줄’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를 꼽는다. 화교들은 한국 내 화교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연·지연으로 뭉친 한국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제 화교 출신으로 고위직에 오른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담도굉(譚道宏) 베이징현대 총경리(대표이사), 설영흥(薛榮興) 현대차그룹 고문(전 부회장), 설호지(薛浩智) 손계서(孫啓瑞) 대한항공 고문(작고), 손서신(孫書臣) 대한항공 상무 정도다. 이들은 모두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설영흥·설호지는 부자(父子)관계로 대를 이어 현대차그룹과 인연이 있다.
화교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뭘까? 곽원유 한성화교협회 총무는 두 가지를 당부한다.
“우선 귀화하려는 화교들을 배려해줬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어 구사에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외국인과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표기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이름을 영어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데, 중국계일 경우 현지어 표기 원칙에 따라 평소 사용하는 한국식 발음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중국식 발음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식으로 표기해 서(徐)씨인데, 아들은 중국어 발음대로 ‘쉬(徐)’씨가 돼버린, 웃지 못할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곽 총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에 대법원에 진정서를 내고 주무 대법관과 면담을 했다.
취재 중 만난 화교들은 “비록 중국계이나, 한국은 나고 자라고 훗날 뼈를 묻을 터전”이라며, 한국에 애착을 보였다. 동시에 여전히 배타적인 한국인에게 서운함을 내비쳤다. “월드컵 경기 때였습니다. 한국대표팀 경기가 열렸는데, 직장 상사가 물었죠. ‘넌 어느 팀 응원하니?’ 답을 뻔히 알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기대감을 나타낸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등 일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대목에 대해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의 권리도 신장되길 희망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의 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