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열린 세계대학생골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필자.
1981년 ‘스포츠동아’에 골프 칼럼을 연재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해, 한국대학골프연맹 창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골프와 함께해온 세월 동안 감회가 없을 리 없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회에 함께 참가해 지켜보면서 보람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사람 특유의 경쟁심’에 관한 작은 에피소드다.
1996년 8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국은 처음 참가한 대회였으니 단장을 맡은 필자나 선수단의 마음이 한껏 달아올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회 종목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단체전은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됐다. 자체적으로 선수들의 실력을 판단해보건대 남자는 중위권, 여자는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남자는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여자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라이벌인 미국을 누르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제2일 경기까지 개인은 2타차 공동선두, 단체전은 6타차 선두였다.
그런데 3일째에 이르러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A선수가 티샷한 공이 연못 가까이에 떨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나마 물 속에 빠지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필자는 이 선수에게 “물에 들어가서 샷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다(대회 규정상 아마추어 신분의 단장은 플레이어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골프화를 벗고 물에서 샷을 하면 최소한 보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A선수는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서 쳐요?” 하더니 그냥 1벌타를 받고 언플레이볼을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말릴 틈도 없었다. 그 결과 A선수는 그 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했고 순식간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미국과 동점을 이루게 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필자는 선수들을 불러 “개인전 성적은 신경 쓰지 말고 단체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개인전 성적은 자연히 좋아지게 돼 있다”고 수 차례 다짐했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경기운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요지였다. 어느새 대회는 막바지여서 한번만 더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지막 날. 전날의 경험이 있었기에 필자는 A선수를 혼자 플레이 하게 두고 B선수를 따라가면서 조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반 9홀에서는 두 선수 모두 2언더파를 기록함으로써 미국의 쉬쉬리폰(1998년 US 오픈 당시 박세리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서 패했던 바로 그 선수)을 1타 차로 앞서고 있었다. 다행히 B선수와 쉬쉬리폰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을 잘 알 수 있었다.
17번 홀까지 B선수가 1타차 리드를 하고 있었던 데다 17번 홀은 파 5홀. 장타자인 B선수는 2온이 가능한 반면 단타인 쉬쉬리폰은 3온을 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마음먹고 세컨드샷을 날린 B선수. 그러나 아쉽게도 샷이 30cm 정도 짧아 그린벙커에 빠졌다. 다행히 벙커의 턱이 낮고 공이 놓인 상태도 양호해서, 퍼터로 서드샷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파는 무난한 상황이었다.
B선수에게 다가가 “벙커샷을 하지 말고 퍼터로 핀을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A선수 몇 타예요?” 하고 묻는 게 아닌가. 두 선수는 동타였다. 사실을 알려주자 B선수는 갑자기 “저 벙커샷 할래요. 자신 있어요!” 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세컨드샷이 짧았던 쉬쉬리폰이 먼저 서드샷을 했다. 공교롭게도 공은 핀 1.5m 거리에 딱 붙어버렸다. 버디 찬스였다. 결국 B선수의 서드샷이 승패를 결정지으리라는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숨을 죽이며 B선수의 샷을 지켜보았다. 아니나다를까, 모래를 얇게 때려 그린을 풀쩍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B선수는 네 번째 샷도 핀에 접근시키지 못하고 보기를 한 반면 쉬쉬리폰은 버디를 성공시켰다. 쉬쉬리폰의 1타차 리드. 18번 홀에서는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했다. 결국 개인전은 쉬쉬리폰의 1타차 우승, 두 한국 선수는 동률 2위. 단체전도 또 다른 미국 선수가 마지막날 3언더파를 기록해 합계 3타 차이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우승을 목표로 삼았던 한국 여자선수들은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아직 배우는 단계였던 젊은 학생들이 이날 보여준 ‘개인주의’, 팀보다 자신을 더 앞세운 플레이는 두고두고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팀 안에서의 실력경쟁은 좋은 약이지만 팀워크를 해치는 경쟁심은 치명적인 독이다. 비단 필드에서뿐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통할 듯한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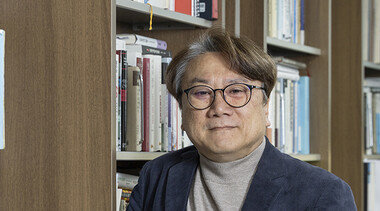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