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산업에서 주파수는 ‘뜨거운 감자’다. 누가 어느 주파수대를, 어느 정도의 대역폭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논란이 그치지 않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보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800MHz는 경쟁사에 비해 주파수 효율성이 높다. 1.8GHz대를 쓰는 KTF와 LG텔레콤은 기지국 설치비용을 SK텔레콤보다 2∼4배나 더 지출했다. SK텔레콤의 해외 자동로밍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이 주파수 덕분이다. CDMA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이동통신업체 대부분은 800MHz를 쓴다. SK텔레콤이 로밍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만도 연간 600억원에 달하니 경쟁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할 만하다.
주파수 사용료가 얼마쯤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LG텔레콤은 IMT2000 동기식 사업을 포기했다. 전세계 통신 기술의 흐름이 비동기식에 집중되면서 시장을 찾기 어렵자 사업권을 반환했다. 그런데 LG텔레콤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부에 1035억원을 내야 했다. 사업을 했다면 주파수 사용료로 1조1500억원을 내야 한다.
전자태그(RFID), 블루투스 등 전파 인식 관련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주파수 간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433MHz 대역을 아마추어 무선통신용으로 할당했다. 그런데 이 대역은 전세계 항만 물류를 위한 RFID 주파수 표준 대역이다. 세계 표준을 따르려면 아마추어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을 조정해야 한다.
미국 미디어업계도 주파수 전쟁 중이다. 지난 7월과 8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방부와 12개 사법기관이 사용하던 90MHz 대역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무려 20조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 위성방송, 케이블 업체가 너나없이 3세대 통신 서비스용으로 주파수 확보에 나서면서 주파수 경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
무선통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 개발되고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기술도 나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파수가 거대한 이권이 된 지 오래다. 그 주파수를 따라 연인들의 속삭임도, 분초를 다투는 증권정보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가쁘게 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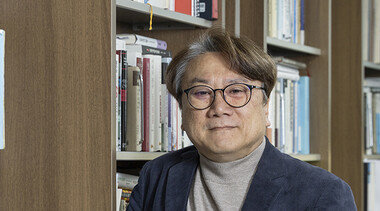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