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회 이야기
- 병합이라는 이름의 망국은 하루아침의 변고로 찾아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반세기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진행된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그 연속선의 일각에 재일 망명객이 있었다. 청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제각각 중시하고 제휴하는 정치그룹 간의 사활을 건 쟁투의 와중에 일본에 깃든 망명객들이었다. 그런데 망국 이후 또 다른 망명객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기미년 3월과 9월 사이의 활발한 정국에 힘입어 일본통치 타도의 일념으로 망명정부를 세웠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일요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평일에는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 심심파적 삼아 종로에 나와 관철동 일대를 드나드는 것이 요즘 세태다. 한 해가 무섭게 새로운 구경거리가 늘어나고 도심을 찾는 나들이도 그만큼 잦아진다. 낮에는 집 주변을 벗어나지 않던 사람들도 해가 저물면 누적되는 시간의 무료함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길을 나서곤 한다. 갈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행선지는 대개 정해져 있다. 인왕산의 백운동천, 북한산의 삼청동천, 목멱산의 남산동천이 청계천으로 흘러들 듯 세 물길의 합수지점 사이에 자리 잡은 관철동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관철동에 옥이야 금이야 만든 관자(貫子)를 사러 나오는 이는 지금 거의 볼 수 없다. 수백 년 동안 이곳에 몰려 성황을 이루던 관자 파는 가게들도 여기가 관자동(貫子洞)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상투머리에 쓰는 망건(網巾)의 줄 꿰는 고리가 관자인데 상투를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들고일어난 것이 25년 전의 일이다. 일본을 배후에 둔 정부 시책에 따를 수 없다며 그동안 쌓인 증오와 분노를 상투머리 끝까지 끌어올리며 무력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의병이라 불렸다. 머리카락을 수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반발에 단발령은 철회되었고 진압군도 철수되었다. 그리고 단발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맡겨졌다.
상투는 잘랐어도 망건과 갓은 그대로 쓰는 풍습이 노인들 중에 아직 남아 있지만 옥관자 금관자 몇 개 팔아보겠다고 이 땅값 비싼 관철동에 가게를 벌이고 있을 경성 상인은 없다. 20세기 하고도 1920년인 것이다. 장통교와 더불어 이 동네의 동쪽 두 귀퉁이를 이루던 철물교(鐵物橋) 주변의 철물전들도 거의 떠나고 없다. 파고다공원 옆 네거리에 있던 철물교 다리는 복개 도로가 개울을 덮으면서 사라졌다. 안국동 관훈동 인사동을 거쳐 흘러내리던 원동천(院洞川)은 지하로 잠복했다. 사라진 관자와 철물다리를 추억이라도 하듯 관자동은 관철동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6년 전의 일이다. 단발령 소동이 있은 지 20년이 되던 그해 1914년에 상투는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관자 찾는 이도 따라서 드물어졌다.
관자도 관자동도 철물도 철물교도 사라진 관철동의 가로와 가게에 전깃불은 날로 환해진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여름밤 나방처럼 맹렬히 몰려들었다. 도회지에서 사람들은 점점 밤낮을 가리지 않아가고 계절도 덜 가리게 된다. 남녀의 낯가림과 몸 가림도 그와 더불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오늘은 2월 1일. 새해의 첫 다섯 날을 혹한으로 시작해 스무 날가량 춥다가 요사이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오랜만에 빙점을 벗어났다. 오늘은 아침부터 포근하다 싶더니 밤이 되어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다. 관철동에서 비스듬히 종로 큰길 너머로 바라보이는 파고다공원, 그 뒷동네 낙원동에 있는 경성측후소는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곤두박질할 것이라 예보했다. 이번 겨울은 무려 50일 넘게 눈이 내렸다. 경성측후소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내린 눈은 거의 녹지 않고 쌓이기만 해 또 하나의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1920년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기미년이다. 섣달 하고 열이틀. 고종 임금이 세상을 하직한 것이 지난해 이맘때다. 그 1주기 제사를 며칠 전에 순종 임금 이왕(李王)은 정성스레 모셨다고 한다. 밤을 지새웠던 아버지와 달리 아침 7시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왕은 오전에 관보(官報)의 활자를 쫓으며 지금은 조선 귀족이 된 옛 중신들의 동정을 챙겨보고, 오후는 신문 보는 것으로 소일한다고 한다. 한 달 뒤면 3·1만세운동 1주년이다.
보름을 향해 가고 있을 달은 어제부터 이틀 내리 하늘을 두껍게 가린 구름에 빛을 거두고 자취마저 묘연하다. 오늘은 살짝 빗방울까지 몇 점 뿌린 뒤라 마치 초봄의 그믐밤 같다. 봄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사흘 뒤면 기미년의 마지막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 그 달이 경성을 환히 비춰줄지는 측후소도 아직 모른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관철동을 메울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달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는다. 먼 달보다는 가까운 전등에 의지해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간다. 도회지의 밤은 점점 낮처럼 돼간다. 동지에서 하지로 간 것보다 훨씬 더 짧아진 밤이 저기 샛길 안쪽으로 웅크리고 있다.

김구 선생(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여러 독립운동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담 넘기는 딱 좋은 밤이다.
저만치 뿌연 가스등 불빛 아래 길목을 오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별 어려움 없이 피해 문무술(文武術)은 대문 옆 행랑채를 끼고 있는 담장을 올랐다. 관철동의 요지를 차지한 저택의 규모가 집 주인의 신분을 짐작게 한다. 잠시 기척을 살핀 뒤 촉촉한 흙 마당에 살짝 내려섰다.
원산(元山)에서 상경한 지 얼마 안 되는 문무술은 이 집 주인을 만나러 일요일의 달빛 흐린 야밤을 골라 찾아왔다. 좀 특이한 이름의 문무술이 학식과 무예를 겸비한 인물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육혈포(六穴砲)라 불리는 6발 권총을 차고 장안의 갑부 집을 내방했다.
주인 차상건(車相健)은 집에 없었다. 대부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일요일 밤에도 집을 비울 만큼 바쁜 줄은 미처 몰랐다. 밤의 방문객은 사랑채에서 담소 중이던 두 남자에게 육혈포를 겨누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얻으러 차상건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소.
그는 자신을 상해(上海)의 가정부원(假政府員)이라고 소개했다.
“차 사장은 장춘관에 가고 안 계십니다.”
장춘관(長春館)은 돈의동에 있는 장안의 손꼽는 요리점이다. 인사동의 명월관 지점(明月館 支店)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가받아 명월관 분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명월관 본점은 없다. 불타 사라진 지 10년도 넘었다. 하지만 명월관이라는 이름은 그 무게 때문에 여태껏 상호로 살아 있다.
―당신들은 누구요.
“차 사장과 함께 무역상을 하는 동업자올시다.”
차상건은 남대문 안 남미창정(南米倉町)에 동광상회라고 하는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신탁업과 호텔사업으로 확장 중이다. 두 달 뒤 4월 상순에 자본금 50만 원의 중앙신탁을 남대문 밖에 개업하게 된다. 그리고 4월 하순에는 종로1정목 재판소 옆 대로변에 서울호텔을 오픈할 것이다. 그 창립총회가 이달 2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7시 명월관 지점에 예약돼 있다. 너무 일이 많아 휴일이 따로 없다. 4월이 오면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업의 자유도 한껏 숨통이 풀릴 분위기다. 4월 1일부로 회사령이 폐지되면 10년 동안의 회사 설립 규제가 풀리게 된다. 회사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자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시대란 무엇이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자본론’을 안 읽어보았지만 그 정도는 안다. 쉬운 일본말로 번역되어 있는 자본론도 안 읽어보고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부쩍 많아졌다. 비록 전후 공황(戰後恐慌)의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끼어 있다지만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시간은 금이다. 차상건의 꿈은 원대하다.
―돈을 안 내면 총살하겠다.
“우리는 이 집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두 실업가는 묵직한 육혈포를 든 33세의 실업자에게 떠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보였다. 말로만 듣던 임시정부 특파원이 바로 이것인가 하는 호기심과 의구심과 낭패감이 표정에 교차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지난 10년 이런 곤욕을 당해본 적은 없다.
집 밖을 조금만 나서면 바로 종로 2정목 네거리다. 거기서 빤히 바라다뵈는 파고다공원 정문 옆 경찰파출소는 큰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무장 경관이 달려올 거리다. 조금 더 가 종로 3정목 네거리 단성사 맞은편의 장춘관은 여기서 500m도 못 되는 거리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무술은 행랑채 앞을 서성대던 하인을 불러 대문을 열라고 했다.
사태를 파악한 23세의 하인은 문을 열어주는 체하더니 불청객을 발길로 걷어찼다. 넘어질 뻔한 문무술은 덮치는 하인에게 육혈포를 연달아 발사했다. 탄환은 하인의 핫바지를 살짝 뚫고 나갔다. 강도야 고함소리와 터지는 총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침입자는 대문을 열고 튀어나갔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순찰 중인 경찰에 붙들렸다.
근래 경성과 각 지방에 강도 피해가 매우 빈발해 인심이 뒤숭숭하므로 경찰이 엄중 경계하는 중이다.
당국의 발표가 어제 신문에 있었다. 그 이틀 전에는 동대문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가 신설되어 동시에 문을 열었다.
“경성의 경찰력은 이로써 두 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제3부장 천엽료(千葉了)는 매일신보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난해 9월에 헌병경찰제가 폐지되었다. 3·1운동 이후 신임 총독 부임에 즈음한 문화정치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독립관청인 경무총감부의 지휘를 받던 각 도 단위 경무부(警務部)는 도지사 휘하의 제3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그때부터 헌병을 대체할 보통경찰의 추가 인력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줄줄이 수송되어 왔다. 만세시위로 인해 지난해 경찰이 사용한 경비는 그 전년도 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사상 유례없이 폭증했는데, 소요가 진정된 올해 1920년은 경찰관 증원 러시로 인해 다시 경비가 늘어 1918년 대비 3배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 한다. 4월이 되면 경찰기관 정비는 완료될 것이라며 3부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치안과 소요 대비에 전력을 기울여왔으나 이제부터는 보안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우선 경성부 내의 인력거 부당 요금을 정리하고 화류계 단속을 단행해갈 예정입니다.”
생의 불꽃
종로 한복판에서 야간 활극을 벌인 문무술은 우미관(優美館)의 불빛을 바라보며 큰 길 건너 종로2정목의 YMCA 옆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극장 간판에는 전날 토요일부터 신 프로로 교체된 세 편의 활동사진 연속상영을 알리는 그림이 겨울비를 머금은 채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다. 미국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제작 코미디 활극에 탐정극, 그리고 미국 유니버설 특작 대활극이 한 편씩 나란히 걸려있다.
황금정 4정목의 황금관(黃金館)이 일본인 위주 극장으로서 굳혀온 7년간의 관례를 깨고 조선인 관객 끌어 모으기 작전에 나선 주말이었다. 우미관 앞은 평소보다 썰렁한 듯도 했다. 황금관은 인기 최고의 조선인 변사 서상호(徐相昊)를 초빙해 토요일부터 3일간 화제만발의 일본영화 ‘생의 불꽃(生の輝)’을 절찬리에 상영 중이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 화류 하루미(花柳春み)를 앞세운 영화는 사회극(社會劇)을 표방하면서, 일본 최초의 순영화극이자 외국영화의 형식으로 촬영한 작품이라고 선전되었다. 요코하마에서 직수입하는 미국영화를 상영하기 바빴던 조선 극장가에 서양영화의 기법을 소화해 서구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본격 일본 영화 한 편이 상륙한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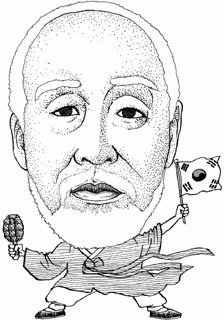
1919년 남대문역 폭탄 의거를 결행한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
조사 결과 문무술은 지난해 봄 고향 원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부호들을 협박해 두어 차례 돈을 뜯어내었고 새해 들어 서울로 진출했음이 밝혀졌다. 원산에서 일을 벌일 때 그와 어울리던 사람들 중에는 지난해 9월 남대문역에 부임하는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원산에서 준비 중이던 강우규(姜宇奎)를 도운 사람도 있었다.
문무술이 종로경찰서로 붙들려가기 나흘 전에 강우규는 바로 옆 공평동의 종각 네거리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지난해 가을에 기소되고 꼭 백일 만이었다. 그날 담당 판사의 말이 매일신보에 이렇게 실렸다.
강우규는 일일이 자백하였다. 그 자백한 것은 어느 하나 사실과 다름이 없었다. 가령 자백하는 대로 원산 같은 데도 가서 조사해보았는데 조금도 오차 나는 점이 없었다. 예심이 백일이나 갈 것도 없었는데 동경으로 보낸 폭탄 감정이 더디어져서 이리 되었다.
법원과 종로 길을 마주하고 있는 경성유치감옥에 강우규는 수감 중이다. 동쪽 길 건너 관철동에서 울린 일요일 밤의 총성을 그도 들었을지 모른다. 4월이 오면 그는 공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의 동정은 어떠하냐는 매일신보 기자의 물음에 그곳 간수장은 말했다.
“처음 여기 들어올 때는 간혹 큰 소리도 내곤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아주 조용히 있으며 몸은 매우 건강합니다.”
임시정부 특파원
문무술 사건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이삼일 전에 심리를 마쳐 수일 내에 공판에 부칠 것이라 한다.
2월에 관영 매일신보에서 처음 접한 관철동 육혈포 강도미수 사건의 경과를 한림은 새로 창간된 민간신문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창간 준비로 바빴던 두 달이 지나 벌써 4월로 들어섰다. 창간에 즈음한 각계 인사들의 담화가 새 신문의 여기저기에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경찰 총수인 적지농(赤池濃) 경무국장의 말이 눈에 띄었다.
요사이 강도가 빈번함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인데, 체포해 취조하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상해 가정부(上海 假政府)의 명령으로” 운운하니, 강도의 지사(志士)화인지 지사의 강도화인지 추측기 어렵다.
그의 말이 과장만은 아닌 것이, 3·1만세 이래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강도사건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단순히 시류에 편승한 날강도들이 뒤섞여 있는 분위기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기사가 창간 둘째 날 신문에 있었다.
경성부 관훈동 사는 무직 정태춘은 6년 전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탈옥도주한 자인데 권농동에서 숯장사 하는 박승억, 돈의동에서 무직업으로 돌아다니는 이종대 등과 서로 상의하고 작년 9월에 충청북도 충주 권병섭의 집에 들어가서 나무로 육혈포같이 만든 것을 꺼내 들고 상해임시정부 특파원이라는 문서를 보이면서 돈 3만 원을 내라고 협박하여 50원을 강탈하고 또다시 같은 달 충청남도 천안 이기련의 집에 들어가서 같은 수단으로 돈 1302원을 강탈하고 금년 1월 29일에는 박승억과 같이 사직골 자작(子爵) 임낙호씨의 집에 들어가 칼을 빼들고 “우리들은 지금 나라 일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중이니 돈 5만 원을 내라”고 무수히 협박하여 1150원과 검은 비단 마고자 한 벌, 금전 차용증서 두 장을 빼앗은 외에 이와 같은 도적질을 사방으로 다니며 하다가 경기도 제3부의 손에 잡히어 취조한 후 지난달 30일에 검사국으로 보내졌다.
한림은 편집국 구석에서 신문철의 창간호 위로 둘째 날 신문을 덮어 끼우다말고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에 빨려들었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3~4월에 서울과 상해와 연해주 각지에서 저마다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9월에 상해에서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한림이 지난해까지 일하던 백산무역의 이사 안희제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사업으로 벌어서 보내준 것이리라. 임시정부로 가는 돈은 다 그처럼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그중에서 과연 얼마가 임시정부로 들어가는 것일까.
상해 임시정부가 존립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국내의 민심에 있었다. 이역만리에 삼권분립의 형태로 민주공화제의 국가기구를 발족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만들었지만 없는 것은 국민이었다. 당시 상해에 조선인은 500명가량 있었는데 약간의 상인과 유학생, 전차회사 검표원 열 명가량을 제하면 대부분 조선과 나라 밖 각처에서 온 망명 지사들이었다. 국민이 없으니 납세자가 없고 군인이 없다. 그래서 국민을 지도하고자 하는 망명객들은 보이지 않는 행정조직을 국내에 만들어 그 비선 망을 통해 특파원을 왕래시키며 선전 선동하는 한편으로 자금을 몰래 건네간다. 국내와 망명정부를 통하게 하는 연결망인 연통제(聯通制), 그 안에서 정보와 물자와 인력을 교환하고 소통시키는 교통국(交通局)이 초기 임시정부 발족 다음달인 5월부터 만들어져 9월의 통합 임시정부로 계승되었다. 7월부터 특파원이 파견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선전대(宣傳隊)도 구성해 조직 기반 넓히기에 나섰다 한다. 나라 안의 조선총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집권 2기를 열며 문화정치 선전정치를 표방하고, 같은 달에 대통령 중심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한 나라 밖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겨냥한 선전투쟁에 들어갔다.
연락하고 교환하며 내통해 체제를 교란하고 동요시키며 조직운영비 혹은 군자금을 애국의 이름으로 갹출하는 일이 임시정부 특파원의 임무다. 그들의 침투 루트는 압록강변 신의주와 마주 보는 중국 땅 안동(安東)이다. 거기에 임시정부 교통국은 안동지부를 두고 정보와 문서와 자금과 무기와 인력을 교환하는 통로로 삼고 있다. 그 사무실은 영국인 무역회사 겸 선박회사 대리점인 이륭양행(怡隆洋行) 안에 있다. 상해의 임시정부가 위장 명칭인 ‘강남공사(江南公司)’ 이름으로 부치는 선전물이 중국우편으로 안동의 이륭양행에 도착하면 그곳 2층에 있는 교통국 상주요원이 마대자루에 담아 중국인을 시켜 압록강 넘어 의주(義州)의 지국으로 보내 전국으로 배포한다. 임시정부의 정보 통신 조직이나 다름없는 이륭양행을 일컬어 상해에서는 국내 전진기지 혹은 요새라 부르기도 한다.
슬픈 아일랜드
김구(金九)가 이륭양행의 배를 타고 안동을 떠나 상해에 도착한 것은 한 해 전인 1919년 4월 13일이었다. 아직 얼음덩이가 여기저기 쌓인 안동에서 압록강을 따라 20㎞를 내려가 황해바다로 나섰을 때 갈매기보다 먼저 일본 경비선이 따라붙었다. 배 세우라고 나발 불며 경고하는 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영국인 선장은 익숙한 몸짓으로 전속력을 내 경비구역을 벗어났다.
영국은 일본에 해양에 관한 근대기술을 전수해준 스승의 나라다. 일본배가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영국제를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의 시꺼먼 군함(黑船)이 검은 태양처럼 태평양상을 솟아올라 평화로운 해안선에 다가오는 충격적인 광경에 대면한 그날 이후 미국에 깍듯이 고개 숙이며 두말없이 모든 것을 시급히 개조해나가기 시작한 일본은 해군에서부터 상선에 이르기까지 배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영국에서 철저하게 배워왔다.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최강 동맹국으로서 도와왔다.
상해로 가는 배의 선장은 이륭양행의 사장 조지 쇼다. 영국의 통치를 받는 아일랜드인으로서 극동의 아일랜드라 할 조선인에 동정심을 갖는다는 쇼는 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의 운송을 종종 맡아서 한다. 중국의 일간 신문 ‘신보(申報)’ 4월 18일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아일랜드에 대한 잉글랜드의 정책과 유사하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라 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로 상해의 황포탄 부두로 실어 나를 조선인은 43세의 김구 포함 15명이다. 잡히면 죄다 감옥살이 오래할 만한 면면들이다. 물론 뱃삯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벌이로만 보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안동의 유일한 영국 회사로서 안동-천진-상해 간 해상운수를 석권하고 있는 그는 일반 여객운수도 겸하고 있다. 상해까지 1인당 편도 요금이 중국돈 16원(圓)이다. 봉천(奉天)주재 영국영사의 주의를 받아가면서도 계속하는 이 일이 언젠가 그를 감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압록강을 넘는 조선인 탈주자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의 이 특이한 사업도 동정심과 마찬가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부인은 일본인이다.
그가 여기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1902년부터 안동이 영국에 통상지로 강제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동북 3성의 농산물을 산동 반도의 연태(煙臺)와 상해 지역으로 실어 나르고 상해와 산동반도 지역의 경공업품을 동북 내륙지대로 교역하는 물류 중심으로 안동을 택했다. 미국과 일본이 다음해 영국을 뒤따라 쇄도했다.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된다면
고향을 떠난 김구가 황해도 재령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3월 29일이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만세를 부르기로 되어있다고 시내가 술렁거렸다. 오는 기차 안에서도 온통 만세 이야기였다.
―전국의 인민이 다 들고 일어나 만세를 부르면 자연 왜놈이 쫓겨나고야 말지. 우리 독립은 벌써 되었어. 아직 왜가 물러나지만 않은 것뿐이야.
열차에서 어떤 이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김구가 보기에 많은 사람의 생각이 그랬다.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가 완전 자치를 하고 명의상으로만 왜의 속국이 되는 줄로 아는 동포가 대부분이었다. 과거의 왕조 교체나 역대 중국과의 속국 경험 같은 것을 떠올리는 듯했다. 병합의 참된 의미는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들 되었다. 김구는 훗날 일지에 그렇게 썼다.
3월 초 황해도의 근거지에서 김구는 만세 부르러 나가자는 청년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만세운동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앞에 나서서 외칩니까.”
김구는 대답했다.
“독립은 만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일을 계획 진행해야 할 터인즉,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말고 자네들은 어서 만세 부르게.”
그렇게 3·1운동을 뒤로하고 떠난 김구가 압록강 너머 안동에서 변성명을 하고 좁쌀장수 행세를 하며 여관 신세를 지고 있던 무렵 서울 종로의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총무 윤치호(尹致昊)는 시위 주도자들의 잇단 체포소식을 들으며 일기에 이렇게 썼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극심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마땅히 소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을 것이다. 여론은 옳건 그르건 간에 사람들의 삶을 형성함에 있어서 법이나 종교, 이성이나 칼보다 더 강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구가 영국 배를 타고 남하해 산동반도를 돌아 황해를 반쯤 건너가고 있던 4월 11일 윤치호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다.
“지방에서 독립소요가 무의미한 대중폭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선동가들은 민주주의는커녕 독립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소요에 참가하라고 설득하거나 아예 협박하고 있다. 경찰관이나 헌병은 어리석게도 총을 쏴 사람들을 꼬꾸라트린다. 그것은 폭동을 일으키라는 신호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런 비극은 무고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선동가들의 어리석음과 잘 어울린다.”
3월 25일까지 만세와 관련해 체포 수감된 인원 2000여 명 중에 농민이 절반가량인 1000여 명으로 중간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이 400명 가까이 되고 기독교의 목사와 관계자들이 100명가량으로 뒤를 이었다. 종교별로는 천도교와 예수교가 각각 500명 이상이어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길은 안동으로 통한다
신의주에 내린 김구는 언제 다시 들를지 모를 조선식당에서 요기를 하고 중국인이 끄는 인력거를 불러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압록강철교는 가운데 단선 철로로 열차가 다니고 양편으로 인도가 나 있다. 근 1㎞에 가까운 다리는 규모나 모양이 한강철교와 닮았다. 경부선 철도, 한강인도교, 수풍댐을 건설한 하자마 구미(間組) 회사의 1911년 작품이다. 일본 정부는 3년 전 청나라 조정을 압박해 압록강철교 가설 협정을 체결하고 마침내 안동-봉천 간 철도를 경의선과 연결시켰다.
수심이 깊지 않은 압록강에 큰 배가 지나가도록 아침저녁 하루 두 번 다리 중간 마디가 90도 회전해 물길을 터준다. 이곳 사계의 절경 중 하나라 일컫는 봄의 물결(春波)이 다리 아래 넘실대지만 총 메고 주시하는 일본 경찰과 헌병과 세관원의 눈길에 통행자들은 얼어붙기 일쑤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형제는 반드시 한숨지으며 머리 숙이고 들어오고 국외로 나아가는 동포는 으레 눈물 뿌리며 얼굴 가리고 나아가는 곳이다. 중국과 일본을 대면하는 반도의 양극단 신의주와 부산은 그런 점에서 닮은꼴이다.
강 건너 국경도시 안동은 먼지와 냄새 많은 곳이지만 의주, 신의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가지가 크고 구획이 반듯하다. 안동의 명칭에는 1250년 전의 먼 옛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나라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점거하고 그 변경 남단의 전진기지에 설치한 군정(軍政)기관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냄새가 배어 있다. 668년 고구려 멸망 직후 평양까지 남하해 병력 2만 명이 주둔했던 안동도호부는 당제국의 동방 진출 전초기지였다. 신라와의 잇단 전투에서 패하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압록강을 경계선으로 하여 양분된 고구려 영토의 북부를 점거한 것이다. 때때로 강을 건너가고 건너오는 말발굽과 발길이 스쳐 지나갈 뿐 청나라 초기 이후 200년간 머무는 인적이 드물어 19세기 중반까지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던 안동 땅은 조선이 개항하던 1876년에 행정구역에 편입되었다. 김구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던 그해다.
김구는 안동에서 일주일을 묵은 뒤에 그렇게 영국 배에 의지해 상해로 향했다. 나흘간의 항해 끝에 양자강의 거대한 어귀로 빨려든 배는 상해의 진흙탕 물 넘실대는 포동 항구에 조선인 망명자들을 내려주었다.
4월이 다 같은 4월이 아니었다. 근 삼천리의 뱃길을 따라 남하한 이곳은 벌써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제주도보다 한참 아래쪽이며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와 비슷한 위도였다. 여자가 다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치마가 아닌 바지차림의 활달한 여자들이 거룻배의 노를 저으며 선객들을 담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신기했다. 더욱 신기한 조계지(租界地)로 들어가 조선 동포의 집을 찾아 온돌 아닌 차가운 바닥에 담요를 깔고 객지의 첫 잠을 청했다. 그날 프랑스 조계 내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공포되었다. 이틀 전에 이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 회의(의회)가 열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내각) 안에 6개 부가 조직되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위시해 각 부의 총장과 차장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또 하나의 임시정부
김구는 상해 도착 열흘 만인 4월 22일 의회 격인 임시의정원 2차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임시정부 일에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그날 그는 임시정부 각 부의 위원을 뽑는 15인의 선거위원단에 선정되고 10인의 내무부 위원 중 하나로 선출되었다.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임시정부가 서울에서 선포되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 만방에 조선의 독립과 조선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전 민족 의사에 기초해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음을 이에 포고하노라.”
4월 23일 정오 서울 서린동의 유명 중국요리점 봉춘관(奉春館)에 모인 13도 대표자들은 임시정부 선포문을 낭독했다. 마치 지난 3월 1일 인사동의 한식요리점 명월관 지점에서 민족대표 29인이 모였던 독립선언 집회를 연상케 했다. 임시정부 선포문의 어떤 구절은 독립선언문을 보는 느낌마저 주었다. ‘국민대회’라는 팻말을 붙이고 진행된 이 모임은 국민대회 취지서도 아울러 발표했다.
“3·1독립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민족 일치의 동작으로서 대소의 단결과, 각 지방대표자들로서 분회를 조직해 이를 세계에 선포한다.”
이 집회의 성격이 지난달의 독립선언식과는 다르다는 것은 6개조로 된 약법(約法)과 임시정부령 제1, 2호가 분명히 보여주었다. 약법은 국체(國體)를 민주제(民主制), 정체(政體)를 대의제(代議制)로 규정하면서, 조선 국민은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임시정부령 제 1, 2호는 조선총독부에 납세와 재판 및 모든 행정명령을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잠시 후 인근 거리에서 이들 문서가 배포되었다.
12시 10분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4~5명의 학생 같은 자가 작은 깃발 3개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질주하여 종로경찰서 방면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곧 추적하였는데 깃발을 종로통에 버리고 관철동 사잇길로 도망하여 사라졌다. 다음 날 이 중 2명은 체포했다. 깃발 두 개는 ‘국민대회’라 쓰고 한 개는 ‘공화만세’라 붓글로 쓴 것이다.
경찰의 관련자 검거는 이날 이후 이어졌고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는 전단 살포는 계속되었다. 한성정부라 하는 이 임시정부의 발족 소식은 서울발 연합통신(UP)에 의해 세계에 타전되었다. 한성에 가정부(假政府)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은 이에 앞서 중국에 먼저 알려졌다. 서울의 중국음식점에서 임시정부 수립 선포식을 갖고 가두선전을 벌이던 그날보다 일주일 전에 상해의 한 신문에는 한성정부가 조직된다는 소식이 각료 명단과 함께 보도되었다. 그 수반인 집정관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의 이름이 정확히 올라 있었다. 그보다 더 빨리 천진의 한 신문은 같은 소식을 닷새 전인 11일에 알렸다. 그날은 상해에서 임시정부 조직이 완료되어 이틀 뒤 선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9일에 북경발로 서울에서 임시정부를 성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성에 한성정부가 생긴다는 소식은 한성사람들이 맨 뒤에 알게 된 셈이었다.
“독립 운동이 분열될 염려가 있다”
한성정부의 수립이 임박해갈 즈음 상해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임시정부 수립에 속도를 더했다. 김구가 황해도 땅을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던 3월 27일 상해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수 의견은 임시정부 수립을 서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3·1운동 주최 측이 상해에 보낸 파견원은 “국내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상해에 2월부터 와 있던 이광수도 서울의 3·1운동 지도자들의 의사를 확인해보려고 서울에 사람을 보내두고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서 국민대회라는 대중적 절차에 따라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한성 정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후광을 갖고 있었다. 이광수 역시 같은 의견을 말했다.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를 조직한다면 미국동포들도 하와이동포들도, 노령에서도 서북간도에서도 저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리 되면 우리 독립운동이 분열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에 보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서울로 떠난 사람으로부터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다. 한성정부와의 통합논의는 실패했다. 국내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자는 말은 3월 중순부터 상해로 30여 명의 원로급 인사들이 대거 건너옴과 때를 같이해 종적을 감추었다. 이동녕 조소앙을 위시해 러시아령과 만주 간도에서 남하해온 지사들은 이광수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뜻이었다.
“왜 33인만 거드는가. 나라의 법통이 어째서 꼭 33인에 있는가. 만일 33인이 아무 의사도 남겨놓은 게 없으면 영영 정부 조직 못 하는 건가.”
무작정 기다릴 바에야 상해를 떠나련다는 대선배들 앞에서 이광수는 바쁜 마음이 더 바빠졌다. 이들보다 먼저 상해에 온 이광수는 등사판 신문 독립신보 창간 일에 바빴다. 오자마자 떠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 원로들이 임시정부 발족을 서두르는 사정은 그들이 떠나온 북녘 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러시아령에서 3월 17일에 이미 결성된 또 하나의 임시정부를 견제하고 있었다.
노령(露領)이냐 상해(上海)냐―새로 발족할 임시정부는 무력단체가 아니고 외교활동을 해야 할 곳이므로 국제도시 상해에 두어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에 맞서 한쪽은 수십만 동포가 살고 있는 노령이 적당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둘은 갈라섰다. 문창범(文昌範)과 김립(金立)을 중심으로 한 노령 그룹은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선포했다. 그들이 극동 러시아 땅에 세운 가정부의 이름은 대한국민의회였다. 의회와 행정 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혁명러시아풍의 이 독특한 형태의 조직은 의장에 문창범이 앉고 행정부의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박영효를 임명했다. 손병희나 박영효가 이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은 없다.
이들을 뒤로하고 이동녕 조완구 등은 정든 노령을 버리고 북간도를 거쳐 만주의 이시영 조소앙 등과 합류해 상해로 왔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노령보다는 늦었으나 서울보다 늦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세 임시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로 합병하고 9월 통합 임시정부로 상해에서 거듭났다. 그렇다고 인맥과 지역과 이념의 파벌에서 비롯되는 알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손발 없는 가정부이지만 일생일대의 고위직을 받은 이승만과 이동휘는 한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상해임시정부에 참가하기를 꺼렸다. 이승만은 이미 한성정부의 집정관을 받아들이고 미국 워싱턴에 대한공화국 임시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있었다. 각각의 조직형태가 제공할 저마다의 권한과 위상의 무게를 재어본 결과였다. 이동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동안 신한민국정부라고 하는 기구의 집정관 노릇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성정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에 조직되어 있던 또 하나의 임시정부였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였다. 요약해보면 상해임시정부와 한성정부에서는 이승만이 서열 1위, 이동휘가 2위였고, 제도적으로 1인자의 권한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는 쪽이 한성정부였다면, 신한민국정부의 1인자는 이동휘이며 그 아래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1946년 3·1운동 기념식에 함께 한 독립운동가들. 앞줄 왼쪽부터 임영신, 윤치영, 이범석, 오세창 선생.
과거 망국 이전의 망명지 동경은 친일 반정부 망명객들의 거점이었고 지금 망국 이후의 망명지 상해는 반일 가정부 망명객의 거점이 되었다.
자금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출범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희망을 거는 곳은 오직 국내의 민심과 국제 열강의 추이였다. 그런 임시정부에 1920년 들어 새 희망이 생겨났다. 국제 정세에 돌파구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다. 우리의 당면 대문제는 전쟁밖에 없다.
1920년을 여는 임시정부의 신년회에서 내무총장 안창호는 그렇게 연설했다.
3·1만세시위가 잦아든 1919년 6월에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파리강화회의가 종결되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주역인 영국과 프랑스가 얻은 이득 못지않은 실리를 극동과 태평양지역에서 챙겼다. 임시정부는 환멸에 가까운 실망 가운데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 이 지역을 독점하려는 일본이 역시 여기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견제를 받아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높아지는 소련과 일본 사이의 적대관계도 희망을 부추겼다.
―소련과 일본의 전쟁,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기정의 사실이며 시간문제다.
안창호의 지휘를 받아 이광수가 만드는 상해의 독립신문은 3월 16일 그렇게 단언했다.
―독립운동의 최후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버티자.
보름 전에 국무총리 이동휘는 임시의정원에서 이러한 시정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사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조사 소집하고, 10만 명 이상의 의용병을 모집 훈련하고, 사관학교를 설립하며, 미국과 소련 등 외국과 군수물자 수입을 교섭하고 우리 민족이 일본과 개전할 때에 후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2의 러일전쟁이 벌어진다고 보고 소련으로 가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그 사절로 여운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전부터 당수로 있는 한인사회당의 한형권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했다. 여운형은 여러 차례 안창호를 만나 “나를 모스크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동휘의 요지부동으로 무산되었다.
통합된 임시정부에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한 북간도의 독립군 단체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기곤 했다. 거기도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었다. 누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느냐, 어느 파가 독립사업을 주도하느냐가 늘 내분을 몰고 왔다.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그들이 표방하는 독립이 나라의 독립인지 자기 당파의 독립인지를 종종 혼동하게 만들곤 했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 나라를 찾겠다는 애국자들이 만주와 간도 일대에 망명해 제각각 항일단체를 만든 것이 한때는 48개에 이르렀다.
일제 투쟁보다 동족끼리 싸우느라
1920년 두만강을 건넌 17세의 이강훈(李康勳)은 북간도에서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소개를 받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거기서 등사판 심부름을 하며 11개월을 지내는 동안 몸 고생보다 더한 마음고생을 했다. 강원도 김화읍에서 3·1만세를 맞고 유치장 생활도 한 뒤에 고향과 나라를 떠난 터라 각오와 기대는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원했다는 44세의 김구 못지않았으나 임시정부에서 목격한 많은 것은 그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다. 북간도에서 이미 독립운동한다는 단체들이 반목하는 모습을 익히 보고 들은 그는 임시정부에 와서도 독립운동의 대업보다 파벌싸움에 날을 보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늙은이들이 모여서 지방싸움이나 하고, 제가끔 자기 당파가 얼마니 자기 세력이 어떠하니 떠들면서 허장성세나 하며 자기 세력이나 더 심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꼴을 보니 동경하던 만큼이나 낙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도로 갔습니다.
그는 김구 이동녕 이시영 같은 이들은 애국지사들이었음을 잊지 못하며 특히 신규식 같은 이는 상해의 반목을 보고 심화가 깊어져 일찍 작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시기를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악착스러운 지방열, 사상적 대립과 편견 때문에 일제에 대한 투쟁보다 동족끼리 싸우는 데에 정력을 소모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래로 경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스림을 받는 자’ 없이 ‘다스리는 자’들만 모여들어 논쟁을 거듭하는 것인데, 아직 한 뼘의 땅도 회복하지 못하고서 서로 시기 질투, 모략중상, 십인십지(十人十志), 사분오열, 임시정부라는 위대한 간판 밑에서 애국지사의 탈을 쓴 무리들이 부지불식간에 독립운동의 임정 내부에까지 기생하여 빗나간 정치극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 내부의 문제는 사실 임정 수립 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미 재미(在美)사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외교를 주로 하고 직접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이승만과 독립전쟁을 강조하는 박용만, 실력 양성을 강조하던 안창호로 나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는 재미 동포사회에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분파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파당 싸움은 임시정부 수립 후에도 영향을 미쳐 그 위에 평안파-기호파의 대립이 겹쳐 파쟁이 격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상해에서 지방별 파쟁은 원래 평안-함경-기호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이동휘를 중심으로한 함경도 인사는 이동휘가 물러난 후 뒤이어 물러났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출신은 임시정부에 관여한 중진급 인사가 적었다.
벌써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 1년을 경과했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선 지도 1년이 지났다. 4월 1일. 끊어질 듯 끊이지 않는 가는 비가 사흘 연속 내리고 있다. 한림은 어제 창간호 신문에서 보았던 글을 떠올린다. 경성지방법원장의 말이었다.
(…)이른바 독립운동을 보더라도, 성심성의로 나라를 걱정하여 진리와 생사를 같이하며 역경에 목숨을 바치는 고매하고 헌신적인 희생정신이 있는 자는 극히 적고, 보통 이기적 동기에서 하릴없이 소요 결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색깔끼리도 공통된 정견과 통일된 내용이 없고 단결력이 결핍하여 무수한 소당파(小黨派)가 각기 할거하고, 당(黨) 내에 당(黨)이 있고 파(派) 안에 파(派)가 있어 서로 시기 질투하는 폐단이 있는데, 비단 요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조선 역사를 일관한 바이며, 이조 오백년간의 정치사가 곧 당파 성쇄(黨派盛衰)의 기록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지니, 공적인 일에 관하여는 사심을 내지 않고 일치단합하는 일본민족에 비하면 천양지차가 있으니 이는 실로 사회생활상 조선인의 공통적 결함인 동시에 사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일대 원인이라 생각하노라.
당 안에 당이 있고
법조문처럼 또는 장황한 훈시처럼 듣기 불편하기도 하고, 속옷 바람으로 거리의 시선을 받는 느낌이 들어 화끈거리기도 하고, 곰곰 생각하면 섬뜩한 느낌조차 드는 것이었다. 염치를 모르는 자가 무례를 행하듯 수치를 모르는 자는 결국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조사와 재판의 기록은 현재 이 사람의 관할하에 있다.
한림은 창간호 위에 덮어 철한 이틀째의 신문을 마저 읽는다. 논설반의 김명식(金明植)의 글이 신문 세 번째 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세와 개조’―무슨 독립단의 선언문 같기도 하고 만국회의 석상의 정치연설문 같기도 한 제목을 하고 있다. 격정적이고 우국적인 김명식의 요즘 관심은 온통 새로운 사조로 떠오르는 사회주의와 노동문제에 쏠려있다.
(…)미국대통령 윌슨 씨가 14개조를 내걸고 파리에 도착하여 시민의 열광적 환영을 받고 자기의 사명은 “미국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라고 호언을 토하던 1919년은 이미 과거라, 열광적 만세소리도 적개심을 담은 노래도 모두 없어지고 적막히 텅 빈 방에 외로이 홀로 앉아 몸뚱이와 그림자가 서로를 쳐다보며 유유히 묵상하는 1920년이 왔다. 담화에 상대가 없고 질병에 위문이 없고 산보에 동반이 없고 방문에 주인이 없고 논의에 동지가 없다.
한림은 분주한 편집국의 귀퉁이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다 자기 이름이 쓰인 봉투 한 장을 받아들었다. 상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보(申報)였다. 1872년에 영국의 차 상인이 창간한 48년 되는 중국어 신문이다. 1920년 3월 3일자였다.
어제 오후 약 500명의 상해 체류 조선인이 영화관에 모여 대회를 열고 조선공화임시정부 성립 한 돌을 기념했다. 그들은 국제가를 높이 부른 다음 조선독립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대회는 질서정연하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간섭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조선인들은 조선국기를 들고 대열을 나누어 시위행진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원들이 3·1운동 1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나보았다. 만년필로 쓴 낯익은 주소와 필체는 윤현진(尹顯振)이 무고함을 알리고 있다.
백산무역의 안희제와 함께 비밀결사 활동을 했다는 윤현진은 지난해 상해로 갔다.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는 알 도리가 없다. 백산무역 대주주의 동생이며 집안이 백산무역과 밀접히 엮여 있는 윤현진은 개인재산의 상당액을 임시정부에 제공했다는 말이 있다. 한림보다 7살 위니까 올해 스물여덟이다.
망명지에서는 사람이 그립고 자금이 아쉽지만 자유는 조국보다 풍부한 듯 보인다. 태극기를 흔들며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자유. 방금 신문철에 보관해 넣은 경성의 신문에는 ‘태극에 신경과민’이라는 글이 있었다.
지난 그믐날 일어난 일이다. 동대문에서 신용산으로 가는 37호 전차 차창에 태극이 그려져 있음을 발견한 경관은 무슨 큰 일이 난 듯이 빨리 쫓아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전차는 돌아가신 이태왕 전하께옵서 합병하기 전 황제로 계실 때에 능(陵) 행사에 타시고자 만드신 전차로 오늘까지 차고(車庫)간 속에 넣어두었든바, 공교롭게 운전수가 무심코 끌고 나온 것으로 판명되어 회사에서는 즉시 곳간(庫間)으로 다시 끌어들여가기로 하고 무사하였다.
폭풍우가 일어날 듯
러시아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베리아에 주둔 중인 일본군들이 일제히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 사할린으로는 함대가 파견되었다. 임시정부의 희망대로 제2의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것인가.
‘동방을 지배하라’―러시아말로 그런 뜻이라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러시아인보다 조선인이 더 많이 산다. 이름하여 해삼위(海參威)다. 그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상해 망명객의 주류를 이루었다. 상해의 조계지로 간 독립지사들은 안전하지만 여전히 해삼위에 사는 조선인들은 전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인 집단 거류지인 신한촌(新韓村)은 뒤숭숭하다는 소식이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이상한 비가 마치 장마 속 같다고 경성 사람들은 야단이다. 전국이 안개구름 속처럼 푹 잠겨 있다. “경성측후소의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빗길에서 돌아온 어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 각지가 함께 일기가 흐리고 세우(細雨)가 거의 끊이지 아니하는 모양을 보건대 그 이유는 일본 북해도와 노령 오츠크 해협에 기압이 한번 높아진 후로 차차 조선 북쪽에까지 널브러져 오게 된바, 한편으로 중국 양자강 유역에는 그와 반대로 옅은 기압이 발생되어 동북 편으로 향하여 흐르려 하나 서남 편으로 널브러져오는 높은 기압과 서로 부딪혀 마침내 조선 전역에 날이 흐리고 비가 오게 된 것이니 앞으로 이삼일은 쉽게 일기가 개일까 싶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황해 일대의 저기압 형세가 만일 광대할 것 같으면 남조선지방에는 암만 해도 폭풍우가 일어날 듯하다.
일기가 하도 오래 궂으니까 모르는 이의 생각에는 비가 매우 많이 온 건가 싶겠지만 실은 날만 흐리고 가는 비만 좀 뿌렸지 우량을 비교해보면 다른 해에 비교하여 도리어 적게 온 셈이다. 즉 측후소가 경성에 생긴 지 14년간 매년 삼월 한 달 동안에 한 평에 대한 우량 평균이 대략 일곱 말 닷 되였는데 금년 삼월 우량은 겨우 서 말 넉 되를 넘지 못한다.
기와를 덧댄 양철지붕 쪽에 빗물이 고이더니 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한다. 신문지에 좋지 않은 습기가 날림으로 개조한 한옥집의 이 칸 저 칸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도 종이 중에는 신문지가 습기에 제일이라고들 한다.
―비도 오는데 떡볶이들 안 먹으려느냐.
어느 간부의 갈라진 목소리가 편집국의 축축한 공기를 갈랐다. 한림은 뒷골목 주점 겸 식당에 주문하러 가는 길에 가마니를 두어 장 구해다 지붕에 덮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비 그치고 나면 지붕부터 손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 나면 일본식 집처럼 처마에 빗물받이를 만들고 홈통도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8, 2001/ 배경식 편역, 백범일지, 너머북스, 2008/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역사비평사, 2001/ 이강훈,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서문당, 1977/ 이정식·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2005/ 유병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이륭양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 4권
|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