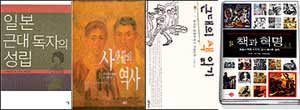
‘책의 사회사’와 한계
‘근대의 책읽기’(천정환 지음, 푸른역사)는 지난해 인문·사회분야 출판의 중요한 흐름으로 꼽힌 우리 근대 탐구의 하나다. 다른 책들이 우선 재미가 없고, 실증과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비해 이 책은 모든 매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출판단체의 추천도서로 고루 선정되었다.
‘한겨레’는 이 책을 지난해 하반기 ‘10권의 책’ 중 한 권으로 뽑으면서 이런 설명을 붙였다. “일제강점기라는 강요된 근대화 시기에 어떤 책들이 들어와 어떻게 읽혔는지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재구성한 ‘책의 사회사’ 연구서다.” 하지만 이 책의 실증이 그리 탄탄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빈곤한 자료로 무리한 추론을 감행해 해석의 과잉을 빚기도 한다. 그럼에도 각종 추천도서의 선정과정에서 이 책의 아쉬운 측면이 지적되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 책의 부족한 면을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한 ‘이 달의 책’ 인문 분야 선정위원들이었다. 제29차 ‘이 달의 책’ 선정회의에서 선정위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승인하는 시각’과 ‘일본의 사례를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 책의 실증과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책이 ‘근대의 책읽기를 해부한다’는 야심찬 기획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이 책은 지은이의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본연의 주제인 ‘한국 근대소설 독자와 소설수용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만한 실증과 다소 과장된 해석이 용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대의 책읽기’에 대한 논의는 다르다. 명백한 근거와 신중한 해석이 요청된다. 표지와 책 등에 인쇄된 부제목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은 원재료와 가공물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출판사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독자의 탄생’ 부분은 버겁게 다가오지만 말이다.
이 책이 탐구하는 근대는 1920년대와 30년대다. 지은이가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책읽기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제도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중반의 약 10년 사이에 발표된 ‘감자’ ‘메밀꽃 필 무렵’ ‘삼대’ 같은 한국문학의 명작소설이 여태껏 읽히는 까닭은 뜬금 없어 보인다. “‘역사’의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여 후손들 모두가 저 소설을 읽게끔 만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소설들이 지금까지 읽히는 것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다.
또 지은이는 문학사에서 정전(正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쟁의 최고봉”이라 이르며 “정전이 되는 텍스트는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자들의 합의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우리의 교수님들에게서 고전에 대한 관념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교수님들도 그들의 교수님들에게서 그 관념을 물려받았다”는 단턴의 설명에 더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국문학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1920년대와 30년대에 집착한다.
그때 정말 그랬을까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내게 더없이 매혹적이었다. 이 책에는 세부적으로 유익한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책의 내용에 몰입하지 못하고 저자의 논리를 삐딱하게 보는 것은 책의 전제가 된 가설을 수긍할 수 없는 탓이다. 지은이는 1920∼30년대의 소설 독자층을 크게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의 세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분은 여러 자료에 나타난 복잡한 ‘구별’을 통해 추론한 결과”임을 내세운다.
하지만 ‘복잡한 구별’의 양상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다만 페이지를 한참 넘기면 ‘근대적 대중독자’와 ‘엘리트적 독자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언급된다. “가장 규모가 큰 ‘근대적 대중독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고등보통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도시 거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엘리트적 독자층’에는 전문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과 문학에 관심을 가진 층이 주로 포함된다.” 결국 ‘근대적 대중독자’와 ‘엘리트적 독자층’을 가르는 기준은 가방끈의 길이인 셈이다.
지은이가 1920∼30년대 책읽기의 양상을 재현하기 위해 내세운 자료 중에는 처음 접하는 것이 꽤 있다. 하지만 그것들로 당시 책읽기의 전모를 밝히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신문의 책광고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무모하다. 같은 책이라도 찍은 책과 팔린 책, 그리고 실제로 읽힌 책의 숫자는 같지 않다. 인쇄된 것보다 더 많이 읽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책이 만들어져 읽히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소용되는 책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발행부수〉판매부수〉독서부수.
이 책에서 1920∼30년대 일반 독자의 독서체험을 짐작케 하는 자료는 ‘동아일보’의 독서 앙케트 3개가 전부다. 그것도 표본의 숫자가 너무 적고 단편적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자료만 갖고서는 1920∼30년대의 누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와 아울러 책에서 드러나는 지은이의 책·출판·독서에 대한 인식의 옅음은 이 책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자책은 물론이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 위의 글 뭉치들도 마땅히 책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지은이의 관점부터 문제가 많다. 게다가 독서의 방식이 소리내어 읽기에서 잠자코 읽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한 대목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지은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해를 살 만한 구석도 있다.
부적절한 인용
“리스먼(D.Riesman)은 ‘고독한 군중’에서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이행’이 영국에서 17∼18세기에 걸쳐 일어난 변화라 명시하며 17세기까지 책읽기란 예외 없이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였다”(115∼116쪽)가 문제의 구절이다.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문예출판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이를 해명할 열쇠는 일본 릿쿄대학 문학부 교수를 지낸 마에다 아이의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이룸)이 쥐고 있다. ‘근대의 책읽기’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이 책에 문제의 구절이 등장한다. 그런데 마에다 아이가 리스먼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전거로 삼은 것은 ‘고독한 군중’이 아니라 ‘구술 전통, 인쇄된 문자, 영상 이미지’ 정도로 옮겨지는 논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지은이가 마에다 아이의 책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로 보인다. 차라리 지은이가 리스먼의 견해를 마에다 아이의 책에서 재인용한 형식을 취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전거로는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보다 ‘사생활의 역사 3’(새물결)가 더 적절하리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리스먼도 이에 대한 성찰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의 구절이 포함된 단락의 끝에 붙어 있는 후주를 보니, ‘사생활의 역사 4’가 참고문헌에 포함돼 있다. 로제 샤르티에가 집필한 묵독에 관한 내용은 ‘사생활의 역사’ 셋째 권에 들어 있다.
한편 지은이가 “하나의 읽을거리를 가족이나 지역·직업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공동체적 독서’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차라리 마에다 아이의 “공동의 독서방식”이라는 표현이 더 나아 보인다.
나는 이 책에 유감이 없다. 오히려 이 책은 내게 지적 자극을 주는 훌륭한 읽을거리였다. 다만 이 책이 세간의 평판만큼 뛰어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은 ‘나쁜 책’을 솎아내는 작업도 신중해야 하지만 ‘좋은 책’을 고르는 일에도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찍힌 ‘나쁜 책’의 낙인을 씻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드리워진 ‘좋은 책’의 후광을 걷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까닭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