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제왕들의 역사와 연대기, 제후국들의 권력 승계 과정, 역대 제도와 문물의 연혁,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전기 등 내용이 방대하다. 2100여 년 전 한나라 무제 때 기록이지만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대목이 많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난항을 겪은 게 인사다. 그중에서도 총리 자리를 놓고 혼란이 컸다. 진통 끝에 2월 말 어렵사리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총리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사기’에 등장한 역대 명재상에게 재상의 길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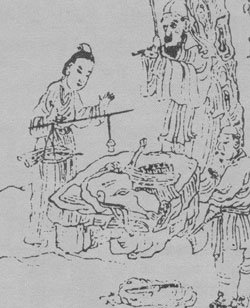
마을 제사에서 진평이 고기를 나누는 광경을 그린 ‘진평분육도’.
진평은 젊어서부터 포부가 대단했다. 한번은 마을 제사에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맡은 적이 있다. 진평은 정말이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기를 나눠줬고,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했다. 여기서 ‘진평이 고기를 나눠준다’는 유명한 고사성어 ‘진평분육(陳平分肉)’이 나왔다.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은 모두 진평을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천하를 나누라고 해도 그렇게 공평하게 잘 나눌 텐데!” 자신은 마을 제사에서 고기나 나누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기도 하고, 천하의 일을 맡겨도 얼마든지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함께 묻어나는 한탄이기도 했다.
“재상 하는 일은 무엇이오?”
진평이 마을 제사에서 고기 나누는 일을 맡은 것을 ‘주재(主宰)’라고 한다. 고기 나누는 일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재상(宰相)이란 단어에서 ‘재(宰)’는 본래 고기를 고루 나눈다는 이 글자 뜻에서 기원한다. 제사에서 고기를 고루 공평하게 잘 나누듯이 나라 일도 그렇게 공평하게 잘 처리하는 자리가 바로 재상이라는 것이다. 다음 글자인 ‘상(相)’은 돕다, 보좌하다는 뜻이다. 합쳐 보자면 제왕을 도와, 또는 보좌해 천하의 일을 주재하는 자리가 바로 재상이다.
꾀돌이 진평은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하자 일등공신의 반열에 올랐고, 소하(蕭何)·조참(曹參)을 거쳐 여태후(呂太后) 때 마침내 자신이 호언장담한 대로 천하의 일을 주재하는 재상(당시 명칭은 승상(丞相)) 자리에 올랐다. 여태후 집권 때는 공신들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심했다. 진평은 여태후의 경계를 풀기 위해 늘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그가 죽자 바로 여씨 세력들을 소탕한 다음 문제(文帝)를 추대해 주발(周勃)과 공동 재상 자리에 앉았다.
문제는 덕정(德政)과 인정(仁政)으로 정국을 안정시켜갔고, 이로써 한나라를 정권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병목 위기에서 구했다. 하루는 문제가 조회석상에서 우승상 주발에게 1년에 형사 사건으로 판결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주발은 당황하며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어 문제는 1년의 재정 수입과 지출 상황을 물었다. 주발은 이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자 문제는 좌승상 진평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진평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건 담당하는 관리가 따로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제가 담당 관리는 누구냐고 묻자 진평은 “폐하께서 형사 사건 판결에 대해 궁금하시면 정위(廷尉)에게 물으시면 되고, 재정이 궁금하시다면 치속내사(治粟內史)에게 물으시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다면 재상이 하는 일은 무엇이오?”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평은 문제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황공하옵니다. 폐하께서 어리석은 신에게 재상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무릇 재상이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며 음양을 다스려 사시(四時)를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는 만물이 제때에 성장하도록 살피며,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와 제후들을 진압하고 어루만지며, 안으로는 백성들을 가까이 따르게 하며, 경대부(卿大夫)로 하여금 그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평의 이 대답에 문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승상 주발은 크게 부끄러워하여 조회에서 물러나온 다음 진평을 원망하며 “그대는 어째서 내게 진작 가르쳐주지 않았소?”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진평은 웃으면서 “그대는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상의 임무를 모르시오? 만약 폐하께서 장안(長安)의 도적 수를 물으셨다면 그대는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였소?”라고 면박을 주었다. 주발은 자신의 능력이 진평에 훨씬 못 미침을 알고는 병을 핑계 삼아 재상의 자리를 내놓았다. 이로써 진평은 유일한 재상이 됐다.
임금보다 부자였던 관중
중국 역사에서 재상에 해당하는 자리가 생긴 이래로 약 80개 왕조에 1000명이 넘는 재상이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 중 재상 본연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한 사람들을 일컬어 명재상이라 하는데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개혁 혁신형 재상으로 전국시대 최고 개혁가로 꼽히는 상앙(商?)을 비롯해 송나라 때 신정(新政)을 주도한 왕안석(王安石), 명나라 때의 개혁 재상 장거정(張居正)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최고 통치자에게 바른말을 잘 하는 직간(直諫)형으로 삼국시대 촉한의 제갈량(諸葛亮), 당나라 태종 때의 위징(魏徵), 청나라 때의 범문정(范文程), 저 멀리 하나라 때의 관용봉(關龍逢), 은나라 때의 비간(比干)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곧은 심지를 지킨 절개형으로 나라가 망했음에도 끝까지 원나라에 투항하기를 거부하다 죽은 남송의 문천상(文天祥), 망한 명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한 육수부(陸秀夫)와 사가법(史可法)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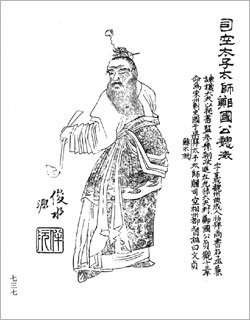
당 태종 때의 명재상 위징(초상화)은 직간의 대명사였다. 그가 죽자 태종은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아주던 거울 하나를 잃었다며 통곡했다.
관중이 남긴 “창고가 넉넉해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衣食足卽知榮辱)”는 명언은 2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관중은 그 자신도 대단히 부유해 임금 환공(桓公)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는 관중의 호화로운 생활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나라 백성 누구도 관중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백성을 모두 부유하게 만드느라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나라에 봉사한 관중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제갈량은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재상이다. 재상으로서 제갈량은 ‘삼공(三公)’으로 대변되는데, 공개(公開), 공평(公平), 공정(公正)이 바로 그것이다. 제갈량은 모든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공개한 이상 공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했으니 공평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법가(法家)사상의 영향을 받아 상벌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하지만 그의 법집행 역시 삼공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됐다. 이 때문에 제갈량이 상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으며, 그가 벌을 내려도 누구 하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궁진력(鞠躬盡力)

제갈량은 재상 중의 재상으로 길이 이름을 남겼다. 말하자면 명재상의 전형(典型)이었다.
제갈량은 또 북벌에 앞서 유선에게 올린 글에서 재산을 공개했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나마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자신은 오로지 촉과 백성들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그가 죽은 뒤 집안을 정리하려고 보니 당초 제갈량 자신이 밝힌 재산에서 한 뼘의 땅도, 한 푼의 돈도 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북벌에 나섰다가 오장원(五丈原)에서 병사했다. 말하자면 과로사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뒷일까지 대비한 다음 촉나라 군대를 철수시켰다. 제갈량의 충정과 청렴 정신은 후손에게도 유전됐다. 아들 제갈첨(諸葛瞻)은 후주(后主) 유선(劉禪)의 딸과 결혼한 부마라는 귀한 신분이었지만 위나라 장수 등애(鄧艾)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고관대작의 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결했다.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諸葛尙)도 면죽관(綿竹關) 전투에서 전사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여 중용하고 소인들을 멀리하여 내친 일, 이것은 바로 전한의 고조·문제·경제·무제 때에 한창 흥성해 잘 다스려졌던 까닭입니다. 소인배를 가까이하여 등용하고 어진 신하들을 멀리하여 내친 일, 이것은 바로 후한의 환제와 영제가 천하를 망하게 한 까닭으로 이를 논하면서 일찍이 환제와 영제를 두고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 중에서
무능한 통치 5가지
1000명이 넘는 역대 재상 중 제갈량같은 명재상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대부분 최고 통치자의 눈치나 보는 복지부동(伏地不動)형이었고, 무능한 재상도 많았다. 또 간신 유형의 재상도 수두룩했다. 송나라 때 황제와 짜고 명장 악비(岳飛)를 모함해서 죽인 것은 물론 금나라에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한 진회(秦檜) 같은 재상은 매국형 재상, 명나라 때 환관으로서 실질적인 재상 노릇을 했던 위충현(魏忠賢)은 공안통치로 백성을 잔인하게 탄압한 잔혹형 재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나라 건륭제 때의 재상 화신(和?)은 탐욕의 화신이었다. 그는 재상으로 있으면서 무지막지한 부정부패로 자신의 배를 불린 탐관오리였다. 가경제가 즉위해 그의 재산을 몰수해 조사해보니 청나라 18년간의 재정과 맞먹었다고 하니 그의 부정축재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다. 그가 죽자 항간에서는 ‘화신이 쓰러지자 가경제가 배불리 먹었다’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춘추시대 진(晉·지금의 산시성 지역)나라에는 음악에 정통한 사광(師曠)이란 악사(樂師)가 있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활동한 사광은 맹인이었다. 그에 얽힌 전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설에서 음악에만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는 설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사광의 귀밝음’을 뜻하는 ‘사광지총(師曠之聰)’이란 고사성어가 나왔다. 또 사광이 천리 밖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순풍이(順風耳)란 단어도 파생됐다. 역사에서는 2500년 넘게 사광을 악성(樂聖)이라 부르며 존중해왔다.
그런데 사광은 단순히 음악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학다식했고 총명했고 또 올곧았다. 이 때문에 수시로 임금의 정책에 자문 노릇을 했고, 어떤 기록에는 그가 재상에 해당하는 태재(太宰) 벼슬에 있었다고도 한다.
한번은 당시 진나라 임금이던 도공(悼公)이 사광에게 눈이 그렇게 어두운데도 어쩌면 그렇게 소리와 음악에 뛰어나냐며 칭찬했다. 그러자 사광은 노기 띤 목소리로 “내 눈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어두운 게 문제”라며 유명한 ‘천하오흑흑(天下五黑黑)’ 논리를 설파했다. 즉, 천하에 다섯 가지 어둡고 어두운 것이 있다는 뜻으로 임금이 통치를 잘못하는 5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줄여서 ‘오흑론(五黑論)’이라고 한다. 사광의 입을 통해 들어보자.
첫째, 군왕이 신하가 뇌물이나 도박·투기 따위로 유명한데 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군왕이 사람을 제대로 바르게 기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군왕이 어진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군왕이 군대를 자주 사용하여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군왕이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광은 백성은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을 맹자(孟子)보다 훨씬 앞서 최초로 주장한 민본주의자이기도 하다. 이런 그였기에 최고통치자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맹인 재상 사광의 오흑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통렬하다 못해 가슴 아프다.
재상은 역사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줄곧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맡아왔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천하의 안위를 한 몸에 짊어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상권(宰相權)의 크기는 정치 판국의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즉, 재상권이 무겁고 크면 국력이 강했고, 그 반대면 국력이 쇠약했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나아가 재상은 최고통치자의 자질을 보완함과 동시에 통치자의 자질을 완성해주는 기능까지 수행했다. 일찍이 상(商)나라 탕(湯) 임금은 이윤(伊尹)이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다섯 번이나 청을 올렸다. 저 유명한 ‘오청이윤(五請伊尹)’이란 고사성어의 출전이다. 이윤은 탕 임금의 정성에 감복해 탕을 보좌해 하(夏)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윤은 나아가 탕 임금에게 요리를 가지고 통치의 이치를 설파했고, 탕 임금은 이윤의 도움으로 훌륭한 명군으로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다.
최근 국무총리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21세기 개명된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총리 후보자의 자격 공방도 답답했거니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가, 통치자가 과연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권력을 부여하는가 등등 모든 점을 다시금 곱씹어보게 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 총리의 현실은 수천 년 전 왕조 체제에서 재상이 가졌던 존재감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닌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하나가 가슴속으로 비수처럼 날아왔다. 역대로 현명한 통치자 밑에 현명한 재상, 즉 성군현상(聖君賢相)은 가능했어도, 못난 제왕 밑에 현명한 재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맹인 재상 사광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는 임금 도공 앞에서 오흑론으로 그를 질타한 것은 물론 끝내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거문고를 그를 향해 내던졌다고 한다(기록에 따라서는 사광이 도공을 거문고로 내리쳤다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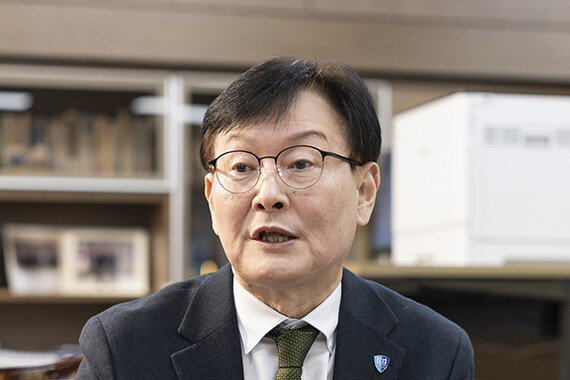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