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 아침 엷게 언 땅 ‘사각사각’ 밟으며 산 정상에 오르니 온통 억새 천지다. 정상인지 평원인지 모를 봉화산에서 중치 지나 백운산까지는 줄곧 오르막. 산 아래 펼쳐진 산죽밭 배경 삼아 해 넘어가고, 하루를 뒤돌아보니 온종일 아무도 없는 산속을 혼자 걸었다.

무룡산 운해.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백두대간 보호는 법률 제정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다. 벌써부터 각 정부부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달리 해석하고 있어 업무조정 단계에서 자칫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백두대간 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 가운데 약 36.8%는 사유림이어서 재산권 분쟁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백두대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한반도 곳곳에서 백두대간의 지형을 변형시키고 있는 각종 위락시설과 채석장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백두대간을 단순한 하이킹 코스 내지는 관광단지 정도로 여기는 우리네 의식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필자는 백두대간의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덕유산의 어느 골짜기에 붙어 있는 문구를 떠올리곤 한다. ‘오지 않았던 것처럼 머물다 가십시오’. 백두대간 보호의 첫걸음은 바로 그렇게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무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진장’. 전라북도 사람들은 동북쪽의 산간지역을 흔히 그렇게 부른다. 무주 진안 장수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무주는 전북에서 경작지 면적이 가장 적고, 진안은 산지의 비율이 80%에 달하며, 장수는 평균 해발고도가 430m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무진장이 ‘전라북도의 지붕’으로 불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12월27일 새벽. 이따금씩 들르던 남원역 근처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시외버스터미널로 발길을 돌려 24시간 김밥집을 찾았다. 순두부찌개에 김밥 한 줄을 추가로 시켜 먹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문득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아저씨의 배낭이 눈에 들어왔다. 필자의 배낭보다 3배는 더 무거울 것 같아 보이는 초대형 배낭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필자는 그에게 한 수 배우고 싶었으나, 그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다. 왠지 그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남원에서 인월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인월에서 택시로 갈아타고 복성이재에 도착했다. 아침 7시40분. 산속이라 그런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첫걸음은 무겁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멀리 지리산 쪽에서 해가 떠올랐고, 몸에서 적당히 땀이 배어나면서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땅속의 물기가 지면을 밀어올려 흙 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에 엷은 얼음이 들어선 탓이다.
아침 9시10분. 봉화산(920m)에 올랐다.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번암면에 걸쳐 있는 이 산은 철쭉이 곱기로 유명하다. 타지역 사람들은 인근의 바래봉 철쭉을 더 높이 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봉화산 철쭉이 바래봉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한다. 봉화산의 또 다른 명물은 억새다. 봉화산 정상 언저리에는 키가 2m를 넘는 억새가 거대한 평원을 이루고 있는데, 늦가을에 찾아가면 제대로 취할 수 있다.
월경봉에서 중치(중재)로 가는 길은 얕은 구릉을 오르내리는 편안한 코스다. 중치 표지판 앞의 너럭바위에 앉아 남원에서 사온 김밥으로 점심을 때웠다. 필자가 “백두대간을 간다”고 하자, 김밥집 아주머니는 “탈이 나면 큰일”이라며 은박지로 겹겹이 싸서 비닐봉투에 넣어주셨다. 덕분에 산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온종일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중치에서 백운산으로 가는 길은 고단했다. 어지간한 산이면 오르내림이 반복되게 마련인데, 백운산은 줄곧 오르막이다. 중치를 출발할 때만 해도 눈앞에 백운산 정상이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묻히는 느낌이었다. 눈 쌓인 응달을 통과하면서는 몇 번이나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백운산은 과연 지리산과 덕유산을 연결할 만한 준봉이었고, 해방 전후의 빨치산들이 주요 근거지로 활용할 만한 심산이었다.
가쁜 숨을 토해내고 정상에 오르자 가장 먼저 까마귀떼가 맞아준다. 수십 마리가 산 정상 주위를 떼지어 선회하고 있었다. 한국에선 ‘흉조’로 알려져 있는 까마귀지만 산꼭대기에서 만나서일까, 그리 싫지가 않았다. 더욱이 까마귀떼가 날아다니다 잠시 머무는 곳을 바라보면 반드시 멋진 조망이 펼쳐졌다. 필자는 책을 펴들고 봉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동쪽으로 기백산, 북쪽으로 덕유산, 서쪽으로 팔공산, 남쪽으로 지리산…. 이제서야 사람들이 백운산을 명산으로 꼽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빠른 속도로 기울던 해가 산 너머로 숨자 먼 산부터 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붉은색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검은색으로 변할 무렵 겨울 하늘에 초생달이 떴다. 이젠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간이다. 필자는 달빛에 의지해 무령고개를 따라 영취산을 내려왔다.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이래 처음으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다.
‘무진장’ 중에서도 장수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 한복판에 바로 논개가 있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 선생은 불꽃처럼 살다 간 논개를 이렇게 노래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기왕지사 장수 땅으로 들어온 이상 논개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지날 수는 없는 노릇. 필자는 아침 일찍 택시기사에게 “논개가 태어난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주논개님 생가를 찾으십니까?”라며 필자의 무례함을 꼬집고 나서, 논개의 삶과 죽음을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냈다. 그는 “장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압니다”라면서도, “사람들이 진주 남강의 촉석루 때문에 주논개님을 진주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계에서는 논개의 실제 출생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장수 사람들은 논개가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 주장에 따르자면 논개의 생가는 1986년 대곡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수몰돼 이후 인근지역에 새롭게 복원한 것이고, 현재의 생가터는 논개의 할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하던 곳이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논개의 무덤에 얽힌 야사다. 진주성 싸움이 끝난 뒤 논개의 시신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남 함양 땅에 묻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씨 문중이 왜병의 추격을 두려워했다는 설과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아무튼 논개의 묘는 순절한 지 382년 만인 1975년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어떤 향토사학자는 “논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적 사실이야 어떻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논개의 정신이 어찌 변질될 수 있을 것인가? 논개가 어디서 태어났든, 또 어디에 묻혔든, 논개의 생가에 들어선 바에야 그의 아름다운 영혼에 빠져볼 일이다. 필자는 논개 생가 입구에 새겨져 있는 만해 한용운의 시 ‘논개의 애인 되야서’를 읽으며 한동안 감상에 젖었다.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깃대봉의 점심식사
아침 9시, 영취산 정상에서 깃대봉을 향해 산행을 시작했다. 군데군데 쉬어갈 만한 바위도 많고 굴곡이 없는 능선이어서 성큼성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이쯤에서 사람 구경을 했으면 했는데, 여전히 인적은 찾을 수 없었다. 멀리서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지만, 정작 벌목공은 보이지 않았다.
영취산과 깃대봉 중간 지점 북바위는 전망이 뛰어난 곳이다. 서쪽으로 대곡호수와 논개 생가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경남 함양군 서상면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필자는 북바위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왼쪽은 논개의 고향이요, 오른쪽은 논개의 무덤이라…. 경남 함양군 서상면에 살던 논개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북바위를 지나 논계의 생가 쪽으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니, 북바위 밑을 뚫고 지나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무상하게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어렵잖게 깃대봉(1014.8m)에 도착했다. 화창한 날씨 탓에 북편의 장수덕유산과 남덕유산이 훤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내일이면 저 장쾌한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에 두근거렸다. 필자는 큰 산에 들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일찌감치 육십령 쪽으로 내려섰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뜻대로만 될 것인가. 필자는 깃대봉 아래 헬기장을 지나다가 진주에서 온 등산객들과 어울려 나른한 오후를 보냈다. 겨우 라면 한 봉지를 보태고, 대신 맛깔스런 반찬을 푸짐하게 얻어먹었으니 이만하면 빚을 져도 단단히 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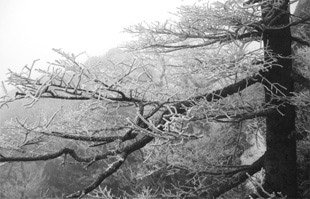
눈꽃이 핀 장수덕유산 상고대.
서상터미널에서 2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 저녁 늦게 육십령휴게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필자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틀 전 남원의 김밥집에서 마주친 아저씨를 다시 만난 것이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리산에서부터 백두대간 연속종주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필자는 아껴두었던 포도주를 따르며 고수의 특강을 경청했고, 그는 맥주로 답례하며 우리의 재회를 자축했다. 백두대간을 세 번째 종주하고 전국의 웬만한 명산은 다 올랐다는 그는 백두대간 구석구석을 손금 보듯 했다. 필자는 그를 기꺼이 ‘송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상처 입은 백두대간
육십령. 이곳은 예부터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예전에는 이 고개에 도적들이 많아 60명 이상 떼를 지어야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서 육십령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지금도 안의와 장계를 연결하는 26번 국도가 육십령 고개를 지나는데, 이 지역은 특히 난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20여년째 육십령휴게소를 지키고 있는 조정자 할머니(64)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굴이 눈에 익으면 공짜로도 재워준다는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드물지만 육십령으로 신혼여행을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12월30일 아침 일찍 육십령휴게소를 나섰다. 송선생이 앞서 걷고 필자는 뒤를 따랐다. 30분쯤 갔을까. 새벽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들려왔다. 인근 채석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쉴새없이 트럭이 드나들며 돌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채석장은 흉측한 모양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지도의 모양도 바꾸어야 할 판이란 생각이 들었다. 채석장이 백두대간의 마루금에서 살짝 비켜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남쪽에서 덕유산을 오르려면 먼저 할미봉을 통과해야 한다. 이곳은 덕유산 전구간에서 가장 까다로운 코스로 알려져 있다. 송선생은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고, 필자는 숨도 고를 겸해서 할미봉 턱밑에 있는 ‘대포바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군이 전주성을 공략하기 위해 육십령을 넘어왔다가 어마어마한 대포를 보고 놀라 달아나서 호남지방이 화를 면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드디어 공포의 할미봉 내리막길. 로프가 매달려 있지만, 올이 헝클어져 있어 그냥 매달리기엔 불안했다. 그래서 힘을 반쯤만 주고 내려가려니 눈길이 미끄러워 위태로웠다. 할 수 없이 배낭을 먼저 떨어뜨리고 네 발로 기어서 겨우 내려설 수 있었다. 멀리 송선생이 봉우리를 두 개쯤 넘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어떻게 저리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싶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만 강하게 불더니 구름이 앞을 가리고 간간이 눈보라까지 날렸다. 필자가 걱정됐던지 송선생은 덕유산교육원 삼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구름 속을 가는 기분으로 덕유산 자락을 걸었다. 똑같은 산이지만 북벽과 남벽은 천양지차였다. 북벽엔 백색의 상고대가 절경을 이루었지만, 남벽엔 가을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우리는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겨울에서 가을로 넘나들며 덕유산에 빠져들었다.
장수덕유산(1510m)에는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면 이곳에서 덕유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겠지만, 짙은 구름과 눈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남덕유산 정상의 일기는 장수덕유산보다 더 불순했다. 바람은 더 세졌고 시야도 갈수록 좁아졌다. 우리는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내공의 차이는 컸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산은 보일 때 걸어야 제 맛이다.’
“왜 산을 타세요?”
월성치에서 삿갓봉으로 가는 길은 달력 속의 그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늑하다. 흔히 등산객들이 여기까지 오면 피로를 핑계삼아 삿갓봉(1418m)을 우회하곤 한다. 하지만 송선생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지나야 한다며 삿갓봉으로 코스를 잡았고, 삿갓봉 정상을 밟고 나서야 비로소 배낭을 풀고 긴 휴식을 취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아주 평범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왜 산을 타세요?” 그의 대답이 곧 그의 내공을 말해주었다.
“저도 때로는 왜 이 짓을 하나 싶어요. 아마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내 돈 쓰면서 하니까 기분 좋게 하는 거죠. 하루종일 걷다가 저녁이 되면 ‘아, 내가 오늘은 이만큼 걸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 때문에 걷는 것 같아요.”
삿갓봉에서 내려서자 삿갓재대피소가 보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수도가 터졌다고 걱정이었지만, 산중에서 하룻밤 쉬어가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송선생과 누룽지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에 잠이 깼다. 대피소 밖으로 나가보니, 어느새 구름이 모두 걷히고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내일은 기분 좋은 산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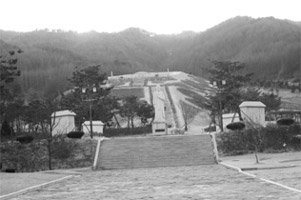
논개 생가 복원 터.
삿갓재에서 40여분쯤 걸어서 무룡산에 올랐다. 우리는 무룡산 정상에서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받았다. 동서로 드넓게 운해가 펼쳐졌고, 남북으로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훤하게 열렸다.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덕유산 정상(향적봉·1614m)이 손에 잡힐 듯 다가서는가 하면, 멀리 가야산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덕유산(德裕山)’의 한자를 풀어보면 ‘크고 넉넉한 산이라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환란을 겪을 때마다 백성들이 이 산으로 숨어들면 적군이 찾지 못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전북 무주와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에 걸쳐 있는 덕유산은 남북으로 30km에 이르고 1000m가 넘는 봉우리만도 20개를 거느리고 있으니 실로 엄청난 규모다.
필자는 어제 무리하게 야간산행을 강행하지 않고 삿갓재대피소에서 묵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악천후를 뚫고 밀어붙였다면 목표지점까지 도달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침 덕유산의 그 비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산했을 것이다.
무룡산에서 동엽령까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앞쪽으로 향적봉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라 상쾌하고, 대간의 좌우를 바라보는 느낌도 시원하다. 동엽령에서 왼쪽으로 하산하면 도중에 칠연계곡이 나타나는데, 이곳은 구한말 전북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신명선이 왜군과 격전을 치르다가 부하 150명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다. 뒷날 주민들이 의병들의 시신을 수습해 안성면 공정리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칠연의총이다.
동엽령에서 백암산에 올라 송계삼거리에 이르면 백두대간은 덕유산 정상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을 튼다. 여기서부터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덕유산 자락을 빠져나가는 코스다. 지봉과 대봉을 지나 갈미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신풍령 가까이에 있는 아담한 오솔길과 시원한 소나무 숲은 산행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나흘 동안 걸어서 빼재까지 왔다. 무주와 거창을 잇는 727번 도로 위에 내려섰을 때, 송선생은 필자를 1시간 동안 기다렸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필자도 제법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는 나보다 훨씬 무거운 배낭을 지고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는 역시 체급이 다른 선수였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 됐다. 우리는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전을 기원했다. 송선생과 동행한 것은 불과 이틀이었지만, 필자는 아주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스키족과 등산객의 분기점 무주
무주리조트와 무주구천동은 백두대간 마루금과 무관하다. 하지만 덕유산을 통과하면서 이곳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필자의 어머니가 오래 전부터 무주구천동에 가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2004년 1월4일 새해 첫 일요일을 맞아 무주리조트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곳에서 덕유산 정상까지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산 타는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이겠지만, 곤돌라를 타고 10여분 올라가서 다시 10분 정도 걸으면 손쉽게 향적봉에 닿을 수 있다. 향적봉에서 50m쯤 내려가면 향적봉산장이 있다. 무주리조트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이 요긴한 대피소였지만, 지금은 투숙객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 향적봉산장은 리조트에 놀러온 사람과 덕유산 등산객을 가르는 심리적 분기점이기도 하다. 곤돌라 타고 놀러온 사람들은 대개 이쯤에서 돌아가고, 등산객 역시 리조트 쪽으로는 애써 눈길을 거둔다. 아주 묘한 일이다. 스키족들은 힘겹게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향해 “추운데 무슨 고생이야”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등산객들은 리조트 쪽을 바라보며 “저 놈의 스키장이 산을 다 망가뜨린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일단 향적봉에 올랐다면 중봉까지 가볼 일이다. 향적봉에서 중봉에 이르는 지역엔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아고산 식생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능선 주변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 군락지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중봉에 올라서야만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향적봉에서 무주구천동으로 내려가는 길의 중간쯤에 조선시대 선승들이 머물렀던 백련사가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모두 196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백련사에서 구천동 관광단지까지는 약 6km 정도인데 넓고 평탄한 길이라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빛을 발하는 이 코스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무주구천동 제1경(나제통문)부터 제33경(향적봉)까지 하나씩 밟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