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이희옥 지음/ 창비/ 316쪽/ 1만3000원
저자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에 사회주의 이념의 변화가 있음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변화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중국, 국내외로 무수히 쏟아지는 연구성과를 따라잡기에도 바쁜 일상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종종 이런 문제의식을 잃기 쉽다. 그러나 진정 ‘한국적 중국담론 형성’을 꿈꾸는 학자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화두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개혁 이전과 개혁 초기 중국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먼저 중국혁명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의 전통적 이념과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마오쩌둥〔毛澤東〕 사상)’로 변화하는 것을 검토했다(2장). 이어 개혁 초기 마오쩌둥 사상과 유산을 극복하고 개혁의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 벌어졌던 이념논쟁을 살펴보았다(3장).
둘째, 4장과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다뤘다. 덩샤오핑의 개혁이론은 1987년 제13차 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으로 변화한다. 간단히 말해 여기서는 중국 개혁사회주의 이론이 어떤 논쟁과 어려움을 겪으며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1990년대 들어 나타난 중국의 이념적 분화, 즉 자유주의·보수주의·신좌파의 핵심주장을 비교 검토했다. 이와 함께 장쩌민(江澤民)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중국 지도자들의 ‘삼개대표이론(三個代表理論)’을 살펴보고(6장), 중국 사회주의의 성격과 중국 민주화 문제 등을 분석하면서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제7장).
넷째, 저자는 ‘우리식의 비판적인 중국 연구’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위에서 ‘한국적 중국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중국은 없다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은 우리가 개혁시기 중국 문제를 분석할 때 간과하기 쉬운 이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여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보았을 때 이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또 좀더 깊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회다. 중국 사회주의 이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국 연구에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개혁시기 중국 사회주의 이념을 ‘통시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현재는 없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개혁사회주의 이념은 과거 중국의 전통사상,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 및 유산과 끊임없이 대결하며 변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통시적 분석 없이 개혁사회주의 이념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중국 역사와 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기초로 이를 잘 소화했다.
이밖에도 저자는 중국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담론’의 빈곤이다. 세부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매달리다 보니 중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때로 ‘전문가 바보’가 되기도 하고, 막상 현재의 중국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문제에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실을 쪼개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 연구도 마찬가지다. 지역 연구로 중국을 분석할 때는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세부 문제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과 이것을 종합하여 전체를 이해하려는 학제적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특정분과 학문의 시각에서 중국의 한정된 문제만을 고립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 학제간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물론 이 책에도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이념(사상) 연구에 내재하는 ‘이념과 현실의 긴장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은 처음부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이념적 도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도 그랬고 개혁 시기에도 그랬다.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적 성격을 비교적 쉽게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민족해방)를 반영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문제와의 긴밀한 결합 없이 이념적 논리에만 치중해 분석한다면 자칫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삼개대표이론’ 등 중국의 개혁사회주의 이념은 크게 두 가지 현실, 즉 개혁노선을 둘러싼 공산당 지도부의 노선투쟁(일부는 권력투쟁)과 정치적·경제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속에서 변화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분석과 재해석은 이런 현실을 일부 반영하지만 모두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선투쟁 및 현실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에 좀더 다가갔어야 했다. 또 그것이 개혁사회주의와 갖는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 이론에서 나타나는 절충과 일관성 부족 등은 보수파와 대립하고 타협해야 했던 중국의 현실을 분석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法制) 건설’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 등의 주요 개념, 촌민위원회의 민주선거, 의회제도 강화, 향장(鄕長) 및 현장(縣長) 등 국가 수장 직선제 시험 실시, 당내 운영 개혁의 실험 등 중국 전역에 걸쳐 실시됐던 여러 가지 정치적 실험은 개혁사회주의 이념의 변화와 함께 시도된 것이고, 개혁사회주의의 변화는 이것을 포괄하고 있다. 당연히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념의 변화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이념(사상)을 연구할 때에는 그것이 갖는 현실적인 타당성과 영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개혁사회주의 이념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혁시기 실제적 의미를 갖는 다른 경향들, 즉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과 민족주의 이념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도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개혁 시기에 ‘경제발전 지상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념을 폐기하는 대신, 알맹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공동화(hollowing-out)’ 전략을 채택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 명제는 그 결과물이다. 동시에 개혁사회주의 이념은 초기 개혁·개방 방침을 확정한 다음에는 국가정책을 지도하는 역할 대신,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개혁 초기부터 근대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제 개혁과정에 이를 적극 도입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 논쟁은 이에 대한 학문적 검토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공산당의 개혁방침과 통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주요 이론적 근거를 여기에서 찾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적 중요성은 상당히 축소됐다.
사실 민족주의 이념도 발전국가론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일 뿐이다. 즉 민족주의는 발전국가 모델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제발전지상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념적으로 이끌고 정당화한 발전국가론과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은 사회주의 이념의 변화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개혁 시기 사회주의 이념이 갖는 현실적 의미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지적에도 이 책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읽어야 할 진지하고 유익한 연구서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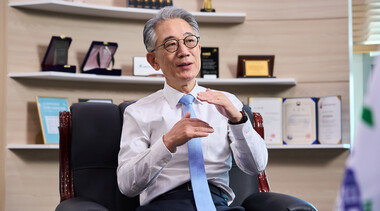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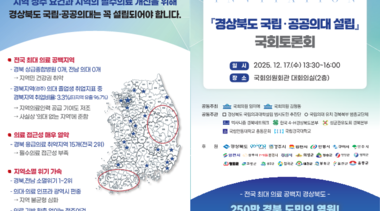

![[전쟁이 남긴 빈자리②] 혼자 아닌 ‘연대’로... 요르단 난민들의 회복 공동체](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3f/d5/4a/693fd54a1f36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