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유독 한국만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한다. 서양인들은 이런 사실에 놀란다. 닮은 듯 보이는 세 나라가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숟가락이다. 거친 탄수화물을 잘 먹으려면 국물이 필요했고, 밥과 국물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데는 숟가락보다 좋은 것이 없었다. 손잡이 달린 개인용 접시와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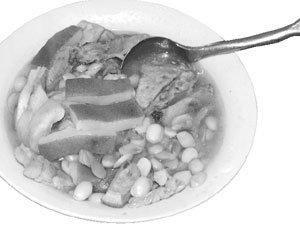
지금도 고기를 옮길 때 사용하는 국자형 숟가락.
닮았지만 다른 문화
나 역시 이 문제로 거의 15년 이상을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 헤맸다. 2003년에는 제주문화방송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이 문제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답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일본 민족학자들은 한국인의 숟가락 사용이 중국 고대문화를 배우려고 했던 조선 사대부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고대 주나라 때의 관습을 문헌을 통해 배웠고,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사용해 식사를 한다고 그들은 설명한다.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생활 습관마저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내 일부 학자들은 한국음식에는 국물음식이 많고, 이로 인해 숟가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숟가락의 용도가 반드시 국물음식을 먹는 데만 있지 않고, 곡물인 밥을 먹는 데도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다른 민족의 음식에도 국물음식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지를 물으면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서양인은 주로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젓가락에 주목하는 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음식문화의 특징으로 젓가락을 꼽는다. 그런데 한국인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 식사를 한다고 하면 놀란다. 그들이 한국의 숟가락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최근이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음식이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면서 비로소 숟가락에 대해 알게 됐다.

고려시대 국자 수저. 국립청주박물관
연암 선생의 황당한 경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 1805) 선생이 청나라 고종(高宗)의 칠순잔치에 참석하는 사신을 따라 지금의 선양(瀋陽)인 성경(盛京)에 도착한 것이 1780년(정조4) 음력 7월 중순이었다. 만주인에 의해 설립된 청나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연암 선생은 심양에서 쑤저우(蘇州) 사람인 54세의 한족 선비 혹정(鵠汀), 왕민호(王民?)와 그의 친구인 지정(志亭) ,학성(?成)을 만나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필담(筆談)으로 소통했다. 왕민호는 연암이 기하학에 능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해 한탄스럽다는 데 공감한다. 얼마 안 돼 밥상이 들어온다. 연암은 밥상 차린 순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과실과 나물이 먼저 오르고 다음에 떡, 그 다음에는 볶은 돼지고기와 지진 달걀 등이 오르고, 밥은 가장 뒤에 올랐다. 하얀 쌀로 지은 밥과 양곱창으로 끓인 국도 올랐다. 중국 음식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숟가락은 없었으며, 권하거니 받거니 하며 작은 잔으로 기쁨을 나눈다. 우리나라처럼 긴 숟가락으로 밥을 둥글둥글 뭉쳐 한꺼번에 배를 채우고 끝내지 않는다. 가끔 작은 국자로 국물을 떴을 뿐이다. 국자는 마치 숟가락과 비슷하면서도 자루가 없어서 술잔 같기도 하다. 또 발이 없어서 모양은 연꽃의 한 쪽과 닮았다. 나는 국자를 집어서 한 공기 밥을 떠보려 하였으나, 그 밑이 깊어서 먹을 수 없기에, “빨리 월왕(越王)을 불러오시오”라며 무심코 웃었다. 이에 학성이 나더러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월왕의 생김새가 목이 죽 길고 입부리가 까마귀처럼 길었답니다.” 하였더니, 학성은 왕민호의 팔을 잡고 웃느라 입에 들었던 밥알이 튀어나오며 재채기를 수없이 한다. 학성은 이내 “귀국 풍속에는 밥을 뜰 때에 무엇을 쓰십니까?” 하고 물어 “숟가락을 쓴답니다” 했다. 이에 학성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는다. 나는 “작은 가지〔茄子〕의 잎 같습니다” 하고 곧장 탁자 위에다 그려 보였다. 이에 둘은 배꼽을 움켜쥐고 졸도하듯이 웃는다.
이어서 학성은 “어떻게 생긴 물건이기에 가지의 이파리 모양인 숟가락이, 저 밥 속에 구멍을 뚫었을까” 하고 시를 지어 읊조렸다. 이에 왕민호가 대응하여 “많고 적은 영웅의 손이, 마치 한나라의 장량(張良)처럼 임금에게 젓가락을 빌린다고 바빴으랴” 한다. 이에 연암이 “기장밥은 젓가락으로 먹지 않고 남과 함께 먹을 때는 손을 국물에 적시지 않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들어와서 숟가락을 구경하지 못하겠으니, 옛 사람들이 기장밥 자실 때 손으로 뭉쳐서 잡수셨던가요” 하였다. 왕민호가 “숟가락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기장밥이고 쌀밥이고 젓가락을 쓰는 것이 관습으로 굳었답니다. 아침에 배우면 습관이 된다는 말도 옛말이라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고 답했다. 즉 예전에는 숟가락을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다.
나는 연암 선생이 ‘열하일기(熱河日記)’의 ‘혹정필담(鵠汀筆談)’에 적어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에피소드로 넘기지 않는다. 송나라 때 주희가 정리한 책으로 알려진 ‘가례(家禮)’에도 조상의 제사에는 반드시 밥 옆에 ‘시저(匙·#55173;)’를 놓도록 그림으로 표시해두었다. 여기에서 ‘시저’는 바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리킨다. 그런데 연암 선생의 말처럼 중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밥상에서 숟가락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오쯔(勺子)’를 주세요?
1993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간 나는 볶음밥을 한 그릇 시켰다. 큰 대접에 수북이 담긴 볶음밥의 향기는 그야말로 감미로웠다. 그런데 이 볶음밥과 함께 제공된 도구는 나무젓가락뿐이었다. 잠시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숟가락의 중국어인 ‘사오쯔(勺子)’를 떠올렸다. 웨이트리스에게 갖다달라고 부탁을 했다. 손잡이는 짧고 입이 움푹 파인 ‘사오쯔’가 나왔다. 이것으로 볶음밥을 꾹꾹 눌러 둥글둥글하게 뭉쳤다. 그렇게 몇 번을 먹고 난 후 입속에서 무엇인가 단단한 게 씹히는 감촉에 놀랐다. 돌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가 젓가락으로 먹어야 그런 불순물도 골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사오쯔’는 밥을 먹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중국의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을 찾아보면, ‘사오(勺)’는 어떤 것을 떠낼 때 사용하는 기구로 자루가 있으며, 고대에는 주로 술 단지에서 술을 떠낼 때 사용했다고 돼 있다. 그러니 이 ‘사오쯔’를 한국어로 옮기면 국자가 된다. 앞의 연암 선생이 밥을 먹으려고 시도했던 ‘사오쯔’ 역시 작은 국자였다.

1. 중국 명대 상아 젓가락. 2. 조선 후기 수저. 3. 한정식 유기 수저.
이런 도구는 무엇에 사용됐을까? 신석기 시대 황하유역에서 재배됐던 주요 농작물은 좁쌀(粟)이었다. 조는 낟알곡식으로 이것을 갈돌에 갈아서 가루를 낸 후 토기에 넣고 물에 반죽해 익혀 먹었다. 이렇게 익힌 음식은 죽과 떡의 중간 상태였다. 만약 뜨거운 상태라면 맨손으로 먹기는 쉽지 않다. 당시엔 오늘날의 스푼처럼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도 없었다. 그래서 발명된 도구가 바로 중국 화북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편평한 형태의 ‘비’였다. 이에 비해 쌀을 주식으로 먹던 지금의 창장(長江) 이남에 살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주걱 모양으로 생긴 도구로 밥을 먹었다. 좁쌀에 비해 좀더 차진 멥쌀을 쪄서 먹는 데는 주걱과 닮은 도구가 효과적이었다.
이들과 달리 가운데가 약간 파인 도구도 발견됐다. 이것은 춘추·전국시대인 동주(東周) 때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두 청동기로 만들어졌다. 특히 청동기로 만든 솥인 정(鼎)이 있는 곳에선 이 청동비(靑銅匕)가 반드시 나왔다. 그 크기도 작은 것은 10cm 이내, 큰 것은 57cm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엇에 사용된 것일까?
당시의 각종 의례를 적은 책인 ‘의례(儀禮)’에는 반비(飯匕)·도비(挑匕)·생비(牲匕)·소비(疏匕)의 네 가지 이름이 붙은 비(匕)란 도구가 나온다. 한자로 미루어 반비는 밥을 먹을 때 사용한 숟가락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슨 용도였는지 알기 어렵다. 중국의 음식고고학자 왕런샹(王仁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도비·생비·소비는 모두 큰 국자로 제사와 접객 때 솥에서 고기를 꺼내는 데 사용됐다. 국자의 입이 많이 굽어 있는 것은 고기를 잘 건져내기 위해서다. 반비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밥을 먹을 때 사용했다.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 주나라 의례제도가 붕괴되면서 큰 비는 점차 소실됐다. 그 대신 작은 비는 실용적으로 개량되면서 널리 쓰였다.”
주나라 때 귀족들의 연회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물에 재료를 넣고 끓인 ‘갱(羹)’이었다. 갱에는 고기·채소·열매 등의 건더기가 많이 들어갔다. 이 ‘갱’ 속에 들어 있는 건더기를 꺼낼 때 각종 국자형 숟가락이 필요했다. 나는 도비가 향신료로 쓰이던 열매를, 생비는 고기를, 소비는 채소를 건져낼 때 사용했던 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나라는 청동기로 인해 망하고 만다.
당시 주된 식기였던 청동기에 녹이 슬면서 그것을 사용해 술이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점차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특히 청동기를 사용하는 계층은 왕과 귀족들이었다. 주나라의 멸망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논거 중에서도 이 점은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주목하는 점이다. 주나라의 멸망은 결국 대형 청동기 식기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큰 국자 혹은 주걱형 숟가락도 사라졌다. 반면에 소형의 청동기 그릇과 반비는 적어도 한나라 이후까지 사용됐다.
일본도 사용했던 숟가락

중국 국자형 숟가락.

고대 일본 국자.
나는 앞에서 중원의 숟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주로 왕이나 귀족의 식사 도구로 사용됐음을 밝혔다. 사실 주나라 때 기록으로 알려진 ‘주례(周禮)’라는 책에는 천자에서 공경대부에 이르기까지 공식 연회에서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청동기 식기는 각각의 계급에 맞추어 그 크기와 가짓수가 정해져 있었다. 가령 1978년 초여름, 후베이(湖北)성 쑤이저우(隨州)시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초기의 무덤에서는 무려 10t에 달하는 청동기 그릇이 나왔다. 이후 제후국인 증국(曾國) 군주인 쩡허우이(曾侯乙)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유적지에서 청동 솥인 동정(銅鼎)이 20개나 나왔다. 당연히 식사 때 사용하는 숟가락과 국자도 나왔다.
곧 구정팔궤(九鼎八·#54451;)의 예기(禮器)가 세트를 이루고 있었다. 원래 이러한 세트는 주나라의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하지만 지방 군주들도 경제 사정이 좋을 경우, 천자를 흉내 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식기를 통한 권력의 표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6~7세기 한반도와 일본에서 사용된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이 왕이나 귀족들의 특권을 드러내는 도구였음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주산(慶州産) 나라(奈良)의 청동기 숟가락과 젓가락도 이런 범주에 드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 나라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백제의 무령왕릉에서도 이와 비슷한 숟가락과 젓가락이 세트로 나왔으니 청동기 숟가락과 젓가락은 지배자의 상징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라시대의 왕이나 귀족들이 일상에서는 청동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 관리를 맞이하거나 공식 연회가 있을 때만 식사 도구로 사용했다. 평소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만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데 익숙해 있던 그들은, 연회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요사이 한국인들이 포크와 나이프에 대해 가진 생각을 당시 나라에 살던 지배층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습관은 적어도 12세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초에 대신인 후지와라 요리나가(藤原賴長)가 베푼 대향연을 그린 그림에서도 자수로 짠 받침대에 한 벌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떤 자료에서도 숟가락을 젓가락과 함께 사용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본 학자들은 숟가락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음식문화 연구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알려진 이시케 나오미치(石毛直道) 선생은 야요이(彌生) 시대부터 일본에서는 찰기가 있는 쌀을 재배했기 때문에 굳이 숟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에 음식을 차려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젓가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을 가능성도 크다. 즉 지배층이나 일반 서민이나 6~7세기 이전에는 모두 식기를 바닥에 놓고 식사를 했다. 그러니 식기를 손에 들고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명나라에 들어와 숟가락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민족학자 슈닷세이(周達生)는 다음의 주장을 펼친다.
중원의 반비(飯匕)는 왜 사라졌나
“송나라에서 원나라에 이르는 시기에는 적어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華北) 지역 사람들은 조로 만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했다. 그런데 명나라에 들어와 창장(長江) 이남에서 재배되던 멥쌀이 화북지역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다. 멥쌀로 지은 밥은 이전의 잡곡밥에 비해 차졌다. 그래서 숟가락보다 젓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편했다.”
이 주장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던 반비가 사라진 이유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이유만을 밝혔을 뿐이다. 나는 숟가락이 지닌 기능에 주목한 이러한 주장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숟가락은 작은 그릇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숟가락의 움푹 파인 입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조선왕조 중기까지,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기까지 사용됐다. 숟가락의 입이 바로 또 다른 이동용 그릇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숟가락은 밥그릇이 좀 멀리 있어 음식을 입에 넣기가 불편할 경우에 사용됐을 수 있다.
적어도 당나라 초기 이전까지 중원에서는 식사를 할 때 식탁이 없었다. 공자나 진시황도 도마와 같은 낮은 상에 식기를 놓고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식기는 후한(後漢) 이전까지 대부분 무거운 청동기였다. 여기에 음식을 담으면 더 무겁다. 또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던 당시 사람들에게 식기를 들고 식사를 하는 방법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찰기가 없는 조나 수수로 지은 밥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젓가락을 사용해 입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반비’라고 불리는 숟가락이 필요했다.

상하이 젓가락박물관에 소장된 원대 이동용 식기.
후한 때 칠기가 유행하면서 식기를 들고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밥의 주재료는 여전히 조나 수수였다. 중국 남방에서 주식으로 먹던 멥쌀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인디카(Indica) 계통의 남방미였기에 숟가락은 필수였다. 그러다가 당나라 중기에 들어와 오랑캐의 풍속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식탁이 보편화됐고 더욱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수받은 서아시아의 유약처리 기술이 도입되면서 중원에서도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도자기로 만든 큰 대접은 여러 가지 음식을 상에 펼쳐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결국 칠기는 잠시 유행으로 멈추고 도자기가 식기의 주인이 됐다.
가벼워진 젓가락
그렇다고 숟가락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은 밥을 먹는 데 쓰였다. 도자기로 숟가락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어렵게 만들어놓아도 곧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나라 이후 더욱 가볍고 튼튼한 도자기가 개발됐다. 도자기로 만든 숟가락보다는 가벼운 젓가락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숟가락은 이전의 습관처럼 밥을 먹을 때도 여전히 필요했다. 하지만 북송에서 남송으로, 그리고 원나라로 옮겨가는 약 100년의 짧은 시간에 왕조가 망하고 흥하면서 기름을 이용한 음식조리가 이동이나 보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됐다. 더욱이 기름으로 코팅을 한 음식은 쉽게 부패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면을 먹을 때는 젓가락이 필수.
밥과 국물을 먹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던 반비 숟가락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편리함은 종종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다. 연암 선생의 표현처럼 별도의 일품음식으로 나온 탕을 별도의 그릇에 떠서 옮길 때 작은 국자형 숟가락이 사용됐을 뿐 밥을 먹는 숟가락은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말았다.
반비 숟가락의 쇠퇴는 역으로 젓가락의 발달을 가져왔다. 현대 중국어로 젓가락은 ‘콰이쯔(?子)’다. 고대 중국어로는 ‘주(箸)’다. 청나라 때 사람 조익(趙翼)은 ‘해여총고(?餘叢考)’란 책에서 “주(箸)의 속칭으로 콰이쯔(快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명나라의 육용(陸容)이 쓴 ‘숙원잡기(菽園雜記)’에 나온다. 즉 장쑤성(江蘇省) 사람들이 주(箸)를 잘못 옮겨 주(住)로 써서 이를 바로 잡으려 주(箸) 대신 ‘콰이어(快兒)’라는 말을 쓴다”고 했다. 명나라 때 남방에서 생긴 ‘콰이쯔’라는 신조어는 식당업의 번성과 함께 일대 유행을 했다. 특히 대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일회용 젓가락이 식당에서 주로 사용됐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자도 ‘콰이쯔(?子)’로 바뀌었다.
원래 송나라 때까지의 젓가락은 짧은 것은 17cm, 긴 것은 무려 50cm에 이를 정도로 제각각이었다. 원나라에 들어와 젓가락은 길이가 30cm 전후로 표준화됐고, 특히 명나라의 것은 손잡이 부분의 모양이 사각의 방형(方形)이며 음식을 집는 끝 부분은 둥글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젓가락과 닮았다. 즉 외식이 도시에서 일상적인 풍속으로 자리를 잡은 명나라 이후에 젓가락의 길이나 모양도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재료는 나무·상아·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젓가락 재료의 중요한 기준은 가벼워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래야 음식물을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숟가락의 비밀
중원이나 일본열도의 지배층에 비해 6~7세기 고구려 귀족들은 개인별 밥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나라 때의 기록은 호상(胡床), 즉 오랑캐의 밥상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신라나 백제의 지배자들도 식탁을 두고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탁이 있으면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식기다.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의 백자와 청화백자는 식기로도 사용됐다. 열전도율이 비교적 높고 무거운 편인 이 식기를 손으로 들고 식사를 할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이전에 지배층이 누렸던 청동기 숟가락과 젓가락의 화려함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이들 도구는 조선 초기까지 사용됐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사대부들이 도학(道學)의 세상을 만드는 데 으뜸 경전으로 여긴 중국의 ‘예기(禮記)’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주나라 때 관습이 적혀 있으니, 당연히 청동기 그릇과 식기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명된 것이 바로 유기(鍮器)다. 청동기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한 유기는 왕실은 물론이고 사대부 집안의 각종 제사에 쓰이는 제기(祭器)가 됐다. 그러나 조선 중기까지 구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백자와 유기가 함께 사용됐다.
도자기와 유기는 모두 무겁고 열전도율이 목기에 비해 높다. 비록 당시 일본열도에 살던 사람과 비슷하게 낮은 식탁을 바닥에 놓고 좌식(坐食) 생활을 했지만 무거운 식기를 손에 들고 먹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밥은 지금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많이 먹은 데다가 지금처럼 차진 밥도 아니었다. 그러니 숟가락이 반드시 요구됐다. 여기에 주자의 ‘가례’를 비롯한 주나라 때 식사 풍속을 흉내 내 밥과 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일상 식사의 ‘세트’로 생각했다.

일본 챤폰과 국물 숟가락.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 국물이 많은 음식이 개발됐으며 이에 맞춰 숟가락은 효과적인 식사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만 해도 시골 할머니들은 숟가락만으로 식사를 했다. 양푼에 보리 반 쌀 반으로 지은 밥을 담고, 식탁도 없이 마룻바닥에 그대로 놓았다. 반찬으로는 배추김치 몇 조각뿐이라고 해도, 숟가락 손잡이로 배추김치를 잘라서 손에 든 채,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그 위에 김치를 올린 다음에 입으로 넣었다. 젓가락이 없어도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숟가락이 제공했다. 숟가락은 손잡이가 달린 이동용 개인 접시였다.
그렇다고 젓가락을 홀대한 것은 아니다. 특히 유기로 된 젓가락은 나무나 상아 젓가락에 비해 거의 4배나 무겁다. 일본인들은 유기 젓가락을 들고서 비빔밥 먹기가 대단한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로지 유기 숟가락으로만 비빔밥을 먹는 친구도 있다. 한국 가정에서는 이 무거운 유기 젓가락을 마치 관운장이 월도(月刀)를 쓰듯이 가볍게 다루는 손놀림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젓가락이 개발되면서 유기의 가치는 줄어든다.
|
상하이(上海)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매우 작은 규모의 젓가락박물관이 있다. 이곳의 유물을 보면 원나라 때 몽골의 장군들은 식기 세트를 개인용으로 들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매일 이동하는 이들에게 이동용 숟가락·젓가락·술잔·이쑤시개 등은 필수품이었다.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각종 전염병이 돌고 환경이 오염돼 이동하면서 건강을 안전하게 책임지기 어렵다. 식사 도구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인류가 개발해낸 도구다. 이쯤에서 유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조립용 유기 수저세트를 개발하면 어떨까? 그러면 관운장의 손놀림을 한국의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으리라.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