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 미술 주류일 때 구상 선택
70년대 홍대에서 접한 현대 미술
돌과 달항아리에 꽂히다
또래보다 빨랐던 해외 진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작업실에서 만난 고영훈 작가. [지호영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0b/64fa6f0b11d3d2738276.jpg)
8월 1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작업실에서 만난 고영훈 작가. [지호영 기자]
![작가의 대표 작품인 달항아리는 실물만큼 세밀하고 생생한 것이 특징이다. [지호영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1d/64fa6f1d1ac3d2738276.jpg)
작가의 대표 작품인 달항아리는 실물만큼 세밀하고 생생한 것이 특징이다. [지호영 기자]
극사실 회화는 현대 미술 기법의 하나로 실제처럼 보이는, 극도의 사실적 그림을 말한다. 이처럼 정밀한 붓질 덕에 그는 일찍이 프로 작가로 데뷔했다. 1974년 당시 덕수궁미술관이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앵데팡당(Independant)’ 전이 열렸다. 앵데팡당은 1884년 설립 이래 무심사(無審査), 무상(無賞)의 전람회를 여는 프랑스의 독립 미술관 협회다. 홍익대 서양화과 3학년이던 그는 전시장 입구에 ‘이것은 돌입니다(This is a stone)’라는 400호 크기의 큰 그림을 걸었다. 20여 년 선배인 국내 1세대 추상화가 윤명로와 박서보, 1세대 설치 미술가 김영진 등이 참여한 글로벌한 전시였다.
1982년 홍익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작가는 국제무대 데뷔에 박차를 가했다.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스톤 북(돌 책)’ 시리즈를 선보였고 1996년엔 스위스 ‘아트 바젤’에 나갔다. 1970~1980년대 추상 미술이 주류이던 시절에 구상 화가 외길을 걸으며 한국의 극사실 회화를 세계에 열심히 알렸다. 어느덧 원로 작가의 대열에 들어선 그를 8월 1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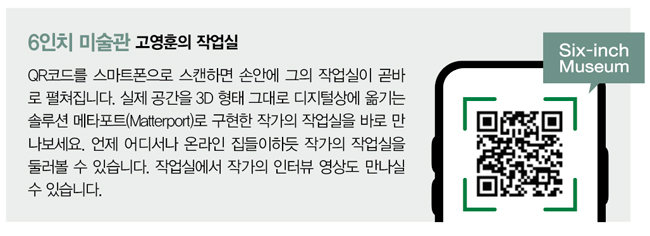
https://my.xrview.co.kr/show/?m=H3KoaGRWwfH
화풍의 갈림길에서
고영훈 작가는 어릴 적부터 수채화로 인정받은 미술 수재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참가한 국제 미술 대회에서 ‘중등부 최고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은 국내 대표 채색 화가 고(故) 천경자 화백이었다. 1970년대 작가가 대학생이던 시절 국내에서는 ‘단색화(單色畫) 운동’이라고 불리는 추상회화 운동이 일어났다. 학교 교수와 선배 대부분이 추상 화가의 길을 걷던 상황에서 화풍의 갈림길에 선 작가는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대접받고, 작가로 성장하려면 추상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영상] 붓으로 그렸다고? 한국의 극사실주의회화 1세대 '이 작가'를 아시나요?
그런데도 구상의 길을 선택했다.
“대세에 따라 추상화를 두어 점 그려봤는데 잘 그렸는지 모르겠더라. 집에 있는 물건이나 누나의 코트를 놓고 구상화를 그렸다. 다들 구상화라고 하면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던 때다. ‘최고로 잘 그리는 게 어떤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그림을 능가할 수 있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되겠더라. 그래서 기존의 사실적 그림보다 극히 더 사실적으로 사물을 그리고자 했다.”
대학에 들어간 시기도 작업에 영향을 미쳤겠다.
“1970년대 홍익대에 입학한 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박서보 선생과 국내 실험 미술 1세대 화가인 이건용 선생이 전위 미술로 현대 미술에 관해 연구할 때다. 그때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좋아하고 잘하는 구상화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미국에서도 (극사실주의라는 개념이) 전시를 통해 가끔 알려졌던 시기였다.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후 50년 동안 극사실주의에 대해 연구했다.”
돌과 달항아리에 빠진 이유
“이 그림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 달라”사진을 찍던 중 그가 추가 촬영을 요청했다. 인터뷰 현장에 있는 모두의 시선이 2002년 그가 그린 첫 번째 달항아리 그림에 모였다. 그의 작품에는 작업 시기마다 다른 사물이 등장한다. 1970년대에는 돌을 허공에 띄운 그림을 그렸고 1980년대에는 돌을 펼쳐진 책 위에 놓은 그림을 그렸다. 1990년대에는 돌 외에도 타자기, 새의 깃털 등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그렸다. 최근엔 조선백자 양식에서 탄생한 달항아리와 도자기를 주로 그린다.
![작가가 2002년 그린 달항아리. [지호영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29/64fa6f290992d2738276.jpg)
작가가 2002년 그린 달항아리. [지호영 기자]
“언젠가 국내 미술 대표 기업인 가나아트(Gana Art) 회장님이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보라’면서 달항아리 한 점을 가져왔다. 엄청나게 희고 큰, ‘대호(大壺)’라고 불리는 달항아리였다. 그걸 보고 있자니 한 번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더라.”
사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
“젊었을 적에는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도 밥은 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1984년 결혼하면서 인간이 됐다(웃음). 집도 있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더라. 그때부터 신문이나 잡지, 고지서 같은 일상의 사물을 그렸다. 그림에는 주로 내 이야기를 담았다. 접힌 책 사이에 돌 3개를 두고 그린 그림은 문명사회에서 나와 집사람, 아들이 외식하러 가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이다.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는 캔버스에 그린 실물이 다 허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림 속 실물은 차원만 다를 뿐 같은 실물이라고 생각한다. 돌을 그렸으면 그게 돌 아닌가. 단지 그 사물이 있는 세계가 다른 것뿐이다.”
![돌과 나비, 코트와 하이힐 등 일상에서 보기 쉬운 사물이 그에게 영감을 준다. [프린트베이커리]](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31/64fa6f31189ed2738276.jpg)
돌과 나비, 코트와 하이힐 등 일상에서 보기 쉬운 사물이 그에게 영감을 준다. [프린트베이커리]
![작가는 달항아리를 그리며 흙을 굽는 과정에서 생긴 스크래치와 티끌까지 섬세하게 표현한다. [프린트베이커리]](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37/64fa6f3701f8d2738276.jpg)
작가는 달항아리를 그리며 흙을 굽는 과정에서 생긴 스크래치와 티끌까지 섬세하게 표현한다. [프린트베이커리]
“달항아리 자체보다는 항아리에 비친 세상을 그린 셈이다. 내 그림은 단순히 항아리의 형상과 실루엣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는 다면화된 세계에 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세계에만 집중하지 않나.”
그림 속 달항아리엔 상처가 많다.
“달항아리는 도공이 하얗게 구워낸 도자기다.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드는 건 도공의 영역이지만 흙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티끌이 표면에 박혀 점과 흠집이 생기는 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달항아리가 만들어진 지 열흘 만에 그린 그림도 있고, 50년, 또는 200년 된 달항아리를 그린 그림도 있다. 시간에 흐름에 따른 가변성의 요소까지 담아 최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작품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나.
“300~400호 크기의 그림은 두세 달 종일 꼬박 작업해서 완성한다. 컬렉터들에게 ‘그림이 선생님을 똑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고맙다.”
해외 진출 꿈을 이루다
![작가의 그림 ‘4개의 돌’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프랑스 파리의 프랑수아 미테랑 도서관. [Gettyimage]](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41/64fa6f4115cbd2738276.jpg)
작가의 그림 ‘4개의 돌’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프랑스 파리의 프랑수아 미테랑 도서관. [Gettyimage]
![과거 작가가 그린 냄비의 실물. 그의 작업실에는 일대기를 가늠할 수 없는 오래된 물건이 많다. [지호영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49/64fa6f491113d2738276.jpg)
과거 작가가 그린 냄비의 실물. 그의 작업실에는 일대기를 가늠할 수 없는 오래된 물건이 많다. [지호영 기자]
“신이 났다(웃음). 작품이 알려지고, 팔리는 건 생존의 문제와도 같았다. 처음 내 그림을 산 사람이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다. 홍대 졸업 전시에서 ‘이것은 돌입니다(This is a stone)’ 그림을 사겠다고 했다. 그에게 그걸 팔아서 개인 작업실을 마련했다.”
해외에 꼭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 때부터 나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어렵사리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림을 선보였고, 간 김에 프랑스 파리에 들러서 화랑 대표들에게 그림을 소개했다. 직접 나서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다.”
또래 화가 가운데 해외에 작업실을 둔 이도 있는데.
“파리의 한 화랑에서 내게 작업실을 내어줄 테니 파리에서 살라고 했지만 안 간다고 했다. 만약에 해외로 나가 작업했으면 지금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나.
“초기에는 얼른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참 잘했어요’ 도장을 꾸역꾸역 채우는 느낌이 들었다. 해외 작가보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1등은 못 할 테니 (내 나라에서) 내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그림을 보고 싶으면 한국에 와서 보라는 거다. 건방져 보여도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자연스레 한국적 세계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 여겼다.”
그는 앞으로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했다.
“미디어 예술 거장 고(故) 백남준 선생이 휠체어를 탄 채로 작품 설치에 참여하는 걸 봤다. 당시엔 ‘저 나이에 무슨 아쉬움이 남아서 저렇게 작업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이가 되니 할 수 있는 게 붓질밖에 없더라. 휠체어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 인생에서 달항아리 다음으로 그리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다. 작가의 답은 ‘어머니’였다.
“죽기 전에 어머니를 그리고 싶다. 300~400호 크기로 크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 그 시대의 여자를 그린 그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작가의 작업실 전경. 작은 거울을 창문처럼 달았다. [지호영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4/fa/6f/50/64fa6f501680d2738276.jpg)
작가의 작업실 전경. 작은 거울을 창문처럼 달았다. [지호영 기자]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00/200/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