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폴 포츠, ‘88만원 세대’의 꿈, 공정사회의 모델….
- 그의 이름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작은 키에 평범한 외모.
- 스물다섯 살 청년 허각은 어느덧 우리 시대 ‘희망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대중은 신인가수 허각의 탄생에 환호했다. 빈한한 가정환경, 중졸 학력의 한계를 넘어 노래 실력 하나로 134만 대 1의 경쟁을 뚫었기 때문이다. 163㎝의 작은 키에 평범한 외모는 주류 아이돌 가수와는 다른 친근함을 자아냈다. ‘88만원 세대’는 그에게 대리만족을 느꼈고, 정치권은 그를 ‘공정사회의 모델’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 열광적인 신드롬이 얼떨떨할 따름이다.
“많은 분이 비주얼 뛰어난 가수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목소리 하나였어요. ‘저 조그만 애가, 저 못생긴 애가 어디서 저런 목소리를 낼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드린 것 같아요.”
허각의 데뷔곡 ‘언제나’는 11월 초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여자친구와의 커플링 사진, 스마트폰 분실 소식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인터넷 주요 뉴스로 등장할 정도다. “아버지와 라면을 먹고 싶다”던 소박한 우승 소감마저 실행에 옮기지 못할 만큼 그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우승 후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외모를 꼽았다.
“헤어나 의상을 저 대신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외모가 달라지고 있어요. 합숙 때는 7㎏까지 빠졌는데, 요즘은 바쁜 스케줄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많이 알아보시고 사진도 찍어가세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부드럽고 애잔하면서도, 때론 강하게 내지르는 목소리는 그의 드라마틱한 삶과 닮아 있다. 세 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는 아버지, 쌍둥이형(허공씨)과 함께 살았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은 없다. 그저 노래하는 것이 좋아 행사장 가수로 무대에 섰다. 생계를 위해 환풍기 수리공으로 일했다. 열일곱 살 때 ‘가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은 뒤 한 번도 그 꿈을 잊은 적이 없다.
“3년간 저를 노래방에 데리고 다녔던 동네 형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제 돈을 주고, 혼자 노래방에서 불렀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는 형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 노래를 들어줬기에 무대에 선 기분으로 연습할 수 있었어요. 당시 부활의 ‘사랑할수록’이나 임재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 그리고 김경호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불렀죠.”
허각은 기획사 오디션에서 수차 고배를 마셨다. 행사장 가수 시절에는 자신의 무대를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의 귀까지 사로잡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쓰디쓴 경험이 지금의 허각을 키운 원동력이 됐다.
“한 기획사에서는, 제가 ‘안녕하세요, 허각입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바로 ‘다음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노래도 안 시키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가수가 아니라 모델 뽑는 회사인가 했죠.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그의 처지는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는다. ‘슈퍼스타K’ 우승이 가수로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건넨 수많은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타고난 보컬 능력은 있는데 음색이 하나다”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소름끼치게 잘해야 한다”는 코멘트는 그가 가장 따끔하게 받아들인 충고다.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다른 가수가 부른 멜로디를 듣고 노래를 익혀요.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분을 따라 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저만의 목소리를 찾는 건 계속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예요.”
허각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많이 놀기도 했지만, 사고는 절대 안 쳤어요. 학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못해도 노래든, 춤이든, 요리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꿈을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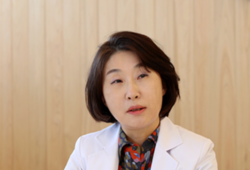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