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이 신문을 발행한 것은 일제에 순응한 반민족적 행위일까, 억압과 핍박에 맞서 국민의 항일의식을 고취하려는 민족적 용단일까. 지난 8월 KBS 특별기획 ‘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방영 이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대두되었다. 과연 일제 총독부는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지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 총독부는 동아·조선이 발행된 1920∼40년에 끊임없이 언론통제와 폐간압력을 가해왔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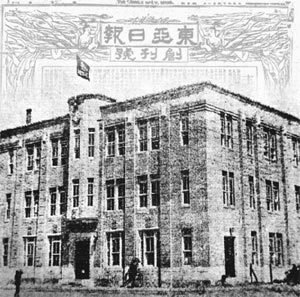
독립국가에 살고 있는 오늘의 관점에선, 총독부 허가를 받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신문이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했다’고 매도할 수 있다. 동아·조선이 일제 통치를 전면 부인하는 비타협적인 항일투쟁을 벌인 게 아니라, 그들이 내준 ‘허가장’을 받아 신문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동아·조선이 일제 치하에 존속했다는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원죄’라는 극단적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시 언론통제의 주무관청이었던 총독부는 동아·조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동아일보는 게재 기사가 문제가 되어 창간 보름째인 4월15일자 신문에 대해 처음으로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사흘이 멀다 하고 삭제·압수 처분을 받다가 창간 6개월을 맞기 전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총독부는 9월25일자로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간 이래 총독부는 누누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8월에도 발행인을 소환하여 최후 경고를 전달한 바 있음에도 동아일보는 일제의 조선 정치를 부정하는 기사를 계속 실었다. 로마의 흥망을 거론하며 조선의 부흥을 말하고, 이집트 독립과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들어 조선의 인심을 자극하고, 영국에 맞선 반역자를 찬양하여 반역심을 자극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총독정치를 부정하여 일반의 오해를 깊게 함에 노력했다.”(동아일보 1921년 2월21일자)
강제 폐간을 당하던 1940년 8월에도 총독부의 눈에는 동아·조선의 근본적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비쳐졌다. 총독부는 두 신문을 폐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던 당시 극비문서 ‘언문신문통제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신문은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책임감과 열의가 부족하다. 적극적 불온성은 줄어들었지만 소극적 불온성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기사를) 차압 또는 삭제당한 일이 여러 차례에 이른다. 나아가 동아·조선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민족의식이 넘쳐 흘러 매일신보를 복멸(覆滅)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신문을 폐간시킴으로써 민족의식을 잘라 없애고 매일신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동아·조선과, 총독부가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동아·조선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총독부, 제목 크기까지 문제삼아

동아일보를 창간한 仁村 김성수
총독부의 일관된 정책은 언론 탄압을 통해 항일의식을 억누르는 동시에 언론을 식민통치에 유리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역대 조선총독들은 이같은 정책에 따라 ‘경성일보’(일본어) ‘매일신보’(한국어) ‘서울 프레스’(영어) 등 3개 기관지를 직접 관할하는 한편, 민간 신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가했다. 이러한 일제 치하의 언론 상황은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간지 발행을 일절 금한 1910년대 ‘총독부 기관지 독점기’다. 당시 한국어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유일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합방 직후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을 모두 폐간시키고 일본어 신문을 ‘경성일보’로 통합하는 ‘신문통일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은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은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였다. 아카시는 한국어 신문 폐간을 강행하면서 합방 직전 통감부가 매수했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제호에서 ‘대한’이란 단어를 없애고 총독부의 어용지로 만들었다.
둘째, 이른바 문화정치 시대인 1920년대 ‘민간지 허용기’이다. 이때 동아·조선·시대일보(후에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로 제호가 바뀌었다) 등 단 3개의 민간지 발행만이 허용되었다. 일제의 언론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에 발행 허가제를 실시해 신문 발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허가된 신문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열 통제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1924년 시인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 등 3개 민간지가 가장 활발하게 항일 언론을 펼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기간이었다.
언론인들은 일제 탄압에 저항해 언론집회압박탄핵회(1924), 전조선기자대회(1925) 등 일련의 저항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번번이 항일적 기사와 논설에 대해 삭제와 압수를 자행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정간(停刊)과 언론인 투옥 등 필화(筆禍) 사건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친일강요기’이다. 이 시기 일제는 적극적 친일을 강요하였기에 신문의 항일 논조는 점차 약화됐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민간지의 논조는 친일적으로 바뀌고 말았다. 총독부는 제목 크기를 비롯해 편집의 미세한 부분까지 문제삼아 시비를 걸었다. 총독부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는 경우라도 침략전쟁 수행과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적 불온’으로 규정, 탄압을 가했다.
만주사변 이후 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총독부는 ‘언론은 전쟁에 협조하는 것이 의무이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란 논리로 언론의 열성적 협조를 강요했다. 이와 같이 언론탄압을 강화하다 1940년에 이르러 마침내 동아·조선의 폐간을 강요했다. 그로부터 5년 후 광복될 때까지 민간 신문은 완전히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조선 통치 방침 비난이 유일한 本務”
일제 치하에서 동아·조선은 각각 4차례의 정간을 당했다. 두 번째 정간은 1926년 3월5일 소련 국제농민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보내온 전보문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전보문은 3·1운동 7주년을 기념해 동아일보에 보내온 것인데, 다음은 총독부가 문제삼은 부분이다.
이 위대한 날의 기념은 영원히 조선 농민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국민적 의무를 일깨울 것을 믿으며,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현재 재감(在監)한 여러 동지에게 형제적인 사랑의 문안을 드리노라.
아무리 혹독한 언론통제 시기라 하더라도 정간까지 시킬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총독부는 이 글이 실린 3월5일자 신문에 대해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문제가 된 이 부분을 삭제한 다음 5일과 6일 신문 대신 ‘호외’를 발행했다.
그러나 6일 오후 4시40분경 ‘발행정지(정간)’ 처분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주필 송진우(宋鎭禹)와 편집 겸 발행인 김철중(金鐵中)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송진우에겐 징역 8개월, 김철중에겐 금고(禁錮) 4개월의 실형이 언도되었다. 정간 처분은 44일 만인 1926년 4월19일에 해제됐다. 당시 총독부가 동아일보를 어떻게 간주했는지 매일신보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매일신보는 4월22자 1면 머릿기사에서 동아·조선 시대 등 3대 민간지를 싸잡아 비난했다.
모든 감정상 문제로 냉정한 이성을 결(缺)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우리 조선 신문은 발매금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일한 영업정책으로 역용(逆用)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당함으로써 무상(無上)한 우세지사(憂世志士)로 자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과도기의 오상(誤想)을 가지고 세인(世人)을 현혹케 하는 자칭 왈 이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는 동업 동아일보가 발행정지를 당한 지 44일간, 또다시 해금(解禁)이라는 은명하(恩命下)에 21일부터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매일신보 1926년 4월22일)

총독부는 모든 기사를 검열하며 기사 삭제·정간·언론인 구속 등 민간지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동아일보사 ‘신문박물관’에서 일제시대 사회상을 공부하는 어린이들.
이튿날인 23일자 논설은 “3개 민간지가 총독부의 강요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면서 “신문의 보도적 사명과 지도적 임무를 망각한다면 신문의 존재를 시인할 무슨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선(日鮮)융화’를 주장하고 총독부의 선전기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신문의 사명과 임무라는 논리였다.
1920년대 민족지의 제작태도에 대해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 다치다(立田淸辰)는 “동아·조선의 종래 논조는 조선 통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을 그 유일한 본무(本務)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 하는 바가 있다. 사사건건 과장·선동의 기사를 싣던지, 혹은 사실을 날조하는 곡필무문(曲筆舞文)의 보고를 싣는 것으로 인심을 자극하고 민족의식을 억지로 고조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썼다.
그는 또 “많은 관리 가운데 극히 일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마치 관리 전체가 모두 나쁜 것 같은 논조를 폈다”고 했다. 반일적 잠재의식으로 일본을 ‘저 나라’, 일본어를 외래어라고 하고 조선을 아국(我國), 조선말을 국어라 부르면서 일병(日兵), 일경(日警), 일거류민(日居留民), 일인(日人), 왜녀(倭女) 등 요컨대 일본과 조선은 전혀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인식을 조선인에게 심으려는 저의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경무국은 동아·조선이 일본의 국가적 경사나 천장절(天長節) 등 축제일을 신문에 크게 취급하지 않고 묵살해버리는 ‘소극적 불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주시했다. 반면 동아·조선이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식민지 치하에 있는 약소 민족들의 민족투쟁에 대해서는 열심히 다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만주사변 이후 검열 강화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무렵부터 민간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총독부 요청에 따라 신년호 1면에 총독의 연두사와 휘호 등을 싣는 등 지면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런 변화는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에 이르는 강화된 군벌 파쇼통치 하에서 민족 언론이 겪어야 했던 수난의 결과이기도 했다.
만주사변에 대해 국제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자신의 조치와 주장의 정당함을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전후해 일본군의 행동을 지지하는 덴츠(電通-日本電報通信社)와 외무성과 관계가 깊은 렌고(連合-新聞連合社)의 보도가 자주 엇갈려 일본 국내 신문들을 혼란케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불신을 부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32년 ‘시국동지회(時局同志會)’란 비공식 정보관계 모임을 조직해 만주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 1936년 7월1일 ‘정보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내무 육군 해군 사법 문부 등 각 청의 칙임관(勅任官 :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1, 2등의 고급관료)으로 구성되었다.
이 기구의 주 목적은 현행 단속법을 강화해 불온사상을 예방 진압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열기관을 정비·확충하고, 검열계 관리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자 기사 압수 및 삭제 건수는 줄어들었고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드물었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후부터 우리 신문을 검열·탄압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신문사는 조판된 신문 대장(臺張)을 일본 헌병사령부에 들고 가서 검열을 받은 뒤 인쇄하도록 되어 있었다. 1905년 11월20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은 ‘황성신문’은 검열 없이 신문을 인쇄·배포했다고 하여 정간당했다.
그러나 1920년에 민간지가 허가된 후 사전검열제가 없어지고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의 지시가 떨어지면 인쇄가 중단되는 다소 간편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것이다. 잡지의 경우 원고 사전 검열, 대장 검열, 납본 검열 등 3중의 통제를 거쳐야 했으나, 신문은 납본 검열만 적용됐다.
동아·조선에 내려진 압수와 정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만,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삭제 조치는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1931∼39년 당시 기록은 남아 있다.
이른바 ‘대륙 병참기지(兵站基地) 시대’ 또는 ‘식민지 파시즘 통치시대’로 불리던 이 기간에는 신문의 저항 논조가 그 전에 비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건 이상의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조선 민간지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법규(‘신문지 규칙’)를 적용받던 일본인 및 외국인 발행 신문에도 적지 않은 삭제 조치가 있었다.
총독부는 동아·조선·조선중앙 3개 민간지가 발행됐던 때에 한 해 500건 이상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3개 신문이 하루 평균 1.5건의 기사를 삭제당한 셈이다.
이같은 시대상황에서 동아·조선 모두 군국주의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신년호 지면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와 조선은 1938년 신년호 1면에 봉황 그림으로 장식한 일본 천황 부부의 전신 사진을 실었다. 또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의 축사도 게재했다. 동아·조선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총독부는 “시국의 중압과 준엄한 단속에 의해 최근 그 필치가 현저히 온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와 조선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193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시기이다. 그러나 총독부는 두 신문의 논조가 변화함에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다. 전쟁을 확대해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시국에 언론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감과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동아·조선이 시국관계와 시정방침을 보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묘한 필치로 민족의식 및 계급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문신문통제안(諺文新聞統制案)’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36년 7월부터 1941년 12월까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가 보관해오던 것을 일본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KBS가 특별기획 ‘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를 제작할 때에 활용하여 지난 8월16일 방영했던 자료이다. 그러나 KBS는 자료 가운데 총독부가 부정적으로 동아와 조선에 관해서 평가했던 부분은 전혀 인용하지 않는 반면 자의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향성을 드러내었다.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槪要, 1940년판)’는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가 민족의식에 편승해 총독정치를 비방하고 곡필을 농(弄)하는 등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어 신문의 논조는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을 통해 편견 시정에 힘쓰고 신문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였는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적극적 불온 태도는 둔화되었지만 소극적 불온의 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동아일보의 논조는 민족적 편견에 기초하여 일본정신과 부합하지 않은 필치의 흔적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인 창씨 개명에 대해서도 그 게재를 기피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보 김진섭 필화사건은 총독부가 동아·조선 폐간을 획책하던 당시의 언론탄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해준다. 1940년 1월6일자 매일신보 학예란에는 ‘구주대전과 문화의 장래’라는 주제로 세 편의 글이 실렸다. 임화의 ‘시민문화 종언’, 김관의 ‘전쟁과 음악’, 그리고 김진섭의 ‘아즉은 염려 업다’가 그것. 이 중 김진섭의 다음과 같은 글 일부가 문제가 되었다.
전쟁은 설사 그것이 정의를 위한 불가피의 전쟁일 경우에 있어서도 문화의 두려운 파괴자이다. 육탄과 폭격이 국가 최고의 자본인 인간의 생명을 무수히 살상하고 인간 노력의 결정인 문화재를 여지없이 파쇄하는 것이다.
조선군사령부의 언론탄압
처음엔 경무국 도서과도 이 글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사흘 뒤인 1월9일 조선군 참모장 가토(加藤)는 헌병대 사령부로 하여금 김진섭의 사상 경향과 집필 동기 등을 취조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무국 도서과에도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을 명령했다. 이에 헌병사령부는 김진섭을 출두시켜 글을 싣게 된 경위와 글 내용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했다. 매일신보 학예부장 조용만(趙容萬)과 부사장 이상협(李相協)은 경무국에 불려가 도서과장으로부터 “당신들은 국적(國賊)”이라고 질책 받았다. 가토는 “식량문제가 심각하고 조선 민중 가운데 반전(反戰) 기운이 싹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이러한 반전적 논설을 게재한 것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군 참모장은 김진섭의 글 가운데 “전쟁수행의 필요상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자유도, 의견의 발표도, 경제적 활동도 제한하고 광범위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근대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개성적 발전의 경향과는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전시체제에 대한 항의로 해석했다. 그러나 헌병사령부는 김진섭이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용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풀어줬다.
이 필화사건은 김진섭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매일신보 학예부장 조용만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파면당했고, 경무국 도서과는 문제 기사가 실린 지면 배포를 금지하고 발행인 이상협, 편집인 김선흠도 시말서를 쓰게 했다. 언론검열 주무부서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던 글을 조선군 사령부가 문제삼은 이 사건은, 당시의 언론 상황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조선군 사령부와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언론을 탄압했던가를 잘 보여준다.
한편 조선일보는 폐간이 임박했을 무렵인 1940년 5월19일 어린이 학습페이지에 실었던 ‘쌀’이란 제목의 한 어린이 작문을 압수당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조영희(趙英喜)라는 어린이가 쓴 이 작문은 흉년과 전쟁물자 수탈로 쌀이 귀했던 당시 배급소에서 쌀을 사려고 아우성치는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 쓴 짧은 글이었다. 조선일보가 덧붙인 심사평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작문입니다. 좀더 재미있게 써보십시오”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 작문이 “어린이 작품으로서 명랑하지 않고 내용 역시 온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쟁으로 쌀이 부족해 궁핍하고 암울했던 시대 상황이 여타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동아·조선 없애는 5가지 ‘비책’
총독부는 ‘조선어 신문은 매일신보 하나만 남긴다’는 방침 아래 동아와 조선 폐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언급한 ‘언문신문통제안’은 두 신문을 폐간하고 매일신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이유와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총독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고려했다.
①동아·조선을 정리·통합하고 매일신보 1개만 남기는 방안. 이 경우 조선의 인구에 비해 신문의 숫자가 적어 조선인의 민의(民意)를 폐쇄한다는 비방을 면할 수 없다. 또 동아·조선이 기관지 매일신보에 매수되었다는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②동아일보를 대전에, 조선일보를 평양에 이전시켜 지방지로 만들고 서울에는 매일신보만 남기는 방안. 지방에 있는 동아·조선에 대한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가 곤란하다. 이전에 따른 건축 및 경영상 실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채산을 맞추기도 어렵다.
③동아·조선을 합병해 새로운 민간지를 만들어 매일신보와 함께 일반 시사를 보도하는 보통신문으로 병존시키는 방안. 그러나 두 신문 합병이 강력한 신문을 탄생시켜 매일신보를 압도할 우려가 있다.
④동아일보를 산업경제 기사만 보도하는 경제지로 만들고 조선일보를 일본어 신문으로 변형하여 종합 일간지로는 매일신보 1개만 남기는 방안. 이 방안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외형상 이점이 있다. 또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어신문 ‘조선신문’과 ‘조선일일신문’을 매수해 발행권을 조선일보에 넘긴다면 일본어 신문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신문으로 전환한 조선일보가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여 조선인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민족의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또한 매일신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발행하는 일어신문 ‘국민신보’와 비슷한 기사를 실을 것임으로 독자와 광고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⑤동아·조선을 합병해 매일신보의 자회사로 만든 후 산업경제 기사만 보도하도록 하는 방안. 조선에 이러한 특수신문이 필요하다는 정세를 따르고, 매일신보와 보도 분야를 다르게 해 대립 경합할 우려를 없앴다는 점에서 가장 실현성 있는 방안이다.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총독부는 1940년 초부터 동아·조선에 폐간을 강요했다. 경무국 보안과장은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에게 2월11일 이전에 신문 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창씨 개명이 강요되던 때였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폐간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를 만나 폐간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김상채 편역, ‘윤치호 일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송진우는 최후 수단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에서 송진우는 정계와 관계의 유력자들에게 동아일보의 강제 폐간을 획책하는 총독부 정책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귀족원 의원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총독부 초대 내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총독부 전 경무국장),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郞, 총독부 전 학무국장), 호시나가 미쓰로(星永光郞, 전보통신 사장) 등 국회의원과 유력인사를 비롯해, 일본 우익의 거두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당시 척무대신 고이소 구니야키(小磯國昭, 후에 조선 총독 부임), 척무성의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후에 총독부 정무총감) 등 관료에게 호소했다. 송진우는 또 전직 총독부 고급 관료들의 친목 단체 ‘조선중앙협회’ 상무였던 나카지마 쓰카사(中島司), 잡지 ‘나이칸(內觀)’을 주재하던 가야하라 카산(茅原華山) 등도 만났다.
그러나 총독부는 7월 중순 부산에서 일본에서 돌아오는 송진우를 연행했고, 동아·조선은 8월10일 동시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1920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허가증을 내주었던 민간신문의 명맥이 끊어지고, 기관지 매일신보의 독무대가 되었다.
총독부는 동아·조선을 폐간함에 따라 인쇄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계획을 동시에 세웠다. 비싸게 구입한 인쇄기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은 1980년 언론통폐합 때 KBS가 동아방송 시설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동아, 상처투성이로 1940년 폐간
또 동아·조선 양 신문사에는 각각 900여 명의 사원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이 두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실업사태에 대해 총독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조선 사원 가운데 상당수를 매일신보가 받아들인 것은 총독부의 치밀한 폐간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폐간 정책에 대해 KBS는 지난 8월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두 신문이 사실상 총독부와의 거래를 통해 ‘합의 폐간’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 군부 정권에 의한 언론통폐합도 언론계의 ‘자율결정’에 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폐간을 당한 언론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뀐 뒤 권력의 강압에 의한 언론통폐합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났다. 폐간 또는 통합된 언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것이다.
동아·조선이 20년 동안 총독부로부터 당한 삭제 처분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인쇄신문 압수와 발매금지 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총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437건에 이른다. 거기에다 네 차례 정간을 당한 동아일보는 상처투성이인 채로 1940년 안타까이 폐간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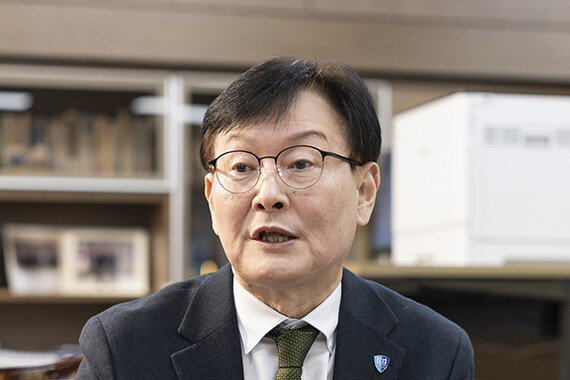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특집] 희망으로 채운 여정, 사랑으로 이어진 발자취](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5/0b/21/69450b211cfc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