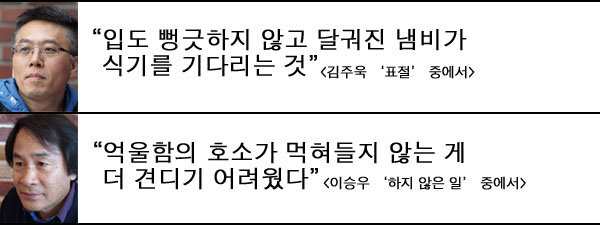
“요즘도 문단에서 표절 논란이 인다. 동인문학상 수상작 ‘지상의 노래’가 논란의 대상이다. 작가 김주욱은 ‘지상의 노래’ 중 1개 장이 자신의 2009년 신문 신춘문예 응모작 ‘허물’과 인물 캐릭터, 모티프, 디테일 등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지상의 노래’의 작가 이승우는 그해 해당 신문의 심사위원이었다. 이런 논란이 진행 중인데도 ‘지상의 노래’는 2013년 10월 문학상을 수상했다. 표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명예욕에 불탄 젊은 작가가 대가의 작품을 도용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하지만 학계에서 교수가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채듯이, 문단에서 중견작가가 신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소설 통해 진실 말하려 해
‘신동아’는 2013년 3월호에서 이승우 조선대 교수의 ‘지상의 노래’와 관련한 표절 시비를 보도했다. 김주욱 작가는 ‘신동아’에 “신춘문예 응모작의 모티프, 캐릭터 설정 등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지상의 노래’ 6장 ‘카다콤’이 자신이 쓴 ‘허물’ 등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교수는 “참고, 참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표절했을 소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2013년 3월호에서 김 작가의 소설 ‘허물’ 등과 ‘지상의 노래’를 비교·분석했다. 주요 인물 캐릭터와 모티프 설정 등에서 나타난 유사점을 소개하면서 중립적 위치에서 김 작가의 주장과 이 교수의 견해를 게재했다. 또한 교수이면서 문학평론가 K씨, 소설가 K씨에게 비교·분석을 의뢰했다.
이 교수와 김 작가는 각각 지난해 가을, 올봄 내놓은 ‘소설’을 통해 표절 시비와 관련한 논박을 이어갔다. 표절 시비가 붙은 두 작가가 소설로 논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 교수는 ‘문예중앙’ 2013년 가을호에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이 붙은 38쪽 분량의 단편소설을 실었다. 김 작가는 3월 15일 348쪽 분량의 장편소설 ‘표절’(나남 펴냄)을 출간했다. 두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마땅한 허구지만, 두 작가가 실제 겪은 일을 바탕 삼았다.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 표절 시비와 관련해 말한 것이다.
‘하지 않은 일’의 주인공은 하지 않은 일을 추궁받는 ‘당신’이다. ‘추궁하는 자’는 “옷을 벗고 나서라”(‘하지 않은 일’ 41쪽)고 요구한다. 이 교수는 “떳떳한 사람이 왜 광장에서 옷을 벗는 수치를 경험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떳떳하다면 옷을 벗는 수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위세 또한 당당하다. 옷 벗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울 때 이 거꾸로 선 논리는 찌르는 것밖에 모르는 흉기가 된다”고 썼다(46쪽). ‘하지 않은 일’에서 ‘당신’을 ‘추궁하는 자’는 “인정할 사실이 없는데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막무가내”(‘하지 않은 일’ 36쪽)다. ‘추궁하는 자’는 김 작가를 변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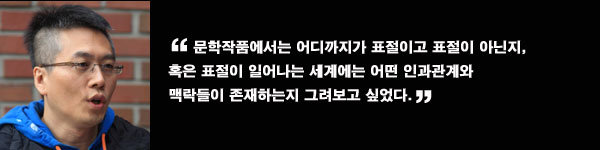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는 ‘당신’의 심리를 파헤치면서 인간과 사람 사는 일의 저변(底邊)을 파고든다. “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억울함보다 억울함의 호소가 먹혀들지 않는 억울함이 더 크고 견디기 어려웠다”(‘하지 않은 일’ 66쪽)고 호소하는가 하면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말고 나서서 떳떳함을 증명하라고 말할 때 당신 아내의 어투에서 당신은 약간의 짜증을 읽었다”(‘하지 않은 일’ 60쪽)면서 “하지 않은 일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없다”(‘하지 않은 일’ 40쪽)고 토로한다.
김 작가의 근작 ‘표절’ 역시 소설로 읽어야 마땅한 허구지만 실제를 바탕 삼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한겨레’는 3월 24일자 기사에서 ‘표절’을 이렇게 소개했다.
“중견 작가가 자신의 신춘문예 응모작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표절 시비를 지켜보면서, 문학작품에서는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표절이 아닌지, 혹은 표절이 일어나는 세계에는 어떤 인과관계와 맥락들이 존재하는지 그려보고 싶었다고 한다.”
출판사 ‘나남’은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3년 3월 시사월간지 ‘신동아’에 문학작품 표절 사건이 실려 문학계에 파문이 일었다. 저명한 소설가의 수상작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한 신예 소설가의 문제 제기였다. 그동안 표절과 창작의 모호한 경계선에 파문을 던진 이 사건이 소설로 탄생했다.”
‘표절’에는 ‘머리카락’과 ‘뱀’이 권력과 욕망이 얽히고설키는 것을 가리키는 오브제로 등장한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인 G는 이 교수에게서 모티프를 따온 것이다. ‘나남’은 “창작과 표절 그리고 오마주의 그 오묘한 줄타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아니 있다! 소설 속의 소설을 위한 소설”이라고 이 작품을 소개했다.
‘표절’은 액자 식으로 구성돼 있다. ‘소설 속 소설’ 격인 ‘머리카락’은 김 작가가 이 작가에게 표절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춘문예 응모작 ‘허물’을 손본 것이다. 지난해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가의 장편소설 ‘지상의 노래’는 ‘표절’에서 ‘천국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변주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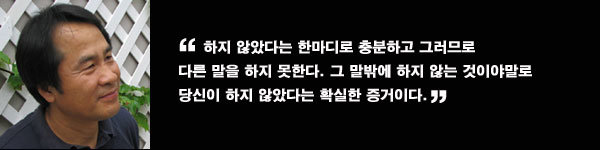
‘표절’의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주인공 Q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신춘문예에 응모한 소설이 심사위원에게 표절 당한다. 또 다른 주인공 G는 ‘소설가들이 존경하는 소설가’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인정받는 작가’다.
‘표절’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하늘 아래 새로운 얘기가 어디 있니?” “프로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는 지금 표절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고 달궈진 냄비가 식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표절’ 37쪽)
G는 신춘문예 응모작을 장편소설에 일부 도용했다는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 결백을 주장하지만 부인하면 할수록 구차해지고 함구하면 할수록 의심을 받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공교롭게도 ‘하지 않은 일’의 ‘당신’과 G의 처지가 비슷하다. 이 작가는 ‘하지 않은 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하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하고 그러므로 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당신의 그 증거를 다른 사람, 당신을 불신하는 사람은 반대 증거로 사용한다. 그는 그 말밖에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 일을 확실히 했다는 증거라고 우긴다.”(‘하지 않은 일’ 36쪽)
두 소설에는 2013년 3월호에서 표절 시비를 보도한 ‘신동아’를 변주한 것으로 보이는 매체도 등장한다.
‘하지 않은 일’은 ‘신동아’를 “선정적인 기사를 주로 다루는 한 온라인 매체”(‘하지 않은 일’ 49쪽)로 묘사한다. “온라인 매체의 기자는 폭로성 기사가 가지는 선정성에 혹시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 않은 일’ 50쪽)라고도 썼다.
‘신동아’를 통해 ‘지상의 노래’ 6장 ‘카다콤’을 둘러싼 시비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문학평론가 K씨, 소설가 K씨도 ‘하지 않은 일’에 등장한다.
“이니셜로만 표기된 증인들은 현장에서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양 증언하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덧붙였는데, 그 의견에 의하면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변호나 옹호해줄 가치가 없는 아주 질이 나쁜 파렴치한이었다.”(‘하지 않은 일’ 60쪽)
‘표절’에도 문학평론가 K씨, 소설가 K씨가 등장한다.
“‘뉴아시아’ 기사에는 ‘모티브 설정, 캐릭터 도둑맞았다’는 Q의 주장에 G는 ‘참고, 참조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G가 심사위원으로 Q의 작품을 읽고 심사평을 썼다는 내용과 평론가가 두 작품을 읽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실렸다.”(‘표절’ 307쪽)
“소설은 흡사해질 수 있어”
‘표절’은 ‘신동아’를 “몇 해 전 원로작가 H의 표절 사건을 담당한 월간지 ‘뉴아시아’”로 묘사한다. “‘뉴아시아’는 1920년 민족자본으로 창간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매체로 2010년 원로 소설가 H가 ‘강서 꿈’ 4장을 집필하면서 어느 기자가 쓴 책을 표절했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뤘다”(‘표절’ 307쪽)고 소개한다. ‘신동아’는 2010년 11월호에서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강남몽’ 4장 ‘개와 늑대의 시간’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를 표절했다고 고발한 적이 있다. 황 작가는 이듬해 6월 1일 소설 ‘낯익은 세상’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책에 인용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다큐소설 형식이고 일종의 역사소설이었지만 어쨌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학술 논문과 다르게 문학 작품은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다’라고 양단하기 어렵다. 한 소설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작가는 창작하면서 다른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기존 작품을 변용하는 것도 창작의 한 형태다. 괴테의 대표작 ‘파우스트’만 해도 독일의 전승 설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 아닌가. 토마스 만의 대표 대하소설 ‘요셉과 그 형제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다. 서양 문학은 성경, 그리스·로마 신화에 뿌리를 둔 경우가 적잖다. 이렇듯 다른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새로운 작품을 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다. 그러나 이런 변용, 변주와는 달리 남의 창작물을 그대로 옮기면 표절이 된다. 핵심 줄거리를 모방하거나 상황 묘사를 베끼는 행위가 그렇다. 물론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고 남의 작품을 탐독하다보면 무의식중에 그 작품의 플롯을 흉내 내거나 흡사한 인물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
이 교수가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김 작가의 ‘허물’을 읽은 후 ‘지상의 노래’ 6장을 완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모티프나 설정 등은 우연히 비슷해질 수 있다. 두 작가가 소송 등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절 시비와 관련해 논박하는 모습은 ‘격(格) 있는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작가가 신춘문예 응모작인 ‘허물’을 손봐 ‘표절’에 소설 속 소설로 실은 ‘머리카락’과 이 작가의 장편소설 ‘지상의 노래’ 6장 ‘카다콤’을 비교해 읽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