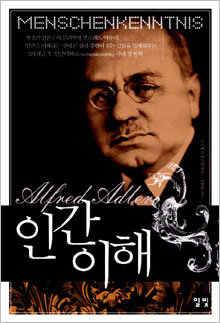
인간이해<br>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라영균 옮김, 일빛
직원들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막말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회사 바깥에서까지 시키며, 비정규직이 많은 노동환경을 빌미로 ‘너는 아직 완전히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직원을 협박하는 상사들. 이런 갑의 횡포를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봤다면 그는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콤플렉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복수하는 증상’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서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남을 괴롭히고 짓밟음으로써만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다. 겉으로는 폭력을 당하는 쪽이 열등해 보이지만, 실은 진짜 심각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앓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자신의 ‘힘’을 느낄 수 없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부터 만족을 느끼는 법을 안다.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신의 힘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아이들, 친구의 돈을 빼앗고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 여성을 억압하며 성적으로 착취하는 남성들, 타인이 소중하게 쌓아올린 삶의 흔적을 도둑질이나 사기 행각을 통해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진짜 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진짜 내 것’ 중에는 물건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켜온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개인심리학의 거장 아들러는 인간이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원인을 ‘열등감 콤플렉스’로 해석한다. 열등감 콤플렉스는 단지 ‘내가 무엇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한 각종 ‘자기정당화’를 지속함으로써 강화된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꾀병을 부리는 일부터 시작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가 남편 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하고 광장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아들러는 사람들이 각종 기상천외한 자기정당화를 통해 열등감을 겉으로는 만회하면서도 실제로는콤플렉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예컨대 사교적인 활동을 싫어하는 한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자고 할 때마다 심한 천식 증상을 보인다. 밖으로 보이는 문제는 ‘천식’이지만, 실은 그가 아내의 뛰어난 사교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고, 자신이 천식 증세를 보이면 아내가 외출을 포기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천식이라는 육체적 질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그가 일부러 천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천식을 일으키면 아내가 외출을 포기한다’는 확실한 ‘보상’이 있었기에, 그의 몸과 마음은 일치단결해 아내가 외출을 제안할 때마다 천식을 심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지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열등감은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올리는 터전이 돼주기도 한다. ‘나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체의 결점을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뜻밖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을 괴롭히는 데 이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나름의 ‘승리의 드라마’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남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들에게 악플을 달면서 자기만족을 얻는 인간의 심리에는 타인의 승리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라는 속설에는 누군가의 탁월함을 볼 때마다 그 자체를 긍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탁월함=나의 열등함’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이 담겨 있다.
타인과의 협력
부럽다고 지는 게 아니다. 부러움의 감정을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패배다. 나약함은 때로는 무기가 되어 타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자신의 허약함을 이용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그릇된 방식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순간적으로 보완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나약함을 무기로 한 순간적 승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아프면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아픈 것이 곧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픈 것을 싫어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상실한 것이다. 그녀는 아프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플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다. 특히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면 쉽게 아플 수 있었다. 그녀는 늘 무언가를 관철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그녀의 아픈 모습만 보았다. 이것은 일종의 ‘병 콤플렉스’이다.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아픈 느낌을 통해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감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관심을 끌고 무한한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어리고 약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터득한다. (194쪽)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하는 열등감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대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자기계발의 공식이 각인돼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해보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협력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흐르면 윗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부정·부패로 흐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공동체적 협력은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여한다. 바이올린 독주를 잘해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현악 사중주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연주자는 개인의 재능뿐 아니라 협력의 위대함도 보여준다. 멤버들끼리의 신뢰와 연대감이 없다면 결코 좋은 협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협력의 소중함’을 부정하려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개인심리학이 결국 사회심리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개인이 훌륭하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도움과 타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정, 누군가를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감정 없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취감은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인 협력을 통한 충족감은 느낄 수가 없다. 1인 기업이든 1인 가족이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없이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야뇨증, 밤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살, 이 세 가지 증세는 모두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나는 엄마 옆에 있어야 해” 또는 “엄마는 늘 나를 돌봐줘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동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나쁜 버릇을 보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교정될 수 있다. (240쪽)
상생의 윤리학
오늘날 아들러가 대중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상실해버린 시대, 유치원까지 경쟁의 전쟁터로 변해버린 시대에 아들러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노력함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상생의 윤리학을 제시한다. 아들러는 만약 선생님이 아이의 잘못을 꾸짖기만 하고 벌을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나는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의 콤플렉스를 비판하기만 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배제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배제하는 쪽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오직 신중한 교육과 강력한 공동체의 윤리만이 인간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는다. 콤플렉스의 가장 나쁜 결과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오직 타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 또한 더 깊어지는 요즘, 나는 아들러를 통해 ‘너와 내가 함께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꿈꾸고 있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