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과 몸가짐이 은퇴한 운동선수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뒤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끈 곳에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줄기로부터 처음 몇 년의 검은 지지대를 막 분리하던 참이었고
그는 그 평범한 나무 밑에
산 채로 매장된 빛이 있다고 했다. 오래전 기능을 잃은 자신의 눈 근육이
곧 자신이 보게 될 뜨겁고 가느다란 세상이
뒤엉켜 있다고 했다.
빛은
몇몇 사람에게만 겨우 알아차려지는 좁고 젊은 절망에
언제 스스로 걸어들어가 눈뜬 채 삭아간 것일까. 사랑의 눈물 사랑의
긴 웃음이 이토록 단순하게 드러나 썩어버리거나
달아나거나
다이빙 물결로 반짝이지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손 내밀어 봐요, 그는 당황해 수런대며 침묵하는 나의 손바닥에 윤기 나는 검은
나무 열매 두 알을 내려놓았고 열매에서는 과육의 물기가 차게 식어가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리듬을
어둡게 뛰어가는 패턴을 알아채기도 전 곧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닳아버린 기능은 잎사귀나 달아난 신체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서 다른 물결을 익히다 올 것입니다. 어떤 분노는 우아한 광대뼈 아래 아주 조용하게 살아가기도 한다.
*
이걸 심어둔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바른 자세로 눕기에 결국 성공했는지 영영 모르게 되었어요,
잘 안다 믿었던 그의 지치고 아름다운 얼굴을 나는
짧은 순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멍하게 곤두박질치던 빛
타일바닥과 아직
깨어나지 않은 나무의 미래를 동시에 떠올리고 있을지 몰라. 과묵한 열매를 자처해 열매의 면적으로 몰래 끼어들고 있을지 모른다. 독특한 몸가짐을 지닌 줄기에는
가느다란 어둠만이 사랑처럼 맺혀 있고
나는 당장 이 밑을 파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을
그러나 무언가는 바뀔 것을 알았다.
김연덕
● 1995년 서울 출생
● 2018년 대산문학상 수상
● 2021년 시집 ‘재와 사랑의 미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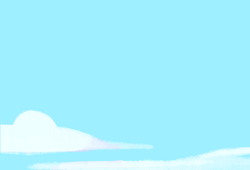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