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솔리 석불입상
이발소에 걸려 있는 풍경화에 삽입된 시로 기억되는,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인생’이라는 시다. 삶도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는 삶의 고달픔을 노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 푸슈킨도 지독히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비운의 시인이 아니던가.
고달픈 현실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미래에 대한 신기루 같은 기대감이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부패해지자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자칭 미륵불 궁예가 등장해 후삼국시대를 열었다. 탐관오리가 득세하는 조선 중기에는 메시아 같은 인물인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의적이 등장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야산
시집살이가 얼마나 모진지 ‘나도야 죽어 후생가면 시집살이 안 하겠다’는 민요(상주 모심기)까지 있는 것을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현세의 삶이 녹록지 않았나 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내세를 꿈꾸거나 변혁을 기대한다. 그래서 홍길동, 임꺽정, 또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륵불을 자처했던 궁예도 나온 것이리라.
기실 민초들의 삶은 수천 년 동안 미륵을 기다리며 산 삶이나 마찬가지다. 그 미륵이 아들딸의 성공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가의 등장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인권과 복지가 잘 구현되는 민주주의가 곧 현대에 는 미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용화사 스님.
경기평야가 끝나는 죽산면은 기호지방답지 않게 비록 높이는 백두대간에 못 미치지만 야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그 가운데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 미륵불이다. 여기도 미륵불, 저기도 미륵불,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온통 미륵불 천지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이 지역에 미륵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원인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개는 궁예가 한동안 이곳에서 똬리를 튼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죽산면 죽산 2리 죽주산성 둥치에 가면 거대한 미륵불이 등장한다. 이름하여 매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37호)이다. 한반도에 흩어져 있는 대개의 미륵불이 그렇듯이 매산리 미륵불도 조형미는 완전히 ‘꽝’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석수장이들의 망치와 정이 다듬은 이 미륵불은 그래서 국보는커녕 보물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 미륵불은 비바람에 나 홀로 서서 사바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매산리 미륵불의 탄생 시기는 고려 초로 추정된다. 후삼국의 피비린내에 진저리를 친 민초들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유토피아와 같은 내세를 꿈꾸게 된 시기와 일치한다. 이 같은 염원이 미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표지판은 전한다. 민초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다보니 유명한 석수장이가 아닌 이웃집 석수장수가 나서게 되고 그런 탓에 미륵불의 얼굴 또한 못생기고 코믹하다.
이곳의 여러 미륵불은 이목구비가 비례에 맞지 않아 마주하면 웃음부터 나온다. 마치 머슴을 연상시킨다. 석가모니 다음으로 부처가 될 것으로 알려진 미륵은 보살과 부처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 모습 또한 보살상과 불상의 두 가지 형태를 띠는 부조화스러운 것이 많다.

두미리 미륵불상.

칠장사 명부전의 궁예.
안성 땅 죽산의 옛 마을은 이제 완전히 해체되어 있다. 경기도의 가장 남쪽으로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난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륵불만이 버려진 오지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미륵불이 널려 있지만 안성 땅이 미륵불이 예언하는 선택의 땅인지에 대해선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매산리 미륵불을 옆에 끼고 5분 거리에는 죽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97호)이 자리하고 있다. 매산리 석불보다는 마모가 심해 보기가 안쓰럽지만 그래도 온화한 얼굴로 중생을 내려다본다.
여기서 또 5분 거리인 기솔리에도 커다란 돌기둥 같은 미륵불(기솔리 석불입상)이 남북으로 놓여 있다. 높이가 6m 가까이 되어 길어 보이는 인상의 쌍둥이 미륵불은 자연석을 둥글게 가공해 만들었다고 한다. 두터운 입, 짧은 귀 등 균형은 맞지 않지만 목에는 번뇌, 업, 고난을 상징하는 삼도가 선명하다.

칠장사 명부전의 임꺽정.
안성 땅에는 미륵불뿐만 아니라 미륵사상도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궁예의 거처라는 주장 외에 여러 가설이 있다. 그 중심에 칠장사가 있다. 칠장사는 임꺽정(?~1562)과 인연이 많은 절이다. 성호 이익은 저서 ‘성호사설’에서 조선의 3대 도둑으로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을 꼽는다. 임꺽정은 황해도를 본거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은 안성 칠장사가 그의 생애에 중요한 대목으로 등장한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따르면 임꺽정의 스승인 갖바치 출신 병해대사가 칠장사 스님이었다. 그래서 칠장사의 건물 요소요소에 임꺽정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사찰 안 홍제관에는 임꺽정이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꺽정불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비록 의적으로 불리긴 하지만 지배계층의 눈으로 보면 도둑과 다름없던 임꺽정의 절에 비극의 주인공인 인목대비의 친필 칠언시가 모셔져 있다는 것이다. 아들 영창대군의 비참한 죽음을 접한 인목대비는 아들을 잃고 무장해제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다.
“늙은 소는 힘을 다한 지 이미 여러 해, 목이 찢기고 가죽은 뚫려 단지 잠만 자고 싶구나. 쟁기질, 써래질도 끝나고 봄비도 흡족한데 주인은 무엇이 괴로워 또 채찍을 가하는가.”
세월이 흘러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이 폐위되고 자신과 영창의 신원이 복원되자 영창을 모신 칠장사에 크게 사례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후세 사가들 중엔 인조반정이 조선의 국운을 끊은 최악의 정변이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힘없는 백성들만 시들어가는 격이다.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된다
한반도에는 유난히 미륵불이 많다. 미륵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고달프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륵불 신앙은 한반도에서는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됐다. 미륵불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 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고 그때의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가 되어 꽃과 향으로 뒤덮인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늘 절대자를 기대하며 산다. 모든 것이 풍부한 현대에도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며 행복한 미래를 소망했던 푸슈킨조차 아내와의 염문에 격분한 나머지 한 사내에게 결투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상대의 총구 앞에서 38세의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은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된다’는 푸슈킨의 시 한 구절을 통해 오히려 미륵불의 역설을 듣는다. 미륵은 없다. 이 땅의 미륵사상은 어쩌면 과거완료형일지도 모른다.

노인대학에 가시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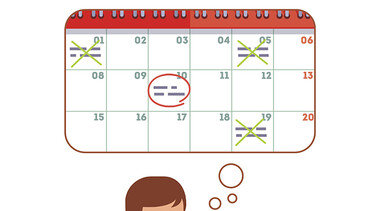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