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소국 의식 버리고 ‘대의명분 외교’ 펼쳐라
- 한반도 통일은 ‘中 평화굴기’ ‘日 재도약’ 필요조건
- 자강(自强) 균세(均勢) 통해 패권국 등장 막아야
- 중국과 선린하면서도 일본과 협력해 견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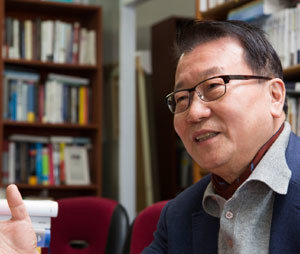
박 교수는 국민통합, 국가발전의 이념으로서 개인의 존엄·창의·자유를 기본으로 삼되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창해왔다. 산업화·민주화·세계화 이후의 지향점으로는 ‘선진화’를 화두로 삼았다. 인기영합주의, 천민자본주의의 해법으로 선공(先公)과 금욕(禁慾)의 ‘선비민주주의’ ‘선비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복 및 분단 70주년인 올해 그가 천착하는 화두는 ‘선진통일강국’.
1월 23일 그를 만나 선진통일강국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남북통일과 평화굴기
▼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한 시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파워가 나날이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한반도가 미국·중국 간 헤게모니 다툼의 전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례로 2월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겸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면서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듯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선진통일강국을 건설하려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죠.
“복잡한 사안이지만 압축해 말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첫째, 한반도 통일이 중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중국의 굴기(堀起)를 두고 정치학 논쟁이 잇따릅니다. 평화적으로 굴기할 것이냐, 분쟁이나 전쟁을 수반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500년 인류 역사에서 글로벌 헤게모니가 15차례가량 바뀌었습니다. 그중 11번 전쟁이 있었어요. 한반도의 통일이 전쟁이나 분쟁을 막아 평화적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만주 지역의 경제적 낙후도 한반도 통일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비정상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익도 없다는 견해를 중국에 확실히 얘기해야 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통일 외교에 나서야 해요. 한반도가 분단돼 있으면 북한의 중국화 즉 중국의 변방 속국화가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제2의 냉전, 다시 말해 대립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내(域內) 모든 나라에 재앙이에요.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번영, 평화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 사활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통일 과정과 통일 후 힘을 합쳐 번영의 아시아를 함께 만들자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策士 왕후닝이 부럽다”
▼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지도로 개혁·개방에 나선 후 성공적 결과물을 만들어왔습니다. 1995년에 개혁·개방의 전환기 국면이 전개됐고, 이후 중국이 국가 대(大)전략을 수립할 때 왕후닝(王?寧)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책사(策士) 노릇을 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이 그를 책사로 발탁한 후 ‘3개 대표론’을 입안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생은 한국의 경세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분이 왕후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첫째, 대단한 독서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듯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푸단대에서 공부할 때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독서의 양뿐 아니라 범위도 대단합니다. 동서양 고전은 물론이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군사를 아우릅니다. 심지어 무협지도 많이 읽는다고 해요. 독서에 대한 관심과 집착은 마오쩌둥(毛澤東)도 비슷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장정(長征)을 할 때도 좋은 새 책이 나오면 밤을 새워 읽었다고 해요. 왕후닝은 독서하는 정책가, 정치가입니다. 창조력, 상상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면모도 독서에서 비롯한 것이겠지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독서를 얼마나 할까요. 학자는 또 어떨까요. 둘째, 왕후닝의 독서 목적은 국가 발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의 화두는 중국의 부흥입니다. 국내·해외 전략을 아울러 공부합니다. 나라 발전이라는 화두에 천착하는 한국 학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공동체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국의 선비들이 얼마나 또렷한 현실 인식을 갖고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반성이 필요해요. 한국의 학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생계형과 선비형이 그것이죠. 선비형 학자는 자기보다 나라를 앞세웁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박 교수는 “왕후닝이 부럽다”고 했다.
“왕후닝은 늘 나라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정치에도 욕심이 없다고 해요. 세 차례의 권력이동 때마다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신형대국관계’(시진핑 주석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구상) 같은 아이디어가 국가 전략으로 채택된 복 많은 사람이죠. 행운아라고도 하겠습니다. 국가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을 때 받아주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지도자가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학자가, 국가가 나아갈 지향과 관련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나요? 왕후닝을 보면 한국의 선비들은 정론을 세워도 추진할 세력과 지도자가 없어 황당하고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문제는 후대에 맡기자”
▼ 중국은 2003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지방정권사(史)로 편입했습니다. 패권주의로 해석할 만한 행동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중화민족주의 부흥을 강조한 왕후닝의 중국몽과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로 꼽히는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63년 공산당 일부 인사가 동북공정과 비슷한 시도에 나섰을 때 대국의 쇼비니즘(맹목적, 광신적, 호전적 애국주의)으로 규정한 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후닝과 저우언라이의 견해가 다른 것에는 어떤 함의가 담겼다고 봅니까.
“두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 식견, 정치적 이념이 어떻게 다르냐를 말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시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우언라이는 혁명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상주의가 살아 숨 쉬던 때입니다. 혁명적 이상주의에서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약소국에 대한 공정 대우라는 이상이 유효할 때였고요. 그런데 왕후닝이 사는 오늘은 패권 지향의 현실주의가 지배합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전략과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주의 시대가 저물고 현실주의 시대가 온 겁니다.”
▼ 2012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자 ‘아베노믹스’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에 조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정신대 문제 등으로 꼬여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는 한동안은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는 피해 입은 할머니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봐야 하지만, 역사 문제는 후손에게 넘겨 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통일을 이뤄내려면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해요. 한반도 통일은 일본의 미래에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성숙한 사회예요. 고령화, 재정적자가 구조화했습니다. 일본 국내만으로는 재도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일본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A)에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일본의 미래’였는데, ‘일본의 미래가 있느냐, 물으면 미안하지만 없다고 본다’고 말한 후 ‘미래를 찾으려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찾아야 한다. 동북아가 경제적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느냐에 당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한일 간 신뢰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진지한 협력관계를 조직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연대하면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한반도 통일이라는 더 큰 사안을 한일관계의 현안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통일 후에는 독도와 역사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입니다.”
속국, 변방으로 가는 길
▼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한미동맹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중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관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은 둘 다 우리 주변의 대국입니다. 앞으로 선린(善隣)해야 할 대국이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 중국은 우리와 영토가 연결됐습니다. 영토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겪은 외침 대부분이 대륙에서 비롯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미국과 동맹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둘째, 중국은 우리와 이념과 가치체계가 다릅니다.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죠. 주지하듯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아시아에서 한미의 전략적 이해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는 겁니다. 아시아의 단일 패권국가는 세계 패권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존과 번영을 지키려면 역내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했을 때 한반도는 속국이거나 변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통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아시아가 서유럽 수준의 경제·사회공동체, 안보협력체로 발전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요.”

1월 23일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왼쪽)와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이 대화를 나눴다.
▼ 일부 좌파 진영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양 부각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벌어지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퇴할 때까지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한반도에서 갖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조선의 상당수 지식인은 주적을 위안스카이로 여겼으나 대한제국은 일본에 침탈당합니다. 당시의 오판은 국제정세에 무지했던 탓이라 하겠습니다. 패권의 발톱을 드러낸 중국과 우경화하는 일본 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미동맹에 기초한 미군이 아시아에서 상당 기간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을 한반도 통일 과정에 끌어들여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강(自强)’입니다. 스스로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대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슴도치가 돼야 해요. 큰 나라라도 발길질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고 여길 만큼 자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원제국(몽골)과도 싸운 나라예요. 고려가 항전한 대원제국은 당시로선 현재의 미국과 중국을 합친 정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안보동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안보동맹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균세(均勢)’ 전략도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각 세력이 균형을 이루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잠재적 패권국가를 균형동맹(balancing coalition)으로 엮어내야 해요. 다자 간, 양자 간 협력을 통해 한 나라가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소프트파워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치 외교, 대의명분 외교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통일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비핵화의 평화 중심 국가를 지향한다’ 같은 어젠다를 내놓는 게 가치 외교 전략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번영의 핵심 구실을 하겠다고 밝히는 겁니다.
하나 더 언급하면, 약소국 의식을 버려야 해요. ‘통일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다녀서는 안됩니다.‘통일하겠다’고 밝히고 ‘통일이 당신네 나라에도 이득’이라고 주변 강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요. 대국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마련할 국가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해 말하고 싶습니다.”
▼ 일부 좌파 지식인은 냉전 시기 핀란드 식의 중립화 모델을 제안합니다. 핀란드가 소련과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립적 정책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펼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도 G2인 미국과 중국 틈에서 중립 모델을 만드는 게 현명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핀란드화 모델(finlandization)은 1960년대 서독에서 생겨난 말로 냉전 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표현. 한 나라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이웃한 대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냉전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과 서유럽 일부 국가가 핀란드화해 반(反)소련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편집자)
“중립화 주장은 몽상”
“중립화 통일론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나 몽상에 가까워요. 중립화하려면 동맹을 포기해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우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터라 미국과의 동맹은 생존의 필수조건이에요.
1904년 1월 고종이 중립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선언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해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러일전쟁이 발발합니다. 1890년대 후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서술하는데요. 그 책에 ‘중립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독립’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혜안을 가졌던 듯합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패권국가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는 한반도를 장악해야만 해요. 우리가 중립화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안 돼요, 그게.”
▼ 선진통일강국을 건설하라면 주체세력이 형성돼야 합니다.
“선진통일강국 건설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는 역사적, 정치적 주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진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어갈 주체가 없습니다. 정당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정당은 이념, 철학, 역사관, 세계관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 이해관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사무소 결합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에는 능하지만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현재의 정당 구조 형태로는 주체세력을 꾸릴 수 없습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죠. 기존 정당을 혁신해 선진통일강국을 여는 세력으로 만들거나 미래 전략을 가진 제3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이론적으론 간단하지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와 지역정당 구조에서는 제3당의 등장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다면 기존 정당 혁신 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선진통일강국을 건설하려면 중국의 부상(浮上)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견인차 구실을 할 주체세력이 형성돼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집권당이 중국 공산당, 일본 여당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8000만 명 넘는 당원을 가졌습니다. 당원들은 정강산당학교에서 혁명정신과 전통을 익힙니다. 선전당학교는 세계화와 시장경제를 가르치고요. 베이징당학교는 정치·사상교육을 합니다. 이렇듯 수준 높은 간부 양성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여의도에만 있는 정당
“지금 말씀한 것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중국, 일본과 국가 발전 전략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과 중국의 공산당, 일본 여당 중 어느 곳이 더 유능하고, 유덕(有德)한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지요. 한국 정당은 굉장히 낙후해 있습니다. 당다운 당이 없잖아요. 이념정당, 가치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파 중심의 사당적, 붕당적 성격이 강하지요. 공당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이 이념과 가치의 깃발을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국회 속 정당은 있는데, 국민 속 정당이 없습니다. 여의도에만 정당이 있어요. 한국 정치는 원내대표 중심입니다. 당 대표 아래 정무대표, 당무대표를 두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합니다. 당무대표가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당원을 교육해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당무대표 중심으로 정당이 바로 서야 해요. 당무대표 아래의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국회의원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당 관료와 당에서 모셔온 전문가가 그 일을 해야 해요. 당무대표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무대표가 맡으면 됩니다. 현재의 원내대표 체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요컨대 정치를 국회로부터 끌어내 국민 속, 역사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년 전 안철수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투어를 했습니다. 정당의 대표, 청년위원장, 정책위원장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국민을 만나 소통하고, 젊은이를 육성해 지방의회에 보내고, 잘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선거에 공천해야 하는데, 사람을 키우지도 않다 선거 때 탤런트 같은 분들을 불러 공천하는 게 현실이죠.”
▼ 미국식, 독일식 중 어떤 게 한국 정당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는 미국식,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는 유럽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정당은 이념과 진성당원을 중시합니다. 대중정당이죠.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실현되며 가치 지향적 정당입니다. 단점은 진성당원 중심인 터라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식 정당은 이념보다 이슈 중심입니다. 광범위한 지지자 중심이죠. 포괄정당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선거 전문가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점은 열린 조직이라는 겁니다. 탈근대의 다양한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치 실현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식, 유럽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게 좋습니다. 유럽식 대중정당의 장점을 강화하면서 미국식의 열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른 길입니다. 진성당원 중심으로 가치 지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해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를 혁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야”
▼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식의 권력 시스템에 집중해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게 개정 절차입니다. 개헌에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주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개헌의 원칙, 범위에 합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꾸려 전문가들이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데다 정파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 사적인 질문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 차이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건가요.
“공부하는 사람이어서인지, 정책적 견해 차이와 사적인 호불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당이라해도 모든 정책에 다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특정 정책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겠죠.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내가 막아야 하는데 할 책무를 못했으니 국회의원직을 돌려드리겠다’고 썼습니다. 당원, 동지에게는 ‘애정을 갖고 한나라당에 들어와 노력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잘못된 것이다. 애정을 남겨두고 간다’고 적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글로 심정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