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택은 대부분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경주 양동마을에 자리잡은 경주 손(孫)씨의 대종택 서백당(書百堂)은 입체적으로 배치되었다. 언덕배기 중간중간에 집들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서백당은 좀더 높은 지대에 있어 위엄을 풍기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풍수적 관점에서 양동마을은 ‘물(勿)’자 형국이다. 동네가 위치한 언덕이 ‘勿’과 흡사한 모양. 배산인 설창산(雪倉山·161m)에서 갈라져나온 4개 지맥 사이사이에 집들이 들어서 있다.
‘勿’자 형국의 장점은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어 추위가 덜하다는 것. 4개의 언덕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바람이 양동마을에 이르러 온순해질 수밖에 없다. 또 언덕 높이가 해발 50∼70m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기 그지없다. 삼복 더위에도 서백당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다.
양동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풍수해가 없다는 것. 어지간한 폭우가 내려도 마을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 1959년 태풍 사라가 몰아쳤을 때도 아랫동네는 침수됐지만 양동마을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
서백당은 ‘勿’자 형국의 양동마을에서 가장 뒤쪽, 그러니까 가장 배후에 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자리잡은 집답게 풍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선점한 셈이다.
흔히 ‘서백당’이라 불리는 경주 손씨 대종택은 20대, 550년의 역사를 지녔다. ‘서백(書百)’은 ‘참을 인(忍)자를 100번 쓴다’는 의미인데, 10만명에 달하는 손씨 집안 대종택을 지키는 종손이라면 그만큼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만 특히 종손 노릇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백당 편액이 걸려 있는 화랑채. 당호 ‘서백’은 ‘참을 인(忍)’자를 100번 쓴다’는 뜻으로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백당은 양민공의 아들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1463∼1529)을 배출한 곳이다. 우재는 27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경상, 전라, 충청, 함경도 등에서 관찰사를 지내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중종반정 직후 상주목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곳 주민들이 살아 있는 그를 사당에 모실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그가 임금에게 올린 문건 ‘오조소(五條疏)’는 우재의 경륜과 선비정신을 짐작케 한다. 국가 관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지침서인 오조소는 ‘군주는 오로지 배움에 힘써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왕실과 고관대작, 그리고 서민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근검절약의 풍습을 진작해야 한다’ ‘국가의 직무를 담당하는 선비가 풍류나 즐기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폐습을 경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도층의 리더십과 도덕성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따라야 할 선비정신이라 하겠다.

① 지금은 ‘퇴역’해 장독대 옆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맷돌.<br>②③ 서백당의 각종 생활유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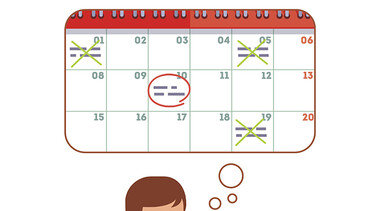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